목차
1. 서론 한국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구체성 심화의 필요성
2. 자금유출입 구조와 조세정책
1) 유입자금의 실체
2) 자금유출의 전체상과 유산자층의 동향
3) 자금유출에 조응한 조세의 기능
3. 자금유출의 사례 분석
1) 전비(戰費) 유출
2) 강제 저축과 가계(家計) 부담
3) 일본 국공채의 강제매입과 조선은행권 남발을 통한 대중수탈
4) 일본인 관리의 봉급으로 유실된 재정
5) 공채비(公債費)와 관업(官業)경영 적자의 재정부담
6) 금융기관의 대일본 청구권
4. 결론 생산력의 총체적 고갈로 귀결된 식민지 경제
2. 자금유출입 구조와 조세정책
1) 유입자금의 실체
2) 자금유출의 전체상과 유산자층의 동향
3) 자금유출에 조응한 조세의 기능
3. 자금유출의 사례 분석
1) 전비(戰費) 유출
2) 강제 저축과 가계(家計) 부담
3) 일본 국공채의 강제매입과 조선은행권 남발을 통한 대중수탈
4) 일본인 관리의 봉급으로 유실된 재정
5) 공채비(公債費)와 관업(官業)경영 적자의 재정부담
6) 금융기관의 대일본 청구권
4. 결론 생산력의 총체적 고갈로 귀결된 식민지 경제
본문내용
파악하지 못한 문화재 유출, 인적 수탈 등을 감안하고 치밀한 세출분석, 공업부문의 재생산구조 및 잉여유출 구조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수탈은 본고에서 언급한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당시에 조선사람이 초근목피로 연명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볼 때 결코 과장되거나 특수사례가 아니었다. 이것이 식민지 경제의 실체요 귀결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이후 변화된 미국의 극동전략 속에서 경제부흥을 배경으로 아시아 진출이 필요했던 일본과 군사정부가 조인한 한일협정(1965. 6. 22) 이후 오늘까지 \'합방\'의 불법성 문제부터 실질적인 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매듭진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 한일협정에 임하는 당시 군사정권의 초점은 李東元(외무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당시 좀더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바가 많다. 하지만 당시 최대의 쟁점은 한일합방 무효시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조약에 관철시키는게 더 중요했다\"( 한겨레 21 82호, 1995. 11. 2). 그러나 그런 표현은 조약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수탈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자본주의를 이식\'했다는 식민지 미화론은 \'수탈도 있었지만\'이라는 겉치레 화두와 달리 식민지 경제의 귀결점인 수탈의 실상에 대해 외면할 뿐 아니라 애초부터 분석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탈하지 않았다\' 또는 \'수탈 운운하는 것은 감정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오도된 전제로 돌아간다. 식민지 미화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제국주의의 \'원죄\'를 인정한 수탈의 실상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죄\'를 부인한 \'신앙\'에 입각한 왜곡된 \'이단의 실증\'은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국내외에서 새로운 세계패권의 정치적 포석을 담은 이데올로기로서 재론되는 식민지 미화론과 달리, 정작 조선 \'개발\'에 \'선의\'를 갖고 임했다는 일제 관리들은 당시 극심했던 수탈의 무모함을 실토하는 형편이다.
)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는 일이 없었다면 \'조선의회\' 설치도 가능했는지 모른다. 일본은 한발한발 임전태세로 끌려들어가 점차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注入해야 했다. 그후 나타난 施政上의 瑕疵가 이 사이에 일본이 범한 오류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善意의 施政 기본이념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財政 , 8 9쪽).
수탈은 특히 전쟁 때문에 극심해졌다. 전쟁이 없었다면 식민지 지배는 \'선의의 시정\'에 힘입어 조선의 발전으로 귀결되었을까 ? 물론 전쟁도발 이전에도 유입자금을 훨씬 초과한 부분이 유출되었다. 1931년까지 유입액은 최대 17억여 엔 정도
) 내역은 공채 33,848만 엔, 회사(조선 본점)투자 21,454만 엔, 회사(일본 본점) 투자 28,186만 엔, 社債 53,990만 엔, 은행회사의 일본 차입금 33,485만 엔 등이었다( 新東亞 4 1, 1934. 1, 43쪽). 위 자료는 총 27억 4,895만 엔으로 집계했지만 조세수입(인지수입 포함)에서 관업경영의 적자분을 제외한 수치와 비슷한 총독부 수입금(6억 2,670여만 엔)까지 포함한 확대된 통계이다. 반면에 내무성 자료에서는 1931년까지 일본자금 유입액을 21억여 엔으로 집계했다(<現況>, 31쪽). 이들 통계는 조선주둔 일본 육해군 주둔비까지 포함시키는 등 가능하면 확대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인 반면, 유출액은 원리금 송금 등을 차치하고 몇 가지 가시적인 통계만으로도 17억 4,800여만 엔
) 일인 관리봉급을 포함한 \'통치비\' 7억 8,800여 만 엔, 공채비 2억 2,800여만 엔, 교육비(일본인학생) 7천여만 엔, 군사관계비 2,200여만 엔, 무역적자 6억 4천여만 엔 등 5개 부문만 예로 들었다.
이나 되었다.
더욱이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러시아 남진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후원에 힘입어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후진국 일본의 군부가 중국(만주)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고, \'총력전\'을 의식하면서 \'일본권\' 전체를 시야에 넣고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상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 加藤俊彦, <軍部の經濟統制思想>, 1979 戰時日本經濟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編), 東京大學 出版會, 67 68쪽
군부의 전쟁구상을 제어할 민주화 수준이 극히 낮았던 일본의 전쟁도발은 필연이었다. 조선의 유산자층이나 식자층은 이러한 전쟁구상을 초기에는 전혀 몰랐고 자신의 이해관계 입각한 견해를 피력조차 못한 채 \'승전\'을 갈망하면서 패전이 명확한 전쟁의 늪에 빠져들어갔다.
\'전쟁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일본경제가 가능했겠는가\' 또는 \'확전만 되지 않았다면 나찌의 프랑스 지배는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처럼 생산적이지 못하다. 경제를 포함한 민족문화의 자존이야말로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생산력의 기반이고 매우 적은 확률의 전쟁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는다는 상식적 사실을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일제의 전쟁도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수구세력의 기득권 방어논리로 전락한 안보논리가 내실을 찾지 못한 결과 남의 나라 국방장관이 북폭(北爆)을 거론해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 초래할 가공할 파괴와 살륙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천박한 국방의식은 냉전체제하의 쇼윈도우적 발전에 도취된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물적 인적 피해를 다른 민족에 안겨준 전쟁도발은 물론 무력침략을 하지 않고, 민족간의 차별 없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자율성이 보장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수탈 없이 다른 민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자기민족의 아픔으로 인식하며, 다른 민족의 민주적 발전, 문화적 자존과 발전, 풍요로운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거꾸로 일본이 조선에 병합되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일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학계에서조차 언제 올지 모르는, 아니 영원히 오지 못할 이러한 \'사해동포주의적\' 망상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한일협정에 임하는 당시 군사정권의 초점은 李東元(외무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당시 좀더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바가 많다. 하지만 당시 최대의 쟁점은 한일합방 무효시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조약에 관철시키는게 더 중요했다\"( 한겨레 21 82호, 1995. 11. 2). 그러나 그런 표현은 조약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수탈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자본주의를 이식\'했다는 식민지 미화론은 \'수탈도 있었지만\'이라는 겉치레 화두와 달리 식민지 경제의 귀결점인 수탈의 실상에 대해 외면할 뿐 아니라 애초부터 분석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탈하지 않았다\' 또는 \'수탈 운운하는 것은 감정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오도된 전제로 돌아간다. 식민지 미화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제국주의의 \'원죄\'를 인정한 수탈의 실상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죄\'를 부인한 \'신앙\'에 입각한 왜곡된 \'이단의 실증\'은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국내외에서 새로운 세계패권의 정치적 포석을 담은 이데올로기로서 재론되는 식민지 미화론과 달리, 정작 조선 \'개발\'에 \'선의\'를 갖고 임했다는 일제 관리들은 당시 극심했던 수탈의 무모함을 실토하는 형편이다.
)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는 일이 없었다면 \'조선의회\' 설치도 가능했는지 모른다. 일본은 한발한발 임전태세로 끌려들어가 점차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注入해야 했다. 그후 나타난 施政上의 瑕疵가 이 사이에 일본이 범한 오류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善意의 施政 기본이념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財政 , 8 9쪽).
수탈은 특히 전쟁 때문에 극심해졌다. 전쟁이 없었다면 식민지 지배는 \'선의의 시정\'에 힘입어 조선의 발전으로 귀결되었을까 ? 물론 전쟁도발 이전에도 유입자금을 훨씬 초과한 부분이 유출되었다. 1931년까지 유입액은 최대 17억여 엔 정도
) 내역은 공채 33,848만 엔, 회사(조선 본점)투자 21,454만 엔, 회사(일본 본점) 투자 28,186만 엔, 社債 53,990만 엔, 은행회사의 일본 차입금 33,485만 엔 등이었다( 新東亞 4 1, 1934. 1, 43쪽). 위 자료는 총 27억 4,895만 엔으로 집계했지만 조세수입(인지수입 포함)에서 관업경영의 적자분을 제외한 수치와 비슷한 총독부 수입금(6억 2,670여만 엔)까지 포함한 확대된 통계이다. 반면에 내무성 자료에서는 1931년까지 일본자금 유입액을 21억여 엔으로 집계했다(<現況>, 31쪽). 이들 통계는 조선주둔 일본 육해군 주둔비까지 포함시키는 등 가능하면 확대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인 반면, 유출액은 원리금 송금 등을 차치하고 몇 가지 가시적인 통계만으로도 17억 4,800여만 엔
) 일인 관리봉급을 포함한 \'통치비\' 7억 8,800여 만 엔, 공채비 2억 2,800여만 엔, 교육비(일본인학생) 7천여만 엔, 군사관계비 2,200여만 엔, 무역적자 6억 4천여만 엔 등 5개 부문만 예로 들었다.
이나 되었다.
더욱이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러시아 남진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후원에 힘입어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후진국 일본의 군부가 중국(만주)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고, \'총력전\'을 의식하면서 \'일본권\' 전체를 시야에 넣고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상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 加藤俊彦, <軍部の經濟統制思想>, 1979 戰時日本經濟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編), 東京大學 出版會, 67 68쪽
군부의 전쟁구상을 제어할 민주화 수준이 극히 낮았던 일본의 전쟁도발은 필연이었다. 조선의 유산자층이나 식자층은 이러한 전쟁구상을 초기에는 전혀 몰랐고 자신의 이해관계 입각한 견해를 피력조차 못한 채 \'승전\'을 갈망하면서 패전이 명확한 전쟁의 늪에 빠져들어갔다.
\'전쟁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일본경제가 가능했겠는가\' 또는 \'확전만 되지 않았다면 나찌의 프랑스 지배는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처럼 생산적이지 못하다. 경제를 포함한 민족문화의 자존이야말로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생산력의 기반이고 매우 적은 확률의 전쟁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는다는 상식적 사실을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일제의 전쟁도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수구세력의 기득권 방어논리로 전락한 안보논리가 내실을 찾지 못한 결과 남의 나라 국방장관이 북폭(北爆)을 거론해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 초래할 가공할 파괴와 살륙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천박한 국방의식은 냉전체제하의 쇼윈도우적 발전에 도취된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물적 인적 피해를 다른 민족에 안겨준 전쟁도발은 물론 무력침략을 하지 않고, 민족간의 차별 없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자율성이 보장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수탈 없이 다른 민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자기민족의 아픔으로 인식하며, 다른 민족의 민주적 발전, 문화적 자존과 발전, 풍요로운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거꾸로 일본이 조선에 병합되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일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학계에서조차 언제 올지 모르는, 아니 영원히 오지 못할 이러한 \'사해동포주의적\' 망상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추천자료
 일제 통치 시대의 행정
일제 통치 시대의 행정 일제강점 시대, 조선 민중은 어떻게 살았을까요?(20세기 우리역사)
일제강점 시대, 조선 민중은 어떻게 살았을까요?(20세기 우리역사) 디지털 시대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디지털 시대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일제 식민시대 지방제도 개편과 참정권 문제 연구
일제 식민시대 지방제도 개편과 참정권 문제 연구 차문화의 역사, 전래,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대와 현대의 차문화
차문화의 역사, 전래,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대와 현대의 차문화 만해 한용운과 일제강점기 시대
만해 한용운과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 시대의 역사 연구
일제 시대의 역사 연구 [일상생활사] 담배의 어원, 담배의 이동 과정, 의약품으로의 담배, 조선시대 때 담배문화, 담...
[일상생활사] 담배의 어원, 담배의 이동 과정, 의약품으로의 담배, 조선시대 때 담배문화, 담... 한국민족운동사_1920년대 일제 제국주의 시대의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한국민족운동사_1920년대 일제 제국주의 시대의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의복의 역사_여성복의 변천과정]개화기, 일제 강점기, 광복 후, 박정희 정권, 영 패션 시대,...
[의복의 역사_여성복의 변천과정]개화기, 일제 강점기, 광복 후, 박정희 정권, 영 패션 시대,... [한국문화사] <쌀의 역사> 쌀의 기원과 원산지 및 전파경로, 우경법과 이앙법, 일제의 쌀수탈...
[한국문화사] <쌀의 역사> 쌀의 기원과 원산지 및 전파경로, 우경법과 이앙법, 일제의 쌀수탈... [교육철학 및 교육사(Ⅱ)]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후기의 교육사상, 근대의 교육 (조선시대 교...
[교육철학 및 교육사(Ⅱ)]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후기의 교육사상, 근대의 교육 (조선시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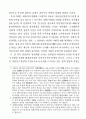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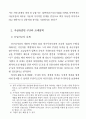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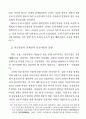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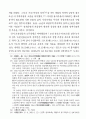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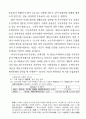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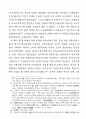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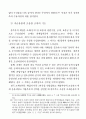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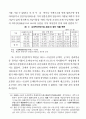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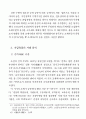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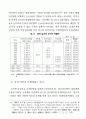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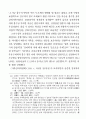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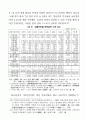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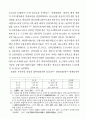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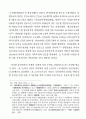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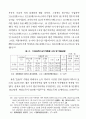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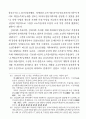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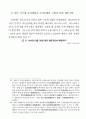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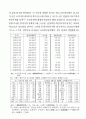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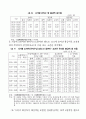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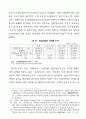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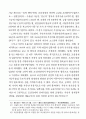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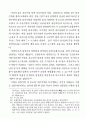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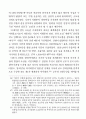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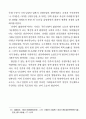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