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서 언
二. 자연자원의 획득
1. 식용식물
2. 수 렵
3. 어로
三. 농경생활의 영위
1. 논농사와 밭농사
2. 수전의 입지와 구조
3. 경작
4. 수확·탈곡
5. 저장
四. 식생활
二. 자연자원의 획득
1. 식용식물
2. 수 렵
3. 어로
三. 농경생활의 영위
1. 논농사와 밭농사
2. 수전의 입지와 구조
3. 경작
4. 수확·탈곡
5. 저장
四. 식생활
본문내용
, 약 143g 정도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필요한 양은 430g이 되고 1년이면 157kg에 이른다. 登呂유적의 조사에서 동일시기의 주거인원은 총 60인 정도로, 1년이면 65,700합(9,400kg)이 소비된다. 登呂유적의 수전면적은 대략 2만여평으로, 100,000합(14,300kg) 정도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분석한 乙益重隆氏는 마을에서 소비하고 남는 최소한 30,000합 이상은 다음해의 종자나 비축물자 혹은 교환물자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유적에서 이와 같은 여분이 계상되지는 않고 대개는 자체 수요의 50%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乙益重隆, 1978)
이를 관창리유적에 적용해 보면, 곡부의 가용가능한 수전면적은 약 7,000평, 산출량으로는 35,000합(5,000kg)이 계상된다. 동시기의 주거지는 약 20기 정도로 주거당 평균인원을 3.5인으로 보았을 때, 전체구성원은 70인, 이들이 1년 내내 쌀만 먹었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로 하는 양은 약 76,000여합(약11,000kg)이 되어, 전체소비량의 절반정도가 쌀로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쌀이 주식으로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식생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먹는 방법에 대한 기록은 미미한 형편이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 부여인이 식사를 할 때, 俎豆(조두)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俎가 소반형태의 상을 일컫고, 豆는 나무로 만든 고배를 의미하고 있음을 본다면 목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匙箸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한편, 왜인전에도 \'음식을 먹을 때는 豆를 사용하여 손으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은 대나무로 만든 고배를 뚱하고 豆는 나무로 만든 고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식용기로서 목기사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식사도구인 匙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자비용토기에 남아있는 조리흔적으로 보아 주로 쌀로서 죽이나 밥을 지어먹거나 기타 스프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가의 식사도구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무문토기유적에서 주전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식생활에 실제 사용된 도구는 매우 다양하였을 것이다. 단지 이들이 목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습지에 대한 조사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된 일본 岡山市 南유적에서는 彌生中期에 해당하는 목제 포크가 발견되었다. 실제 식사시 사용된 것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식생활에 여러 형태의 도구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五. 결어
고대의 생업에 대한 연구는 대상은 비록 방대하지만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연구대상에서 도외시되어져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차츰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 고고자료의 중가여부에 따라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너무 방대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구체적인 중거를 제시하거나 제대로 논증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고를 통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점 양해를 구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강인희, 1978,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곽종철 외, 1995, 「신석기시대 토기태토에서 검출된 벼의 plant-opal」, 『한국고고학보』32.
권진숙, 1994, 「탈곡도구의 변천개관」, 『한국의 농경문화』 제4집, 경기대학교박물관.
권진숙, 1991, 「도설 한국의 벼농사」, 『한국의 농경문화』 제3집, 경기대학교박물관.
김재홍, 1995,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7.
안덕임, 1993, 「패총출토 동물유체-안면도 고남리패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29.
안승모, 1996, 「한국 선사농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7.
이근수, 1991, 「<농사직설>단계에서의 수전농업」, 『한국의 농경문화』3, 경기대학교박물관.
이춘녕, 1989, 『한국농학사』, 민음사.
이현혜, 1991, 「삼국시대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4∼5세기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지건길.안승모, 1983, 「한반도 선사시대 출토 곡류와 농구」, 『한국의 농경문화』, 경기대학 출판부.
허문회, 1991, 「한국 재배도의 기원과 전래」, 『한국고고학보』27.
後藤直, 1991, 「日韓出土の植物遺體」, 『韓日交涉の考古學』, 六興出版.
寺澤薰.寺澤知子, 1981, 「彌生時代植物質食料の基礎的硏究」, 『考古學論攷』第5冊.
渡邊誠, 1976, 『繩文時代の植物食』.
西本豊弘, 1983, 「イヌ」 『繩文文化の硏究』2-生業-, 雄山閣.
赤澤 威, 1983, 『採集狩獵民の考古學』, 海鳴社.
鈴木公雄, 1989, 『貝塚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社.
乙益重隆, 1978, 「彌生農業の生産力と勞動力」, 考古學硏究 25-2.
山崎純男, 1982, 『海の中道遺蹟』,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87集.
藤原宏志外, 1989, 「先史時代水田の區劃規模決定要因に關する檢討」, 『考古學と自然科學』 第21號, 日本文化財科學會誌.
深澤芳樹, 1995, 「おこげのあと」, 『文化財論叢Ⅱ』,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創立40周年記念論文集.
工樂善通, 1991, 『水田の考古學』, UP考古學選書[12], 東京大學出版會.
山口讓治, 1990, 「彌生文化成立期の木器」, 『生産と流通の考古學』, 橫山浩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
金關怒.佐原眞編, 1988, 『彌生文化の硏究』-生業-, 雄山閣.
石毛直道, 1968, 「日本稻作の起源」, 『史林』51-5.6.
坪井洋文, 1983, 「靈的食べ物としての米」, 『世界の食べもの』, 週刊朝日百科 117號.
기타 발굴조사보고서
---------------------------------------------------------------
이 자료는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 [레포트 천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정보·아이디어·지식\" 복합 포탈의 리더 \"다자바컴\"(www.dajaba.com)
이를 관창리유적에 적용해 보면, 곡부의 가용가능한 수전면적은 약 7,000평, 산출량으로는 35,000합(5,000kg)이 계상된다. 동시기의 주거지는 약 20기 정도로 주거당 평균인원을 3.5인으로 보았을 때, 전체구성원은 70인, 이들이 1년 내내 쌀만 먹었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로 하는 양은 약 76,000여합(약11,000kg)이 되어, 전체소비량의 절반정도가 쌀로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쌀이 주식으로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식생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먹는 방법에 대한 기록은 미미한 형편이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 부여인이 식사를 할 때, 俎豆(조두)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俎가 소반형태의 상을 일컫고, 豆는 나무로 만든 고배를 의미하고 있음을 본다면 목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匙箸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한편, 왜인전에도 \'음식을 먹을 때는 豆를 사용하여 손으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은 대나무로 만든 고배를 뚱하고 豆는 나무로 만든 고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식용기로서 목기사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식사도구인 匙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자비용토기에 남아있는 조리흔적으로 보아 주로 쌀로서 죽이나 밥을 지어먹거나 기타 스프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가의 식사도구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무문토기유적에서 주전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식생활에 실제 사용된 도구는 매우 다양하였을 것이다. 단지 이들이 목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습지에 대한 조사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된 일본 岡山市 南유적에서는 彌生中期에 해당하는 목제 포크가 발견되었다. 실제 식사시 사용된 것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식생활에 여러 형태의 도구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五. 결어
고대의 생업에 대한 연구는 대상은 비록 방대하지만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연구대상에서 도외시되어져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차츰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 고고자료의 중가여부에 따라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너무 방대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구체적인 중거를 제시하거나 제대로 논증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고를 통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점 양해를 구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강인희, 1978,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곽종철 외, 1995, 「신석기시대 토기태토에서 검출된 벼의 plant-opal」, 『한국고고학보』32.
권진숙, 1994, 「탈곡도구의 변천개관」, 『한국의 농경문화』 제4집, 경기대학교박물관.
권진숙, 1991, 「도설 한국의 벼농사」, 『한국의 농경문화』 제3집, 경기대학교박물관.
김재홍, 1995,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7.
안덕임, 1993, 「패총출토 동물유체-안면도 고남리패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29.
안승모, 1996, 「한국 선사농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7.
이근수, 1991, 「<농사직설>단계에서의 수전농업」, 『한국의 농경문화』3, 경기대학교박물관.
이춘녕, 1989, 『한국농학사』, 민음사.
이현혜, 1991, 「삼국시대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4∼5세기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지건길.안승모, 1983, 「한반도 선사시대 출토 곡류와 농구」, 『한국의 농경문화』, 경기대학 출판부.
허문회, 1991, 「한국 재배도의 기원과 전래」, 『한국고고학보』27.
後藤直, 1991, 「日韓出土の植物遺體」, 『韓日交涉の考古學』, 六興出版.
寺澤薰.寺澤知子, 1981, 「彌生時代植物質食料の基礎的硏究」, 『考古學論攷』第5冊.
渡邊誠, 1976, 『繩文時代の植物食』.
西本豊弘, 1983, 「イヌ」 『繩文文化の硏究』2-生業-, 雄山閣.
赤澤 威, 1983, 『採集狩獵民の考古學』, 海鳴社.
鈴木公雄, 1989, 『貝塚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社.
乙益重隆, 1978, 「彌生農業の生産力と勞動力」, 考古學硏究 25-2.
山崎純男, 1982, 『海の中道遺蹟』,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87集.
藤原宏志外, 1989, 「先史時代水田の區劃規模決定要因に關する檢討」, 『考古學と自然科學』 第21號, 日本文化財科學會誌.
深澤芳樹, 1995, 「おこげのあと」, 『文化財論叢Ⅱ』,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創立40周年記念論文集.
工樂善通, 1991, 『水田の考古學』, UP考古學選書[12], 東京大學出版會.
山口讓治, 1990, 「彌生文化成立期の木器」, 『生産と流通の考古學』, 橫山浩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
金關怒.佐原眞編, 1988, 『彌生文化の硏究』-生業-, 雄山閣.
石毛直道, 1968, 「日本稻作の起源」, 『史林』51-5.6.
坪井洋文, 1983, 「靈的食べ物としての米」, 『世界の食べもの』, 週刊朝日百科 117號.
기타 발굴조사보고서
---------------------------------------------------------------
이 자료는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 [레포트 천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정보·아이디어·지식\" 복합 포탈의 리더 \"다자바컴\"(www.dajab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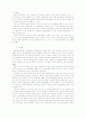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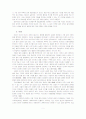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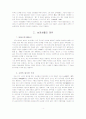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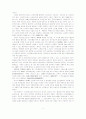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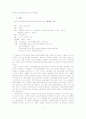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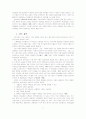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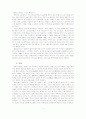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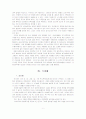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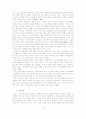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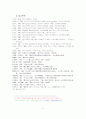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