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튼부터 로잔까지
목적과 과정
위튼
베를린
로잔
요약
목적과 과정
위튼
베를린
로잔
요약
본문내용
일부 로잔 회의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2.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주의자들은 비슷한 자세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존 스토트와 같은 일부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 이 둘은 통합되어야 하며 또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선교화 연합은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로잔회의에서 \"교회의 분명한 진실 안에서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단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모호하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 국제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기관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표어가 되고 있다(참고. 카이스,1983).
4. 기독교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토론이 공식적인 성명서를 특정하게 읽거나 오해와 소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글래서와 윈터 같은 학자들은 이 문화간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원칙적으로 로잔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5. 아마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복음주의와 사회변화 및 활동에 대한 것일 것이다. 로잔회의까지 복음주의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상반되는 의견들이 들려왔다. 그러나 로잔에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 로잔회의는 제자훈련에 대해 두 가지 의무적인 관점을 지지했다(마28:18-20). 하나님은 metanoia와 제자훈련을 요구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으로 확인됐다. 간단히 말해, 로잔회의는 복음주의가 존재론적으로 해석되고 사회 활동이 목적론적으로 해석된다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먼저이며 사회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 왕국이 알아서 할 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다시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로잔회의는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작은 심의회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로잔의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심의회에는 복음주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도 마드라스 선언의 복음주의 연합(1979), 간소한 삶을 위한 복음주의 약속(1980), 개발 신학 상담(1980), 복음주의와 사회적 책임(1980)등이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복음주의 운동은 우리의 이 혁명적인 세기와 타협을 해왔다는 사실을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위튼 회의에 앞서 복음주의자들은 \"후기 기독교\" 세계의 현실을 고려에 넣은 선교학적 전략을 제시하려는 WCC의 시도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기 다른 나라와 다른 정치 사회학적 상황에서 파견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복음주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복음주의적 사고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종교회의 측에 영향을 미쳤던 비 신학적인 요소들이 비슷하게 복음주의 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종교 회의 운동 그 자체가 1966년 이후로 복음주의 운동이 취해온 수정 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종교 회의 운동은 그 해 이후로 복음주의 운동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히 종교 회의 측도 복음주의 측도 어떻게 교회가 선교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영적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 할 수 없다고 본다. 종교 회의의 개혁안도 복음주의의 개혁안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 접근했다고 할 수 없다. 양측 모두 항상 인기 있는 생각이나 대다수의 바램을 편드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여 여전히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복음에 대한 이해나 이 문화 선교에 대한 관점 또 비기독교 종교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신학의 세세한 항목이 아니라 교회가 건실한 선교 전략을 제도적인 이념주의와 혼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학의 세세한 항목은 우리가 다른 지위에 있고 다른 문화에서 길러져 일정 시각으로 성서적 현실을 인식하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면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볼 때, 선교학 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실제 문제는 종교정치학적 스팩트럼의 좌나 우로 치우치도록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인식론상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한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와 비프로테스탄트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선교학 의제에 있어 주된 이슈(이문화적 복음주의를 위한 철학적 정당화와 그로 인한 개종과 같은 문제)를 공정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WCC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략은 신기하고 의심스러운 것인 반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진정한 복음주의\"(맥가브런)를 위한 표준구라는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학에 있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실\"은 당연히 하너가 느낀 또 글래서와 맥가브런이 묘사한(1983) 더욱 벌어진 복음주의와 종교 회의 측 사이에 차이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점점 더 에큐메니칼해졌으며 에큐매니칼 측은 더욱 복음주의화 됐을 뿐 아니라(앤더슨, 1985:226) 두 측은 많은 선교학적 문제에 있어 의견일치를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바스함 1979: 331-67, 코스타스 1984:135-61). 이런 발전은 단순히 위턴, 베를린, 로잔 회의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늘 날 이것들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다들여진다. 일정한 시간 내에 비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와 같은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의 대부분을 푼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간의 친선이 지속될 것이냐 또 우리의 변화무쌍한 세계가 두 운동사이에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 운동 모두 자신들에게 맞는 일을 가진 셈이다.
2.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주의자들은 비슷한 자세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존 스토트와 같은 일부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 이 둘은 통합되어야 하며 또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선교화 연합은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로잔회의에서 \"교회의 분명한 진실 안에서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단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모호하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 국제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기관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표어가 되고 있다(참고. 카이스,1983).
4. 기독교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토론이 공식적인 성명서를 특정하게 읽거나 오해와 소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글래서와 윈터 같은 학자들은 이 문화간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원칙적으로 로잔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5. 아마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복음주의와 사회변화 및 활동에 대한 것일 것이다. 로잔회의까지 복음주의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상반되는 의견들이 들려왔다. 그러나 로잔에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 로잔회의는 제자훈련에 대해 두 가지 의무적인 관점을 지지했다(마28:18-20). 하나님은 metanoia와 제자훈련을 요구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으로 확인됐다. 간단히 말해, 로잔회의는 복음주의가 존재론적으로 해석되고 사회 활동이 목적론적으로 해석된다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먼저이며 사회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 왕국이 알아서 할 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다시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로잔회의는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작은 심의회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로잔의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심의회에는 복음주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도 마드라스 선언의 복음주의 연합(1979), 간소한 삶을 위한 복음주의 약속(1980), 개발 신학 상담(1980), 복음주의와 사회적 책임(1980)등이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복음주의 운동은 우리의 이 혁명적인 세기와 타협을 해왔다는 사실을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위튼 회의에 앞서 복음주의자들은 \"후기 기독교\" 세계의 현실을 고려에 넣은 선교학적 전략을 제시하려는 WCC의 시도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기 다른 나라와 다른 정치 사회학적 상황에서 파견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복음주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복음주의적 사고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종교회의 측에 영향을 미쳤던 비 신학적인 요소들이 비슷하게 복음주의 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종교 회의 운동 그 자체가 1966년 이후로 복음주의 운동이 취해온 수정 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종교 회의 운동은 그 해 이후로 복음주의 운동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히 종교 회의 측도 복음주의 측도 어떻게 교회가 선교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영적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 할 수 없다고 본다. 종교 회의의 개혁안도 복음주의의 개혁안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 접근했다고 할 수 없다. 양측 모두 항상 인기 있는 생각이나 대다수의 바램을 편드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여 여전히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복음에 대한 이해나 이 문화 선교에 대한 관점 또 비기독교 종교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신학의 세세한 항목이 아니라 교회가 건실한 선교 전략을 제도적인 이념주의와 혼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학의 세세한 항목은 우리가 다른 지위에 있고 다른 문화에서 길러져 일정 시각으로 성서적 현실을 인식하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면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볼 때, 선교학 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실제 문제는 종교정치학적 스팩트럼의 좌나 우로 치우치도록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인식론상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한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와 비프로테스탄트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선교학 의제에 있어 주된 이슈(이문화적 복음주의를 위한 철학적 정당화와 그로 인한 개종과 같은 문제)를 공정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WCC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략은 신기하고 의심스러운 것인 반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진정한 복음주의\"(맥가브런)를 위한 표준구라는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학에 있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실\"은 당연히 하너가 느낀 또 글래서와 맥가브런이 묘사한(1983) 더욱 벌어진 복음주의와 종교 회의 측 사이에 차이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점점 더 에큐메니칼해졌으며 에큐매니칼 측은 더욱 복음주의화 됐을 뿐 아니라(앤더슨, 1985:226) 두 측은 많은 선교학적 문제에 있어 의견일치를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바스함 1979: 331-67, 코스타스 1984:135-61). 이런 발전은 단순히 위턴, 베를린, 로잔 회의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늘 날 이것들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다들여진다. 일정한 시간 내에 비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와 같은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의 대부분을 푼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간의 친선이 지속될 것이냐 또 우리의 변화무쌍한 세계가 두 운동사이에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 운동 모두 자신들에게 맞는 일을 가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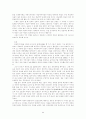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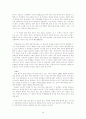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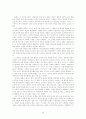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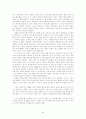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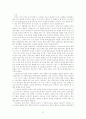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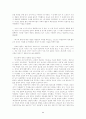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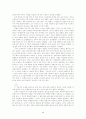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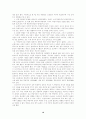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