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목차
PART 1 성균관
PART 2 사학
PART 3 과거제도
PART 4 서원
PART 5 향교
PART 2 사학
PART 3 과거제도
PART 4 서원
PART 5 향교
본문내용
왜란 이후 서원이 남설되어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서원은 본래 명현(名賢)을 봉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높으면 서원을 세우고 가족이 성(盛)하면 서원을 세우고 혹은 한 사람의 서원을 수십여곳씩 첩설(疊設)하는 예도 있어 의론이 엇갈려 종종 난장판을 이루기도 하였다.
서원 뿐만 아니라 향사(鄕祠)도 또한 남설(濫設)되었다. 향사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마친 충신 열사를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 유림들이 건설한 것으로서, 진천의 김유신사(金**信祠), 진주의 은열사(殷烈祠, 姜民瞻)와 같이 고려 이전에 건립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에 건설한 것이다. 선조시대에 건설한 순천의 충민사(李舜臣), 광주의 보충사(高敬命) · 의열사(金千鎰), 동래의 충렬사(宋象賢)를 비롯하여 각지에 많은 향사가 설립되었는데,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여 전국의 서원과 향사를 총계하면 약 65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서원과 향사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는 면세되었으므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서원에는 노비뿐만 아니라 양민이 몰락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으므로 군사행정에 또한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원생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향교의 교생(校生)을 노예와 같이 멸시한 까닭에 향교가 무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반이 향교에 입학하지 않고 아전(衙前)들이 향교를 점령한 것은 이 까닭이다. 당쟁이 발전함에 따라 서원은 당쟁의 소굴이 되어 자기 당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소위 만인소(萬人疏)를 만들어 서울에 올라와 정치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았다. 그러므로 인조 때부터 서원의 폐해를 논하여 서원의 신축과 첩설(疊設)을 금하고 사액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서원과 향사는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다.
《각 서원의 교과목》
서원명
교과목
西岳書院
小學 四書 五經 公禮·諸史集·詞章
石岡書院
小學 四書 五經 諸性理之書·史學·子集
仁賢書院
小學 四書 五經 家禮·子·史集·詞章
知川書院
小學 四書 五經 擊蒙要訣·先賢性理之書·史記·詞章
伊山書院
小學 四書 五經 家禮·諸史·子集·文章
德陽書院
小學 四書 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考巖書院
小學 四書 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Part 4 향교(鄕校)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운영된 중등정도의 교육기관이다. 일명 교궁(校宮), 재궁(齋宮)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이다. 고려의 학제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국자감·동서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다. 즉 인종 5년(1127) 3월에 여러 주(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를 가르치라는 조서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향교의 제도는 공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사는 조교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도 또한 퇴폐되니 향교도 역시 쇠미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곡으로 하여금 여러 군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원년(1392)에 각 도의 안찰사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이 해에는 \'제주에 학교를 세우다\' 라고 하고, 또 태조가 직위한 뒤에 공주(지금의 경흥)로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 다 학교를 세우고 선비를 모아 경서를 가르치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향교는 부·목·군·현에 각각 1개교씩 설립을 보게 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설립의 목적은 성현에 대한 향사(享祀)와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함에 있으며, 아울러 지방문화의 향상 및 사풍진작 등 사회교육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향교의 역할 자체가 지방에서 관리양성 이외에 또 그 지방의 유교적 미풍양속 중심지로서의 과업도 담당해야 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러기에 향교나 향교 교관은 향교 안의 유생을 교도하는 일 이외에 민간에 도덕적·예양적 향풍을 수립시키는 것이 당시의 방침이었으니,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를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를 지도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향교 교관의 임무는 문자와 의식을 통하여 민간의 향풍을 순화하는 데 있었다.
유교정신을 국민 생활에 침투시키는 데 있어서 향교의 역할은 양노례(養老禮), 향음례(鄕飮禮), 향사례(鄕射禮) 등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양노례는 미풍순화에 매우 중요했으므로 각 지방관들이 예풍행정의 하나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 식은 향교 교정에서 향교 직원의 협력으로 행하였었다.
향음례는 매년 10월에 향촌의 나이 많고 덕행이 높은 이들을 주빈으로 청하여 모아놓고,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이다. 이 예식이 있을 때는 원근의 선비들과 학생이 모여오고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그 의식은 매우 성대하였고, 한 마을을 교화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가졌었다.
향음례 다음으로는 항상 향사례가 따른다. 이는 1477년 왕이 태학에서 대사(大射)를 행하고 열읍에서 음사례(飮射禮)를 행하고 명한 것이 그 시초가 되어 있다. 향교의 향사례는 성균관의 대사례와 같이 예양 훈련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해마다 춘추 두 차례에 효·제·충·신하고 예를 숭상하는 이를 주빈으로 맞고 주배와 궁사와 음악으로 손과 주인이 서로 즐겨하되 예의를 엄중히 했다.
이 향음례, 향사례는 모두 덕행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 향촌의 미풍양속을 유지케 한 것이었으니, 이는 곧 사회교육의 의의가 컸던 것이다.
향교 역시 성균관과 같이 문묘·명륜당 및 선철·선현을 제사하는 동서양무, 동서양재를 두었다. 그러므로 향교는 규모는 작지만 성균관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교의 문묘는 성균관의 문묘와 비슷하나, 그 규모가 작고 군·현의 대소에 따라 향사자 수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를 두고 보통 내외양사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광생을 두었다.
서원 뿐만 아니라 향사(鄕祠)도 또한 남설(濫設)되었다. 향사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마친 충신 열사를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 유림들이 건설한 것으로서, 진천의 김유신사(金**信祠), 진주의 은열사(殷烈祠, 姜民瞻)와 같이 고려 이전에 건립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에 건설한 것이다. 선조시대에 건설한 순천의 충민사(李舜臣), 광주의 보충사(高敬命) · 의열사(金千鎰), 동래의 충렬사(宋象賢)를 비롯하여 각지에 많은 향사가 설립되었는데,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여 전국의 서원과 향사를 총계하면 약 65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서원과 향사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는 면세되었으므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서원에는 노비뿐만 아니라 양민이 몰락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으므로 군사행정에 또한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원생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향교의 교생(校生)을 노예와 같이 멸시한 까닭에 향교가 무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반이 향교에 입학하지 않고 아전(衙前)들이 향교를 점령한 것은 이 까닭이다. 당쟁이 발전함에 따라 서원은 당쟁의 소굴이 되어 자기 당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소위 만인소(萬人疏)를 만들어 서울에 올라와 정치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았다. 그러므로 인조 때부터 서원의 폐해를 논하여 서원의 신축과 첩설(疊設)을 금하고 사액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서원과 향사는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다.
《각 서원의 교과목》
서원명
교과목
西岳書院
小學 四書 五經 公禮·諸史集·詞章
石岡書院
小學 四書 五經 諸性理之書·史學·子集
仁賢書院
小學 四書 五經 家禮·子·史集·詞章
知川書院
小學 四書 五經 擊蒙要訣·先賢性理之書·史記·詞章
伊山書院
小學 四書 五經 家禮·諸史·子集·文章
德陽書院
小學 四書 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考巖書院
小學 四書 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Part 4 향교(鄕校)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운영된 중등정도의 교육기관이다. 일명 교궁(校宮), 재궁(齋宮)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이다. 고려의 학제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국자감·동서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다. 즉 인종 5년(1127) 3월에 여러 주(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를 가르치라는 조서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향교의 제도는 공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사는 조교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도 또한 퇴폐되니 향교도 역시 쇠미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곡으로 하여금 여러 군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원년(1392)에 각 도의 안찰사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이 해에는 \'제주에 학교를 세우다\' 라고 하고, 또 태조가 직위한 뒤에 공주(지금의 경흥)로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 다 학교를 세우고 선비를 모아 경서를 가르치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향교는 부·목·군·현에 각각 1개교씩 설립을 보게 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설립의 목적은 성현에 대한 향사(享祀)와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함에 있으며, 아울러 지방문화의 향상 및 사풍진작 등 사회교육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향교의 역할 자체가 지방에서 관리양성 이외에 또 그 지방의 유교적 미풍양속 중심지로서의 과업도 담당해야 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러기에 향교나 향교 교관은 향교 안의 유생을 교도하는 일 이외에 민간에 도덕적·예양적 향풍을 수립시키는 것이 당시의 방침이었으니,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를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를 지도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향교 교관의 임무는 문자와 의식을 통하여 민간의 향풍을 순화하는 데 있었다.
유교정신을 국민 생활에 침투시키는 데 있어서 향교의 역할은 양노례(養老禮), 향음례(鄕飮禮), 향사례(鄕射禮) 등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양노례는 미풍순화에 매우 중요했으므로 각 지방관들이 예풍행정의 하나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 식은 향교 교정에서 향교 직원의 협력으로 행하였었다.
향음례는 매년 10월에 향촌의 나이 많고 덕행이 높은 이들을 주빈으로 청하여 모아놓고,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이다. 이 예식이 있을 때는 원근의 선비들과 학생이 모여오고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그 의식은 매우 성대하였고, 한 마을을 교화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가졌었다.
향음례 다음으로는 항상 향사례가 따른다. 이는 1477년 왕이 태학에서 대사(大射)를 행하고 열읍에서 음사례(飮射禮)를 행하고 명한 것이 그 시초가 되어 있다. 향교의 향사례는 성균관의 대사례와 같이 예양 훈련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해마다 춘추 두 차례에 효·제·충·신하고 예를 숭상하는 이를 주빈으로 맞고 주배와 궁사와 음악으로 손과 주인이 서로 즐겨하되 예의를 엄중히 했다.
이 향음례, 향사례는 모두 덕행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 향촌의 미풍양속을 유지케 한 것이었으니, 이는 곧 사회교육의 의의가 컸던 것이다.
향교 역시 성균관과 같이 문묘·명륜당 및 선철·선현을 제사하는 동서양무, 동서양재를 두었다. 그러므로 향교는 규모는 작지만 성균관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교의 문묘는 성균관의 문묘와 비슷하나, 그 규모가 작고 군·현의 대소에 따라 향사자 수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를 두고 보통 내외양사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광생을 두었다.
추천자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일상 생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일상 생활 조선시대 서민의 직업생활
조선시대 서민의 직업생활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 조선시대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조선시대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조선시대 미술사 완벽정리
조선시대 미술사 완벽정리 [조선신분제]조선시대의 신분제도(양반,중인,상민,천민)
[조선신분제]조선시대의 신분제도(양반,중인,상민,천민) 조선시대의 여류문학
조선시대의 여류문학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조선시대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조선시대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의 배경,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과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의 배경,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과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 조선시대 성균관과 자치활동
조선시대 성균관과 자치활동 [음악][고구려시대 음악][백제시대 음악][신라시대 음악][고려시대 음악][조선시대 음악][고...
[음악][고구려시대 음악][백제시대 음악][신라시대 음악][고려시대 음악][조선시대 음악][고...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인사행정][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조선후기 인사행정][이승만정부 인사행정][국민의 정부]...
[인사행정][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조선후기 인사행정][이승만정부 인사행정][국민의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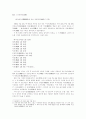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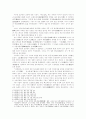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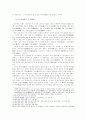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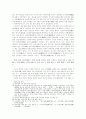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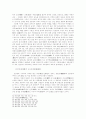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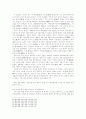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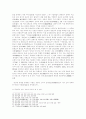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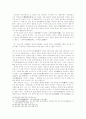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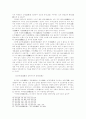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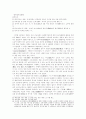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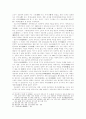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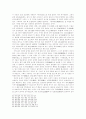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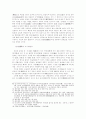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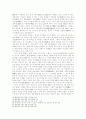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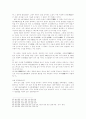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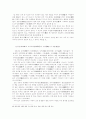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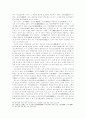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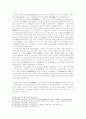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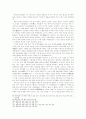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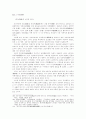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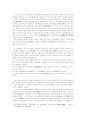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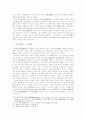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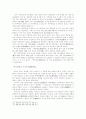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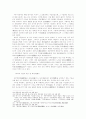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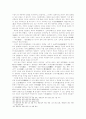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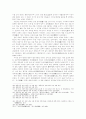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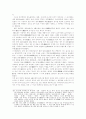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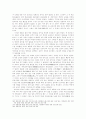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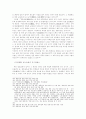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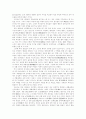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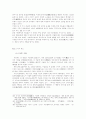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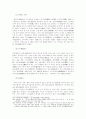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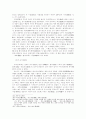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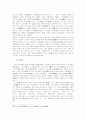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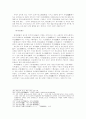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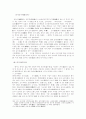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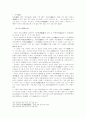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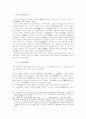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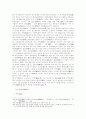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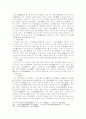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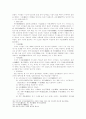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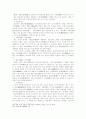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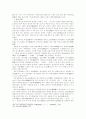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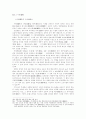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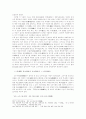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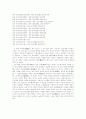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