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없음..
본문내용
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신라인으로 돌아고 있는 둣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신라인인데 묘를 파려고 해요 하는 생각에 미쳤을 때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는 그냥 수수께께로 남겨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시가지로 들어섰을 낯설게 여겨지는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내가 살던 곳이구나 싶었지만 영시간 전에 빠져있던 곳과의 시대차 때문에 오히려 이곳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점점 현대에 익숙해지면서 몇시간 전에 빠져 있던 곳과 현대가 겹쳐져 보였다. 이 두 시대 사이의 변화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한 민족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 속에 그때도 있있고 지금도 있는 우리 민족 정신의 고요한 흐름은 느낄 수 있었다. 이 흐름만이 우리 민족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고 생각했다.
진실한 느낌으로 남을 여행
1학년 장미반 유명은(1995년)
\"Where was your favorite?\"
나흘간의 국토순례가 막을 내리고 학교에서 한참 사진들을 돌려 보고 다닐 때 쯤이었다. 영어 회화 시간에 선생님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간신히 가라앉혔던 내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다. 어느 한 군데를 둘러 보고 버스에 오를 때 마다 뿌듯하게 상기되었던 며칠 전의 나처럼.
\"My favorite was….\"
아이들의 대답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대답 중에 나오는 여러 지명이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불국사, 광주 비엔날레, 낙화암…. 내가 만일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황룡사지,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국토순례 일정도 하룻밤을 넘겼고, 이틀째라는 생각에 설레임과 기대에 마음을 부풀리는 것도 이제 어느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석굴암에서의 해돋이를 시작으로 참으로 여러 곳에서 오전을 보내고 나니, 어느 새 하루의 반이 지나 있었다.
분황사에서 나온 나와 내 친구는 둘씩 셋씩 줄줄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행렬에 끼게 되었다. 목적지는 황룡사지였다. 가을임을 의심할 수 없는, 진한 하늘을 닮은 그 진한 햇빛을 받으며, 흙과 풀을 밟고 꽃잎도 만져 가며, 친구와 팔짱을 끼고, 그렇게 편한 기분으로 걸었다. 내 심정에 큰 물결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모른 채로….
\'여기야? 여기구나. 바로……\'
가슴이 철렁하고 뜨겁게 두근두근거렸다. 양팔에 좌악 하고 기운이 흘러 내렸다. 친구의 이름을 불렀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탄사를 외쳤던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외마디말을 내뱉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 돌며 확 트인 풍경을 시야에 담아 보고는 그 풀밭에 섰다.
이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작은 언덕에 올라갔다. 금당들의 자리와, 그토록 거대했다던 9층 목탑의 자리… 네모반듯하고 가지런한 채 아무런 말이 없는 그 흔적들을 내려다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타버리고 없다는 아까움에 그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는 자랑스러움에 그친 것도 아니었다. 9층 목탑의 끝이 닿아 있었을 파랗기만 한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나는 장엄함을, 숙연함을, 뿌듯함을, 또한 아쉬움을 한 번에 느끼고 있었다. 신라의 절터, 그 의미와 함께…
\'땅의 이름이 풀밭에서 터로 되면서부터 작은 풀 한 포기나마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자라나는 것이다.\'
버스에 올라타서 수첩에 적으면서, 나는 그 풀밭이 위대한 터로 내 안에 자리잡고 있음을 느꼈다. 신라인의 자취와 그들의 원대했던 기상을 믿으며 자랑스럽게 전율할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풀 한 포기를 느꼈다. 한국인으로서의 이상, 그것이 바로 그 풀의 이름이었다.
마지막날이었다. 어느 새 우리는 세 밤을 보냈고,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나오랄 때 나와라.\"
긴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림사지에 들어섰다.
\"어떻게 해!\"
내 친구의 손을 붙들고 내뱉은 말이었다. 나조차도 어찌 할 바를 모를 느낌이 밀려왔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 언제인가 국사책에서 읽고 한 번쯤 이름을 외웠을, 국사책에서든 어디에서든 한 번쯤 사진으로 보았을 탑이다. 그런데 그 느낌이 아주 새롭고, 새롭지만 친근하고, 친근하지만 위엄있고, 위엄있지만 경쾌했다. 벡제의 탑. 백제의 온기가 담겨진 탑이었다.
감칠맛 나는 수채화 한 폭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그 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주 맑고 아름다운 수채화에서 붓터치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고 소중한 것처럼, 5층 석탑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옥개석 하나하나의 끄트머리와 그 돌탑에 끼어 있는 검버섯 하나하나까지 아름답고 소중했다.
단지 외형의 아름다움에만 반했던 것일까? 돌탑에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진다던 기행문을 읽은 적이 있다. 돌덩이가 자기에게 말을 한다던 어느 학생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큰 시간적 공백을 사이에 두고 이 탑에 혼혈을 기울인 이와 만나고, 이 탑이 서 있던 오랜 시간동안의 비바람과 가을 하늘, 그 향기를 맡아보고…. 그렇게 나는 탑과, 탑이 서 있었던 긴 시간과 정을 나누었다.
시간이 다 되어 뒷걸음질을 하며 문을 나가면서도, 차에 올라타서 그 곳을 지나칠 때에 담장 너머로 그 꼭대기만을 보면서도, 그 사랑스러운 탑과 쉬 이별하지 못했다. 백제 시대 돌탑과의 짧은 사랑? 아마 그것이었으리라.
단지 몇 글자의 이름에 불과한 것을, 단지 어떤 사물에 불과한 것을 자기 안에 들여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폭넓은 이해, 특색있는 경험, 그 것에 관한 특별한 물건…. 내가 이번 국토순례에서 택한 방법은 \'진실한 느낌\'이었다. 진실한 느낌으로 바라보기, 사랑하기, 간직하기….
터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풀밭에서, 5층 석탑이라는 이름의 돌덩이에서 그토록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나임이 사뭇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것들로부터 진실한 느낌을 내 안에 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공유할 자격, 즉 나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었다. 느낌으로 풍성한 가을여행이었다. 앞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줄.
서울 시가지로 들어섰을 낯설게 여겨지는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내가 살던 곳이구나 싶었지만 영시간 전에 빠져있던 곳과의 시대차 때문에 오히려 이곳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점점 현대에 익숙해지면서 몇시간 전에 빠져 있던 곳과 현대가 겹쳐져 보였다. 이 두 시대 사이의 변화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한 민족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 속에 그때도 있있고 지금도 있는 우리 민족 정신의 고요한 흐름은 느낄 수 있었다. 이 흐름만이 우리 민족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고 생각했다.
진실한 느낌으로 남을 여행
1학년 장미반 유명은(1995년)
\"Where was your favorite?\"
나흘간의 국토순례가 막을 내리고 학교에서 한참 사진들을 돌려 보고 다닐 때 쯤이었다. 영어 회화 시간에 선생님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간신히 가라앉혔던 내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다. 어느 한 군데를 둘러 보고 버스에 오를 때 마다 뿌듯하게 상기되었던 며칠 전의 나처럼.
\"My favorite was….\"
아이들의 대답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대답 중에 나오는 여러 지명이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불국사, 광주 비엔날레, 낙화암…. 내가 만일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황룡사지,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국토순례 일정도 하룻밤을 넘겼고, 이틀째라는 생각에 설레임과 기대에 마음을 부풀리는 것도 이제 어느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석굴암에서의 해돋이를 시작으로 참으로 여러 곳에서 오전을 보내고 나니, 어느 새 하루의 반이 지나 있었다.
분황사에서 나온 나와 내 친구는 둘씩 셋씩 줄줄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행렬에 끼게 되었다. 목적지는 황룡사지였다. 가을임을 의심할 수 없는, 진한 하늘을 닮은 그 진한 햇빛을 받으며, 흙과 풀을 밟고 꽃잎도 만져 가며, 친구와 팔짱을 끼고, 그렇게 편한 기분으로 걸었다. 내 심정에 큰 물결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모른 채로….
\'여기야? 여기구나. 바로……\'
가슴이 철렁하고 뜨겁게 두근두근거렸다. 양팔에 좌악 하고 기운이 흘러 내렸다. 친구의 이름을 불렀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탄사를 외쳤던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외마디말을 내뱉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 돌며 확 트인 풍경을 시야에 담아 보고는 그 풀밭에 섰다.
이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작은 언덕에 올라갔다. 금당들의 자리와, 그토록 거대했다던 9층 목탑의 자리… 네모반듯하고 가지런한 채 아무런 말이 없는 그 흔적들을 내려다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타버리고 없다는 아까움에 그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는 자랑스러움에 그친 것도 아니었다. 9층 목탑의 끝이 닿아 있었을 파랗기만 한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나는 장엄함을, 숙연함을, 뿌듯함을, 또한 아쉬움을 한 번에 느끼고 있었다. 신라의 절터, 그 의미와 함께…
\'땅의 이름이 풀밭에서 터로 되면서부터 작은 풀 한 포기나마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자라나는 것이다.\'
버스에 올라타서 수첩에 적으면서, 나는 그 풀밭이 위대한 터로 내 안에 자리잡고 있음을 느꼈다. 신라인의 자취와 그들의 원대했던 기상을 믿으며 자랑스럽게 전율할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풀 한 포기를 느꼈다. 한국인으로서의 이상, 그것이 바로 그 풀의 이름이었다.
마지막날이었다. 어느 새 우리는 세 밤을 보냈고,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나오랄 때 나와라.\"
긴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림사지에 들어섰다.
\"어떻게 해!\"
내 친구의 손을 붙들고 내뱉은 말이었다. 나조차도 어찌 할 바를 모를 느낌이 밀려왔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 언제인가 국사책에서 읽고 한 번쯤 이름을 외웠을, 국사책에서든 어디에서든 한 번쯤 사진으로 보았을 탑이다. 그런데 그 느낌이 아주 새롭고, 새롭지만 친근하고, 친근하지만 위엄있고, 위엄있지만 경쾌했다. 벡제의 탑. 백제의 온기가 담겨진 탑이었다.
감칠맛 나는 수채화 한 폭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그 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주 맑고 아름다운 수채화에서 붓터치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고 소중한 것처럼, 5층 석탑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옥개석 하나하나의 끄트머리와 그 돌탑에 끼어 있는 검버섯 하나하나까지 아름답고 소중했다.
단지 외형의 아름다움에만 반했던 것일까? 돌탑에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진다던 기행문을 읽은 적이 있다. 돌덩이가 자기에게 말을 한다던 어느 학생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큰 시간적 공백을 사이에 두고 이 탑에 혼혈을 기울인 이와 만나고, 이 탑이 서 있던 오랜 시간동안의 비바람과 가을 하늘, 그 향기를 맡아보고…. 그렇게 나는 탑과, 탑이 서 있었던 긴 시간과 정을 나누었다.
시간이 다 되어 뒷걸음질을 하며 문을 나가면서도, 차에 올라타서 그 곳을 지나칠 때에 담장 너머로 그 꼭대기만을 보면서도, 그 사랑스러운 탑과 쉬 이별하지 못했다. 백제 시대 돌탑과의 짧은 사랑? 아마 그것이었으리라.
단지 몇 글자의 이름에 불과한 것을, 단지 어떤 사물에 불과한 것을 자기 안에 들여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폭넓은 이해, 특색있는 경험, 그 것에 관한 특별한 물건…. 내가 이번 국토순례에서 택한 방법은 \'진실한 느낌\'이었다. 진실한 느낌으로 바라보기, 사랑하기, 간직하기….
터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풀밭에서, 5층 석탑이라는 이름의 돌덩이에서 그토록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나임이 사뭇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것들로부터 진실한 느낌을 내 안에 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공유할 자격, 즉 나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었다. 느낌으로 풍성한 가을여행이었다. 앞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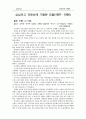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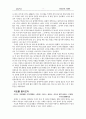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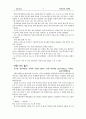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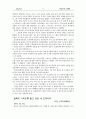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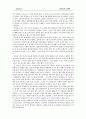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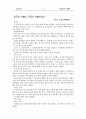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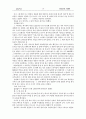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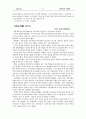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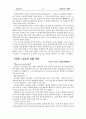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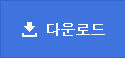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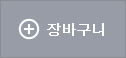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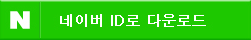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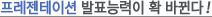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