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종묘
2. 유교의 도입
3. 삼국사기나 유사의 유교에 관한 것
4. 성리학의 전래
5. 정도전의 배불론
6. 불교의 이단성
7.불교의 멸인륜성
1)道 學
2)趙光祖(1482-1519)
3)退溪
4)우주론
2. 유교의 도입
3. 삼국사기나 유사의 유교에 관한 것
4. 성리학의 전래
5. 정도전의 배불론
6. 불교의 이단성
7.불교의 멸인륜성
1)道 學
2)趙光祖(1482-1519)
3)退溪
4)우주론
본문내용
人心道心을 논함\" 347-349)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현실사회의 구체적 사실들 속에서 실천윤리가 생겨난다. 율곡은 ......夫心 必有感而動 而所感 皆外物也. 感於父則孝動焉 感於君則忠動焉 感於兄則敬動焉...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퇴계가 통치자의 수신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통치의 요체로 보았다면 율곡은 통치자의 수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治國平天下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율곡은 養民然後可施敎化라고 보았고 양민의 방법으로는 때에 따라 변화하는 즉 시대와 제도의 개별성 특수성을 인정하는 상황주의적 지향을 보였다. (박충석)
note
이이의 철학을 기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선 유학에서 진정한 기철학은 성립되지 않았다. 단지 주리학파 가운데서 기를 강조한 정도일 뿐이다.
리와 기의 개념은 춘추전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이것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송대부터이다. 기는 선진시대부터 사용되어 처음에는 \'숨\'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희박해지고 농축된다는 생각이 연결되어 모든 사물을 이루는 재료라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에 음양과 오행이라는 도식이 부가되면서 인간의 신체구조, 사회, 자연, 우주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 개념은 유가 도가 심지어 불가까지 받아 들였다. 그러나 기 하나만으로는 운동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인식되면서 \'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송대에 이르러 정호와 정이를 거치면서 리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리와 기의 두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 성리학이고 그 집대성이 주희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희는 인간의 도덕성 확립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써 리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나 리를 강조할 경우 리에 부합되도록 하는 주관적 수양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객관적 현실성을 망각하기 쉽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기철학이 출발한다.
기철학이 진정한 기철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송대 왕안석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가 사회적 물질적 현실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 현실의 물질적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좋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좋은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폐단을 드러내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 나는 것으로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 그러므로 규범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정하는 위에서 자연스런 경향성을 띠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의미의 기철학은 정도전이 한 때 제도적 변화를 강조하였을 뿐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기철학은 비판의 대상이었을 뿐 모두 정통 주자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였다. 이황은 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리라는 개념을 내세웠을 정도였으며 이이는 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자가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퇴계학파는 남인으로 율곡학파는 서인으로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율곡학파에는 우암학파 농암학파 화서학파 등의 세분이 가능하다.
조선조 후기에야 실학파가 등장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기철학의 등장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note
사칠논쟁
심성론에 대한 탐구가 왜 일어나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이나 인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회현실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내면에 선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선한 요소를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정과 교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사단이라는 개념은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인간의 심리 현상이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각각 인의예지의 단서로 설명하였다.
칠정은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서 인간의 감정을 통칭하여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으로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자들은 대체로 중용에서 언급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네 가지 감정을 문제시 삼는다.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나누든, 네 가지로 나누든 양자가 인간의 감정 일반을 통칭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행위의 선악과 관련하여 이 사단과 칠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양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있다.
주자학을 연 주희(朱熹)는 사단칠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희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성과 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은 성에 근거하고 성이 발하면 정이 된다.(주자문집 32권 [答張敬夫])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정이고 인의예지는 성이며 심은 성과 정을 통섭(統攝)하는 것이다.(주자어류 권40 [맹자]3)
맹자가 말한 사단은 정이고 사덕(인의예지)은 성이다. 한편 주희는 이렇게도 설명하였다.
희노애락은 정이고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은 성이다.({中庸章句} 제1장)
여기서 주자는 사단과 칠정이 다 같이 정이라고 하지만 양자를 같이 보았던 것은 아니다. 사단은 순선무악하지만 칠정은 발동하여 중절한 경우는 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이므로 유선유악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단이 선한 것은 순선무악한 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논리적 문제가 없지만 칠정 중의 악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칠정은 정이고 정의 근거는 성이므로 칠정 가운데 악도 순선무악한 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는 \"악 또한 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二程遺書} 권1 [端伯傳師說]).고 하였고 주자 또한 \"사단에도 부중절이 있다\"({주자어류} 권40 [맹자]3)
이러한 혼란이 사칠논쟁을 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리 소속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한 반면 기대승은 분리하지 않고서 해결하려 하였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현실사회의 구체적 사실들 속에서 실천윤리가 생겨난다. 율곡은 ......夫心 必有感而動 而所感 皆外物也. 感於父則孝動焉 感於君則忠動焉 感於兄則敬動焉...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퇴계가 통치자의 수신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통치의 요체로 보았다면 율곡은 통치자의 수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治國平天下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율곡은 養民然後可施敎化라고 보았고 양민의 방법으로는 때에 따라 변화하는 즉 시대와 제도의 개별성 특수성을 인정하는 상황주의적 지향을 보였다. (박충석)
note
이이의 철학을 기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선 유학에서 진정한 기철학은 성립되지 않았다. 단지 주리학파 가운데서 기를 강조한 정도일 뿐이다.
리와 기의 개념은 춘추전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이것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송대부터이다. 기는 선진시대부터 사용되어 처음에는 \'숨\'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희박해지고 농축된다는 생각이 연결되어 모든 사물을 이루는 재료라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에 음양과 오행이라는 도식이 부가되면서 인간의 신체구조, 사회, 자연, 우주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 개념은 유가 도가 심지어 불가까지 받아 들였다. 그러나 기 하나만으로는 운동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인식되면서 \'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송대에 이르러 정호와 정이를 거치면서 리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리와 기의 두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 성리학이고 그 집대성이 주희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희는 인간의 도덕성 확립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써 리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나 리를 강조할 경우 리에 부합되도록 하는 주관적 수양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객관적 현실성을 망각하기 쉽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기철학이 출발한다.
기철학이 진정한 기철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송대 왕안석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가 사회적 물질적 현실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 현실의 물질적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좋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좋은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폐단을 드러내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 나는 것으로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 그러므로 규범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정하는 위에서 자연스런 경향성을 띠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의미의 기철학은 정도전이 한 때 제도적 변화를 강조하였을 뿐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기철학은 비판의 대상이었을 뿐 모두 정통 주자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였다. 이황은 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리라는 개념을 내세웠을 정도였으며 이이는 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자가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퇴계학파는 남인으로 율곡학파는 서인으로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율곡학파에는 우암학파 농암학파 화서학파 등의 세분이 가능하다.
조선조 후기에야 실학파가 등장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기철학의 등장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note
사칠논쟁
심성론에 대한 탐구가 왜 일어나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이나 인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회현실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내면에 선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선한 요소를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정과 교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사단이라는 개념은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인간의 심리 현상이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각각 인의예지의 단서로 설명하였다.
칠정은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서 인간의 감정을 통칭하여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으로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자들은 대체로 중용에서 언급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네 가지 감정을 문제시 삼는다.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나누든, 네 가지로 나누든 양자가 인간의 감정 일반을 통칭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행위의 선악과 관련하여 이 사단과 칠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양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있다.
주자학을 연 주희(朱熹)는 사단칠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희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성과 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은 성에 근거하고 성이 발하면 정이 된다.(주자문집 32권 [答張敬夫])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정이고 인의예지는 성이며 심은 성과 정을 통섭(統攝)하는 것이다.(주자어류 권40 [맹자]3)
맹자가 말한 사단은 정이고 사덕(인의예지)은 성이다. 한편 주희는 이렇게도 설명하였다.
희노애락은 정이고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은 성이다.({中庸章句} 제1장)
여기서 주자는 사단과 칠정이 다 같이 정이라고 하지만 양자를 같이 보았던 것은 아니다. 사단은 순선무악하지만 칠정은 발동하여 중절한 경우는 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이므로 유선유악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단이 선한 것은 순선무악한 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논리적 문제가 없지만 칠정 중의 악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칠정은 정이고 정의 근거는 성이므로 칠정 가운데 악도 순선무악한 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는 \"악 또한 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二程遺書} 권1 [端伯傳師說]).고 하였고 주자 또한 \"사단에도 부중절이 있다\"({주자어류} 권40 [맹자]3)
이러한 혼란이 사칠논쟁을 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리 소속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한 반면 기대승은 분리하지 않고서 해결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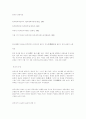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