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판인쇄술(木版印刷術) 기원설(起源說)
1.1 후한대(後漢代) 기원설
1.2 진대 함화년간(晋代 咸和年間) 기원설
1.3 육조(六朝) 기원설
1.4 북제(北齊) 이전(以前) 기원설
1.5 수조(隋朝) 기원설
1.6 당조(唐朝) 기원설.
2 활자인쇄술(活字印刷術) 기원설(起源說)
2.1 교니활자인쇄술(膠泥活字印刷術)의 발명
2.2 목활자인쇄술(木活字印刷術)의 발명
2.3 금속활자인쇄술(金屬活字印刷術)의 발명
1.1 후한대(後漢代) 기원설
1.2 진대 함화년간(晋代 咸和年間) 기원설
1.3 육조(六朝) 기원설
1.4 북제(北齊) 이전(以前) 기원설
1.5 수조(隋朝) 기원설
1.6 당조(唐朝) 기원설.
2 활자인쇄술(活字印刷術) 기원설(起源說)
2.1 교니활자인쇄술(膠泥活字印刷術)의 발명
2.2 목활자인쇄술(木活字印刷術)의 발명
2.3 금속활자인쇄술(金屬活字印刷術)의 발명
본문내용
승(畢升)이 목활자를 만들어 시용(試用)하였음도 알 수 있다.
목편(木片)에 신축성이 있어 수분을 첨가시키면 쉽게 팽창하여 인출할 때에 판면(版面)이 편편하지 못하고 약물을 바르면 서로 쉽게 점연(粘連)되는 점 등의 단점을 알고 교니(膠泥)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목활자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교니(膠泥)를 사용하여 활자를 제작하는 것만큼 장점이 많을 수 없다고 고려한 결과, 비로소 교니(膠泥)를 사용하여 활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필승(畢升)이 사거(死去)했던 서적들은 나의 군종(群從)들의 소득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잘 보장(保藏)되고 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필승(畢升)의 사후(死後)에 이러한 활자들은 심괄(沈括)의 자질배(子侄輩)들의 소유(所有)로 돌아가 고동(古董)으로 진장(珍藏)되었을 뿐, 다시금 그것을 사용하여 서적을 인출한 바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2.2 목활자인쇄술(木活字印刷術)의 발명
북송(北宋)의 경력년간(慶曆年間)에 필승(畢升)에 의하여 교니활자인쇄술(膠泥活字印刷術)이 발명된 후 안휘(安徽)의 정덕현윤(旌德縣尹) 왕정(王楨) 2(1298)년에 목활자 3만여개를 제조하였는데 2년이 걸렸다. 그는 목활자를 완성한 후에 시험적으로「정덕현지(旌德縣志)」를 인출하였는데 6만자의 전서(全書) 100부를 인출하는데 한 달도 채 못걸렸다. 이 때에 인출(印出)된 서적은 산일(散逸)되었으나, 왕정(王楨)에 의하면 활자판(活字版)의 효능으로 볼 때 몇 차례는 더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왕정(王楨)은 2년 후에 강서(江西)의 영혜현윤(永慧縣尹)으로 전임(轉任)을 하였는데, 당시 그 곳에서 본 활자로 자기의 저술「농서(農書)」를 인출하였다. 그의 저술「농서(農書)」권22의 부록에 있는 \'조활자인서법(造活字印書法)\'에는 사운(寫韻)·각자(刻字)·거자(鋸字)·수자(修子)·감자(嵌字) 등을 비롯하여 조륜(造輪)·취자(取字)·안자(安字)로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인쇄기술사상 가상 자세하게 기록된 활자인쇄술의 방법인 것이다.
4.2.3 금속활자인쇄술(金屬活字印刷術)의 발명
한편, 성현(成俔)의「용제총화( 齊叢話)」권7의 \'활자\' 조(條)에는 주자법(鑄字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자지법(鑄字之法>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가 주조(鑄造)되어 서적의 인출(印出)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주자소(鑄字所)와 주자발(鑄字跋) 등에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태종실록(太宗實錄)」. 권5. 태종 3년 2월 경신(庚申)>
⑵ <「정조실록(正祖實錄)>
⑶ <권근(權近) 주자발(鑄字跋)>
⑷ <변계량(卞季良) 주자발(鑄字跋)>
⑸ <금빈(金 ) 주자발(鑄字跋)>
⑹ < >
⑺ < >
⑻ <「지봉집(芝峯集)」. 총4>
⑼ <「어정인서록(御定人瑞錄)>
⑽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의례말(義例末)>
⑾ <신주자발(新鑄字跋)>
목편(木片)에 신축성이 있어 수분을 첨가시키면 쉽게 팽창하여 인출할 때에 판면(版面)이 편편하지 못하고 약물을 바르면 서로 쉽게 점연(粘連)되는 점 등의 단점을 알고 교니(膠泥)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목활자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교니(膠泥)를 사용하여 활자를 제작하는 것만큼 장점이 많을 수 없다고 고려한 결과, 비로소 교니(膠泥)를 사용하여 활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필승(畢升)이 사거(死去)했던 서적들은 나의 군종(群從)들의 소득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잘 보장(保藏)되고 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필승(畢升)의 사후(死後)에 이러한 활자들은 심괄(沈括)의 자질배(子侄輩)들의 소유(所有)로 돌아가 고동(古董)으로 진장(珍藏)되었을 뿐, 다시금 그것을 사용하여 서적을 인출한 바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2.2 목활자인쇄술(木活字印刷術)의 발명
북송(北宋)의 경력년간(慶曆年間)에 필승(畢升)에 의하여 교니활자인쇄술(膠泥活字印刷術)이 발명된 후 안휘(安徽)의 정덕현윤(旌德縣尹) 왕정(王楨) 2(1298)년에 목활자 3만여개를 제조하였는데 2년이 걸렸다. 그는 목활자를 완성한 후에 시험적으로「정덕현지(旌德縣志)」를 인출하였는데 6만자의 전서(全書) 100부를 인출하는데 한 달도 채 못걸렸다. 이 때에 인출(印出)된 서적은 산일(散逸)되었으나, 왕정(王楨)에 의하면 활자판(活字版)의 효능으로 볼 때 몇 차례는 더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왕정(王楨)은 2년 후에 강서(江西)의 영혜현윤(永慧縣尹)으로 전임(轉任)을 하였는데, 당시 그 곳에서 본 활자로 자기의 저술「농서(農書)」를 인출하였다. 그의 저술「농서(農書)」권22의 부록에 있는 \'조활자인서법(造活字印書法)\'에는 사운(寫韻)·각자(刻字)·거자(鋸字)·수자(修子)·감자(嵌字) 등을 비롯하여 조륜(造輪)·취자(取字)·안자(安字)로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인쇄기술사상 가상 자세하게 기록된 활자인쇄술의 방법인 것이다.
4.2.3 금속활자인쇄술(金屬活字印刷術)의 발명
한편, 성현(成俔)의「용제총화( 齊叢話)」권7의 \'활자\' 조(條)에는 주자법(鑄字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자지법(鑄字之法>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가 주조(鑄造)되어 서적의 인출(印出)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주자소(鑄字所)와 주자발(鑄字跋) 등에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태종실록(太宗實錄)」. 권5. 태종 3년 2월 경신(庚申)>
⑵ <「정조실록(正祖實錄)>
⑶ <권근(權近) 주자발(鑄字跋)>
⑷ <변계량(卞季良) 주자발(鑄字跋)>
⑸ <금빈(金 ) 주자발(鑄字跋)>
⑹ < >
⑺ < >
⑻ <「지봉집(芝峯集)」. 총4>
⑼ <「어정인서록(御定人瑞錄)>
⑽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의례말(義例末)>
⑾ <신주자발(新鑄字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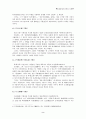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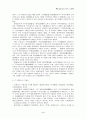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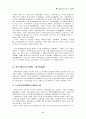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