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 1 장 철학적 정신
1. 철학적 정신은 지에 대한 사랑이다.
2. 철학적 물음은 주체적물음이다.
3. 철학적 정신은 비상하고 비적시적인 것이다.
Ⅱ. 제2장 철학과 과학
1. 철학적 정신은 지에 대한 사랑이다.
2. 철학적 물음은 주체적물음이다.
3. 철학적 정신은 비상하고 비적시적인 것이다.
Ⅱ. 제2장 철학과 과학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실제적인 문제는 과학적 문제이니 그 외의 다른 문제란 없다. 그러면 여러세기동안 특별히 철학적 문제로 간주되어 온 ―또는 차라리 존경받아 온―저 심오한 문제들은 어찌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질문중에는 어떤 일정한 문법적 질서를 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질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질문이 못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그 까닭은 그럴 경우 낱말들은, 그 함께 모여 있는 그대로는, 아무런 이론적 의미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만일 \"푸름은 음악보다 훨씬 동일적인가?\"(Is blue more identical than music?) 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금방 이 문장은 비록 영문법의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문장은 전혀 질문이 아니요 단지 일련의 낱말일 뿐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 소위 철학적 질문들도 이런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제들은 질문처럼 보여서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들은 한갓 일종의 낱말들의 혼란상태임을 밝혀진다. 그렇다는 것이 드러난 후애는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며, 우리의 철학적 정신은 평온해 진다. 질문이 없고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둘째로, 진정한 질문임이 입증되는 \'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적절히 분석해 보면 이런 문제도 비록 지금으로서는 순전히 技術的인 이유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과학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특별히 \'철학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대답될 수 없다 하드라도, 원리상으로는 항상 대답될 수 있는 문제이며, 더구나 그 대답도 오직 과학적인 탐구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적 문제\'의 운명는 이렇다;
그 중 어떤 것은 우리 언어가 저지른 過誤요 誤解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사라질 것이며, 다른 것들은 變裝한 보통의 과학문제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소견은 철학의 全장래를 조우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몇몇 위대한 철학자들은, 비록 精巧(정교)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비교적 명확하게 認知하였다. 예컨대, 칸트는 講義時間에 철학은 가르 칠 수 없다고 말하곤 헹다. 그렇지만, 만일 철학이 지질학이나 천문학 같은 과학이라면, 어째서 가르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사실 철학을 가르치는 일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철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낌새챘던 것이다. 이 文脈(문맥)에 動詞(동사,philosphieren)를 사용하고 名詞(명사,philosophie)를 퇴짜 놓음으로써 칸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긴 하지만, 활동으로서의 철학의 특수한 성격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동일한 동찰의 예는 라이프니츠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베를린 한림원을 창설하고 그 조직을 위한 槪略的(개략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그는 그 조직안에 모든 과학의 위치는 정해 주었어나 철학은 거기 끼지 못했다. 라이프니츠가 과학의 체계안에 철학의 자리를 두지 않았던 것은, 철학은 특수한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진리탐구에 스며들 하나의 활동임을 명백히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옹호하고 있는 견해를 현대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은 루트비히 비트갠슈타인이다. 그는 자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철학의 목표는 사상을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함에 있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의 성과는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명제의 명료화이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려 애써 온 바로 그 견해이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철학은 보편과학으로 간주될 수 없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이 이렇게 오해된 것은, 명제의 의미가 어느 면에서는 모든 論議의 기초가 되는 까닭에 그것이 무슨 \'보편적\'인 것인양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어째서 고대에는 철학이 과학과 동일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당시에는 세계를 서술하는데 사용된 개념들이 모두 매우 애매하였기 때문이다. 과학에게 임무가 부과된 것은 명료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이 서서히 발전됨에 따라 개념들은 명료하게 되게 마련이니 과학적 탐구의 노력은
주로 이 명료화에 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탐구는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 과학과 철학은 구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논리학이나 미학 같은 특수한 연구분야는 \'철학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철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철학은 활동이기 때문에 부분이나 독립적인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질 수는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탐구들이 철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런 탐구들이 과학적 段階의 초기에 처해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심리학도 그런 것 같다. 논리학과 미학은 확실히 아직도 충분히 명료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 개념들을 명료화 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철학적이라고 부름은 당연하겠다. 그러나 장차 그것들은 당연히 과학의 위대한 체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미래의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의 방법은 겉으로나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바란다.
나는 철학의 본성에 관한우리의 견해가 미래에는 일반적으로 채택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치려고 기도하지는 않게될 것이다. 우리는 명료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철학적 정신으로 특수과학과 그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의 철학적 정신을 啓發시킬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은 인류의 정신적 진보의 큰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질문중에는 어떤 일정한 문법적 질서를 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질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질문이 못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그 까닭은 그럴 경우 낱말들은, 그 함께 모여 있는 그대로는, 아무런 이론적 의미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만일 \"푸름은 음악보다 훨씬 동일적인가?\"(Is blue more identical than music?) 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금방 이 문장은 비록 영문법의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문장은 전혀 질문이 아니요 단지 일련의 낱말일 뿐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 소위 철학적 질문들도 이런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제들은 질문처럼 보여서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들은 한갓 일종의 낱말들의 혼란상태임을 밝혀진다. 그렇다는 것이 드러난 후애는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며, 우리의 철학적 정신은 평온해 진다. 질문이 없고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둘째로, 진정한 질문임이 입증되는 \'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적절히 분석해 보면 이런 문제도 비록 지금으로서는 순전히 技術的인 이유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과학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특별히 \'철학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대답될 수 없다 하드라도, 원리상으로는 항상 대답될 수 있는 문제이며, 더구나 그 대답도 오직 과학적인 탐구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적 문제\'의 운명는 이렇다;
그 중 어떤 것은 우리 언어가 저지른 過誤요 誤解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사라질 것이며, 다른 것들은 變裝한 보통의 과학문제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소견은 철학의 全장래를 조우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몇몇 위대한 철학자들은, 비록 精巧(정교)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비교적 명확하게 認知하였다. 예컨대, 칸트는 講義時間에 철학은 가르 칠 수 없다고 말하곤 헹다. 그렇지만, 만일 철학이 지질학이나 천문학 같은 과학이라면, 어째서 가르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사실 철학을 가르치는 일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철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낌새챘던 것이다. 이 文脈(문맥)에 動詞(동사,philosphieren)를 사용하고 名詞(명사,philosophie)를 퇴짜 놓음으로써 칸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긴 하지만, 활동으로서의 철학의 특수한 성격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동일한 동찰의 예는 라이프니츠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베를린 한림원을 창설하고 그 조직을 위한 槪略的(개략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그는 그 조직안에 모든 과학의 위치는 정해 주었어나 철학은 거기 끼지 못했다. 라이프니츠가 과학의 체계안에 철학의 자리를 두지 않았던 것은, 철학은 특수한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진리탐구에 스며들 하나의 활동임을 명백히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옹호하고 있는 견해를 현대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은 루트비히 비트갠슈타인이다. 그는 자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철학의 목표는 사상을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함에 있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의 성과는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명제의 명료화이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려 애써 온 바로 그 견해이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철학은 보편과학으로 간주될 수 없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이 이렇게 오해된 것은, 명제의 의미가 어느 면에서는 모든 論議의 기초가 되는 까닭에 그것이 무슨 \'보편적\'인 것인양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어째서 고대에는 철학이 과학과 동일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당시에는 세계를 서술하는데 사용된 개념들이 모두 매우 애매하였기 때문이다. 과학에게 임무가 부과된 것은 명료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이 서서히 발전됨에 따라 개념들은 명료하게 되게 마련이니 과학적 탐구의 노력은
주로 이 명료화에 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탐구는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 과학과 철학은 구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논리학이나 미학 같은 특수한 연구분야는 \'철학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철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철학은 활동이기 때문에 부분이나 독립적인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질 수는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탐구들이 철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런 탐구들이 과학적 段階의 초기에 처해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심리학도 그런 것 같다. 논리학과 미학은 확실히 아직도 충분히 명료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 개념들을 명료화 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철학적이라고 부름은 당연하겠다. 그러나 장차 그것들은 당연히 과학의 위대한 체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미래의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의 방법은 겉으로나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바란다.
나는 철학의 본성에 관한우리의 견해가 미래에는 일반적으로 채택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치려고 기도하지는 않게될 것이다. 우리는 명료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철학적 정신으로 특수과학과 그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의 철학적 정신을 啓發시킬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은 인류의 정신적 진보의 큰걸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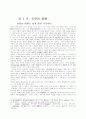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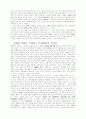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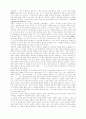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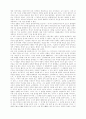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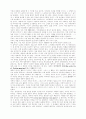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