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성서교육의 발전사
III. 문화통전적·실존적 성서이해와 교회의 청소년교육
IV. 나오는 말
II. 성서교육의 발전사
III. 문화통전적·실존적 성서이해와 교회의 청소년교육
IV. 나오는 말
본문내용
하고 결국 아버지를 구한 심청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 소개된 손순매아(遜順埋兒) 이야기는 손순이 노모를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땅에 묻으려 했다는 효심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담들이 실재로 일어난 사건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 이야기들이 주는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야만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자기를 태울 땔감을 몸소 지고 3일 동안 산에 오른 이삭의 모습에서 무언의 효성을 찾게 된다. 이미 종교적 제의를 알만한 나이에 있었던 이삭은 순진한 양처럼 끌려간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효성을 보게 된다. 마치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경솔함을 탓하지 않고 말없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보도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헌신적인 효행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정은 한국인이 느낄 수 있는 문화통전적인 성서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참조. 박종수,『히브리 설화연구-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 (도서출판 글터, 1995), 제 3 장.
필자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물었던 첫 질문은, 자신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의 입장이길 원하는가, 혹은 시어머니와 할 수 없이 결별하고 고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오르바의 입장이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룻이 될 자격도 그럴 수도 없다고 거의 단언적으로 대답했다.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어떤 주입식 신앙교육이 가능할까? 문제는 교회의 성서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해석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새대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신세대로 대변되는 오늘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정해진 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실존적인 물음에 성서가 답해 주길 원하고 있다. 이 답은 성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쉽지 않은 숙제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청소년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그들의 요구와 생각을 포착해야만 한다. 그런 후에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과 신앙을 통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성서에 대한 실존적이며, 문화통전적인 이해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IV. 나오는 말
이제까지 교회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성서교육을 살펴보았다. 성서에 대한 실존적(existential)이며, 문화통전적인(trans-cultural) 이해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할 때 가능해진다. 인간자유를 위한 교육을 위해 토마스 그룸은 세 차원을 말한다: 1)영혼의 자유를 통해 궁극적인 초월자와 연합에 이르는 것; 2)인격적 자유를 통해 노예상태에서 내적인 자발성으로 돌아서는 것; 3)사회적·정치적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및 타인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교육적 활동은 기독교적 비평의식이 더욱 고무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교육이 \'복사적\' 혹은 \'축적식\'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토마스 H. 그룸,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161, 373.
교회나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이 성인처럼 잘 알지 못하며 종교성이나 경건성도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책임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참조. 박종수,『히브리 설화연구-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 (도서출판 글터, 1995), 제 3 장.
필자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물었던 첫 질문은, 자신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의 입장이길 원하는가, 혹은 시어머니와 할 수 없이 결별하고 고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오르바의 입장이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룻이 될 자격도 그럴 수도 없다고 거의 단언적으로 대답했다.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어떤 주입식 신앙교육이 가능할까? 문제는 교회의 성서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해석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새대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신세대로 대변되는 오늘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정해진 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실존적인 물음에 성서가 답해 주길 원하고 있다. 이 답은 성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쉽지 않은 숙제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청소년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그들의 요구와 생각을 포착해야만 한다. 그런 후에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과 신앙을 통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성서에 대한 실존적이며, 문화통전적인 이해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IV. 나오는 말
이제까지 교회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성서교육을 살펴보았다. 성서에 대한 실존적(existential)이며, 문화통전적인(trans-cultural) 이해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할 때 가능해진다. 인간자유를 위한 교육을 위해 토마스 그룸은 세 차원을 말한다: 1)영혼의 자유를 통해 궁극적인 초월자와 연합에 이르는 것; 2)인격적 자유를 통해 노예상태에서 내적인 자발성으로 돌아서는 것; 3)사회적·정치적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및 타인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교육적 활동은 기독교적 비평의식이 더욱 고무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교육이 \'복사적\' 혹은 \'축적식\'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토마스 H. 그룸,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161, 373.
교회나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이 성인처럼 잘 알지 못하며 종교성이나 경건성도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책임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추천자료
 2014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멀티미디어 강의 핵심요약노트
2014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멀티미디어 강의 핵심요약노트 2016년 2학기 청소년과학교교육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2학기 청소년과학교교육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2학기 청소년과학교교육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6년 2학기 청소년과학교교육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교육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기말시험 핵심체크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4학년 레크레이션활동지도 공통] 유머와 웃음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4학년 레크레이션활동지도 공통] 유머와 웃음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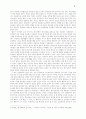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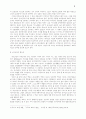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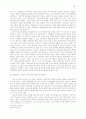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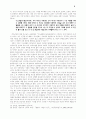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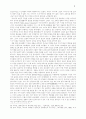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