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윤선도의 생애와 사상
1. 윤선도의 생애
2. 윤선도의 사상
Ⅲ. 어부사시사의 시간성
1. 존재와 시간
2. 문학과 시간성
3. 어부사시사의 시간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한글97
Ⅱ. 윤선도의 생애와 사상
1. 윤선도의 생애
2. 윤선도의 사상
Ⅲ. 어부사시사의 시간성
1. 존재와 시간
2. 문학과 시간성
3. 어부사시사의 시간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지 夏詞와 秋詞, 그리고 冬詞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夏詞에서는 황혼과 모기 등으로 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秋詞에서는 瞑色과 曉月로 역시 하루가 갔음을 알리고 있으며, 冬詞에서는 宿鳥와 窓月로 하루의 마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夏詞에서 가을을 보여주는 단초는 세 번째 작품의 \"마람잎에 바람나니 窓이 서늘쿠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秋詞에서는 아홉 번째 작품에서 \"옷 위에 서리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에서 다음의 작품이 겨울로 이어질 것임을 萌芽的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漁父四時詞는 작가인 尹善道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매우 치밀하게 얽어 짠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다음과 같은 시간의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시간에 맞춘 春.夏.秋.冬의 4부로 작품을 구성하여 우주의 순환적 시간성을 작품의 큰 틀로 하고 있다. 둘째, 각 部는 10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는 해당되는 계절의 하루를 대상으로 하여 시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순환적 시간성으로 한 部를 구성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漁父四時詞는 각 편마다 두 개의 斂이 쓰이는데, 앞의 것은 작품의 시간적 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前斂이고, 뒤의 것은 의성어로써 작품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구실을 하는 中斂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앞의 斂은 작품의 시간적 순환성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시가 작품에서 보이는 단순한 주기적 반복구조의 斂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순환적 시간의 구조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틀의 시간성과 아주 작은 틀의 시간성, 그리고 작품을 진행시키키면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斂을 통해 외부의 현상적 시간성과 작품 내적인 시간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높은 경지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구조와 내용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성을 인식의 세계 속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사용된 순환적 시간성이 작품의 치밀한 구조를 통하여 예술적 아름다움을 획득하면서 의미의 확장을 통한 영원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漁父四時詞는 孤山의 예술적 감각이 낳은 가장 훌륭한 시가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Ⅳ. 맺음말
孤山 尹善道는 조선조 사회가 壬.丙兩亂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모색하던 시기인 17세기에 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남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대부들에 비해서 볼 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19년에 걸친 유배생활과 20여 년에 걸친 은둔생활이 말해주듯이 그의 생애는 결코 평탄한 삶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우리 문학사에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다른 누구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로는 松江 정철과 노계 朴仁老 등을 꼽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중 시조 작가로는 고산 尹善道가 최고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조를 무려 75수나 남겼는데, 五友歌나 漁父四時詞 같은 작품은 연시조로써 시조 문학사에 끼친 영향과 예술적 가치는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할 만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시는 259편 정도밖에 남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말로 된 시조를 75수나 남겼다는 것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한다.
본고는 고산의 여러 시조 작품들 중에서 漁父四時詞를 대상으로 작품의 구성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시간적 순환성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어부사시사는 일회적인 성격을 가진 시간을 영원성으로 고양시키는 시간적 순환성을 기본 축으로 하는데, 일년과 하루라는 두 개의 시간적 循環性을 중심으로 하는 특이한 형태의 연시조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각 계절에 열 편씩 나누어져있는 40편의 작품은 각각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시간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진 순환개념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계절을 각각 노래한 열 편씩의 작품은 모두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경물과 정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작가의 이러한 정서들은 진행기능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형태의 斂과 더불어 하루라는 시간적 순환성을 통하여 일회성을 가지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적 영원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의 순환성을 일년의 순환성으로 확대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작품 전체의 예술적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孤山遺稿」, 『韓國文集叢刊』 91, 民族文化推進會, 1992.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8.
김상진, 『조선중기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마르틴 하이데거지음, 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문영오, 「尹善道論」,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박을수편, 『한국시조대전 上,下』, 아세아문화사, 1992.
백영10주기 추모논집간행위원회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신연우, 『朝鮮朝 士大夫 時調文學硏究』, 박이정, 1997
알렉상드르 꼬제브지음, 설헌영옮김, 『역사와 현실 변증법』, 한벗, 1981.
국어국문학회편, 『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원용문, 『尹善道 文學硏究』, 국학자료원, 1989.
윤영옥, 『시조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이재수, 『尹孤山硏究』, 학우사, 1955.
정병욱, 「孤山 尹善道」, 『문학사상』, 2월호, 1976.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9.
최철.설성경 엮음, 『시가의 연구』, 정음사, 1984.
헤겔지음, 두행숙옮김, 『정신현상학』, 분도출판사, 1993.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다음과 같은 시간의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시간에 맞춘 春.夏.秋.冬의 4부로 작품을 구성하여 우주의 순환적 시간성을 작품의 큰 틀로 하고 있다. 둘째, 각 部는 10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는 해당되는 계절의 하루를 대상으로 하여 시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순환적 시간성으로 한 部를 구성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漁父四時詞는 각 편마다 두 개의 斂이 쓰이는데, 앞의 것은 작품의 시간적 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前斂이고, 뒤의 것은 의성어로써 작품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구실을 하는 中斂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앞의 斂은 작품의 시간적 순환성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시가 작품에서 보이는 단순한 주기적 반복구조의 斂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孤山의 漁父四時詞는 순환적 시간의 구조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틀의 시간성과 아주 작은 틀의 시간성, 그리고 작품을 진행시키키면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斂을 통해 외부의 현상적 시간성과 작품 내적인 시간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높은 경지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구조와 내용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성을 인식의 세계 속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사용된 순환적 시간성이 작품의 치밀한 구조를 통하여 예술적 아름다움을 획득하면서 의미의 확장을 통한 영원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漁父四時詞는 孤山의 예술적 감각이 낳은 가장 훌륭한 시가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Ⅳ. 맺음말
孤山 尹善道는 조선조 사회가 壬.丙兩亂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모색하던 시기인 17세기에 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남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대부들에 비해서 볼 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19년에 걸친 유배생활과 20여 년에 걸친 은둔생활이 말해주듯이 그의 생애는 결코 평탄한 삶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우리 문학사에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다른 누구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 작가로는 松江 정철과 노계 朴仁老 등을 꼽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중 시조 작가로는 고산 尹善道가 최고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조를 무려 75수나 남겼는데, 五友歌나 漁父四時詞 같은 작품은 연시조로써 시조 문학사에 끼친 영향과 예술적 가치는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할 만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시는 259편 정도밖에 남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말로 된 시조를 75수나 남겼다는 것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한다.
본고는 고산의 여러 시조 작품들 중에서 漁父四時詞를 대상으로 작품의 구성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시간적 순환성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어부사시사는 일회적인 성격을 가진 시간을 영원성으로 고양시키는 시간적 순환성을 기본 축으로 하는데, 일년과 하루라는 두 개의 시간적 循環性을 중심으로 하는 특이한 형태의 연시조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각 계절에 열 편씩 나누어져있는 40편의 작품은 각각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시간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진 순환개념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계절을 각각 노래한 열 편씩의 작품은 모두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경물과 정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작가의 이러한 정서들은 진행기능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형태의 斂과 더불어 하루라는 시간적 순환성을 통하여 일회성을 가지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적 영원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의 순환성을 일년의 순환성으로 확대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작품 전체의 예술적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孤山遺稿」, 『韓國文集叢刊』 91, 民族文化推進會, 1992.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8.
김상진, 『조선중기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마르틴 하이데거지음, 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문영오, 「尹善道論」,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박을수편, 『한국시조대전 上,下』, 아세아문화사, 1992.
백영10주기 추모논집간행위원회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신연우, 『朝鮮朝 士大夫 時調文學硏究』, 박이정, 1997
알렉상드르 꼬제브지음, 설헌영옮김, 『역사와 현실 변증법』, 한벗, 1981.
국어국문학회편, 『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원용문, 『尹善道 文學硏究』, 국학자료원, 1989.
윤영옥, 『시조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이재수, 『尹孤山硏究』, 학우사, 1955.
정병욱, 「孤山 尹善道」, 『문학사상』, 2월호, 1976.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9.
최철.설성경 엮음, 『시가의 연구』, 정음사, 1984.
헤겔지음, 두행숙옮김, 『정신현상학』, 분도출판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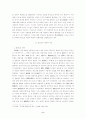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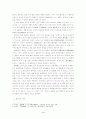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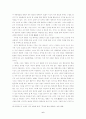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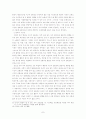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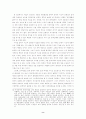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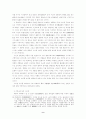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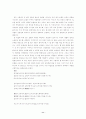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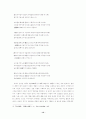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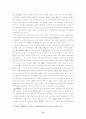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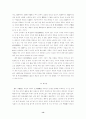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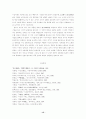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