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행의 문학적 양상---기억의 내면공간을 향하여
2. <유선애상>의 신경방석과 방랑하는 `나비`의 풍경
3. 동백, 혈통의 나무---신경증과 불안의 극복
4.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순수의지로서의 여성적 가족주의
참고문헌
2. <유선애상>의 신경방석과 방랑하는 `나비`의 풍경
3. 동백, 혈통의 나무---신경증과 불안의 극복
4.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순수의지로서의 여성적 가족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입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의 초침소리는 고요함을 강조하는 음악소리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구름이 유리에 부딪쳐서 떨어져내리는 \'落水짓는 소리\'와 조화되면서 이 산장의 조용한 그리고 즐거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구름이 부딪친 유리창에는 마치 그 구름 속에서 나온 듯한 커다란 나비 한 마리가 따악 붙어있게 된다. 정지용은 이 나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해발 오천 피이트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幻想 호흡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自在畵 한幅은 활 활 불피어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季節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가 무섭어라
우리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정지용의 <구름>을 정지용의 여행자로 파악하고 그것이 무상한 변화의 놀이를 즐기는 장자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유유함의 미학을 대변하는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난 나비는 여기서는 그렇게 유유해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힘들게 이 높은 곳으로까지 여행을 한 이 나비는 오랜 여행길이 평탄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찢어진 날개를 달고 있다. 그것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휴식의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나비는 이 주인공을 따라온 시적 환상의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구름의 미학을 지향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려는 시인의 내적인 혼을 상징하고 있다. 그 혼의 여행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에서 나비가 붙어있는 이 유리창은 이미 자연의 깊이 속에 들어와 거대한 휴식 속에 안주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관찰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은 주먹으로 이 유리창을 징징 치기까지 한다. 이 시에서는 관찰하는 감각이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삶이 앞에 나선다. 시의 첫 줄에서부터 그러하다.
시기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어지피고 燈皮 호 호
닦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이 산장에서의 휴식이란 바로 이러한 즐거운 노동이며 그것이 바로 즐거운 삶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구속적인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난로와 램프의 불을 피우는 이 매우 즐겁고 활기차며 생동감있는 일은 바로 불의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지용의 이전의 시 즉 <별>같은 시에서 \"누워서 보는 별 하나는/ 진정 멀-고나\"라고 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던 그 관조적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세계로 변화된 것은 얼마만한 차이인가? 사실 이 차이를 건너뛰기 위한 길목에 <육체>와 <슬픈 우상><이목구비> 같은 산문적인 시와 시적 산문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시들은 모두 감각주의적 신경과 그러한 것의 절제에 대해 말한다. 禮라는 것이 감각적인 추구를 정리하고 절제하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정지용의 변화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이 중에서도 <이목구비>는 이 禮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 개의 예민한 후각이 사람에게는 禮답지 못하나마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냄새를 가리게 될 때 禮를 갖춘 삶의 형식들이 가능하다는 것, 인간은 그러한 감각들의 충동을 그대로 동물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얼굴을 장중히 보존하여 흐트러짐 없이 경계하여 이목구비를 삼갈 것 등에 대해 이 글은 말한다. 이렇게 육체의 동물성을 정신적으로 고양시켜 인간 육체를 성경의 아가처럼 우아하게 찬양한 것이 바로 <슬픈 우상>이다. <육체>에 오면 노동과 노래의 육체와 신경적인 육체의 확실한 대비를 만나게 된다. 건축현장에서 몽끼질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그들이 불러대는 노동요인 지경닦는 소리를 실감있게 묘사하고 있는 이 산문은 그들의 하는 짓거리와 노래가사 내용을 들으며 반응하는 정지용 자신을 이렇게 등장시킨다.
야비한 얼골짓에 허리아랫등과 어깨를 으씩으씩 하여가며 하도 꼴이 그다지
애교로 사주기에는 너무도 나의 神經이 가늘고 약한가 봅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자로서의 독특한 비판과 풍자가 있기는 하니 그것을 그대로 듣기에 좀
찔리기도하고 무엇인지 생각게도 합니다. 이것도 육체로 산다기보다 다분히
神經으로 사는 까닭인가 봅니다.
노동하는 육체의 노래와 신경증적인 감각주의의 대비가 이처럼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 곳은 별로 없다. 이와 같은 관찰적 감각이 노동과 삶의 육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풍자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이러한 단계가 <나비>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름>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다. <구름> 이후 이렇게 육체의 기관들이나 육체에 대한 관상학적이고 인상주의적인 탐색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거둬들이고 육체의 자연스러운 혼돈 상태 속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 비록 정신적인 상승의 문제처럼 비치는 것이지만 모든 감각과 인위적인 사유들이 휴식하는 육체 속에서 잠자게 된다는 것을 <나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無心의 고요함으로 安靜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 가운데서 쉰다는 장자의 경지
) <<장자>> 天道편, 앞의 책, 346쪽 참조.
가 그러한 휴식의 경지일 것이다. <호랑나비>는 지금까지 관찰의 대상이던 나비가 에로틱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날아간다. 자연 속에 틀어박혀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겨우내 눈에 띄지 않게 되어버린 두 남녀의 사랑은 호랑나비 한 쌍으로 변화되었다. 청산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이 나비 한 쌍은 정지용의 나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무위자연의 한 토막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참고문헌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신구문화사. 1998)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신구문화사. 1998)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니체. 청하. 1991)
비극적 인생(쇼펜 하우어. 탐구당. 1980)
육당전집10(현암사. 1973)
문학독본(정지용. 박문출판사. 1949)
최남선 작품집(형설출판사. 1982)
김영랑 전집(문학세계사. 1993)
문예비평과 이론(문예출판사. 1987)
정신병리학의 기초(민음사. 1992)
해발 오천 피이트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幻想 호흡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自在畵 한幅은 활 활 불피어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季節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가 무섭어라
우리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정지용의 <구름>을 정지용의 여행자로 파악하고 그것이 무상한 변화의 놀이를 즐기는 장자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유유함의 미학을 대변하는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난 나비는 여기서는 그렇게 유유해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힘들게 이 높은 곳으로까지 여행을 한 이 나비는 오랜 여행길이 평탄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찢어진 날개를 달고 있다. 그것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휴식의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나비는 이 주인공을 따라온 시적 환상의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구름의 미학을 지향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려는 시인의 내적인 혼을 상징하고 있다. 그 혼의 여행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에서 나비가 붙어있는 이 유리창은 이미 자연의 깊이 속에 들어와 거대한 휴식 속에 안주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관찰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은 주먹으로 이 유리창을 징징 치기까지 한다. 이 시에서는 관찰하는 감각이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삶이 앞에 나선다. 시의 첫 줄에서부터 그러하다.
시기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어지피고 燈皮 호 호
닦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이 산장에서의 휴식이란 바로 이러한 즐거운 노동이며 그것이 바로 즐거운 삶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구속적인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난로와 램프의 불을 피우는 이 매우 즐겁고 활기차며 생동감있는 일은 바로 불의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지용의 이전의 시 즉 <별>같은 시에서 \"누워서 보는 별 하나는/ 진정 멀-고나\"라고 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던 그 관조적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세계로 변화된 것은 얼마만한 차이인가? 사실 이 차이를 건너뛰기 위한 길목에 <육체>와 <슬픈 우상><이목구비> 같은 산문적인 시와 시적 산문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시들은 모두 감각주의적 신경과 그러한 것의 절제에 대해 말한다. 禮라는 것이 감각적인 추구를 정리하고 절제하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정지용의 변화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이 중에서도 <이목구비>는 이 禮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 개의 예민한 후각이 사람에게는 禮답지 못하나마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냄새를 가리게 될 때 禮를 갖춘 삶의 형식들이 가능하다는 것, 인간은 그러한 감각들의 충동을 그대로 동물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얼굴을 장중히 보존하여 흐트러짐 없이 경계하여 이목구비를 삼갈 것 등에 대해 이 글은 말한다. 이렇게 육체의 동물성을 정신적으로 고양시켜 인간 육체를 성경의 아가처럼 우아하게 찬양한 것이 바로 <슬픈 우상>이다. <육체>에 오면 노동과 노래의 육체와 신경적인 육체의 확실한 대비를 만나게 된다. 건축현장에서 몽끼질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그들이 불러대는 노동요인 지경닦는 소리를 실감있게 묘사하고 있는 이 산문은 그들의 하는 짓거리와 노래가사 내용을 들으며 반응하는 정지용 자신을 이렇게 등장시킨다.
야비한 얼골짓에 허리아랫등과 어깨를 으씩으씩 하여가며 하도 꼴이 그다지
애교로 사주기에는 너무도 나의 神經이 가늘고 약한가 봅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자로서의 독특한 비판과 풍자가 있기는 하니 그것을 그대로 듣기에 좀
찔리기도하고 무엇인지 생각게도 합니다. 이것도 육체로 산다기보다 다분히
神經으로 사는 까닭인가 봅니다.
노동하는 육체의 노래와 신경증적인 감각주의의 대비가 이처럼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 곳은 별로 없다. 이와 같은 관찰적 감각이 노동과 삶의 육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풍자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이러한 단계가 <나비>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름>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다. <구름> 이후 이렇게 육체의 기관들이나 육체에 대한 관상학적이고 인상주의적인 탐색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거둬들이고 육체의 자연스러운 혼돈 상태 속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 비록 정신적인 상승의 문제처럼 비치는 것이지만 모든 감각과 인위적인 사유들이 휴식하는 육체 속에서 잠자게 된다는 것을 <나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無心의 고요함으로 安靜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 가운데서 쉰다는 장자의 경지
) <<장자>> 天道편, 앞의 책, 346쪽 참조.
가 그러한 휴식의 경지일 것이다. <호랑나비>는 지금까지 관찰의 대상이던 나비가 에로틱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날아간다. 자연 속에 틀어박혀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겨우내 눈에 띄지 않게 되어버린 두 남녀의 사랑은 호랑나비 한 쌍으로 변화되었다. 청산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이 나비 한 쌍은 정지용의 나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무위자연의 한 토막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참고문헌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신구문화사. 1998)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신구문화사. 1998)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니체. 청하. 1991)
비극적 인생(쇼펜 하우어. 탐구당. 1980)
육당전집10(현암사. 1973)
문학독본(정지용. 박문출판사. 1949)
최남선 작품집(형설출판사. 1982)
김영랑 전집(문학세계사. 1993)
문예비평과 이론(문예출판사. 1987)
정신병리학의 기초(민음사. 1992)
추천자료
 2011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2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2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4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이해와감상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5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이해와감상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5년 하계계절시험 근현대문학사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5년 하계계절시험 근현대문학사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근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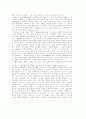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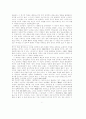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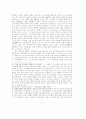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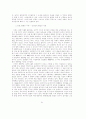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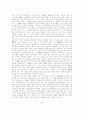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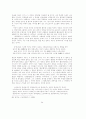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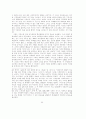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