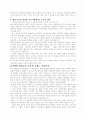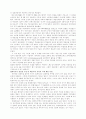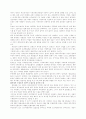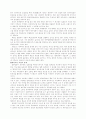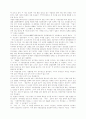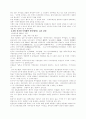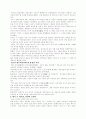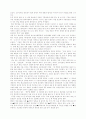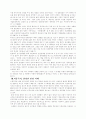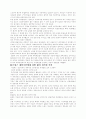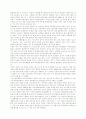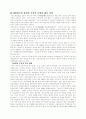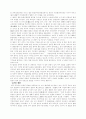목차
Ⅰ.재일 동포들의 참정권 왜 문제인가?
1.재일 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배경
2.참정권을 둘러싼 상황
3. 재일 동포의 참정권, 동포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
Ⅱ.2백만 재외국민 투표권 이제는 되찾아야
①도입과 폐지의 과정
②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 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③단계적 도입론과 전면적 도입론을 둘러싼 논란
④참가 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⑤외국의 사례
⑥재외국민 자신의 문제
1.재일 동포 지방참정권 청신호 지 자체 42%“투표권 인정해야”
2.지방 선거권 부여법안 한국에서도 깊은 관심
3.한일 정상회담: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포석으로
4.日서 영주외국인에 첫 참정권 부여
5. 한국 속 외국인, 인권이 보인다
Ⅲ.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 부여
Ⅳ.재일한국인 참정권 부여의 난항과 향후 전망
1.법안의 추진과 연기 배경
2.관련 쟁점
3.전망과 대응
1.재일 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배경
2.참정권을 둘러싼 상황
3. 재일 동포의 참정권, 동포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
Ⅱ.2백만 재외국민 투표권 이제는 되찾아야
①도입과 폐지의 과정
②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 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③단계적 도입론과 전면적 도입론을 둘러싼 논란
④참가 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⑤외국의 사례
⑥재외국민 자신의 문제
1.재일 동포 지방참정권 청신호 지 자체 42%“투표권 인정해야”
2.지방 선거권 부여법안 한국에서도 깊은 관심
3.한일 정상회담: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포석으로
4.日서 영주외국인에 첫 참정권 부여
5. 한국 속 외국인, 인권이 보인다
Ⅲ.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 부여
Ⅳ.재일한국인 참정권 부여의 난항과 향후 전망
1.법안의 추진과 연기 배경
2.관련 쟁점
3.전망과 대응
본문내용
정권을 얻고 싶어한다. 한국의 재외국민 등록을 갖고 있는 약 46만 명의 민단계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올 3월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적을 “가능하면 반드시 취득하고 싶다”가 25%,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한 바 없다”가 52%,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가 23%로 나타났다. 이들 재일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피선거권보다는 선거권을 월등히 중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 전달하거나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3.전망과 대응
자민당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를 무산시키고 대신 이들의 일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특례법을 심의할 태세이다. 일본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은 (1)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2)준법정신과 사회적 의무관념을 판정하기 위해 소행이 선량해야 하며, (3)가족과 생계를 함께 할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4)이중국적을 피하기 위해 대상은 무국적자로 일본 국적 취득과 함께 자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등이다. 여건을 만족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법무성의 조사관이 본인 조사는 물론, 지인, 친구, 이웃사람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나 학교, 거래선 등을 조사하며, 사상, 정치활동, 범죄력, 납세상황 등의 프라이버시도 조사된다. 이를 통과하면 국적을 ‘허가’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적법 3조항은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탄생한 적출 자녀의 경우 신청만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이를 특별영주자에게도 적용,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일교포가 대부분인 특별영주외국인의 수가 1992년 이래 매년 약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화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례법이 통과되어 국적취득이 쉬워지면 재일교포의 귀화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례법은 귀화도 쉬어졌으니 귀화한 다음에 선거권을 가지라는 논리를 강화, 재일교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원치 않는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유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인종성(ethnicity)은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문화적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대신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엄격한 국적주의를 취한다. 미국의 사례는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반대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발적 이민에 의한 미국의 인종집단들은 강제연행에 의한 일본의 재일교포들과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재일교포들이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일본적 토양에서 다인종 국가의 문화적 인종주의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둘째는 국제화시대의 개방성과 인권옹호가 그 이유이다. 국경을 넘어 인력이동이 잦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는 개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48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일랜드인과 영연방 시민에게, 아일랜드도 1963년부터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이후 국적 제한없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였다. 1998년에 이탈리아도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호성원칙에 따라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위해 뒤늦게 입법화를 추진 중인 국가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이다. 여기에서 참정권의 중요한 잣대는 국적보다는 주민권(장기체류권), 생활권, 편의권 등이다. 일본은 21세기 전반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대거 수입을 추진, 개방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개방과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 기회에 국내 화교들에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문헌)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한겨레네트워크 hankyore.net
윤상삼 /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임지현 한양대 교수 자료집
www.yonhapnews.net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국제부/설원태기자 solwt@kyunghyang.com〉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기고 17/09)
이숙종(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마이니찌 : 2000-09-25자 보도자료 발췌
연합뉴스에 올해 8월 30일 기사 발췌
한국일보에 실린 보도 자료발췌
동아일보 2000-10-22일 사설발췌
조선일보 2001-8-23일 3면 기사발췌
(2000.11.01 민단신문 한글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발췌
김득중 / 중도일보 도쿄 특파원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헌 발췌
每日新聞의 2000년 9월 하순 조사참고
곽진웅 / 재일 한국 민주 인권협의회 사무국장보고서 발췌
‘어린이의 권리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인권차별철폐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91년 일본선거학회가 한국적, 조선족동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활용
97년 4월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방영 자료 발췌 사용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www.hankyore.net
www.bumgoo.net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서 발췌
95년11월 파리에서 발간되는 <르빠리지엥>발췌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94년에 출간한 '귀화동포와 이중국적 문제'라는 백서에서 발췌
법무부가 95년 8월25일 발표한 '재외국민 특례법안'
양필승/ 건국대 교수·서울 中國學中心 대표
[조선일보<시론-김명섭>2001.12.28]
(한신대 강상수 교수·국제관계학)
3.전망과 대응
자민당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를 무산시키고 대신 이들의 일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특례법을 심의할 태세이다. 일본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은 (1)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2)준법정신과 사회적 의무관념을 판정하기 위해 소행이 선량해야 하며, (3)가족과 생계를 함께 할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4)이중국적을 피하기 위해 대상은 무국적자로 일본 국적 취득과 함께 자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등이다. 여건을 만족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법무성의 조사관이 본인 조사는 물론, 지인, 친구, 이웃사람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나 학교, 거래선 등을 조사하며, 사상, 정치활동, 범죄력, 납세상황 등의 프라이버시도 조사된다. 이를 통과하면 국적을 ‘허가’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적법 3조항은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탄생한 적출 자녀의 경우 신청만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이를 특별영주자에게도 적용,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일교포가 대부분인 특별영주외국인의 수가 1992년 이래 매년 약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화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례법이 통과되어 국적취득이 쉬워지면 재일교포의 귀화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례법은 귀화도 쉬어졌으니 귀화한 다음에 선거권을 가지라는 논리를 강화, 재일교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원치 않는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유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인종성(ethnicity)은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문화적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대신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엄격한 국적주의를 취한다. 미국의 사례는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반대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발적 이민에 의한 미국의 인종집단들은 강제연행에 의한 일본의 재일교포들과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재일교포들이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일본적 토양에서 다인종 국가의 문화적 인종주의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둘째는 국제화시대의 개방성과 인권옹호가 그 이유이다. 국경을 넘어 인력이동이 잦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는 개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48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일랜드인과 영연방 시민에게, 아일랜드도 1963년부터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이후 국적 제한없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였다. 1998년에 이탈리아도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호성원칙에 따라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위해 뒤늦게 입법화를 추진 중인 국가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이다. 여기에서 참정권의 중요한 잣대는 국적보다는 주민권(장기체류권), 생활권, 편의권 등이다. 일본은 21세기 전반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대거 수입을 추진, 개방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개방과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 기회에 국내 화교들에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문헌)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한겨레네트워크 hankyore.net
윤상삼 /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임지현 한양대 교수 자료집
www.yonhapnews.net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국제부/설원태기자 solwt@kyunghyang.com〉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기고 17/09)
이숙종(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마이니찌 : 2000-09-25자 보도자료 발췌
연합뉴스에 올해 8월 30일 기사 발췌
한국일보에 실린 보도 자료발췌
동아일보 2000-10-22일 사설발췌
조선일보 2001-8-23일 3면 기사발췌
(2000.11.01 민단신문 한글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발췌
김득중 / 중도일보 도쿄 특파원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헌 발췌
每日新聞의 2000년 9월 하순 조사참고
곽진웅 / 재일 한국 민주 인권협의회 사무국장보고서 발췌
‘어린이의 권리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인권차별철폐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91년 일본선거학회가 한국적, 조선족동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활용
97년 4월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방영 자료 발췌 사용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www.hankyore.net
www.bumgoo.net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서 발췌
95년11월 파리에서 발간되는 <르빠리지엥>발췌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94년에 출간한 '귀화동포와 이중국적 문제'라는 백서에서 발췌
법무부가 95년 8월25일 발표한 '재외국민 특례법안'
양필승/ 건국대 교수·서울 中國學中心 대표
[조선일보<시론-김명섭>2001.12.28]
(한신대 강상수 교수·국제관계학)
추천자료
 재일교포의 문제점과 대책
재일교포의 문제점과 대책 재일교포 인권
재일교포 인권 재일교포의 형성 과정 및 현황과 향후 전망(별첨1 :북한의 재일동포정책, 별첨2 :조선족, 재...
재일교포의 형성 과정 및 현황과 향후 전망(별첨1 :북한의 재일동포정책, 별첨2 :조선족, 재... [정체성][정체감][재일교포][모성][한인][인종][언론]재일교포의 정체성, 중앙아시아 한인의 ...
[정체성][정체감][재일교포][모성][한인][인종][언론]재일교포의 정체성, 중앙아시아 한인의 ...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해외동포]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역사,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해외동포]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역사,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민족교육]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민족교육]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재일동포의 형성과 분단, 재일동포의 역사, 재일동포의 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재일동포의 형성과 분단, 재일동포의 역사, 재일동포의 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재일동포의 현황, 재일동포의 당면 문제점, 재일동포 법적...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재일동포의 현황, 재일동포의 당면 문제점, 재일동포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