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알타이 지방의 지리적 특징
2. 우리 나라와의 연관성
3. 시대별 알타이문화
가. 구석기 시대
나. 신석기 시대
다. 청동기 시대
라. 파라지크 시대(초기철기 시대)
4. 알타이와 한반도의 암각화
- 참고문헌
2. 우리 나라와의 연관성
3. 시대별 알타이문화
가. 구석기 시대
나. 신석기 시대
다. 청동기 시대
라. 파라지크 시대(초기철기 시대)
4. 알타이와 한반도의 암각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럽인종이었다. 아파나시에보 문화는 유물의 일정한 조합과 장례의식이 특징적이다. 시신은 지상에 매장 되었으며, 무덤안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앙와굴장으로 묻혀 있었다. 무덤상부는 적석 시설을 하였고 때로는 작은 울타리를 주위에 돌렸다. 이 문화의 유물은 첨저, 평저, 원저의 토기류로 구성되었으며, 토제향로가 일반적이다. 석제, 골제 유물은 다소 고식적이며 그 생김새가 신석기시대의 유물을 닮고 있다. 청동도구는 원시적인 칼과 소형 유물로 대표된다.
라.파리지크 시대(초기철기 시대)
파지리크문화는 기원전 육세기에서 기원전 이세기까지 산지 알타이 지역에 존재했다. 그 문화의 기원은 기원전 육세기에 새로운 주민의 유입과 연관되어있다. 이미 그 이전 두 시대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유목종족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에서 온 강한 전투 기마 유목민들에게 항복해야 했다. 이 정복자들은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화의 대부분이 앗시리아, 미디아, 이란의 고대 예술과 문화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알타이 원주민과 정복자들이 가진 두 가지 전통이 융합된 결과로 나타난 이 문화는 오늘날 전세계 고고학자들에게 파지리크 문화라고 알려져 있다.
4.알타이와 한반도의 암각화
알타이와 몽골 고원 지대의 선사새대 유적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암각화이다. 암각화는 바위나 암벽위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인물 등의 모습을 새기거나 그려서 남겨놓은 것으로 과거에 살었던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이다. 이와 유사한 암각화는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어 있어 두 지역 문화비교의 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암각화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그 자체의 예술성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과거의 여러 문화인의 정신세계, 생활방식, 사회구조의 부분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물증임과 동시에 여러 문화와 그 시기들간에 있었던 연계관계를 입중해 주는 자료가 많다고 한다.
알타이와 몽골 고원에서 발견되는 암각화는 대부분이 강가의 벼랑이나 눈에 띄는 돌산 또는 큰바위에서 발견된다. 그 중 중요한 암각화는 추야강, 에랑가쉬강, 바르부가지강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우코크계곡과 베릍텍지역에서도 암각화가 발견된다. 그런데 알타이와 몽골고원지대의 암각화와 같은 내용, 양식의 것들이 한반도의 울산 반구대, 남해 상주리, 벽련리, 경주, 포항 일대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암각화를 통한 두 지역간의 문화 교류상을 파악해 보기 의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암각화의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산양과 사슴 그리고 새의 그림이다. 이들 중 산양과 사슴은 반구대, 상주, 벽련리, 암각화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이 발견되며, 이 장소들이 모두 같은 목적의 제의장소들 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에 관한 암각화와 고대신앙에 있어서 알타이 몽골지역과 한반도의 연계성을 더욱 두드러 진다. 알타이와 몽골지역에서는 동북아시아 중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보다 새의 암각과 암화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청동기 시대에 가장 많이 제작되었고 그 후 초기 철기시대로 내려오면서도 이 계통의 암각화를 수 없이 남겨놓고 있다. 오늘 날에 와서도 새의 암각화는 이 지역 여러 종족의 조상신으로 남겨진 것이 알려지고 있다 .즉 새 토템사상 영향이 계속 이 지역에서 존재했던 것이다. 새와 연계된 토템 사상적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의 다른 하나가 한반도이다.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이 새 토템이 알타이, 몽골, 만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새에 관한 유물, 유적은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가장 오랜 된 유물로는 전 대전 출토의 방패형의기의 새 문양과 경주에서 발견된 청동제 조산(솟대)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라왕관의 내관깃털장식, 고구려전사나 고관의 깃털장식 등도 이러한 고대 새 토템사상과의 연관을 말해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보편적인 새 토템 사상의 흔적은 오늘날의 솟대신앙에서 찾아진다. 솟대신앙은 현재까지도 지켜져 내려오는 전통 신앙의 하나이다. 결국 우리는 알타이, 몽골지역과 한반도의 연계관계를 암각화와 전통신앙의 내용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알타이 문화사 연구-박시인(1970. 탐구당)
● 알타이 인문 연구-박시인(1981. 서울대학교 출판사)
● 알타이 문명전 (1995)
●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최몽룡(1993. 학연문화사)
● 알타이 문화기행-박시인(1995.청노루)
라.파리지크 시대(초기철기 시대)
파지리크문화는 기원전 육세기에서 기원전 이세기까지 산지 알타이 지역에 존재했다. 그 문화의 기원은 기원전 육세기에 새로운 주민의 유입과 연관되어있다. 이미 그 이전 두 시대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유목종족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에서 온 강한 전투 기마 유목민들에게 항복해야 했다. 이 정복자들은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화의 대부분이 앗시리아, 미디아, 이란의 고대 예술과 문화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알타이 원주민과 정복자들이 가진 두 가지 전통이 융합된 결과로 나타난 이 문화는 오늘날 전세계 고고학자들에게 파지리크 문화라고 알려져 있다.
4.알타이와 한반도의 암각화
알타이와 몽골 고원 지대의 선사새대 유적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암각화이다. 암각화는 바위나 암벽위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인물 등의 모습을 새기거나 그려서 남겨놓은 것으로 과거에 살었던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이다. 이와 유사한 암각화는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어 있어 두 지역 문화비교의 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암각화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그 자체의 예술성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과거의 여러 문화인의 정신세계, 생활방식, 사회구조의 부분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물증임과 동시에 여러 문화와 그 시기들간에 있었던 연계관계를 입중해 주는 자료가 많다고 한다.
알타이와 몽골 고원에서 발견되는 암각화는 대부분이 강가의 벼랑이나 눈에 띄는 돌산 또는 큰바위에서 발견된다. 그 중 중요한 암각화는 추야강, 에랑가쉬강, 바르부가지강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우코크계곡과 베릍텍지역에서도 암각화가 발견된다. 그런데 알타이와 몽골고원지대의 암각화와 같은 내용, 양식의 것들이 한반도의 울산 반구대, 남해 상주리, 벽련리, 경주, 포항 일대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암각화를 통한 두 지역간의 문화 교류상을 파악해 보기 의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암각화의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산양과 사슴 그리고 새의 그림이다. 이들 중 산양과 사슴은 반구대, 상주, 벽련리, 암각화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이 발견되며, 이 장소들이 모두 같은 목적의 제의장소들 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에 관한 암각화와 고대신앙에 있어서 알타이 몽골지역과 한반도의 연계성을 더욱 두드러 진다. 알타이와 몽골지역에서는 동북아시아 중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보다 새의 암각과 암화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청동기 시대에 가장 많이 제작되었고 그 후 초기 철기시대로 내려오면서도 이 계통의 암각화를 수 없이 남겨놓고 있다. 오늘 날에 와서도 새의 암각화는 이 지역 여러 종족의 조상신으로 남겨진 것이 알려지고 있다 .즉 새 토템사상 영향이 계속 이 지역에서 존재했던 것이다. 새와 연계된 토템 사상적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의 다른 하나가 한반도이다.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이 새 토템이 알타이, 몽골, 만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새에 관한 유물, 유적은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가장 오랜 된 유물로는 전 대전 출토의 방패형의기의 새 문양과 경주에서 발견된 청동제 조산(솟대)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라왕관의 내관깃털장식, 고구려전사나 고관의 깃털장식 등도 이러한 고대 새 토템사상과의 연관을 말해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보편적인 새 토템 사상의 흔적은 오늘날의 솟대신앙에서 찾아진다. 솟대신앙은 현재까지도 지켜져 내려오는 전통 신앙의 하나이다. 결국 우리는 알타이, 몽골지역과 한반도의 연계관계를 암각화와 전통신앙의 내용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알타이 문화사 연구-박시인(1970. 탐구당)
● 알타이 인문 연구-박시인(1981. 서울대학교 출판사)
● 알타이 문명전 (1995)
●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최몽룡(1993. 학연문화사)
● 알타이 문화기행-박시인(1995.청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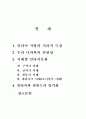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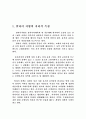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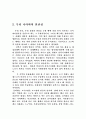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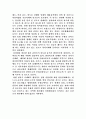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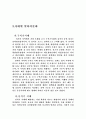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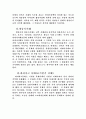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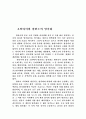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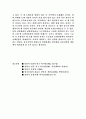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