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몽골 이야기
Ⅱ. 몽골의 문화
1. 주거문화
(1) 게르(Ger)
(2) 게르아일 (나무집)
(3) 어런소츠(아파트)
2. 의복문화
(1) 기사전통
(2) 의복재료
(3) 의복의 특징
(4) 모자와 머리장식
(5) 고탈(장화)
(6) 허리띠
3. 음식문화
4. 목축문화
(1) 목축이야기
(2) 젖짜기
(3) 불까기
(4) 가축도살
Ⅱ. 몽골의 문화
1. 주거문화
(1) 게르(Ger)
(2) 게르아일 (나무집)
(3) 어런소츠(아파트)
2. 의복문화
(1) 기사전통
(2) 의복재료
(3) 의복의 특징
(4) 모자와 머리장식
(5) 고탈(장화)
(6) 허리띠
3. 음식문화
4. 목축문화
(1) 목축이야기
(2) 젖짜기
(3) 불까기
(4) 가축도살
본문내용
은 지형, 기후, 특히 풍향, 풀의 식생, 물 먹이는 장소 등을 머리에 넣어 시뮬레이션하면 자신의 말이나 낙타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거의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가축이 없어졌을 때 남자들은 즉시 가축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가축을 찾는 일이다. 가축을 찾아 나서는 길에 머물게 되는 집에서는 식사 와 침구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의다. 이때 남자들은 누구네 집 말떼가 어디에 있다는 등 가축 떼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교환하게 되는데, 가축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젖짜기
가축의 젖은 고기와 함께 사람의 귀중한 식량원이다.
특히 여름은 젖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얀 음식>이라 불리는 유제품이 음식 중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 5종 가축 가운데서 소가 가장 많은 젖을 공급한다. 다른 가축은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젖을 짜지만 소는 거의 일년 내내 젖을 짠다. 양과 염소의 젖짜기는 어미 가축의 머리를 엇갈리게 하여 줄로 묶고 뒤에서 젖꼭지를 쥐고 짠다. 젖을 짠 뒤 줄을 잡아당기면 묶어 놓은 줄은 쉽게 풀린다. 새끼는 사람이 짜고 난 뒤 남은 젖을 먹는다. 젖을 짤 때 양과 염소는 어미 가축을 묶지만 말, 소, 낙타 등 덩치가 큰 가축은 새끼를 붙들어 땅바닥에 처놓은 <젤>이라는 줄에 묶는다. 큰어미를 붙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새끼를 묶어 놓으면 어미는 자기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다.
송아지는 저녁 무렵에 묶어 놓고 아침에 어미 소젖을 짠 뒤 놓아준다. 이에 비해 말은 아침에 게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말떼를 데려와 망아지를 붙들어 매어 놓은 후 낮에 젖을 짜고 저녁에 풀어준다. 말젖은 금방 고여 저절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루 2시간마다 5회에서 8회 정도 짜야 한다. 또한 말, 소, 낙타의 젖을 짤 때는 미리 새끼에게 젖을 약간 먹이는 최유(催乳)행위가 필요하다. 젖짜는 동안 새끼를 어미 옆에 세워 놓아야 한다.
젖을 둘러싸고 사람이 어미와 새끼 사이에 개입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송아지에 입마개를 붙이거나 어미 염소에 젖덮개를 씌우기도 한다. 크게 자라서도 젖을 먹는 송아지, 새끼염소, 새끼양은 코에 앞이 뾰족한 막대기를 찔러 놓는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어미 유방을 찌르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 없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미와 새끼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즉 어미와 새끼를 각각 다른 무리로 나누는 방법이다. 말이나 낙타는 모자간의 결속이 굳건하여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소는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아침에 젖을 짠 후 저녁에 젖을 짤 때까지 송아지를 다른 소와 별도로 게르 근처의 목초지에 방목한다.
양, 염소도 젖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여 따로 따로 무리를 짓는 방법을 쓴다. 양, 염소는 주로 오후에 젖을 짠다. 젖짜기는 원래 새끼가 먹을 젖을 어미에게서 착취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목축기술상 몇 개의 기능을 한다. 하나는 새끼나 어미를 묶거나 젖을 짜거나 결합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온순하게 길들인다. 즉 사람에게 순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유목민에 의하면 새끼의 추위 등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젖을 빨리 떼면 가축 자신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3) 불까기
불까기는 가장 기본적인 목축기술이다.
사람은 불까기를 통해 가축의 형질을 자신에 맞추어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어 왔다. 또한 불까기는 암수관계를 규제하고 무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가축을 만들어 낸다. 불까기는 젖짜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목축기술이다. 불깐 수컷은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 불깐 말은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승용마로 쓴다. 똑같은 이유로 불깐 낙타,불깐 소는 운송용에 이용된다.
불깐 양은 신체가 크다. 연회시 차림 고기로서 또는 다른 양이 야윈 봄에 식량으로서 없어서는 안된다. 불깐 가축이 온존될 수 있는 것은 목초지에 그 정도의 허용력이 있고 가축이 무리로 방복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깐 가축을 활용하는 몽골 목축문화를 어떤 연구자는 <거세 가축문화(去家畜文化)>라 부른다.
(4) 가축도살
양이나 염소를 도살, 도축 해체할 때는 피를 땅바닥에 흘리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복부에 고인 피를 퍼내 순대를 만들어 먹기 때문이다. 양과 염소는 잡는 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나 소는 다리를 묶어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칼로 숨골을 끊는다. 말과 낙타를 잡는 경우는 드물다. 늙은 말이나 낙타는 무리에서 처져 결국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 씨 가축으로 쓴 늙은 양, 염소, 소는 불을 까서 고기냄새를 뺀 후 잡는다.
단, 어렸을 때 어미를 잃고 주인이 게르 안에서 젖병으로 기른 가축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그동안의 정분을 고려하여 주인이 죽이지 못하고 다른 집에 선물하여 처분한다.
가축은 야생동물과 같이 기질이 사납거나 사람을 보고 곧바로 도망가버려서는 안되지만 ,사람과 너무 가깝게 친숙해지거나 지나치게 손을 타서도 안되며 사람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는 가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불까기를 통하여 가축을 선택해 왔다. 또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갓 태어난 새끼양 관리나 젖짜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작업도 거리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작업들이 가축을 <야생>에서 <사람>에 가깝게 하는 노력이라 한다면, 유목민이 가축의 관리에 가능한 한 힘을 아끼려 하는 것은 반대로 가축을 사람에게 너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목민은 통상적인 유목작업 중에도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람과 가축의 거리를 재고 있는데, 가축마다 쫓는 소리, 멈춰 세우는 소리, 불러들이는 소리가 정해져 있다. 젖짜기 등 사람과 가축의 거리가 극도로 가깝게 된 경우 젖짜는 데 필요한 소리 외에도 불러들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축이 없어졌을 때 남자들은 즉시 가축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가축을 찾는 일이다. 가축을 찾아 나서는 길에 머물게 되는 집에서는 식사 와 침구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의다. 이때 남자들은 누구네 집 말떼가 어디에 있다는 등 가축 떼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교환하게 되는데, 가축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젖짜기
가축의 젖은 고기와 함께 사람의 귀중한 식량원이다.
특히 여름은 젖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얀 음식>이라 불리는 유제품이 음식 중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 5종 가축 가운데서 소가 가장 많은 젖을 공급한다. 다른 가축은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젖을 짜지만 소는 거의 일년 내내 젖을 짠다. 양과 염소의 젖짜기는 어미 가축의 머리를 엇갈리게 하여 줄로 묶고 뒤에서 젖꼭지를 쥐고 짠다. 젖을 짠 뒤 줄을 잡아당기면 묶어 놓은 줄은 쉽게 풀린다. 새끼는 사람이 짜고 난 뒤 남은 젖을 먹는다. 젖을 짤 때 양과 염소는 어미 가축을 묶지만 말, 소, 낙타 등 덩치가 큰 가축은 새끼를 붙들어 땅바닥에 처놓은 <젤>이라는 줄에 묶는다. 큰어미를 붙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새끼를 묶어 놓으면 어미는 자기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다.
송아지는 저녁 무렵에 묶어 놓고 아침에 어미 소젖을 짠 뒤 놓아준다. 이에 비해 말은 아침에 게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말떼를 데려와 망아지를 붙들어 매어 놓은 후 낮에 젖을 짜고 저녁에 풀어준다. 말젖은 금방 고여 저절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루 2시간마다 5회에서 8회 정도 짜야 한다. 또한 말, 소, 낙타의 젖을 짤 때는 미리 새끼에게 젖을 약간 먹이는 최유(催乳)행위가 필요하다. 젖짜는 동안 새끼를 어미 옆에 세워 놓아야 한다.
젖을 둘러싸고 사람이 어미와 새끼 사이에 개입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송아지에 입마개를 붙이거나 어미 염소에 젖덮개를 씌우기도 한다. 크게 자라서도 젖을 먹는 송아지, 새끼염소, 새끼양은 코에 앞이 뾰족한 막대기를 찔러 놓는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어미 유방을 찌르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 없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미와 새끼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즉 어미와 새끼를 각각 다른 무리로 나누는 방법이다. 말이나 낙타는 모자간의 결속이 굳건하여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소는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아침에 젖을 짠 후 저녁에 젖을 짤 때까지 송아지를 다른 소와 별도로 게르 근처의 목초지에 방목한다.
양, 염소도 젖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여 따로 따로 무리를 짓는 방법을 쓴다. 양, 염소는 주로 오후에 젖을 짠다. 젖짜기는 원래 새끼가 먹을 젖을 어미에게서 착취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목축기술상 몇 개의 기능을 한다. 하나는 새끼나 어미를 묶거나 젖을 짜거나 결합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온순하게 길들인다. 즉 사람에게 순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유목민에 의하면 새끼의 추위 등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젖을 빨리 떼면 가축 자신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3) 불까기
불까기는 가장 기본적인 목축기술이다.
사람은 불까기를 통해 가축의 형질을 자신에 맞추어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어 왔다. 또한 불까기는 암수관계를 규제하고 무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가축을 만들어 낸다. 불까기는 젖짜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목축기술이다. 불깐 수컷은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 불깐 말은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승용마로 쓴다. 똑같은 이유로 불깐 낙타,불깐 소는 운송용에 이용된다.
불깐 양은 신체가 크다. 연회시 차림 고기로서 또는 다른 양이 야윈 봄에 식량으로서 없어서는 안된다. 불깐 가축이 온존될 수 있는 것은 목초지에 그 정도의 허용력이 있고 가축이 무리로 방복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깐 가축을 활용하는 몽골 목축문화를 어떤 연구자는 <거세 가축문화(去家畜文化)>라 부른다.
(4) 가축도살
양이나 염소를 도살, 도축 해체할 때는 피를 땅바닥에 흘리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복부에 고인 피를 퍼내 순대를 만들어 먹기 때문이다. 양과 염소는 잡는 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나 소는 다리를 묶어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칼로 숨골을 끊는다. 말과 낙타를 잡는 경우는 드물다. 늙은 말이나 낙타는 무리에서 처져 결국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 씨 가축으로 쓴 늙은 양, 염소, 소는 불을 까서 고기냄새를 뺀 후 잡는다.
단, 어렸을 때 어미를 잃고 주인이 게르 안에서 젖병으로 기른 가축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그동안의 정분을 고려하여 주인이 죽이지 못하고 다른 집에 선물하여 처분한다.
가축은 야생동물과 같이 기질이 사납거나 사람을 보고 곧바로 도망가버려서는 안되지만 ,사람과 너무 가깝게 친숙해지거나 지나치게 손을 타서도 안되며 사람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는 가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불까기를 통하여 가축을 선택해 왔다. 또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갓 태어난 새끼양 관리나 젖짜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작업도 거리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작업들이 가축을 <야생>에서 <사람>에 가깝게 하는 노력이라 한다면, 유목민이 가축의 관리에 가능한 한 힘을 아끼려 하는 것은 반대로 가축을 사람에게 너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목민은 통상적인 유목작업 중에도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람과 가축의 거리를 재고 있는데, 가축마다 쫓는 소리, 멈춰 세우는 소리, 불러들이는 소리가 정해져 있다. 젖짜기 등 사람과 가축의 거리가 극도로 가깝게 된 경우 젖짜는 데 필요한 소리 외에도 불러들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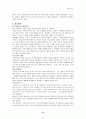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