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연구사
-작자에 대한 연구
-원본에 대한 연구
-작품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구조 및 주제에 대한 연구
2.본론
1)<홍길동전>의 창작배경
-사회·역사적 배경
-창작동기
2)영웅구조를 통해 본 홍길동전
-탄생 - 영웅의 기틀 마련
-첫 번째 고난 - 영웅성 입증
-구출 - 자력에 의한 구출
-두 번째 고난 - 영웅성 확장
-승리 - 영웅성 보장
3.결론
1)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연구사
-작자에 대한 연구
-원본에 대한 연구
-작품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구조 및 주제에 대한 연구
2.본론
1)<홍길동전>의 창작배경
-사회·역사적 배경
-창작동기
2)영웅구조를 통해 본 홍길동전
-탄생 - 영웅의 기틀 마련
-첫 번째 고난 - 영웅성 입증
-구출 - 자력에 의한 구출
-두 번째 고난 - 영웅성 확장
-승리 - 영웅성 보장
3.결론
본문내용
\'의 세계를 되살린 것이다.
*\'최초의 한글소설\'은 어느 작품인가? 그 동안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소설로 가르쳐 왔는데, 1997년 봄 한글본 <설공찬전>의 존재가 알려지고,
) 채수(蔡壽, 1449-1515)의 <설공찬전(薛公瓚傳)>은 1508-1511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소설로서, 어숙권(魚叔權)의『패관잡기(稗官雜記)』에는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이라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당시에 이미 한문으로 베끼거나 한글로 번역되어 민간에 널리 읽혔는데, 1511년 \"요서(妖書)\"로 규정되어 왕명으로 회수, 소각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품명과 간략한 요지만 알려져 왔었을 뿐 작품 자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속면에 \'셜공찬이\'란 제목으로 필사되어 있는, 총 13쪽 4천여 자(A4 2쪽 정도) 분량의 한글본인데, 아쉽게도 작품 뒷부분이 없는 결본(缺本)이다. 서사의 짜임새나 흐름이 극히 부실하고 미완의 상태로 끝난 것으로 보아, 한문본을 직접 번역한 것이기보다는 구전되던 내용을 일부 적어 놓은 게 아닐까 추정된다.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초라는 견해와, 16세기까지는 소급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복규(1997), \"설공찬전 국문본 발견의 경위와 의의\", 설공찬전 연구, 시인사.
그 형성 시기가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본 <설공찬전>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한글소설은 여전히 <홍길동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물론 이는 지금 전하는 <홍길동전>이 허균(許筠, 1569-1618)의 작이고, 그것은 한글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현전하는 <홍길동전>이 과연 허균의 작인지, 그리고 그것이 처음 한글로 창작되었는지에 대해 이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이렇게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한글본 <설공찬전>의 형성 시기가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보다 설령 아무리 앞선다 하더라도
) <설공찬전>은 1508-1511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511년(중종 6년) 사헌부에서 채수를 탄핵할 당시 그것은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당시의 번역본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1511년에는 이미 한글본 <설공찬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는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로 추정되는 17세기초보다 약 1세기 정도 앞서는 것이 된다. 물론 이는 한글본 <설공찬전>이 \'최초로\' 형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번에 발견된 자료의 형성 시기가 그렇게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결론은 마찬가지다. <설공찬전>은 분명히 한문으로 창작된 작품인 만큼, 비록 이를 한글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문소설이지 한글소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최초의 한글소설\'이 아니라고 해서 한글본 <설공찬전>의 소설사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의 한글소설\'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16세기초에 이미 한문소설이 곧바로 한글로 번역되어 읽힐 정도로 소설 독자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로서, 또 한문학으로 출발한 우리 소설이 한글문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소설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초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출현이나, 18·19세기 한글소설의 융성과 같은 현상들도 이러한 소설사적 흐름 위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한글소설\'은 어느 작품인가? 그 동안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소설로 가르쳐 왔는데, 1997년 봄 한글본 <설공찬전>의 존재가 알려지고,
) 채수(蔡壽, 1449-1515)의 <설공찬전(薛公瓚傳)>은 1508-1511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소설로서, 어숙권(魚叔權)의『패관잡기(稗官雜記)』에는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이라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당시에 이미 한문으로 베끼거나 한글로 번역되어 민간에 널리 읽혔는데, 1511년 \"요서(妖書)\"로 규정되어 왕명으로 회수, 소각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품명과 간략한 요지만 알려져 왔었을 뿐 작품 자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속면에 \'셜공찬이\'란 제목으로 필사되어 있는, 총 13쪽 4천여 자(A4 2쪽 정도) 분량의 한글본인데, 아쉽게도 작품 뒷부분이 없는 결본(缺本)이다. 서사의 짜임새나 흐름이 극히 부실하고 미완의 상태로 끝난 것으로 보아, 한문본을 직접 번역한 것이기보다는 구전되던 내용을 일부 적어 놓은 게 아닐까 추정된다.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초라는 견해와, 16세기까지는 소급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복규(1997), \"설공찬전 국문본 발견의 경위와 의의\", 설공찬전 연구, 시인사.
그 형성 시기가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본 <설공찬전>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한글소설은 여전히 <홍길동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물론 이는 지금 전하는 <홍길동전>이 허균(許筠, 1569-1618)의 작이고, 그것은 한글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현전하는 <홍길동전>이 과연 허균의 작인지, 그리고 그것이 처음 한글로 창작되었는지에 대해 이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이렇게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한글본 <설공찬전>의 형성 시기가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보다 설령 아무리 앞선다 하더라도
) <설공찬전>은 1508-1511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511년(중종 6년) 사헌부에서 채수를 탄핵할 당시 그것은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당시의 번역본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1511년에는 이미 한글본 <설공찬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는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로 추정되는 17세기초보다 약 1세기 정도 앞서는 것이 된다. 물론 이는 한글본 <설공찬전>이 \'최초로\' 형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번에 발견된 자료의 형성 시기가 그렇게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결론은 마찬가지다. <설공찬전>은 분명히 한문으로 창작된 작품인 만큼, 비록 이를 한글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문소설이지 한글소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최초의 한글소설\'이 아니라고 해서 한글본 <설공찬전>의 소설사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의 한글소설\'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16세기초에 이미 한문소설이 곧바로 한글로 번역되어 읽힐 정도로 소설 독자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로서, 또 한문학으로 출발한 우리 소설이 한글문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소설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초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출현이나, 18·19세기 한글소설의 융성과 같은 현상들도 이러한 소설사적 흐름 위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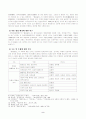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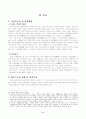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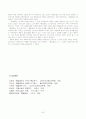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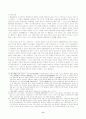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