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 전통음악의 이해를 위한 몇가지 착안점
1)식물성 질감이 펼쳐내는 화평한 음색
2)호흡에 기준을 둔 폐부의 음악
3)농현에 묻어나는 공유한 민족심성
4)제례음악 속에 관류하는 음양사상
5)전통음악의 계기성과 동이기질
6)싱싱한 다이내믹이 펼치는 정관의 세계
7)흥과 신명의 한마당, 민속음악
8)정가와 판소리의 맛
2. 전통음악의 이해를 위한 몇가지 착안점
1)식물성 질감이 펼쳐내는 화평한 음색
2)호흡에 기준을 둔 폐부의 음악
3)농현에 묻어나는 공유한 민족심성
4)제례음악 속에 관류하는 음양사상
5)전통음악의 계기성과 동이기질
6)싱싱한 다이내믹이 펼치는 정관의 세계
7)흥과 신명의 한마당, 민속음악
8)정가와 판소리의 맛
본문내용
다. 이처럼 중몰이에서 입
신(入神)의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자지러지게 죄어드는 잦은몰이에서는 접신(接神)의 성
사(聖事)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환상
의 세계로 이행(移行)되는 것이다. 분명히 민속악의 속성에는 현세를 잊고 내세로 뛰어
넘으려는 소위 통과제의(通過祭儀)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엔 또한 먼 태고의 저쪽 끝에
있을 인간의 시원(始原), 인간의 원형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8)정가와 판소리의 맛
여름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산으로 바다로 대자연의 품 속에 잠겨든다는 것
은 마치 인간이 자신의 본향을 찾아 어머니 품 속으로 돌아와 안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덧없는 세사에 탐닉타가 돌아온 방랑자가 언제나 한결같은 고향의 숨결에서 문득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 여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계시의 순간들인지도
모른다. 자연의 섭리를 외면한 채 콘크리트 밀림 속으로만 칩거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일
깨우려는 연례적인 성무(聖務)행사가 다름아닌 짙푸른 여름의 계절일 것이다.
이처럼 싱그러운 계절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섭리를 맞아들일 채비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곧 대자연을 향한 예의바른 정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
겠다. 여기 예의바른 정장이란 곧 속된 인위의 옷을 벗어던지는 일일 것이다. 가식의 옷
을 벗고 오만의 옷을 벗고, 그야말로 적나라한 속말이 나올 때까지 세속의 껍질을 벗겨
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자연으로 귀일(歸一)했을 때, 그곳엔 어느덧
망망한 지평에 동이 터오듯 은은한 자연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
바로 이때에 들려옴직한 소리, 즉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제격이랄 수 있는 음
악이 지상에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시조나 가곡과 같은 우리네 정가(正價)계통의 음
악이 아닐까 한다.
특히 시조음악은 너무도 자연을 닮았다. 한가로운 시골어귀의 정자나무밑 정경을 연상
해 보자. 적절한 크레센도(cresendo)와 데크레센도로 노송사이를 스쳐가는 산바람의 다
이내믹, 여름날의 정적을 한층 두텁게 깔아가는 매미의 울음소리, 반쯤 눈을 감고 한낮
을 반추하는 일소의 입놀림, 하얀 구름마저 미류나무 가지에 걸려 졸고있는 전형적인 여
름철 대자연의 한 모퉁이에서 오수를 즐기던 촌로(村老) 한분이 목청을 뽑아 소리를 냈
다고 하자. 과연 그때의 음악이란 템포에 있어서나 선율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성격의
음악이어야 제격이랄 수 있을까. 바로 시조창의 속성 그것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
조의 생명은 노송을 스쳐가는 산바람의 다이내믹처럼 오묘한 역동감(力動感)을 주는데
있으며, 그것의 참맛이란 여름날의 정적처럼 깊은 관조의 세계를 펼쳐주는 데 있다. 시
조의 템포가 시간을 반추하는 일소의 이미지를 닮았다면 그것은 곧 부생공자망(浮生空自
忙)이라고 부평초같은 인생들이 공연히 바빠들하는 도회의 생리를 넌지시 꼬집어주는 것
이겠으며, 시조의 선율이 단조로운듯 여울져오는 매미소리를 닮았다면 그것은 곧 번문욕
례(繁文縟禮)의 부질없는 짓거리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세사의 허상을 찔러주는 것임에
틀임없을 것이다.
한편 판소리 음악은 영락없이 질뚝배기를 닮은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질뚝배기
또한 판소리를 빼어 닮았다고 하겠다. 마치 판소리가 민중감정의 저수지이듯 거기엔 확
실히 서민의 체취와 애환이 응축되어 있다. 거기엔 멍석에 누워 별을 헤던 서민의 꿈이
있고, 등잔불에 실을 잦던 초가의 전설이 있다. 또한 거기엔 역겹도록 일그러진 서민의
한이 있고, 바보스럽도록 질박한 촌부의 인정이 있다. 질뚝배기는 여러면에서 판소리를
닮았다. 비단 판소리만이 아니라 국악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판소리적인 요소를 상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질뚝배기와 판소리는 주인이 같다. 모두가 서민에 의해서
육성되고 애용되어 왔다. 가곡의 짝인 청자가 사대부들의 애완물이었고, 가사를 닮은 백
자가 양반이나 중인계층의 기호품쯤 되었다면, 판소리를 닮은 질뚝배기는 어디로 보아도
서민의 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청자가 근엄한 도포자락에 어울리고, 백자가
새하얀 한산 세모시 자락에 비견된다면, 질뚝배기는 아무래도 올이 굵은 무명 중의(重
衣)적삼에 비교될 수 있다. 문방사우와 산수병풍의 사랑방에는 청자와 가곡이 제맛이라
면, 초가삼간 짚방석에는 질뚝배기와 판소리가 제격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깔끔한 청
자가 가곡의 속성을 대변하고, 담담한 백자가 가사음악을 대표한다면, 텁텁한 질뚝배기
는 도리없이 판소리의속성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껄낄껄낄한 질뚝배기의 질
감은 어쩌면 그렇게도 판소리의 창법과 비슷한지 모를 일이다. 수리성(聲)이니 발발성,
아귀성, 파성, 항성, 철성 등 가지가지의 판소리의 창법을 들어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 다양한 판소리의 창법에서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미감이란 곧 질뚝배기에서 느
끼는 미감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질뚝배기는 겉으로 보아서 그 진미를 모르듯, 판소리 음악도 얼핏 흘려들으면 그렇게
거칠고 우악스럽기만 할 수가 없다. 얼굴에 핏발을 세워가며 우직스럽게 질러대는 판소
리 창은 오직 억지와 불협화음의연속 같이 생각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뚝배기보다는 장
맛이라는 속담처럼 판소리 창에 귀가 트이게 되면 그때는 그 껄끄럽고 거친 발성들이 그
렇게도 구수하고 절묘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가성(假聲)을 기피하는 판소리는 그만큼
꾸밈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유약에 신경을 안쓰는 질그릇처럼, 생긴 그대로를 드러낼뿐
이다. 가성이 없음은 가식이 없음과 통하고, 이는 곧 진실의 절규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소리 창의 그 목쉰듯 거친 음성은 질뚝배기의 진실을 담은 것이요 이는
또한 서민의 진실, 서민의 애환과 적나라한 원색의 감성을 잔재주없이 직설적으로 분출
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판소리 연창에는 늘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해학과 욕설과
신명이 함께하는 것은 모두가 껄끄러운 질뚝배기처럼 늘 서민의 일상에 함께 해오고 있
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신(入神)의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자지러지게 죄어드는 잦은몰이에서는 접신(接神)의 성
사(聖事)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환상
의 세계로 이행(移行)되는 것이다. 분명히 민속악의 속성에는 현세를 잊고 내세로 뛰어
넘으려는 소위 통과제의(通過祭儀)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엔 또한 먼 태고의 저쪽 끝에
있을 인간의 시원(始原), 인간의 원형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8)정가와 판소리의 맛
여름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산으로 바다로 대자연의 품 속에 잠겨든다는 것
은 마치 인간이 자신의 본향을 찾아 어머니 품 속으로 돌아와 안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덧없는 세사에 탐닉타가 돌아온 방랑자가 언제나 한결같은 고향의 숨결에서 문득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 여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계시의 순간들인지도
모른다. 자연의 섭리를 외면한 채 콘크리트 밀림 속으로만 칩거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일
깨우려는 연례적인 성무(聖務)행사가 다름아닌 짙푸른 여름의 계절일 것이다.
이처럼 싱그러운 계절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섭리를 맞아들일 채비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곧 대자연을 향한 예의바른 정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
겠다. 여기 예의바른 정장이란 곧 속된 인위의 옷을 벗어던지는 일일 것이다. 가식의 옷
을 벗고 오만의 옷을 벗고, 그야말로 적나라한 속말이 나올 때까지 세속의 껍질을 벗겨
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자연으로 귀일(歸一)했을 때, 그곳엔 어느덧
망망한 지평에 동이 터오듯 은은한 자연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
바로 이때에 들려옴직한 소리, 즉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제격이랄 수 있는 음
악이 지상에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시조나 가곡과 같은 우리네 정가(正價)계통의 음
악이 아닐까 한다.
특히 시조음악은 너무도 자연을 닮았다. 한가로운 시골어귀의 정자나무밑 정경을 연상
해 보자. 적절한 크레센도(cresendo)와 데크레센도로 노송사이를 스쳐가는 산바람의 다
이내믹, 여름날의 정적을 한층 두텁게 깔아가는 매미의 울음소리, 반쯤 눈을 감고 한낮
을 반추하는 일소의 입놀림, 하얀 구름마저 미류나무 가지에 걸려 졸고있는 전형적인 여
름철 대자연의 한 모퉁이에서 오수를 즐기던 촌로(村老) 한분이 목청을 뽑아 소리를 냈
다고 하자. 과연 그때의 음악이란 템포에 있어서나 선율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성격의
음악이어야 제격이랄 수 있을까. 바로 시조창의 속성 그것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
조의 생명은 노송을 스쳐가는 산바람의 다이내믹처럼 오묘한 역동감(力動感)을 주는데
있으며, 그것의 참맛이란 여름날의 정적처럼 깊은 관조의 세계를 펼쳐주는 데 있다. 시
조의 템포가 시간을 반추하는 일소의 이미지를 닮았다면 그것은 곧 부생공자망(浮生空自
忙)이라고 부평초같은 인생들이 공연히 바빠들하는 도회의 생리를 넌지시 꼬집어주는 것
이겠으며, 시조의 선율이 단조로운듯 여울져오는 매미소리를 닮았다면 그것은 곧 번문욕
례(繁文縟禮)의 부질없는 짓거리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세사의 허상을 찔러주는 것임에
틀임없을 것이다.
한편 판소리 음악은 영락없이 질뚝배기를 닮은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질뚝배기
또한 판소리를 빼어 닮았다고 하겠다. 마치 판소리가 민중감정의 저수지이듯 거기엔 확
실히 서민의 체취와 애환이 응축되어 있다. 거기엔 멍석에 누워 별을 헤던 서민의 꿈이
있고, 등잔불에 실을 잦던 초가의 전설이 있다. 또한 거기엔 역겹도록 일그러진 서민의
한이 있고, 바보스럽도록 질박한 촌부의 인정이 있다. 질뚝배기는 여러면에서 판소리를
닮았다. 비단 판소리만이 아니라 국악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판소리적인 요소를 상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질뚝배기와 판소리는 주인이 같다. 모두가 서민에 의해서
육성되고 애용되어 왔다. 가곡의 짝인 청자가 사대부들의 애완물이었고, 가사를 닮은 백
자가 양반이나 중인계층의 기호품쯤 되었다면, 판소리를 닮은 질뚝배기는 어디로 보아도
서민의 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청자가 근엄한 도포자락에 어울리고, 백자가
새하얀 한산 세모시 자락에 비견된다면, 질뚝배기는 아무래도 올이 굵은 무명 중의(重
衣)적삼에 비교될 수 있다. 문방사우와 산수병풍의 사랑방에는 청자와 가곡이 제맛이라
면, 초가삼간 짚방석에는 질뚝배기와 판소리가 제격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깔끔한 청
자가 가곡의 속성을 대변하고, 담담한 백자가 가사음악을 대표한다면, 텁텁한 질뚝배기
는 도리없이 판소리의속성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껄낄껄낄한 질뚝배기의 질
감은 어쩌면 그렇게도 판소리의 창법과 비슷한지 모를 일이다. 수리성(聲)이니 발발성,
아귀성, 파성, 항성, 철성 등 가지가지의 판소리의 창법을 들어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 다양한 판소리의 창법에서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미감이란 곧 질뚝배기에서 느
끼는 미감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질뚝배기는 겉으로 보아서 그 진미를 모르듯, 판소리 음악도 얼핏 흘려들으면 그렇게
거칠고 우악스럽기만 할 수가 없다. 얼굴에 핏발을 세워가며 우직스럽게 질러대는 판소
리 창은 오직 억지와 불협화음의연속 같이 생각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뚝배기보다는 장
맛이라는 속담처럼 판소리 창에 귀가 트이게 되면 그때는 그 껄끄럽고 거친 발성들이 그
렇게도 구수하고 절묘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가성(假聲)을 기피하는 판소리는 그만큼
꾸밈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유약에 신경을 안쓰는 질그릇처럼, 생긴 그대로를 드러낼뿐
이다. 가성이 없음은 가식이 없음과 통하고, 이는 곧 진실의 절규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소리 창의 그 목쉰듯 거친 음성은 질뚝배기의 진실을 담은 것이요 이는
또한 서민의 진실, 서민의 애환과 적나라한 원색의 감성을 잔재주없이 직설적으로 분출
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판소리 연창에는 늘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해학과 욕설과
신명이 함께하는 것은 모두가 껄끄러운 질뚝배기처럼 늘 서민의 일상에 함께 해오고 있
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추천자료
 한국의전통주거(집)
한국의전통주거(집) 한국전통음식의 간장과된장
한국전통음식의 간장과된장 한국전통주거의 역사
한국전통주거의 역사 전통한국식 장류 전문 유통 사업 계획서
전통한국식 장류 전문 유통 사업 계획서 한국전통차
한국전통차 [떡][떡의 의미][떡의 역사][떡의 분류][떡의 영양][떡의 성분][전통음식][한국전통음식][송...
[떡][떡의 의미][떡의 역사][떡의 분류][떡의 영양][떡의 성분][전통음식][한국전통음식][송... 한국전통복식
한국전통복식 [단청][색채][조화미][전통][한국전통][단청의 의미][단청의 종류][단청의 기능][단청의 목적...
[단청][색채][조화미][전통][한국전통][단청의 의미][단청의 종류][단청의 기능][단청의 목적... 한국전통주거의주동배치
한국전통주거의주동배치 한국전통문화의이해
한국전통문화의이해 한국전통육아와 현대육아
한국전통육아와 현대육아 [한국전통춤] 승무의 유래에 대한 조사
[한국전통춤] 승무의 유래에 대한 조사 [한국전통문화] 상장풍속에 담겨 있는 정신문화 - 한국인의 사생관념(장례의 형태), 효사상과...
[한국전통문화] 상장풍속에 담겨 있는 정신문화 - 한국인의 사생관념(장례의 형태), 효사상과... [한국전통문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동양과 서양, 종교(이슬람교, 기독교...
[한국전통문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동양과 서양, 종교(이슬람교,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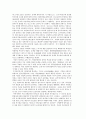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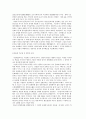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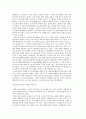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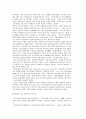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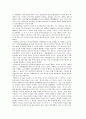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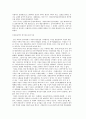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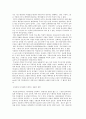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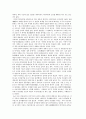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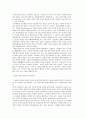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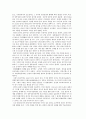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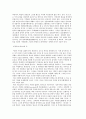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