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 문제의 제기
II. 권한의 위임과 법률의 근거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 구별할 개념
(1) 내부위임
(2) 권한의 대리
(3) 위임전결
3. 권한의 위임의 근거
4. 재위임
III. 하급청의 복종의무
1. 개설
2. 훈령과 직무명령
3. 유효요건
4. 하자있는 훈령의 효력
IV. 설문의 검토
1. A 장관의 권한의 위임의 적법성 여부
2. B 국장의 복종의무와 불복의 적법성 여부
V. 결 론
II. 권한의 위임과 법률의 근거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 구별할 개념
(1) 내부위임
(2) 권한의 대리
(3) 위임전결
3. 권한의 위임의 근거
4. 재위임
III. 하급청의 복종의무
1. 개설
2. 훈령과 직무명령
3. 유효요건
4. 하자있는 훈령의 효력
IV. 설문의 검토
1. A 장관의 권한의 위임의 적법성 여부
2. B 국장의 복종의무와 불복의 적법성 여부
V. 결 론
본문내용
그 예이다.
결국 설문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32조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시·도지사에 한정되어 있음에 A 장관의 권한위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나, 정부조직법 제6조가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견해에 따르자면 일반적으로 위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장관의 석유판매업에 관한 허가 사무의 권한을 B 국장에게 위임한 것은 설문의 취지상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며, 긍정설의 논거에 의해서도 허가 사무의 권한의 전부 위임은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권한의 위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권한의 전부 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임청의 권한의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원천적인 장관의 권한의 소멸과 책임의 소멸을 가져오는 부당함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2. B 국장의 복종의무와 불복의 적법성 여부
하급청의 기관의사를 구속하는 훈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안(영업허가)에 대해서 A 장관에게 명령권이 인정되고, 설문상의 훈령은 긍정설의 입장에 따라 일반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 B 국장에게 허가 사무의 위임이 하급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 법률상의 근거가 인정되나, 즉 권한의 전부 위임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한의 위임으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설문의 훈령으로 볼 수 있는 장관의 통고는 권한의 전부· 포괄적 위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A 장관의 권한위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B 국장은 A 국장의 훈령은 하자있는 훈령에 해당한다. 하자있는 A 장관의 훈령에 대해 B 국장은 통설적 견지에서 중대·명백한 하자있는 훈령으로서 무효한 훈령이기에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행해져야 유효한 것인바, 상기 설문의 A 장관의 석유판매영업에 대한 허가권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나, 법률의 근거 없이 전부 위임한 B 국장에 발한 권한의 위임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B 국장에게는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 국장이 자신이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의 위임사항을 불복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권한을 이유로 X 의 석유판매영업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결국 설문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32조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시·도지사에 한정되어 있음에 A 장관의 권한위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나, 정부조직법 제6조가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견해에 따르자면 일반적으로 위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장관의 석유판매업에 관한 허가 사무의 권한을 B 국장에게 위임한 것은 설문의 취지상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며, 긍정설의 논거에 의해서도 허가 사무의 권한의 전부 위임은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권한의 위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권한의 전부 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임청의 권한의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원천적인 장관의 권한의 소멸과 책임의 소멸을 가져오는 부당함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2. B 국장의 복종의무와 불복의 적법성 여부
하급청의 기관의사를 구속하는 훈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안(영업허가)에 대해서 A 장관에게 명령권이 인정되고, 설문상의 훈령은 긍정설의 입장에 따라 일반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 B 국장에게 허가 사무의 위임이 하급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 법률상의 근거가 인정되나, 즉 권한의 전부 위임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한의 위임으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설문의 훈령으로 볼 수 있는 장관의 통고는 권한의 전부· 포괄적 위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A 장관의 권한위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B 국장은 A 국장의 훈령은 하자있는 훈령에 해당한다. 하자있는 A 장관의 훈령에 대해 B 국장은 통설적 견지에서 중대·명백한 하자있는 훈령으로서 무효한 훈령이기에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행해져야 유효한 것인바, 상기 설문의 A 장관의 석유판매영업에 대한 허가권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나, 법률의 근거 없이 전부 위임한 B 국장에 발한 권한의 위임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B 국장에게는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 국장이 자신이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의 위임사항을 불복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권한을 이유로 X 의 석유판매영업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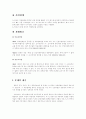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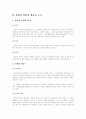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