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낙서재(樂書齋) 무민당
2.소은병(小隱屛)
3.석실(石室)
4.승룡대(升龍臺)
5.곡수당(曲水堂)
6.낭음계(朗吟溪)
7.서재(書齋)
8.연정(蓮亭)
9.조산(造山)
10.하한대(夏寒臺)
11.혁의대(赫의臺)
12.석전(石田)
13.정성암(靜成庵)
14.세연정(洗然亭)
2.소은병(小隱屛)
3.석실(石室)
4.승룡대(升龍臺)
5.곡수당(曲水堂)
6.낭음계(朗吟溪)
7.서재(書齋)
8.연정(蓮亭)
9.조산(造山)
10.하한대(夏寒臺)
11.혁의대(赫의臺)
12.석전(石田)
13.정성암(靜成庵)
14.세연정(洗然亭)
본문내용
이와 같은 암석이 놓여 있다. 그 등에 다리를 가로로 가설하여 \'비홍교(飛虹橋)\'라 하는데, 이를 따라서 누(樓)에 오른다.
비홍교 남쪽에 혹약재연(或躍在淵) 등의 일곱 암석이 있으므로 정자 서쪽의 편액을 \'칠암(七岩)\'이라 하였다. 암석이 모두 정결하고 말숙한데, 더러는 제방을 지고 물을 마시고 더러는 흙을 깔아 소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수원을 따라 올라 가노라면 굽이굽이 돌고 구불구불 흐르는 경관은 모두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다. 장송은 수면을 스치고 단풍나무·삼나무는 암석을 가리고 있으며, 두어 자 깊이의 물은 맑디맑아 푸른빛을 띠어 있고, 못 속에 있는 수 개의 암석은 모두 둥글고 모나며 깨끗하고 흰 것으로서 물이 그 위에 넘쳐흐르는데 물이 맑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못 남쪽 한가운데에는 암석이 어지럽게 모여 조그마한 섬을 이루고 있는데 송죽(松竹)이 그 위에 자라고 있다. 이에 못의 북쪽에도 크기가 엇비슷한 작은 섬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이름하여 동서지(東西池)라 한다.
남쪽 봉우리 위에 옥소대(玉 臺)라는 석대(石臺)가 있는데, 그림자가 못속에 거꾸로 비친다. 정자 위에서는, 서쪽으로 미전과 석애를 바라볼 수 있고 동으로 장재도를 대하고 있으며, 전후좌우로는 푸른산이 판히 펼쳐져 있다. 그리고 황원포는 완연히 평담(平潭)을 이루고 있는데, 앉으면 소나무 숲속에 가려져서, 고깃배의 돛대만 장재도 사이에 은은히 보일 뿐이다. 하늘빛 바닷빛이 천태만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자 동쪽에 조그마한 누를 지어 \'호광(呼光)\'이라 하고, 공은 매양 난간을 의지하고 멀리 바라보았다 한다.
공은 늘 무민당에 거처하면서 첫닭이 울면 일어나 경옥주(瓊玉酒)한 잔을 마신 다음,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자제를 보고, 자제들은 각기 배운 글을 진강(進講)하였다. 아침 식사 뒤에는 사륜거(四輪車)에 풍악을 대동하고, 혹은 곡수에서 놀고 혹은 석실(石室)에 오르기도 하였다가, 일기가 청화(淸和)하면 반드시 세연정으로 향하되, 곡수 뒷간 기슭을 거쳐 정성암(靜成庵)에서 쉬곤 하였다. 학관의 어머니가 오찬(午饌)을 갖추어 소거(小車)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정자에 당도하게 되면 자제들이 시립(侍立)하고 기희(妓姬)들이 모시는 가운데 못 안에 작은배를 띄우고 남자 아이로 하여금 채색옷을 입고 배를 일렁이며 돌게 하고, 공이 지은 어부수조(漁父水調])등의 가사로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면 당 위에서는 관현악(管絃樂)을 연주하게 된다. 수명으로 하여금 동서대에서 춤을 추게 하고 혹은 긴소매로 옥소암(玉 岩)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 그림자는 못속에 떨어지고 너울너울 춤추는 것이 음절에 맞았다. 혹은 칠암에서 낚시를 드리우기도 하고 혹은 동서도(東西島)에서 연밥을 따기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무민당에 돌아와서 촛불을 밝히고 밤놀이를 한다. 공이 질병이나 걱정할 일이 없으면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 한다. 이는 \'하루도 음악이 없으면 성정(性情)을 수양하며 세간의 걱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일찍이 섬 속의 모든 경치를 다음과 같이 품평하였다.
\"석실은 비유컨대 신선 중의 사람이라 마땅히 제일이 되고, 세연정은 변화하면서도 청정(淸整)함을 겸하여 낭묘(廊廟·재상)의 그릇이고, 곡수(曲水)는 아결(雅潔)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자이다.\"
학유공(學諭公)은 늘 가사를 간검(看檢)하기 위하여 육지에 있다가 수개월마다 한번씩 공을 찾아뵈었다. 공은 그가 온다는 말을 들으면 격자봉의 정자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북을 울려 서로 호응하게 하는가 하면, 노복(奴僕)을 시켜 황원포에 나와 맞이하게 하였다. 학유공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큰 소리로 공의 안부를 묻고는 급히 달려서 골짜기로 들어오노라면 공은 벌써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맞이하였다 하니, 그 자애와 연모의 정이 이와같이 돈독하였던 것이다.
공은 여러 첨의 자식들에게도 차이가 없이 사랑하였지만, 선조의 유업(遺業)은 서손들에게 마음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고, 나누어 준 것은 모두 공이 자영(自영)한 것들이었다. 임종시에 학관의 어머니가 시종토록 가장 오래 모셨다 하여 학관이 더욱 사랑을 받았지만, 부용동을 개척하는 데 노고가 있었다하여 이것을 그에게 주었다. 어떤이는, 공이 그 사이에 남 모르는 뜻이 게재되었다는 말을 하는 자도 있다.
공이 기장(機張)에서 귀양살이할 때 산으로 땔나무를 하러 갔던 어린 종이 도가류로 보이는 한 어른이 암석 위에 앉아서 시 한 수를 써주며, \'돌아가거든 네 상사(上舍·웃사람 죽 윤고산)에게 드리라.\' 하는 것이었다. 어린 종은 이를 받았는데 잠깐 사이에 그 노인의 소재를 읾어버렸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봉래산 한 골짜기 남쪽 땅에 떨어지니
그 절경 천하에서 드문 곳임을 알게 되리.
산은 비단 병풍 두른 듯 북녘으로부터 에웠고
개울물은 옥대를 두른 듯 동쪽을 향해 돌아 흐르네.
숲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빛 석에 반사하고
안개 속 에 내리는 저녁 비는 산야에 자욱하네
성긴 숲을 마주하고 앉아 한 수의 시 읊노라니
솔솔 부는 바람에 초의(草衣)를 움직인다.
공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는데, 부용동을 얻게 되어 본 경관이 일체 그 시에서 그린 경관과 같았다 한다.
평일에도 사고가 있지 않으면 세연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가지 않았는데 노복이 연못가에서 세연정 안에서 나는 바둑 놓는 소리가 매우 분명함을 듣고, 공이 나와 놀고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상하게도 시중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용동에 돌아가 보니 공은 낙서재에 있었다. 괴이하게 여겨 그 일을 아뢰었더니, 공이 사람을 시켜곧바로 가서 사실을 살피도록 하였는데, 문의 빗장은 그대로 잠겨 있고 사람의 자취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하니, 공은 말하기를 \"산신령의 장난이 아니겠는가.\"하였다는 것이다.
부용동은 비록 골짜기가 깊어서 나무는 많아도 원래 호랑이·표범은 없었는데, 갑자기 으르렁대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공이 글을 지어 산에 제사를 지낸 며칠 뒤에, 나무하던 자가 암석 틈에 눌려 죽은 호랑이를 보았다는 말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한다.
비홍교 남쪽에 혹약재연(或躍在淵) 등의 일곱 암석이 있으므로 정자 서쪽의 편액을 \'칠암(七岩)\'이라 하였다. 암석이 모두 정결하고 말숙한데, 더러는 제방을 지고 물을 마시고 더러는 흙을 깔아 소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수원을 따라 올라 가노라면 굽이굽이 돌고 구불구불 흐르는 경관은 모두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다. 장송은 수면을 스치고 단풍나무·삼나무는 암석을 가리고 있으며, 두어 자 깊이의 물은 맑디맑아 푸른빛을 띠어 있고, 못 속에 있는 수 개의 암석은 모두 둥글고 모나며 깨끗하고 흰 것으로서 물이 그 위에 넘쳐흐르는데 물이 맑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못 남쪽 한가운데에는 암석이 어지럽게 모여 조그마한 섬을 이루고 있는데 송죽(松竹)이 그 위에 자라고 있다. 이에 못의 북쪽에도 크기가 엇비슷한 작은 섬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이름하여 동서지(東西池)라 한다.
남쪽 봉우리 위에 옥소대(玉 臺)라는 석대(石臺)가 있는데, 그림자가 못속에 거꾸로 비친다. 정자 위에서는, 서쪽으로 미전과 석애를 바라볼 수 있고 동으로 장재도를 대하고 있으며, 전후좌우로는 푸른산이 판히 펼쳐져 있다. 그리고 황원포는 완연히 평담(平潭)을 이루고 있는데, 앉으면 소나무 숲속에 가려져서, 고깃배의 돛대만 장재도 사이에 은은히 보일 뿐이다. 하늘빛 바닷빛이 천태만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자 동쪽에 조그마한 누를 지어 \'호광(呼光)\'이라 하고, 공은 매양 난간을 의지하고 멀리 바라보았다 한다.
공은 늘 무민당에 거처하면서 첫닭이 울면 일어나 경옥주(瓊玉酒)한 잔을 마신 다음,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자제를 보고, 자제들은 각기 배운 글을 진강(進講)하였다. 아침 식사 뒤에는 사륜거(四輪車)에 풍악을 대동하고, 혹은 곡수에서 놀고 혹은 석실(石室)에 오르기도 하였다가, 일기가 청화(淸和)하면 반드시 세연정으로 향하되, 곡수 뒷간 기슭을 거쳐 정성암(靜成庵)에서 쉬곤 하였다. 학관의 어머니가 오찬(午饌)을 갖추어 소거(小車)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정자에 당도하게 되면 자제들이 시립(侍立)하고 기희(妓姬)들이 모시는 가운데 못 안에 작은배를 띄우고 남자 아이로 하여금 채색옷을 입고 배를 일렁이며 돌게 하고, 공이 지은 어부수조(漁父水調])등의 가사로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면 당 위에서는 관현악(管絃樂)을 연주하게 된다. 수명으로 하여금 동서대에서 춤을 추게 하고 혹은 긴소매로 옥소암(玉 岩)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 그림자는 못속에 떨어지고 너울너울 춤추는 것이 음절에 맞았다. 혹은 칠암에서 낚시를 드리우기도 하고 혹은 동서도(東西島)에서 연밥을 따기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무민당에 돌아와서 촛불을 밝히고 밤놀이를 한다. 공이 질병이나 걱정할 일이 없으면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 한다. 이는 \'하루도 음악이 없으면 성정(性情)을 수양하며 세간의 걱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일찍이 섬 속의 모든 경치를 다음과 같이 품평하였다.
\"석실은 비유컨대 신선 중의 사람이라 마땅히 제일이 되고, 세연정은 변화하면서도 청정(淸整)함을 겸하여 낭묘(廊廟·재상)의 그릇이고, 곡수(曲水)는 아결(雅潔)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자이다.\"
학유공(學諭公)은 늘 가사를 간검(看檢)하기 위하여 육지에 있다가 수개월마다 한번씩 공을 찾아뵈었다. 공은 그가 온다는 말을 들으면 격자봉의 정자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북을 울려 서로 호응하게 하는가 하면, 노복(奴僕)을 시켜 황원포에 나와 맞이하게 하였다. 학유공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큰 소리로 공의 안부를 묻고는 급히 달려서 골짜기로 들어오노라면 공은 벌써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맞이하였다 하니, 그 자애와 연모의 정이 이와같이 돈독하였던 것이다.
공은 여러 첨의 자식들에게도 차이가 없이 사랑하였지만, 선조의 유업(遺業)은 서손들에게 마음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고, 나누어 준 것은 모두 공이 자영(自영)한 것들이었다. 임종시에 학관의 어머니가 시종토록 가장 오래 모셨다 하여 학관이 더욱 사랑을 받았지만, 부용동을 개척하는 데 노고가 있었다하여 이것을 그에게 주었다. 어떤이는, 공이 그 사이에 남 모르는 뜻이 게재되었다는 말을 하는 자도 있다.
공이 기장(機張)에서 귀양살이할 때 산으로 땔나무를 하러 갔던 어린 종이 도가류로 보이는 한 어른이 암석 위에 앉아서 시 한 수를 써주며, \'돌아가거든 네 상사(上舍·웃사람 죽 윤고산)에게 드리라.\' 하는 것이었다. 어린 종은 이를 받았는데 잠깐 사이에 그 노인의 소재를 읾어버렸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봉래산 한 골짜기 남쪽 땅에 떨어지니
그 절경 천하에서 드문 곳임을 알게 되리.
산은 비단 병풍 두른 듯 북녘으로부터 에웠고
개울물은 옥대를 두른 듯 동쪽을 향해 돌아 흐르네.
숲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빛 석에 반사하고
안개 속 에 내리는 저녁 비는 산야에 자욱하네
성긴 숲을 마주하고 앉아 한 수의 시 읊노라니
솔솔 부는 바람에 초의(草衣)를 움직인다.
공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는데, 부용동을 얻게 되어 본 경관이 일체 그 시에서 그린 경관과 같았다 한다.
평일에도 사고가 있지 않으면 세연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가지 않았는데 노복이 연못가에서 세연정 안에서 나는 바둑 놓는 소리가 매우 분명함을 듣고, 공이 나와 놀고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상하게도 시중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용동에 돌아가 보니 공은 낙서재에 있었다. 괴이하게 여겨 그 일을 아뢰었더니, 공이 사람을 시켜곧바로 가서 사실을 살피도록 하였는데, 문의 빗장은 그대로 잠겨 있고 사람의 자취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하니, 공은 말하기를 \"산신령의 장난이 아니겠는가.\"하였다는 것이다.
부용동은 비록 골짜기가 깊어서 나무는 많아도 원래 호랑이·표범은 없었는데, 갑자기 으르렁대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공이 글을 지어 산에 제사를 지낸 며칠 뒤에, 나무하던 자가 암석 틈에 눌려 죽은 호랑이를 보았다는 말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한다.
추천자료
 도시재개발 도시 건축 조경 도쿄
도시재개발 도시 건축 조경 도쿄 한국의 정원
한국의 정원 남성컴플렉스
남성컴플렉스 교육철학 - 실존주의의인간관과교육
교육철학 - 실존주의의인간관과교육 [리조트][관광상품][관광][리조트 개념][리조트 특성][리조트 개발유형][리조트 선택요인][일...
[리조트][관광상품][관광][리조트 개념][리조트 특성][리조트 개발유형][리조트 선택요인][일... [PI][폴리이미드][PMMA][ABS수지][POM][PC][멜라민수지][에폭시수지]폴리이미드(PI), 폴리메...
[PI][폴리이미드][PMMA][ABS수지][POM][PC][멜라민수지][에폭시수지]폴리이미드(PI), 폴리메...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본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본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비잔틴미술양식
비잔틴미술양식 [관광투자론] 포천시 막걸리체험관 개발
[관광투자론] 포천시 막걸리체험관 개발 [평가학점 A 제로] 창덕궁과 동궐도 개요 및 비교분석 (답사기)
[평가학점 A 제로] 창덕궁과 동궐도 개요 및 비교분석 (답사기) 조선전기의 역사인식과 동국통감
조선전기의 역사인식과 동국통감  [졸업논문][농업경제학] 한국 김치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졸업논문][농업경제학] 한국 김치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여가트랜드 분석 - 노인여가의 과거 현재 미래
여가트랜드 분석 - 노인여가의 과거 현재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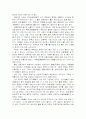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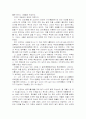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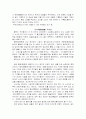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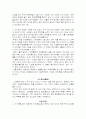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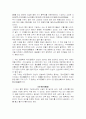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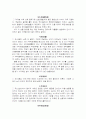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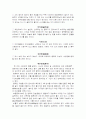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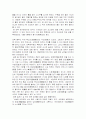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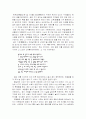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