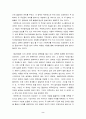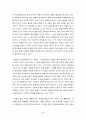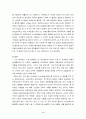본문내용
존 앤더튼은 기계문명 다시 말해 시스템의 구조적 사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태어난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은 오히려 로봇의 밧데리가 되고 범죄예방시스템에서 범죄(살인)를 예언하기 위한 기계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서, 인간의 과학의 논리는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간다. 이 두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뒤집어 보면 결코 미래를 소재로 한 SF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곳이 어디란 말인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말했고 칸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분열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2003년의 한국은 현실이다. 그러나 영화 같은 시스템 안에서 보내지는 신호를 지금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 내가 존재하는 지금은 언제이며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의 모든 직관은 현상의 표상일 뿐이다." 칸트의 말이 떠오른다. "생각하려 하지 마라. 인식하라!" 생각과 인식 '생각'은 논리적 이성을 뜻하고 '인식'은 감성을 가리킨다.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언하고 어떻게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질문자체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관적인 견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원성이 인정되는 현대의 사회에서 데카르트의 말을 이 두 영화를 보고 난 후 바꾸어 본다면 "나는 인식한다. 고로 나는 시스템 밖에 존재한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