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본 론
1. 떡의 정의
2. 떡의 어원
3. 떡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근대이후
4. 떡의 영양
5. 떡의 종류
6. 약이 되는 떡
7. 떡의 문화적 의미
(1) 통과 의례와 떡의 풍속
(2) 무속행의와 떡의 풍속
(3) 절일과 떡의 풍속
- 결 론
- 본 론
1. 떡의 정의
2. 떡의 어원
3. 떡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근대이후
4. 떡의 영양
5. 떡의 종류
6. 약이 되는 떡
7. 떡의 문화적 의미
(1) 통과 의례와 떡의 풍속
(2) 무속행의와 떡의 풍속
(3) 절일과 떡의 풍속
- 결 론
본문내용
악의 순으로 쌓아올린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떡과 조과를 섞어 가며 괴어 올리는데, 그 순서는 시루떡, 솔변, 은절미, 중박괴, 약괴, 절변이다. 이 밖에 평안도에서는 백설기를 크게 만들어 괴고, 함경도에서는 조찰떡, 시루떡, 자바귀등을 만든다.
- 책 례 이 의례는 지금은 사라진 풍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가 서당에 다니면서 책을 한 권씩 땔 때마다 행하던 의례이다. 책례 의식은 어려운 책을 끝냈다는 축하와 격려의 뜻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떡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선생님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었다. 이 때 책례 음식으로 만들던 떡은 백일이나 돌 때와 같은 작은 모양의 오색 송편이었다.
(2) 무속행의와 떡의 풍속
무속행의란, 무당의 주관 아래 행하는 굿을 말한다. 그런데 굿이란 궂은 일이나 궂은 것을 풀어 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굿의 절차는 열두 거리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제물이 준비된다. 제물들은 신을 감응 청배하는 상, 제석상, 별성상, 대신상, 호구상, 뒷전상등에 진설된다. 제물 중에도 떡이 중요한 몫을 차지함은 물론이다.
(3) 절일과 떡의 풍속
우리나라는 예부터 각 철마다 명절을 만들어 뜻있게 보냈는데, 이것을 절일(節日)이라 한다. 절일은 대략 자연환경과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농경의례라든가 민간 신앙 또는 역사적 의의 내지 풍류나 보신을 위해 설정된 경우도 있다. 이들 절일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이 날을 뜻 깊게 보냈는데, 특히 떡이 없는 절일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음식이었다.
- 정조다례 흰떡가래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흰떡 외에도 찹쌀, 차조, 기장, 차수수 등 찰곡식으로 만든 인절미와 거피팥, 콩가루, 검은깨, 잣가루 등으로 고물을 입힌 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 상원 즉, 정월대보름에는 묵은 나물, 복쌈, 부럼, 귀밝이술 등과 함께 약식을 만들어 먹었다. 까마귀가 왕의 생명을 구해주어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까마귀가 좋아하는 대추로 까마귀 깃털 색과 같은 약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들이 먹게 되었다고 한다.
- 중화절 볏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커다란 송편을 빚은 후 노비들에게 자기 나이수대로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새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뜻에서 상전이 노비를 대접하는 것이다. 또 궁중에서는 왕이 재상과 신하들에게 자를 하사하였는데 이 역시 농사일에 힘쓰라는 뜻이었다.
- 삼짇날 만물이 활기를 띠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소원 성취를 비는 산제를 올렸다. 이날에는 화전놀이를 하여 찹쌀가루와 번철을 들고 야외로 나가 진달래꽃을 따가 그 자리에서 진달래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 한식날 어린쑥을 넣어 절편이나 쑥단자를 만들어 먹었으며 ,어린느티싹을 넣은 느티떡을 해 먹거나 흔해진 장미꽃을 넣어 장미화전을 부쳐 먹었다. 혹은 석남잎으로 석남엽병을 만들기도 했다.
- 단오 단오차사를 거피팥시루떡을 만들어 지내고 앵두차사라 하여 앵두를 천신하기도 하였다. 떡으로는 수리치 절편 곧잘 해먹었으며, 햇쑥으로 버무리, 절편, 인절미를 만들어 쑥의 향취로 봄을 느끼는 떡을 해먹었다.
- 유두일 아침 일찍 밀국수, 떡, 외, 과일 등을 천신하고 떡을 만들어 논에 나가 농신께 풍년을 축원하였다. 절식으로는 상화병이나 밀전병을 즐겼고, 더위를 잊기 위한 음료수로 꿀물에 둥글게 빚은 흰떡을 넣은 수단을 만들어 먹었다.
- 칠석 올벼를 가묘에 천신하고 흰쌀로만 만든 백설기를 즐겼다. 삼복에는 깨찰떡, 밀설기, 주악, 증편을 많이 해먹었다.
- 한가위 햅쌀로 시루떡, 송편을 만들어 조상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낸다. 이밖에 찰떡 곧 인절미도 만들어 먹었다.
- 중양절 추석제사 때 못 잡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날은 주로 국화주나 국화꽃잎을 띄운 향기로운 가양주와 함께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으며 또한 삶은 밤을 으깨어 찹쌀가루에 버무려 찐 밤떡도 즐겨 먹었다.
- 상달 당산제와 고사를 지내며 마을과 집안의 풍요를 빌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백설기나 붉은팥시루떡을 만들었으며, 상달 오일에는 팥시루떡을 시루째 마구간에 갖다 놓고 말이 병나지 않기를 빌었다.
- 동짓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날은 특별히 떡을 만들지 않으나 찹쌀경단을 넣어 끓인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 섣달 골동반, 장김치등과 함께 팥소를 넣고 골무 모양으로 빚은 골무떡을 즐겨 먹는다. 특히 섣달그믐에는 온시루떡과 정화수를 떠놓고 고사를 지내고, 색색의 골무떡을 빚어 나누어 먹기도 한다.
결 론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서 우리의 전통 먹거리인 떡은 시식과 절식으로 내려오면서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먹거리 중의 하나였다.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까지도 지배하던 떡은 그러나 19세기말에 접어들어 서양의 식문화가 전해지면서 한동안 뒷켠으로 밀려나 있었다. 산업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들의 먹을거리 또한 서구화가 되었다. 우리의 전통 떡은 칼로리 많은 거양의 빵과 과자에 밀려나고 있다. 특히 빵에 익숙해져 있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경우 떡 먹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평소에 익숙하게 먹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리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전통음식인 떡의 새로운 자리 매김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우나 먹기에 조금 불편한 전통 떡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인의 기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도 환영받는 떡을 개발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떡을 개발해내야 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http://www.bokttokbang.co.kr/frame002.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dduk/fframe.htm
http://miaowmj.hihome.com/index_01.html
http://www.kfr.or.kr/museum/ttock-7.htm
- 책 례 이 의례는 지금은 사라진 풍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가 서당에 다니면서 책을 한 권씩 땔 때마다 행하던 의례이다. 책례 의식은 어려운 책을 끝냈다는 축하와 격려의 뜻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떡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선생님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었다. 이 때 책례 음식으로 만들던 떡은 백일이나 돌 때와 같은 작은 모양의 오색 송편이었다.
(2) 무속행의와 떡의 풍속
무속행의란, 무당의 주관 아래 행하는 굿을 말한다. 그런데 굿이란 궂은 일이나 궂은 것을 풀어 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굿의 절차는 열두 거리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제물이 준비된다. 제물들은 신을 감응 청배하는 상, 제석상, 별성상, 대신상, 호구상, 뒷전상등에 진설된다. 제물 중에도 떡이 중요한 몫을 차지함은 물론이다.
(3) 절일과 떡의 풍속
우리나라는 예부터 각 철마다 명절을 만들어 뜻있게 보냈는데, 이것을 절일(節日)이라 한다. 절일은 대략 자연환경과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농경의례라든가 민간 신앙 또는 역사적 의의 내지 풍류나 보신을 위해 설정된 경우도 있다. 이들 절일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이 날을 뜻 깊게 보냈는데, 특히 떡이 없는 절일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음식이었다.
- 정조다례 흰떡가래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흰떡 외에도 찹쌀, 차조, 기장, 차수수 등 찰곡식으로 만든 인절미와 거피팥, 콩가루, 검은깨, 잣가루 등으로 고물을 입힌 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 상원 즉, 정월대보름에는 묵은 나물, 복쌈, 부럼, 귀밝이술 등과 함께 약식을 만들어 먹었다. 까마귀가 왕의 생명을 구해주어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까마귀가 좋아하는 대추로 까마귀 깃털 색과 같은 약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들이 먹게 되었다고 한다.
- 중화절 볏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커다란 송편을 빚은 후 노비들에게 자기 나이수대로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새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뜻에서 상전이 노비를 대접하는 것이다. 또 궁중에서는 왕이 재상과 신하들에게 자를 하사하였는데 이 역시 농사일에 힘쓰라는 뜻이었다.
- 삼짇날 만물이 활기를 띠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소원 성취를 비는 산제를 올렸다. 이날에는 화전놀이를 하여 찹쌀가루와 번철을 들고 야외로 나가 진달래꽃을 따가 그 자리에서 진달래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 한식날 어린쑥을 넣어 절편이나 쑥단자를 만들어 먹었으며 ,어린느티싹을 넣은 느티떡을 해 먹거나 흔해진 장미꽃을 넣어 장미화전을 부쳐 먹었다. 혹은 석남잎으로 석남엽병을 만들기도 했다.
- 단오 단오차사를 거피팥시루떡을 만들어 지내고 앵두차사라 하여 앵두를 천신하기도 하였다. 떡으로는 수리치 절편 곧잘 해먹었으며, 햇쑥으로 버무리, 절편, 인절미를 만들어 쑥의 향취로 봄을 느끼는 떡을 해먹었다.
- 유두일 아침 일찍 밀국수, 떡, 외, 과일 등을 천신하고 떡을 만들어 논에 나가 농신께 풍년을 축원하였다. 절식으로는 상화병이나 밀전병을 즐겼고, 더위를 잊기 위한 음료수로 꿀물에 둥글게 빚은 흰떡을 넣은 수단을 만들어 먹었다.
- 칠석 올벼를 가묘에 천신하고 흰쌀로만 만든 백설기를 즐겼다. 삼복에는 깨찰떡, 밀설기, 주악, 증편을 많이 해먹었다.
- 한가위 햅쌀로 시루떡, 송편을 만들어 조상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낸다. 이밖에 찰떡 곧 인절미도 만들어 먹었다.
- 중양절 추석제사 때 못 잡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날은 주로 국화주나 국화꽃잎을 띄운 향기로운 가양주와 함께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으며 또한 삶은 밤을 으깨어 찹쌀가루에 버무려 찐 밤떡도 즐겨 먹었다.
- 상달 당산제와 고사를 지내며 마을과 집안의 풍요를 빌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백설기나 붉은팥시루떡을 만들었으며, 상달 오일에는 팥시루떡을 시루째 마구간에 갖다 놓고 말이 병나지 않기를 빌었다.
- 동짓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날은 특별히 떡을 만들지 않으나 찹쌀경단을 넣어 끓인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 섣달 골동반, 장김치등과 함께 팥소를 넣고 골무 모양으로 빚은 골무떡을 즐겨 먹는다. 특히 섣달그믐에는 온시루떡과 정화수를 떠놓고 고사를 지내고, 색색의 골무떡을 빚어 나누어 먹기도 한다.
결 론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서 우리의 전통 먹거리인 떡은 시식과 절식으로 내려오면서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먹거리 중의 하나였다.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까지도 지배하던 떡은 그러나 19세기말에 접어들어 서양의 식문화가 전해지면서 한동안 뒷켠으로 밀려나 있었다. 산업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들의 먹을거리 또한 서구화가 되었다. 우리의 전통 떡은 칼로리 많은 거양의 빵과 과자에 밀려나고 있다. 특히 빵에 익숙해져 있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경우 떡 먹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평소에 익숙하게 먹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리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전통음식인 떡의 새로운 자리 매김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우나 먹기에 조금 불편한 전통 떡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인의 기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도 환영받는 떡을 개발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떡을 개발해내야 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http://www.bokttokbang.co.kr/frame002.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dduk/fframe.htm
http://miaowmj.hihome.com/index_01.html
http://www.kfr.or.kr/museum/ttock-7.htm
추천자료
 [생활대]-일본의 음식문화
[생활대]-일본의 음식문화 한국음식의 상차림과 절식
한국음식의 상차림과 절식 녹차 제다 과정
녹차 제다 과정 우리나라의 풍속
우리나라의 풍속 [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
[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 세계여러나라음식
세계여러나라음식 [Food & Design]사찰음식
[Food & Design]사찰음식 한국전통음식의특징
한국전통음식의특징 케익의 역사와 유래
케익의 역사와 유래 5대 영양소와 각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 음식을 쓰고,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
5대 영양소와 각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 음식을 쓰고,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 한국과 중국의 음식문화 비교
한국과 중국의 음식문화 비교 어린이집 월간 식단표 구성_ (2014년) 2월 3~5세 오전죽식형 식단표와 식단 안내 및 이달의 ...
어린이집 월간 식단표 구성_ (2014년) 2월 3~5세 오전죽식형 식단표와 식단 안내 및 이달의 ... [어린이집 월간 식단표 구성](2014년) 2월 1~2세 영아 일반식 식단표, 식단 안내, 이달의 신...
[어린이집 월간 식단표 구성](2014년) 2월 1~2세 영아 일반식 식단표, 식단 안내, 이달의 신... 0245영어설교-Crumbs from the Tables식탁의 부스러기들
0245영어설교-Crumbs from the Tables식탁의 부스러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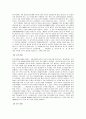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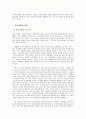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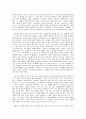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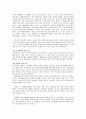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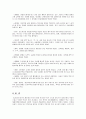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