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ustave Flaubert (플로베르)
사실주의
19세기 유럽의 시대상황
줄거리
인물분석
형식(소설의 시점과 관련하여..)
감상
자료참고
사실주의
19세기 유럽의 시대상황
줄거리
인물분석
형식(소설의 시점과 관련하여..)
감상
자료참고
본문내용
이다. 주체할수 없는 동경과 이상 그리고 현실사이로부터오는 괴리속에 괴로워하고 결국 파멸의 길을 보지 못한채 현실에서 그욕망을 받아들인다 그녀의 무모함에 부럽단 생각마저 든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플로베르의 보바리부인이라는 소설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과거의 그 시대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과거이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현대의 작가가 같은 작품을 발표한다면, 그작품은 또다르게 해석되어질 것이다. 과연 이만한 평가를 받을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당시에는 비난받은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그당시나 현재나 누구나가 가지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 이며 실제의 이야기 즉, 작가자신 그리고 우리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실은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엠마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지배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행동은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한 이성으로써 비판받을만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 한여성으로서도 맹목적 사랑과 남성에 기대는 모습 물론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의 규정과 도덕률 속에서의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의 엠마에대한 비판적 측면보다 온전히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써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좀더 주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소설속 엠마의 욕망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소설이 갖는 이해적인 분석이랄까.. 현실에서보다 더 넓은 이해가 가능한 문학속 여인이기에 더욱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다.
보다 본질적이고 진실된 삶이 어느편에 서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든 문제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더불어 욕망의 표출또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욕망\'이라는 것의 형태또한 다양하다고 본다.
이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각자 해보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누구나가 추구하는 욕망의 크기와 형태로 다르고 표출되는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자 찾아야할 본질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보바리부인 내부의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덧붙여(자료참고)
행복을 향한 인간의 노력들이 극히 좌절과 실패의 연속으로 끝나버리는 이작품에서는 결혼이란 제도가 사랑과 맞물리지 않으며 현싱과 이상의 코드가 분리되어진 작품의 세계를 통하여 19세기의 프랑스 모습을 살펴볼수 있다. 개인의 허상된 꿈과 현실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리고 이중적인지가 나타난다. 계급사회로 나뉘고 물질이 중요시된 당시 인간이 실로 중요시 여겨야할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작가는 현실세계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서 되돌아 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19세기 프랑스 사회는 플로베르를 \'도덱에 대한 위해\' 혐으로 재판에 회부했고 언론은 그를 에마의 심장을 도려내어 독자의 눈에 들이대는 냉정한 외과의사로 그렸다. 하지만 낭만주의 극성기에 성장한 그가 의도한 것은 \'감정교육\'과 \'성 앙투안의 유혹\'의 초고를 쓰면서 스스로 주체하지 못했던 낭만적 주관성을 배제하고, 너무도 흔해 소설적 가치를 지니지 목한 소재로 한편의 완성된 예술작품을 구축해내는 일이었다. 냉정한 외과의사가 도혀낸 선혈이 낭자한 에마의 심장은 곧 낭만적 몽상기질을 버리지 못한 플로베르 자신의 심장이었던 것이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환상과 맞섰던 샘이다. 결국 보바리 부인의 모습이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가자신의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그믈속에 갇혀 행복을 그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보바리즘? (Bovarism)
<보봐리 부인>은 보봐리즘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는데 현실적인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의 덫에 걸려서 숙명적으로 난파당하고 마는 인간의 모습 즉, 현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의 비극성이다. 이것은 대책없는 낭만주의의 안타까운 폐해이자 이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에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플로베르는 Madame Bovary, c\'est moi 마담 보봐리는 나 자신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 이상을 꿈꾼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마담 보봐리 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엠마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지배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행동은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한 이성으로써 비판받을만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 한여성으로서도 맹목적 사랑과 남성에 기대는 모습 물론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의 규정과 도덕률 속에서의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의 엠마에대한 비판적 측면보다 온전히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써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좀더 주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소설속 엠마의 욕망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소설이 갖는 이해적인 분석이랄까.. 현실에서보다 더 넓은 이해가 가능한 문학속 여인이기에 더욱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다.
보다 본질적이고 진실된 삶이 어느편에 서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든 문제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더불어 욕망의 표출또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욕망\'이라는 것의 형태또한 다양하다고 본다.
이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각자 해보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누구나가 추구하는 욕망의 크기와 형태로 다르고 표출되는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자 찾아야할 본질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보바리부인 내부의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덧붙여(자료참고)
행복을 향한 인간의 노력들이 극히 좌절과 실패의 연속으로 끝나버리는 이작품에서는 결혼이란 제도가 사랑과 맞물리지 않으며 현싱과 이상의 코드가 분리되어진 작품의 세계를 통하여 19세기의 프랑스 모습을 살펴볼수 있다. 개인의 허상된 꿈과 현실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리고 이중적인지가 나타난다. 계급사회로 나뉘고 물질이 중요시된 당시 인간이 실로 중요시 여겨야할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작가는 현실세계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서 되돌아 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19세기 프랑스 사회는 플로베르를 \'도덱에 대한 위해\' 혐으로 재판에 회부했고 언론은 그를 에마의 심장을 도려내어 독자의 눈에 들이대는 냉정한 외과의사로 그렸다. 하지만 낭만주의 극성기에 성장한 그가 의도한 것은 \'감정교육\'과 \'성 앙투안의 유혹\'의 초고를 쓰면서 스스로 주체하지 못했던 낭만적 주관성을 배제하고, 너무도 흔해 소설적 가치를 지니지 목한 소재로 한편의 완성된 예술작품을 구축해내는 일이었다. 냉정한 외과의사가 도혀낸 선혈이 낭자한 에마의 심장은 곧 낭만적 몽상기질을 버리지 못한 플로베르 자신의 심장이었던 것이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환상과 맞섰던 샘이다. 결국 보바리 부인의 모습이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가자신의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그믈속에 갇혀 행복을 그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보바리즘? (Bovarism)
<보봐리 부인>은 보봐리즘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는데 현실적인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의 덫에 걸려서 숙명적으로 난파당하고 마는 인간의 모습 즉, 현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의 비극성이다. 이것은 대책없는 낭만주의의 안타까운 폐해이자 이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에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플로베르는 Madame Bovary, c\'est moi 마담 보봐리는 나 자신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 이상을 꿈꾼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마담 보봐리 일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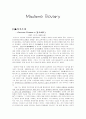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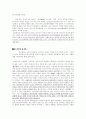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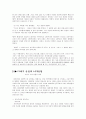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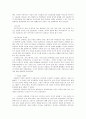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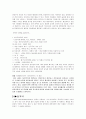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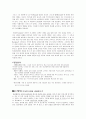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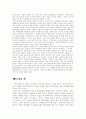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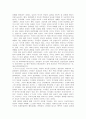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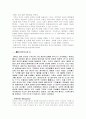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