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서론
B. 심리주의 비평의 개관
C. 안주(安住)와 획일화의 파괴
D. 일탈과 좌절
E. 전쟁과 분담체험의 소설적 형상화
F.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실과 운동성에의 추적
G. 여성 문제의 소설적 반영
H. 소시민적 허위성 드러내기
I. 생명성의 복원
J. 불안정의 미학
K. 결론
B. 심리주의 비평의 개관
C. 안주(安住)와 획일화의 파괴
D. 일탈과 좌절
E. 전쟁과 분담체험의 소설적 형상화
F.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실과 운동성에의 추적
G. 여성 문제의 소설적 반영
H. 소시민적 허위성 드러내기
I. 생명성의 복원
J. 불안정의 미학
K. 결론
본문내용
얼굴까지 입이 생기고 눈 코가 생기면서 아기의 얼굴을 닮아 갔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아아,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 억압과 가면을 박차고 생명력처럼 억세게 분출하는 걸 느꼈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조그만 채송화씨들은 순전히 제 힘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잘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바닥은 순식간에 푸실푸실 떡고물처럼 곱게 부서졌다. 작은 씨앗들은 단박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색색가지 꽃을 피웠다. <그 가을의 사을동안>
<그 가을의 사흘동안>에서 주인공은 사람백정을 하면서 인간성과 동시에 생명성을 파괴한다. 그러나 생명성의 존엄을 느끼고 채송화 씨를 심으면서 생명성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엄마의 말뚝1>은 대처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살아가는 어머니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대처로 나가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는 대처로 나간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대처로 나가면서 시작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어머니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따로 떨어져 자식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구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과 사별하여 아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전통사회의 틀을 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강인한 여성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공부 시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단정하기 힘들다.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의 성공과 신여성이 되길 바라는 딸의 모습은 자신이 원했던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이 되지 못했던 것들 즉, 자신이 꿈꾸었던 삶을 자식들에게 강요한다. 아들에게 지워진 짐은 전통사회에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락 되지만 딸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했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에게 있어 신여성은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또 \'신여성이 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신여성의 절대적 모습을 자신의 딸에게 전수한다. 어머니의 무의식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 전하면서 그 꿈을 딸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꾸는 꿈의 전의는 어머니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지위는 그녀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소설 속에서 시종일관 어머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종 못할 상것들\'이라말한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가 되고 그녀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되었다.
성안에서 살기를 꿈꾸던 어머니는 결국 \'괴불마당 집\'을 얻음으로서 대처에 말뚝을 박게 되고 삶의 안주를 이룰 수 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삶의 굴곡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대처에서 말뚝을 박음으로써 불안했던 삶을 바로 잡아 나간다.
박완서는 <엄마의 말뚝1>에서 어머니가 \'괴불마당 집\'을 얻을 때까지 야성적 생명력을 어떤식으로 발휘했었는가, 그리고 그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그 강인한 생명력을 박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J. 불안정의 미학
박완서가 쓴 소설들의 제목들을 검토해보자. 나목, 포말의 집,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유실, 서있는 여자, 비애의 장, 저문날의 삽화 등, 이러한 제목은 암시적인 불안정의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전체 소설 중 80% 이상이 비극적이고 극적 결말을 자아낸다. 이것은 독자의 불일정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데, 박완서 소설의 성격을 대변하게 된다. 그 외 획일화의 파괴, 일탈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 안주 속에 불안정의 미학을 제시했다.
K. 결론
이상에서 박완서 소설관한 심리주의 비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박완성 소설에서 살펴본 심리주의 비평을 한 작품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주의 획일화의 파괴 - <어떤 나들이>, <포말의 집>, <닮은 방들>, <지렁이 울음소리>
둘째, 일탈과 좌절 - <어떤 나들이>, <지렁이 울음소리>
셋째, 전쟁과 분단체험의 소설적 형상화 - <아저씨의 훈장>,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카메라와 워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2>
넷째,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실과 운동성에의 추적 -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다섯째, 여성문제의 소설적 반영 - <포말의 집>, <어떤 나들이>, <지렁이 울음소리>
여섯째, 소시민적 허위성 드러내기 - <세모>, <추적자>
일곱째, 생명성의 복원 -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1>
여덟째, 불안정의 미학 - 나목, 포말의 집,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유실, 서있는 여자, 비애의 장, 저문날의 삽화 등 제목을 통해 불안정의 미학을 알아 보았다.
박완서의 소설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체험적 소설이 많다. 이런 자기 체험적 소설이 박완서 스스로에게는 글쓰기를 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극히 자기 체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성 역시 지니고 있다. 박완서가 현실 문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고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성은 계속 지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박완서에 대한 논의는 \'자기 체험적 소설에서 벗어난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통한 글 쓰기를 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윤철현, 「박완서 소설 연구」, 『白楊語文論集 第一輯』,1992.
아아,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 억압과 가면을 박차고 생명력처럼 억세게 분출하는 걸 느꼈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조그만 채송화씨들은 순전히 제 힘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잘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바닥은 순식간에 푸실푸실 떡고물처럼 곱게 부서졌다. 작은 씨앗들은 단박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색색가지 꽃을 피웠다. <그 가을의 사을동안>
<그 가을의 사흘동안>에서 주인공은 사람백정을 하면서 인간성과 동시에 생명성을 파괴한다. 그러나 생명성의 존엄을 느끼고 채송화 씨를 심으면서 생명성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엄마의 말뚝1>은 대처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살아가는 어머니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대처로 나가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는 대처로 나간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대처로 나가면서 시작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어머니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따로 떨어져 자식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구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과 사별하여 아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전통사회의 틀을 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강인한 여성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공부 시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단정하기 힘들다.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의 성공과 신여성이 되길 바라는 딸의 모습은 자신이 원했던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이 되지 못했던 것들 즉, 자신이 꿈꾸었던 삶을 자식들에게 강요한다. 아들에게 지워진 짐은 전통사회에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락 되지만 딸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했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에게 있어 신여성은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또 \'신여성이 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신여성의 절대적 모습을 자신의 딸에게 전수한다. 어머니의 무의식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 전하면서 그 꿈을 딸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꾸는 꿈의 전의는 어머니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지위는 그녀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소설 속에서 시종일관 어머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종 못할 상것들\'이라말한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가 되고 그녀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되었다.
성안에서 살기를 꿈꾸던 어머니는 결국 \'괴불마당 집\'을 얻음으로서 대처에 말뚝을 박게 되고 삶의 안주를 이룰 수 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삶의 굴곡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대처에서 말뚝을 박음으로써 불안했던 삶을 바로 잡아 나간다.
박완서는 <엄마의 말뚝1>에서 어머니가 \'괴불마당 집\'을 얻을 때까지 야성적 생명력을 어떤식으로 발휘했었는가, 그리고 그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그 강인한 생명력을 박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J. 불안정의 미학
박완서가 쓴 소설들의 제목들을 검토해보자. 나목, 포말의 집,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유실, 서있는 여자, 비애의 장, 저문날의 삽화 등, 이러한 제목은 암시적인 불안정의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전체 소설 중 80% 이상이 비극적이고 극적 결말을 자아낸다. 이것은 독자의 불일정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데, 박완서 소설의 성격을 대변하게 된다. 그 외 획일화의 파괴, 일탈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 안주 속에 불안정의 미학을 제시했다.
K. 결론
이상에서 박완서 소설관한 심리주의 비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박완성 소설에서 살펴본 심리주의 비평을 한 작품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주의 획일화의 파괴 - <어떤 나들이>, <포말의 집>, <닮은 방들>, <지렁이 울음소리>
둘째, 일탈과 좌절 - <어떤 나들이>, <지렁이 울음소리>
셋째, 전쟁과 분단체험의 소설적 형상화 - <아저씨의 훈장>,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카메라와 워커>,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2>
넷째,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실과 운동성에의 추적 -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다섯째, 여성문제의 소설적 반영 - <포말의 집>, <어떤 나들이>, <지렁이 울음소리>
여섯째, 소시민적 허위성 드러내기 - <세모>, <추적자>
일곱째, 생명성의 복원 -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1>
여덟째, 불안정의 미학 - 나목, 포말의 집,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유실, 서있는 여자, 비애의 장, 저문날의 삽화 등 제목을 통해 불안정의 미학을 알아 보았다.
박완서의 소설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체험적 소설이 많다. 이런 자기 체험적 소설이 박완서 스스로에게는 글쓰기를 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극히 자기 체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성 역시 지니고 있다. 박완서가 현실 문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고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성은 계속 지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박완서에 대한 논의는 \'자기 체험적 소설에서 벗어난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통한 글 쓰기를 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윤철현, 「박완서 소설 연구」, 『白楊語文論集 第一輯』,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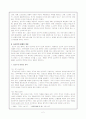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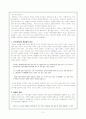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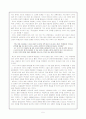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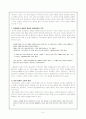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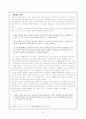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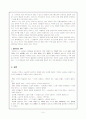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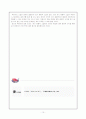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