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문 내용 및 해석
2. 요 점
3. 배경 유래
4. 연 구
2. 요 점
3. 배경 유래
4. 연 구
본문내용
구석에서 늦게 일어나 그 힘이 가장 약하고 발전 또한 지지부진하여 반도에서는 북으로 고구려와 서로는 백제세력의 압밥을 받고 또한 바다 건너 일본의 계속되는 침략에도 시달려 오고 있을 때이다.
신라 제 17대 내물왕이 36년(391)에 왕자 미해(삼국사기 미사흔)와 제 19대 눌지왕 3년(419)에 왕제 보해를 차례로 왜국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고 있었으나 두 나라는 오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눌지왕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없는 영화를 누렸으나 두 왕제를 이웃 나라에 볼모로 보냈으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 때 삽량주간으로 용맹과 지혜를 갖춘 박제상이 신하들의 추거함에 따라 왕명을 받고 고구려로 들어가 보해왕제를 구출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눌지왕은 한편은 반가우나 왜국에 인질로 있는 미해왕제를 생각하니 간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를 본 박제상은 자청하여 일본의 미해왕제도 구출해 올 것을 말하고 그 길로 일본을 향해 율포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 일을 알게된 박제상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랐으나 그는 이미 배를 타고 손을 흔들 뿐이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박제상은 거짓으로 계림왕이 나의 부모를 죄없이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왔다하고 항상 미해왕제를 모시면서 틈을 보아 왕제를 배를 태워 도망가게하고 그는 남아서 잡혀 일본왕의 신하되기를 한사코 거절하다가 마침내 목도에서 소사되고 말았다. 국내에서는 미해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백관을 명하여 굴헐역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며 국내에 대사령을 내리고 박제상 부인을 국대부인으로 책봉 그의 딸로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았다. 오랜 뒤 제상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마침내 치술신모가 되었다.
한편으로 울산읍지에 의하면 부인이 죽어 몸은 화석이 되어 한많은 망부석이 되고 넋은 새가 되어 은을암에 숨었다고 한다. 또 큰 딸 아기와 막내딸 아경도 어머니를 따라 죽어 화석이 되니 망부석 좌우에 두 돌이 있다 하였다. 2녀 아영만은 내마저 따라 죽으면 어미와 동생을 누가 묻어주며 또 동생 문량을 누가 양육하랴 하고 죽지 않았다 한다.
낭군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이 된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다. 무창의 망부석은 먼데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산 위에서 기다리다 그만 돌로 화하였다고 한다.
5) 은을암
은을암은 국수봉에 있는 바위이며 신라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 치술신모에 관한 설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제상이 눌지왕의 명을 받아 고구려에 가서 왕제 복호를 구출하고, 왜국에 볼모로 가 있던 왕제 미사흔(삼국유사는 미해)을 왜국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오게 한 후 그는 끝내 신라의 신하됨을 주장하다가 죽었다. 이 일이 있은 오랜 뒤에 제상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정을 못이겨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마침내 치술신모가 되었다.
울산지방의 속설에 김씨부인은 죽어 몸은 화석이 되어 망부석이 되고 넋은 새가 되었다. 새가 된 넋은 한 마을에 와서 앉았다가 날았다 하여 그 곳을 비조라 하며 또 새는 한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으므로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은을암이라 하였다. 비조는 두동면 만화리에 있으며 은을암은 국수봉에 있다.
속된 설화의 뒤에도 숨은 암시가 있기 마련이다. 설화에 숨어있는 시사에는 신모의 신시가 들어있다. 신모의 뜻에 따라 비조에 신모사와 치산원을, 은을암 앞에는 은을암을 세워 그를 사제하였다는 것이다. 국수봉은 국사봉의 음전함이니 여기에서 신모를 위한 국가의 제전이 있었음을 산이름이 말하여 주는 것인데 은을암과 은을암은 먼 옛날에는 바로 그를 위한 국사당 그것이었을 것이다.
신라 제 17대 내물왕이 36년(391)에 왕자 미해(삼국사기 미사흔)와 제 19대 눌지왕 3년(419)에 왕제 보해를 차례로 왜국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고 있었으나 두 나라는 오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눌지왕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없는 영화를 누렸으나 두 왕제를 이웃 나라에 볼모로 보냈으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 때 삽량주간으로 용맹과 지혜를 갖춘 박제상이 신하들의 추거함에 따라 왕명을 받고 고구려로 들어가 보해왕제를 구출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눌지왕은 한편은 반가우나 왜국에 인질로 있는 미해왕제를 생각하니 간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를 본 박제상은 자청하여 일본의 미해왕제도 구출해 올 것을 말하고 그 길로 일본을 향해 율포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 일을 알게된 박제상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랐으나 그는 이미 배를 타고 손을 흔들 뿐이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박제상은 거짓으로 계림왕이 나의 부모를 죄없이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왔다하고 항상 미해왕제를 모시면서 틈을 보아 왕제를 배를 태워 도망가게하고 그는 남아서 잡혀 일본왕의 신하되기를 한사코 거절하다가 마침내 목도에서 소사되고 말았다. 국내에서는 미해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백관을 명하여 굴헐역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며 국내에 대사령을 내리고 박제상 부인을 국대부인으로 책봉 그의 딸로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았다. 오랜 뒤 제상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마침내 치술신모가 되었다.
한편으로 울산읍지에 의하면 부인이 죽어 몸은 화석이 되어 한많은 망부석이 되고 넋은 새가 되어 은을암에 숨었다고 한다. 또 큰 딸 아기와 막내딸 아경도 어머니를 따라 죽어 화석이 되니 망부석 좌우에 두 돌이 있다 하였다. 2녀 아영만은 내마저 따라 죽으면 어미와 동생을 누가 묻어주며 또 동생 문량을 누가 양육하랴 하고 죽지 않았다 한다.
낭군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이 된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다. 무창의 망부석은 먼데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산 위에서 기다리다 그만 돌로 화하였다고 한다.
5) 은을암
은을암은 국수봉에 있는 바위이며 신라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 치술신모에 관한 설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제상이 눌지왕의 명을 받아 고구려에 가서 왕제 복호를 구출하고, 왜국에 볼모로 가 있던 왕제 미사흔(삼국유사는 미해)을 왜국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오게 한 후 그는 끝내 신라의 신하됨을 주장하다가 죽었다. 이 일이 있은 오랜 뒤에 제상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정을 못이겨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마침내 치술신모가 되었다.
울산지방의 속설에 김씨부인은 죽어 몸은 화석이 되어 망부석이 되고 넋은 새가 되었다. 새가 된 넋은 한 마을에 와서 앉았다가 날았다 하여 그 곳을 비조라 하며 또 새는 한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으므로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은을암이라 하였다. 비조는 두동면 만화리에 있으며 은을암은 국수봉에 있다.
속된 설화의 뒤에도 숨은 암시가 있기 마련이다. 설화에 숨어있는 시사에는 신모의 신시가 들어있다. 신모의 뜻에 따라 비조에 신모사와 치산원을, 은을암 앞에는 은을암을 세워 그를 사제하였다는 것이다. 국수봉은 국사봉의 음전함이니 여기에서 신모를 위한 국가의 제전이 있었음을 산이름이 말하여 주는 것인데 은을암과 은을암은 먼 옛날에는 바로 그를 위한 국사당 그것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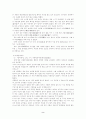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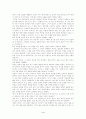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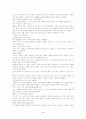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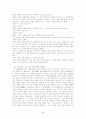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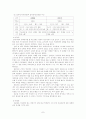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