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은사지(感恩寺址)를 찾아서
2. 감은사의 창건설화
3. 감은사의 가람구조
1) 용담(龍潭)
2) 석축(石築)
3) 문(門)
4) 금당(金堂)
5) 승원(僧院), 회랑(回廊)
6) 석물(石物)
4. 감은사지 3층 석탑
1) 문화의 융합
2) 동탑(東塔)의 주인공
5. 맺음말
#. 참고문헌, 답사일정
2. 감은사의 창건설화
3. 감은사의 가람구조
1) 용담(龍潭)
2) 석축(石築)
3) 문(門)
4) 금당(金堂)
5) 승원(僧院), 회랑(回廊)
6) 석물(石物)
4. 감은사지 3층 석탑
1) 문화의 융합
2) 동탑(東塔)의 주인공
5. 맺음말
#. 참고문헌, 답사일정
본문내용
게 감소하면서 거대한 규모에서 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이는 전탑의 탑신을 석재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 같다. 탑신의 1층은 우주와 면석을 각각 조형하여 조립한 것이지만, 2층은 4매의 석재로, 3층은 하나의 석재로 탑신을 묘사하였다. 반면에 옥개는 4개의 석재로 조립되었는데 목탑의 양식을 따라 옥개와 5단의 옥개받침이 나타나고 상승하는 추녀 끝이 묘사되어 있다. 처음 조성되었을 때에는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처럼 그 끝마다 풍경을 달아 놓았을 것이다. 상륜부는 다른 탑들과는 다르게 매우 투박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철제 찰간 때문이었다. 찰간은 길이가 4미터에 이르며 노반석을 관통하여 꽂혀 있다. 단순하면서도 날렵한 찰간은 섬세하면서도 중량감있는 석탑에 상승하는 느낌을 주었다. 감은사지 석탑은 이처럼 신라와 백제의 석탑양식을 고루 채용하면서 통일 직후에 건립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비단 정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2) 동탑(東塔)의 주인공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96년 동탑 해체복원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리장치를 발굴해 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문화재연구원은 2001년 동탑에는 문무왕의 사리가 봉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발표했다.
)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104061858261&code=960201
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문무왕은 신라에서 최초로 화장된 왕이었을 만큼 불심이 깊었고 서탑의 사리병 장식물은 부처님의 열반을 향연하는 천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동탑의 사리장치에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인 사천왕이 장식되어 있어 이것이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사실 감은사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을 떠날 때까지 탑의 웅장함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하였다. 비록 감은사는 쌍탑 1금당식의 배치를 보여 일반적인 시각에서 석탑의 중요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기의 석탑을 눈앞에 두면 그러한 주장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는 통일을 기점으로 하여 불교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절정을 맞는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는 확장된 영토를 관리하고 지방의 반란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정치체계가 필요했다. 불교가 삼국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유교는 현실적으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은사를 완공한 신문왕은 682년에 국학(國學)을 설립하여 유교적 이데올로기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감은사는 사부대중을 위한 사찰이 아닌 왕실만을 위한 원찰이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왕실은 불교를 숭상하고 불력에 의지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숭유억불 정책을 편 조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문무왕은 감포 앞 바다의 대왕암에 묻힌 것이 아니라 동탑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국가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던 신라사회에서 왕은 곧 부처였다.
또한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감은사를 짓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미완의 사찰을 완공하면서 열반하여 부처가 되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부왕의 유골을 원찰의 석탑에 안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 쌍탑이 조성된 것은 예배대상으로서 석탑의 입지가 축소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초에 각각의 석탑은 다른 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기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다.
5. 맺음말
삼국통일의 주인공이며 죽어서도 왜구의 침략을 간절히 막고자 한 문무왕을 기리는 감은사는 왕실의 원찰로 건립되었다. 지금은 비록 사지만 남아있지만, 그곳에는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아름다운 석탑이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석탑의 면석 위에 근래에 행해 진 것 같은 낙서자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흔적은 석탑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다. 또한 몇 차례의 발굴과 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담과 중문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복원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 감은사지 주변에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준비가 미흡한 채 답사 길에 나선 것을 안타까워하며 꼭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경주행 버스에 올랐다.
<참고문헌>
김부식, 이강래 譯. 2000. 『三國史記』, 한길사.
유홍준. 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일연, 김원중 譯. 2002.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1998,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한정갑. 2002.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여래출판사
홍윤식. 1997. 『한국의 가람』, 민족사
황수영. 1984. 「新羅梵鍾과 萬波息笛 說話」, 新羅文化, Vol.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이영호. 1983. 「신라중대의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韓國史硏究, Vol. 43. 한국사연구회.
\'감은사 東塔에는 문무왕 사리 봉안’京鄕新聞, 2001. 4. 6.
http://www.ocp.go.kr 「문화재청」
http://www.gameunsa.com 「김영호의 감은사지 보기」
http://www.scoreup.co.kr/edu/hist/kor.htm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사」
http://k5000.nurimedia.co.kr/「누리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 번역문」
http://www.tongiledu.pe.kr/yun/concept/%C7%CF/%C8%AD%B6%FB%B5%B5.htm「신라의 화랑도」
< 답사일정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경주행 기차탑승
11월 1일 토요일
오전 4시 50분 경주역 도착
오전 6시 00분 감포행 버스승차 (좌석, 150번)
오전 6시 40분 감은사지
오전 10시 00분 이견대, 문무대왕릉
오후 1시 00분 국립경주박물관
오후 10시 10분 서울행 기차 탑승
11월 2일 일요일
오전 3시 40분 서울역 도착
2) 동탑(東塔)의 주인공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96년 동탑 해체복원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리장치를 발굴해 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문화재연구원은 2001년 동탑에는 문무왕의 사리가 봉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발표했다.
)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104061858261&code=960201
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문무왕은 신라에서 최초로 화장된 왕이었을 만큼 불심이 깊었고 서탑의 사리병 장식물은 부처님의 열반을 향연하는 천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동탑의 사리장치에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인 사천왕이 장식되어 있어 이것이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사실 감은사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을 떠날 때까지 탑의 웅장함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하였다. 비록 감은사는 쌍탑 1금당식의 배치를 보여 일반적인 시각에서 석탑의 중요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기의 석탑을 눈앞에 두면 그러한 주장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는 통일을 기점으로 하여 불교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절정을 맞는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는 확장된 영토를 관리하고 지방의 반란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정치체계가 필요했다. 불교가 삼국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유교는 현실적으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은사를 완공한 신문왕은 682년에 국학(國學)을 설립하여 유교적 이데올로기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감은사는 사부대중을 위한 사찰이 아닌 왕실만을 위한 원찰이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왕실은 불교를 숭상하고 불력에 의지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숭유억불 정책을 편 조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문무왕은 감포 앞 바다의 대왕암에 묻힌 것이 아니라 동탑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국가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던 신라사회에서 왕은 곧 부처였다.
또한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감은사를 짓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미완의 사찰을 완공하면서 열반하여 부처가 되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부왕의 유골을 원찰의 석탑에 안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 쌍탑이 조성된 것은 예배대상으로서 석탑의 입지가 축소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초에 각각의 석탑은 다른 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기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다.
5. 맺음말
삼국통일의 주인공이며 죽어서도 왜구의 침략을 간절히 막고자 한 문무왕을 기리는 감은사는 왕실의 원찰로 건립되었다. 지금은 비록 사지만 남아있지만, 그곳에는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아름다운 석탑이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석탑의 면석 위에 근래에 행해 진 것 같은 낙서자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흔적은 석탑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다. 또한 몇 차례의 발굴과 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담과 중문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복원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 감은사지 주변에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준비가 미흡한 채 답사 길에 나선 것을 안타까워하며 꼭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경주행 버스에 올랐다.
<참고문헌>
김부식, 이강래 譯. 2000. 『三國史記』, 한길사.
유홍준. 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일연, 김원중 譯. 2002.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1998,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한정갑. 2002.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여래출판사
홍윤식. 1997. 『한국의 가람』, 민족사
황수영. 1984. 「新羅梵鍾과 萬波息笛 說話」, 新羅文化, Vol.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이영호. 1983. 「신라중대의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韓國史硏究, Vol. 43. 한국사연구회.
\'감은사 東塔에는 문무왕 사리 봉안’京鄕新聞, 2001. 4. 6.
http://www.ocp.go.kr 「문화재청」
http://www.gameunsa.com 「김영호의 감은사지 보기」
http://www.scoreup.co.kr/edu/hist/kor.htm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사」
http://k5000.nurimedia.co.kr/「누리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 번역문」
http://www.tongiledu.pe.kr/yun/concept/%C7%CF/%C8%AD%B6%FB%B5%B5.htm「신라의 화랑도」
< 답사일정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경주행 기차탑승
11월 1일 토요일
오전 4시 50분 경주역 도착
오전 6시 00분 감포행 버스승차 (좌석, 150번)
오전 6시 40분 감은사지
오전 10시 00분 이견대, 문무대왕릉
오후 1시 00분 국립경주박물관
오후 10시 10분 서울행 기차 탑승
11월 2일 일요일
오전 3시 40분 서울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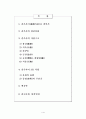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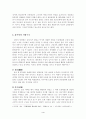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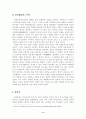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