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촘스키, 그는 누구인가?
Ⅱ. 본론
1. 전제 - 표현의 자유
2. 우리들의 현재 -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미국
1) 기업의 자본주의
2) 세계화
3) 미국
3. 선전 그리고 혁명을 통한 진실 찾기
1) 선전
(1) 누가 - 언론·지식인·엘리트
(2) 어떻게 - 선전
(3) 국가와 권력
2) 혁명을 통한 진실 찾기
(1) 혁명
(2) 진실
(3) 누가 - 국민·민중·여론
(4) 어떻게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판정신
4. 우리들의 미래 - 환경문제와 민주주의
1) 환경문제
2) 민주주의
Ⅲ. 결론
- 인간에 대한 희망
촘스키, 그는 누구인가?
Ⅱ. 본론
1. 전제 - 표현의 자유
2. 우리들의 현재 -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미국
1) 기업의 자본주의
2) 세계화
3) 미국
3. 선전 그리고 혁명을 통한 진실 찾기
1) 선전
(1) 누가 - 언론·지식인·엘리트
(2) 어떻게 - 선전
(3) 국가와 권력
2) 혁명을 통한 진실 찾기
(1) 혁명
(2) 진실
(3) 누가 - 국민·민중·여론
(4) 어떻게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판정신
4. 우리들의 미래 - 환경문제와 민주주의
1) 환경문제
2) 민주주의
Ⅲ. 결론
- 인간에 대한 희망
본문내용
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 재앙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2) 민주주의
미국에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거의 공식화된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이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줄 지도자를 선택한다. 이런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국민은 집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 국가를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현대 정치학의 창시자 중 한사람인 해럴드 라스웰도 \"우리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설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민주주의\'와 \'절제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중이 온순하고 무관심한 대중으로 돌아갈 때에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려는 대중과, 민주주의를 제한하려 안간힘을 다하는 지배계급간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Ⅲ. 결론
촘스키는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만 떠벌리면 된다고 말한다. 그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란 것도 동일한 현상에서 끌어내는 결론이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결론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 결국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배구조와 계급구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지배구조와 계급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배구조는 부당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아인슈타인과 러셀, 그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핵무기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상이 된 반면 러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아는가? 아인슈타인은 탄원서에 서명한 후에 연구실로 돌아가 물리학에 전념했지만, 러셀은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길거리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환경 재앙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2) 민주주의
미국에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거의 공식화된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이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줄 지도자를 선택한다. 이런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국민은 집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 국가를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현대 정치학의 창시자 중 한사람인 해럴드 라스웰도 \"우리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설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민주주의\'와 \'절제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중이 온순하고 무관심한 대중으로 돌아갈 때에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려는 대중과, 민주주의를 제한하려 안간힘을 다하는 지배계급간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Ⅲ. 결론
촘스키는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만 떠벌리면 된다고 말한다. 그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란 것도 동일한 현상에서 끌어내는 결론이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결론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 결국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배구조와 계급구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지배구조와 계급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배구조는 부당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아인슈타인과 러셀, 그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핵무기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상이 된 반면 러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아는가? 아인슈타인은 탄원서에 서명한 후에 연구실로 돌아가 물리학에 전념했지만, 러셀은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길거리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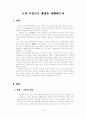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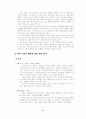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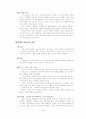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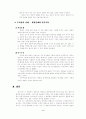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