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2p
★ 본 론 2p
― 목조건축의 구조 양식 2p
1. 기 단 2p
2. 초 석 5p
3. 민도리집 구조 6p
4. 포집(포작집) 구조 7p
5. 지 붕 9p
6. 기 와 10p
7. 한국 목조건축의 특징 13p
― 삼국의 건축 14p
1. 고구려 시대 14p
2. 백 제 시대 22p
3. 고 신라시대 29p
★ 결 론 34p
★ 본 론 2p
― 목조건축의 구조 양식 2p
1. 기 단 2p
2. 초 석 5p
3. 민도리집 구조 6p
4. 포집(포작집) 구조 7p
5. 지 붕 9p
6. 기 와 10p
7. 한국 목조건축의 특징 13p
― 삼국의 건축 14p
1. 고구려 시대 14p
2. 백 제 시대 22p
3. 고 신라시대 29p
★ 결 론 34p
본문내용
가 옮겨진 때부터로서 지배계급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한 의도로 이해된다.
▷ 구정동 고분 ― 이 고분은 마치 고분의 봉토와 같은 원형의 구릉 정상부에 있다. 구릉 자체가 고분의 봉토와 같게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정상부에 장방형의 토광(土壙)을 파고 나무곽을 놓고, 그 안에 나무관과 부장품을 안치하였다. 나무관은 나무곽의 중심부에 있으며, 양단에는 부장품을 넣었다. 머리는 동침(東枕)하였으며, 2기의 묘곽이 약 1m 간격을 두고 합장되어 있는데, 부부묘로 추정된다.
▷ 황남대총 ―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신라시대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무덤
이다. 황남동 제98호분이라고도 한다. 경주시내의 고분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표형분(瓢形墳) 표형분은 두 분묘의 봉토가 겹쳐서 외형이 낙타등이나 표주박을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 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은 고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돌무지나무곽무덤은 그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추가매장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매장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주 인 사후에 부인을 주인묘에 붙여서 축조하는 경우 표형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다. 거의 원형이 유지된 무덤의 규모는 동서 80m, 남북 120m, 높이 22.2m(南墳) 23m(北墳)로 1973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에 의해 남분이 북분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분은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주곽은 당시의 지표(地表)를 45cm 깊이로 파고 그 위에 맷돌과 자갈을 깔아 설치되어 있었다. 목곽(木槨)은 내외 이중으로 설치되었는데, 내외곽 사이는 잔자갈로 채워져 있었다. 다시 내곽 안에는 널과 부장품(副葬品) 칸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둔 유골(遺骨) 일부가 남아 있어 60살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는데, 그 외에 20대의 여자 유골 일부가 내곽 안에서 더 수습되어 한 무덤곽 안에 순장(殉葬)된 여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주곽과 3m 두께의 돌벽을 사이에 두고 부곽이 만들어져 있다.
북분은 남분의 봉토를 일부 제거하고 연이어 축조되었는데 남분과는 달리 부곽이 없는 단곽분(單槨墳)이다. 남분과 마찬가지로 덧널 안에는 널이 안치되어 있고 널 위 동쪽에 따로 부장품 칸이 마련되어 있었다. 북분은 남분에 비해 장신구가 많은 반면 무기류가 적었으며 또한 夫人帶(부인대)라는 명문이 있는 허리띠끝꾸미개가 출토되어 부부묘(夫婦墓)인 북분과 남분 중 북분이 부인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황남대총은 기원 4~5세기내 돌무지덧널무덤의 등장과 그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금관총 ―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路西洞)에 있는 고분이고, 신라의 금관이 출토되어 붙은 이름이다. 1921년 9월 가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이미 파괴된 고분인데다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어서 묘의 구조나 유물의 정확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출토물은 금관을 비롯하여 장신구무구(武具)용기 등이며, 특히 구슬 종류만 총 3만 개가 넘게 나왔다.
금관총의 원형은 지름이 50m, 높이 13m 정도이고, 신라 때만 있었던 적석총(積石塚)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속에 목곽(木槨)을 마련하여 목관(木棺)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구조와 불교의 영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 신라 이전인 지증왕(智證王) 전후의 6세기에 만들어진 왕릉으로 추정된다.
고신라시대 건축은 이후 한국건축의 건축배치 및 공간형식, 건축구조 및 구성체계, 그리고 건축장식 수법과 상징형식 등이 정착하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된다. 특히 고신라의 건축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 건축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만든 소박하고 견실하면서 단아한 모습을 특징으로 나타냈다.
★ 결론
이제까지 한국의 목조 건축의 구조와 삼국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축은 삶을 담는 공간이다. 따라서 건축은 역사적인 삶의 모습, 자연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고건축은 반도의 특징 상 중국 목조건축의 양식과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받아 들이는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풍토에 알맞게 변화 또는 개선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의 건물과 다른 부드러운 지붕의 곡선, 아름다운 형태의 두공(枓)을 만들어 내고 익공(翼工)이라는 한국적 포작을 안출(案出)해 내었다.
그리고, 대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기초로 하여 나무로 틀을 짜서 만들었는데, 건축을 조영하는데 극대하지도 왜소하지도 않으며, 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 쓰거나 생긴 모습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가공으로 건축 부재를 만들어 자연을 파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려는 태도로 건축을 계획하려 했다. 즉, 자연과 건축의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미를 꾀한 것이다. 건축의 배경이 되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는 오늘날 야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칼로 자른 듯한 수직수평선이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 참 고 문 헌★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김동욱, 기문당, 1993
『한국의 전통건축』, 장경호, 문예출판사, 1992
『한국건축사』, 기문당, 대한건축학회편, 2002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강영환, 지문당, 1991
『한국의 벽화고분』, 김원룡, 일지사, 1987
『한국의 목조건축』, 주남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김왕직, 발언사, 2000
『한국 목조건축』, 김정기, 일지사, 1980
『한국의 고건축』, 한국 건축사 연구자료, 제 11호, 21호23호,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류정수, 대원사, 1988
★참고 사이트★
http://ysgotem.hihome.com/main/archi/html/archi02.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참조
다음 백과사전 참조
▷ 구정동 고분 ― 이 고분은 마치 고분의 봉토와 같은 원형의 구릉 정상부에 있다. 구릉 자체가 고분의 봉토와 같게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정상부에 장방형의 토광(土壙)을 파고 나무곽을 놓고, 그 안에 나무관과 부장품을 안치하였다. 나무관은 나무곽의 중심부에 있으며, 양단에는 부장품을 넣었다. 머리는 동침(東枕)하였으며, 2기의 묘곽이 약 1m 간격을 두고 합장되어 있는데, 부부묘로 추정된다.
▷ 황남대총 ―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신라시대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무덤
이다. 황남동 제98호분이라고도 한다. 경주시내의 고분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표형분(瓢形墳) 표형분은 두 분묘의 봉토가 겹쳐서 외형이 낙타등이나 표주박을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 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은 고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돌무지나무곽무덤은 그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추가매장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매장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주 인 사후에 부인을 주인묘에 붙여서 축조하는 경우 표형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다. 거의 원형이 유지된 무덤의 규모는 동서 80m, 남북 120m, 높이 22.2m(南墳) 23m(北墳)로 1973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에 의해 남분이 북분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분은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주곽은 당시의 지표(地表)를 45cm 깊이로 파고 그 위에 맷돌과 자갈을 깔아 설치되어 있었다. 목곽(木槨)은 내외 이중으로 설치되었는데, 내외곽 사이는 잔자갈로 채워져 있었다. 다시 내곽 안에는 널과 부장품(副葬品) 칸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둔 유골(遺骨) 일부가 남아 있어 60살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는데, 그 외에 20대의 여자 유골 일부가 내곽 안에서 더 수습되어 한 무덤곽 안에 순장(殉葬)된 여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주곽과 3m 두께의 돌벽을 사이에 두고 부곽이 만들어져 있다.
북분은 남분의 봉토를 일부 제거하고 연이어 축조되었는데 남분과는 달리 부곽이 없는 단곽분(單槨墳)이다. 남분과 마찬가지로 덧널 안에는 널이 안치되어 있고 널 위 동쪽에 따로 부장품 칸이 마련되어 있었다. 북분은 남분에 비해 장신구가 많은 반면 무기류가 적었으며 또한 夫人帶(부인대)라는 명문이 있는 허리띠끝꾸미개가 출토되어 부부묘(夫婦墓)인 북분과 남분 중 북분이 부인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황남대총은 기원 4~5세기내 돌무지덧널무덤의 등장과 그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금관총 ―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路西洞)에 있는 고분이고, 신라의 금관이 출토되어 붙은 이름이다. 1921년 9월 가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이미 파괴된 고분인데다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어서 묘의 구조나 유물의 정확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출토물은 금관을 비롯하여 장신구무구(武具)용기 등이며, 특히 구슬 종류만 총 3만 개가 넘게 나왔다.
금관총의 원형은 지름이 50m, 높이 13m 정도이고, 신라 때만 있었던 적석총(積石塚)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속에 목곽(木槨)을 마련하여 목관(木棺)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구조와 불교의 영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 신라 이전인 지증왕(智證王) 전후의 6세기에 만들어진 왕릉으로 추정된다.
고신라시대 건축은 이후 한국건축의 건축배치 및 공간형식, 건축구조 및 구성체계, 그리고 건축장식 수법과 상징형식 등이 정착하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된다. 특히 고신라의 건축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 건축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만든 소박하고 견실하면서 단아한 모습을 특징으로 나타냈다.
★ 결론
이제까지 한국의 목조 건축의 구조와 삼국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축은 삶을 담는 공간이다. 따라서 건축은 역사적인 삶의 모습, 자연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고건축은 반도의 특징 상 중국 목조건축의 양식과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받아 들이는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풍토에 알맞게 변화 또는 개선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의 건물과 다른 부드러운 지붕의 곡선, 아름다운 형태의 두공(枓)을 만들어 내고 익공(翼工)이라는 한국적 포작을 안출(案出)해 내었다.
그리고, 대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기초로 하여 나무로 틀을 짜서 만들었는데, 건축을 조영하는데 극대하지도 왜소하지도 않으며, 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 쓰거나 생긴 모습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가공으로 건축 부재를 만들어 자연을 파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려는 태도로 건축을 계획하려 했다. 즉, 자연과 건축의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미를 꾀한 것이다. 건축의 배경이 되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는 오늘날 야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칼로 자른 듯한 수직수평선이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 참 고 문 헌★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김동욱, 기문당, 1993
『한국의 전통건축』, 장경호, 문예출판사, 1992
『한국건축사』, 기문당, 대한건축학회편, 2002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강영환, 지문당, 1991
『한국의 벽화고분』, 김원룡, 일지사, 1987
『한국의 목조건축』, 주남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김왕직, 발언사, 2000
『한국 목조건축』, 김정기, 일지사, 1980
『한국의 고건축』, 한국 건축사 연구자료, 제 11호, 21호23호,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9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류정수, 대원사, 1988
★참고 사이트★
http://ysgotem.hihome.com/main/archi/html/archi02.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참조
다음 백과사전 참조
추천자료
 중세시대와 바로크시대의 건축물과 의복 비교
중세시대와 바로크시대의 건축물과 의복 비교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건축물의 열성능과의 관계고찰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건축물의 열성능과의 관계고찰 인천지역에 소형건축물을 개론적(대지 & 외부형태 & 구조적 분석)으로 분석하라
인천지역에 소형건축물을 개론적(대지 & 외부형태 & 구조적 분석)으로 분석하라 최고층 건축물[버즈 두바이]
최고층 건축물[버즈 두바이]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그린에너지 친환경건축물
그린에너지 친환경건축물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건축물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건축물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이슬람의 건축물
이슬람의 건축물 르네상스 시대와 건축물과의 관계.pdf
르네상스 시대와 건축물과의 관계.pdf 복합 건축물 국내 해외 사례 (DDP, COEX, 바비칸 센터, 센다이 미디어 테크)
복합 건축물 국내 해외 사례 (DDP, COEX, 바비칸 센터, 센다이 미디어 테크) [한국 건축물 답사] 영암향교답사 보고서 - 영암향교(靈巖鄕校)를 다녀와서...
[한국 건축물 답사] 영암향교답사 보고서 - 영암향교(靈巖鄕校)를 다녀와서... 신기한 건축물(퐁피두센터 - Pompidou Centre)
신기한 건축물(퐁피두센터 - Pompidou Centre) 특이하고 신기한 건축물 답사(예화랑)
특이하고 신기한 건축물 답사(예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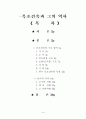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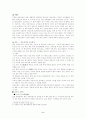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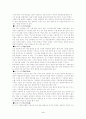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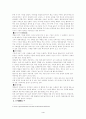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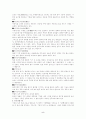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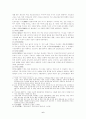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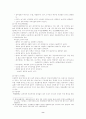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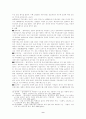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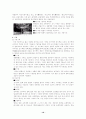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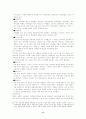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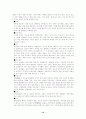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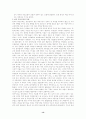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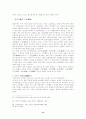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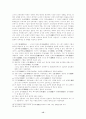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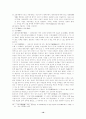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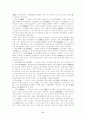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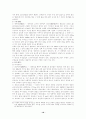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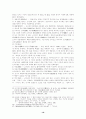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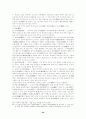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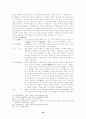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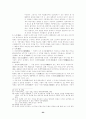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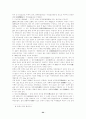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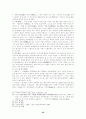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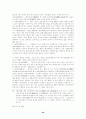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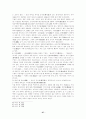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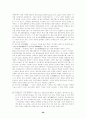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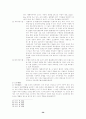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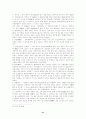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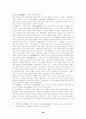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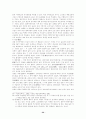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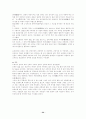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