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름 및 유래
2. 위치 및 창건
3. 가람구역과 주요전각
1) 가람구역
2) 주요전각
4. 대적광전
1) 평면
2) 기단 8) 공포
3) 초석 9) 가구
4) 기둥 10) 천장
5) 마루 11) 처마
6) 벽체 12) 단청
7) 창살
2. 위치 및 창건
3. 가람구역과 주요전각
1) 가람구역
2) 주요전각
4. 대적광전
1) 평면
2) 기단 8) 공포
3) 초석 9) 가구
4) 기둥 10) 천장
5) 마루 11) 처마
6) 벽체 12) 단청
7) 창살
본문내용
이러한 개폐 방식이나 울거미와 문살의 짜임 등으로 보아 당초의 것이 아니고 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문살은 모두 소슬빗꽃살로 짜여져 있으나, 세부적인 살의 형태나 구성에는 차이가 있어 5가지로 구분된다. 정면 어칸과 양협칸의 사분합 중 가운데쪽 2짝씩과 바깥쪽 2짝씩은 각기 살의 형태와 구성수법이 다르며, 정면 양툇간에 사용된 삼분합도 이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양측면의 전툇간에 사용된 것들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살의 형태에 각각 차이가 있다.
② 판문
배면 어칸과 양툇간에는 두짝식의 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문짝은 모두 판재를 울거미에 끼운 당판문 형태인데, 울거미 외부쪽 선대의 상부와 하부에 촉을 내어 문미와 문지방 외부쪽에 고정시켜 놓은 둔테에 꽂아 놓았다. 둔테는 문미에 설치된 것은 길게 한 부재로 되어 있으나 문지방에 설치된 것 양쪽을 따로 만들어 설치해 놓았다.
8) 공포
대적광전의 공포는 다포계인데 통상적인 맞배집의 경우처럼 정면과 배면에만 공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정면과 배면의 공포는 내부 공포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정면쪽은 외3출목7포작, 내5출목11포작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에, 배면쪽은 외3출목7포작 내 4출목9포작으로 짜여져 있다.
주간포는 정면과 배면 모두 어칸과 양협칸에는 각각 2구씩 배치되었고 동서 양툇간에는 가각 1구씩 배치되어 있다. 위치에 따른 공포의 종류와 개수는 주상포가 12구, 주간포가 16구로서 모두 28구의 공포가 짜여져 있다.
각 제공에서 살미의 양단부를 살펴 보면 외부쪽은 쇠서 및 연봉이 초각되어 있고 내부쪽은 연화나 연봉 혹은 연잎이 초각되어 운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조선조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적광전의 공포과 가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내목도리의 위치가 공포의 가장 안쪽 내목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가구 구성의 견실성 보다는 불전의 장엄에 더 비중을 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같은 주상포나 주간포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그 구성상의 차이나 공포 유형에 따른 짜임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9) 가구
대적광전의 가구는 내진고주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내진고주는 배면쪽 고주열에 4개 전면쪽 고주열에는 동 서툇간쪽으로 각 1개씩 2개가 배열되어 있어 모두 6개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도리칸 5칸 중 어칸 좌우의 양통에는 1개씩의 고주가, 동 서툇간의 좌우 양통에는 2개씩의 고주가 설치되어 있다. 고주의 위치는 양통 전체가 34자, 어칸이 16자, 전 후툇간이 각각 9자씩이므로 전체 양통 34자를 사분변작한 후 반자씩을 안쪽으로 좁힌 위치에 해당한다.
10) 천장
대적광전을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정면과 배면의 평주열을 따라 공포가 설치되고 제일 안쪽 내목장여 안쪽으로는 전체에 반자가 구성되어 있다.
내목에서 하중도리 사이,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에는 빗반자, 그리고 전 후면의 상중도리 사이에는 소란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공포부분 출목사이에는 순각판이 설치되어 있어 순각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① 소란반자
소란반자는 전 후면의 상중도리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우물 개수는 어칸과 협칸에서는 도리방향이 7칸씩이고 보방향은 4칸씩이며, 툇간에서는 도리방향은 5칸씩이고 보방향은 어칸이나 협칸과 같은 4칸씩이다.
반자의 구성은 종향과 종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장귀틀과 동귀틀을 교차시켜 우물을 구성하고, 단순한 각재로 된 소란을 귀틀마다 양옆으로 대었다. 그리고 소란대 위 개개의 우물마다 별개의 반자판을 덮어 구성하였다.
② 빗반자
빗반자는 전면과 후면에서 각기 상중도리와 하중도리 사이, 하중도리와 제일 안쪽 내목장여 사이에 2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만 배면쪽 어칸의 하단에서는 다시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빗반자의 널은 상단은 상중도리 받침장여와 하중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하단은 하중도리 받침장여 하부 뜬장여와 공포의 내목장여 사이에 설치되거나 혹은 하중도리 받침장여 하부 뜬장여와 내목장여 위에 별도로 설치한 부재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11. 처마
대적광전의 처마는 정면과 배면쪽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되어있다. 측면쪽은 도리를 바깥쪽으로 내밀고 박공과 목기연을 설치한 다음 풍판을 단 박공처마를 구성하고 있다.
① 처마 내밀기
외목도리에서부터의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쪽은 4,69자~4.8자, 배면쪽은 4.74자~4.83자 와 5.0자~5.23자이고, 부연내밀기는 정면쪽은 2.19자 ~ 2.29자 배면 쪽은 1.96자 ~1.99자이다. 서까래와 부연을 합친 처마내밀기는 정면쪽은 6.98자 ~6.99자 배면쪽은 6.68자 ~ 6.73자와 6.96자~7.24자이다.
이로보아 대적광전을 지을 당초의 의도는 전체 처마 내밀기는 7자로 같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쪽의 2자3치와 배면쪽의 2자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 외진평주 주초위 주심선에서 연함 외연까지의 처마가 이루는 각도는 정면쪽이 33.5°이고 배면쪽이 34.5°정도인데 이와 같은 차이는 건물이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평균치는 34°서 처마를 많이 내민 편이다.
② 서까래
대적광전에 사용된 서까래의 종류는 처마부분에서부터 하중도리 사이에 걸린 처마서까래와 하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걸린 상연으로 구분된다. 처마서까래의 개수는 정면과 배면 모두 62개식으로 같고, 상연은 정면과 배면쪽 모두 63개씩으로 처마서까래 보다 1개씩 많다.
12) 단청
기림사 대적광전은 어칸을 중심으로 동, 서가 철저하게 문양과 기법이 상이하다. 이와 같은 단청을 편단청(便丹靑) 혹은 패단청(牌丹靑)이라고 하며, 동일한 건축물에 단청 편수가 2인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건물 전체의 단청 문양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며 흔치 않은 방법이다.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금산사 미륵전과 화엄사 극락전의 시공기법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대 대략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로 보여지나, 그 이전의 수법과 문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청의 기법이 중기에서 후반기로 변천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추정된다.
문살은 모두 소슬빗꽃살로 짜여져 있으나, 세부적인 살의 형태나 구성에는 차이가 있어 5가지로 구분된다. 정면 어칸과 양협칸의 사분합 중 가운데쪽 2짝씩과 바깥쪽 2짝씩은 각기 살의 형태와 구성수법이 다르며, 정면 양툇간에 사용된 삼분합도 이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양측면의 전툇간에 사용된 것들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살의 형태에 각각 차이가 있다.
② 판문
배면 어칸과 양툇간에는 두짝식의 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문짝은 모두 판재를 울거미에 끼운 당판문 형태인데, 울거미 외부쪽 선대의 상부와 하부에 촉을 내어 문미와 문지방 외부쪽에 고정시켜 놓은 둔테에 꽂아 놓았다. 둔테는 문미에 설치된 것은 길게 한 부재로 되어 있으나 문지방에 설치된 것 양쪽을 따로 만들어 설치해 놓았다.
8) 공포
대적광전의 공포는 다포계인데 통상적인 맞배집의 경우처럼 정면과 배면에만 공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정면과 배면의 공포는 내부 공포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정면쪽은 외3출목7포작, 내5출목11포작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에, 배면쪽은 외3출목7포작 내 4출목9포작으로 짜여져 있다.
주간포는 정면과 배면 모두 어칸과 양협칸에는 각각 2구씩 배치되었고 동서 양툇간에는 가각 1구씩 배치되어 있다. 위치에 따른 공포의 종류와 개수는 주상포가 12구, 주간포가 16구로서 모두 28구의 공포가 짜여져 있다.
각 제공에서 살미의 양단부를 살펴 보면 외부쪽은 쇠서 및 연봉이 초각되어 있고 내부쪽은 연화나 연봉 혹은 연잎이 초각되어 운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조선조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적광전의 공포과 가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내목도리의 위치가 공포의 가장 안쪽 내목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가구 구성의 견실성 보다는 불전의 장엄에 더 비중을 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같은 주상포나 주간포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그 구성상의 차이나 공포 유형에 따른 짜임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9) 가구
대적광전의 가구는 내진고주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내진고주는 배면쪽 고주열에 4개 전면쪽 고주열에는 동 서툇간쪽으로 각 1개씩 2개가 배열되어 있어 모두 6개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도리칸 5칸 중 어칸 좌우의 양통에는 1개씩의 고주가, 동 서툇간의 좌우 양통에는 2개씩의 고주가 설치되어 있다. 고주의 위치는 양통 전체가 34자, 어칸이 16자, 전 후툇간이 각각 9자씩이므로 전체 양통 34자를 사분변작한 후 반자씩을 안쪽으로 좁힌 위치에 해당한다.
10) 천장
대적광전을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정면과 배면의 평주열을 따라 공포가 설치되고 제일 안쪽 내목장여 안쪽으로는 전체에 반자가 구성되어 있다.
내목에서 하중도리 사이,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에는 빗반자, 그리고 전 후면의 상중도리 사이에는 소란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공포부분 출목사이에는 순각판이 설치되어 있어 순각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① 소란반자
소란반자는 전 후면의 상중도리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우물 개수는 어칸과 협칸에서는 도리방향이 7칸씩이고 보방향은 4칸씩이며, 툇간에서는 도리방향은 5칸씩이고 보방향은 어칸이나 협칸과 같은 4칸씩이다.
반자의 구성은 종향과 종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장귀틀과 동귀틀을 교차시켜 우물을 구성하고, 단순한 각재로 된 소란을 귀틀마다 양옆으로 대었다. 그리고 소란대 위 개개의 우물마다 별개의 반자판을 덮어 구성하였다.
② 빗반자
빗반자는 전면과 후면에서 각기 상중도리와 하중도리 사이, 하중도리와 제일 안쪽 내목장여 사이에 2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만 배면쪽 어칸의 하단에서는 다시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빗반자의 널은 상단은 상중도리 받침장여와 하중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하단은 하중도리 받침장여 하부 뜬장여와 공포의 내목장여 사이에 설치되거나 혹은 하중도리 받침장여 하부 뜬장여와 내목장여 위에 별도로 설치한 부재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11. 처마
대적광전의 처마는 정면과 배면쪽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되어있다. 측면쪽은 도리를 바깥쪽으로 내밀고 박공과 목기연을 설치한 다음 풍판을 단 박공처마를 구성하고 있다.
① 처마 내밀기
외목도리에서부터의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쪽은 4,69자~4.8자, 배면쪽은 4.74자~4.83자 와 5.0자~5.23자이고, 부연내밀기는 정면쪽은 2.19자 ~ 2.29자 배면 쪽은 1.96자 ~1.99자이다. 서까래와 부연을 합친 처마내밀기는 정면쪽은 6.98자 ~6.99자 배면쪽은 6.68자 ~ 6.73자와 6.96자~7.24자이다.
이로보아 대적광전을 지을 당초의 의도는 전체 처마 내밀기는 7자로 같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까래 내밀기는 정면쪽의 2자3치와 배면쪽의 2자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 외진평주 주초위 주심선에서 연함 외연까지의 처마가 이루는 각도는 정면쪽이 33.5°이고 배면쪽이 34.5°정도인데 이와 같은 차이는 건물이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평균치는 34°서 처마를 많이 내민 편이다.
② 서까래
대적광전에 사용된 서까래의 종류는 처마부분에서부터 하중도리 사이에 걸린 처마서까래와 하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걸린 상연으로 구분된다. 처마서까래의 개수는 정면과 배면 모두 62개식으로 같고, 상연은 정면과 배면쪽 모두 63개씩으로 처마서까래 보다 1개씩 많다.
12) 단청
기림사 대적광전은 어칸을 중심으로 동, 서가 철저하게 문양과 기법이 상이하다. 이와 같은 단청을 편단청(便丹靑) 혹은 패단청(牌丹靑)이라고 하며, 동일한 건축물에 단청 편수가 2인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건물 전체의 단청 문양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며 흔치 않은 방법이다.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금산사 미륵전과 화엄사 극락전의 시공기법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대 대략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로 보여지나, 그 이전의 수법과 문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청의 기법이 중기에서 후반기로 변천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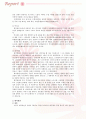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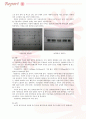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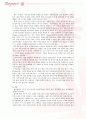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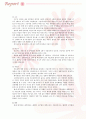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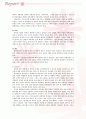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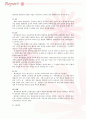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