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간, 그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평성 너구리 전쟁 폼포코-
1. 잃어버린 세계
2. ‘광기의 언덕’과 자연에 대한 ‘닦달’(Ge-Stell)
3. 인간, 그 고독한 동물에 대하여
4. 놀이와 노동
5. 원더 랜드: 마법을 대체한 마법, 놀이를 대체한 놀이
6. ‘달려가고픈’ 과거와 ‘만들고픈’ 미래
-평성 너구리 전쟁 폼포코-
1. 잃어버린 세계
2. ‘광기의 언덕’과 자연에 대한 ‘닦달’(Ge-Stell)
3. 인간, 그 고독한 동물에 대하여
4. 놀이와 노동
5. 원더 랜드: 마법을 대체한 마법, 놀이를 대체한 놀이
6. ‘달려가고픈’ 과거와 ‘만들고픈’ 미래
본문내용
을 닦달하고 있는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것일까? 이사오의 다른 작품 <반딧불의 묘지>(1988)를 보자.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인간이야말로 폭격 아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던가!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 도망가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 누구도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저 밑에서 놀란 사냥감처럼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 인간들과 동일한 인간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저 아래 인간들만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도 인간은 그 장치에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근대 인간, 그 역시 주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숲에서 벤 나무들을 측량하고 있는 산지기는 겉보기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숲길을 다니지만, 오늘의 그는 자신이 알건 모르건 간에 목재 가공 산업에 의해 주문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TK: 49).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은 결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같은 쪽)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그는 추락의 낭떠러지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자신마저도 한낱 부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73쪽).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닦달이 탈은폐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은 다른 탈은폐들을 모두 감추어버린다는 데 있다. “포이에시스”의 의미로 현존하는 것을 감추어 버린다(75쪽). 인간이 더 근원적인 진리의 부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77쪽).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어디에 있을까? 횔더린의 시구 속에서 하이데거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97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여는 것이다. 존재의 역운인 현대 기술은 어떤 다른 역운의 도래가 있을 때만 극복 변형될 수 있다(107쪽).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미리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상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역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본질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존재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함을 통해서 존재에 귀속할 수 있는 원초적 차원인 언어가 열어준다(111쪽).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항상 우리 옆에 있었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소리.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면 그것이 바로 ‘사유’이다. 이렇게 될 때 존재는 이러한 본질에 떨어져 나와 존재자 내로 귀의한다. 그것은 바로 전형(Kehre)하는 것이다.
위험을 위험으로 합당하게 사유할 수 있을 때 전향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역운적으로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며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오직 <존재의 목자>로서 존재의 진리를 돌볼 때에만 기다릴 수 있다(113쪽). 위험이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존재의 망각은 존재의 진리로 전향된다(119쪽). 이 전향은 매개 없이, 인과적 맥락도 없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 그것은 번쩍임이고 빛남이다.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존재는 자신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존재의 형세(Konstellation)는 그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지배하에서 청각과 시각을 방송과 필름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존재의 형세 사물의 존재를 등한시하여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129쪽)
너구리들이 벌인 퍼레이드. 고목에 꽃을 피우고, 초롱을 들고 다니는 요괴. 그 옛날의 ‘등 행렬’, ‘초롱과 우산’. 사람들에게 잊혀진 아름다운 동화처럼, 그리고 꿈처럼.... 장로는 말한다. “고등과학의 합리적 해석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갑자기 인간들은 삼라만상의 신비에 놀라 이처럼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모든 패배가 명백해졌을 때도 너구리들은 마지막으로 옛 모습을 되살려 낸다. 나무는 무성하고, 사람들은 논길을 걸어가며, 새들은 노래한다. 사람들은 그동안 잊어먹었던 것들을 보고 듣는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TV 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풍요를 느끼고 풍요로운 그들의 세계의 빈곤함을 느낀다. 과거는 풍성하고 현재는 빈곤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효과를 냈다”고 말하는 것이란 ‘너구리와 공생할 수 있는 생활’이라는 캠페인, 그리고 공원의 조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고, 살아가기엔 너무 좁은 것”이었다.
여전히 세계는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다. 언젠가 너구리를 만난다면 그들을 따라 모든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들의 놀이마당으로 뛰어들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내달리고 싶은 것이다. 과거는 항상 풍성하다. 영화가 이끌어온 철학의 발걸음은 여기까지이다.
사이렌의 노래! 과거로 내달리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 노래는 너무나 아름답다. 즐겁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은 동경하는 자를 과거라는 함정에 빠뜨린다(계몽의 변증법: 64).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회상은 혹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산자(無産者), 그가 꿈꾸어야 할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존재의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Ending Song
“언제든지 누군가가 꼭 곁에 있어 / 생각해주세요. 그 멋있는 이름을 ..../ 마음이 울적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 꼭 꼭 누군가가 언제나 곁에 있어.
태어난 마을을 멀리 떠나있어도 /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마을의 바람을 .... / 언제든지 곁에 있어.
비오는 아침엔 도대체 어떻게 해 / 꿈에서 깨어나도 역시 외톨이야
언제든지 네가 꼭 옆에 있어 / 생각해주세요. 멋있는 그 이름을....
싸움에서 상처입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 귀를 기울여봐요. 노래가 들려와요. / 눈물도 아픔도 언젠가 사라져 가 / 그래 꼭 너의 웃는 얼굴을 원해.
바람부는 밤엔 누군가를 만나고파. / 꿈속에서 봤지. 너를 만나고파.”
근대 인간, 그 역시 주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숲에서 벤 나무들을 측량하고 있는 산지기는 겉보기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숲길을 다니지만, 오늘의 그는 자신이 알건 모르건 간에 목재 가공 산업에 의해 주문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TK: 49).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은 결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같은 쪽)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그는 추락의 낭떠러지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자신마저도 한낱 부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73쪽).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닦달이 탈은폐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은 다른 탈은폐들을 모두 감추어버린다는 데 있다. “포이에시스”의 의미로 현존하는 것을 감추어 버린다(75쪽). 인간이 더 근원적인 진리의 부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77쪽).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어디에 있을까? 횔더린의 시구 속에서 하이데거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97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여는 것이다. 존재의 역운인 현대 기술은 어떤 다른 역운의 도래가 있을 때만 극복 변형될 수 있다(107쪽).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미리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상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역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본질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존재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함을 통해서 존재에 귀속할 수 있는 원초적 차원인 언어가 열어준다(111쪽).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항상 우리 옆에 있었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소리.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면 그것이 바로 ‘사유’이다. 이렇게 될 때 존재는 이러한 본질에 떨어져 나와 존재자 내로 귀의한다. 그것은 바로 전형(Kehre)하는 것이다.
위험을 위험으로 합당하게 사유할 수 있을 때 전향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역운적으로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며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오직 <존재의 목자>로서 존재의 진리를 돌볼 때에만 기다릴 수 있다(113쪽). 위험이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존재의 망각은 존재의 진리로 전향된다(119쪽). 이 전향은 매개 없이, 인과적 맥락도 없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 그것은 번쩍임이고 빛남이다.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존재는 자신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존재의 형세(Konstellation)는 그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지배하에서 청각과 시각을 방송과 필름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존재의 형세 사물의 존재를 등한시하여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129쪽)
너구리들이 벌인 퍼레이드. 고목에 꽃을 피우고, 초롱을 들고 다니는 요괴. 그 옛날의 ‘등 행렬’, ‘초롱과 우산’. 사람들에게 잊혀진 아름다운 동화처럼, 그리고 꿈처럼.... 장로는 말한다. “고등과학의 합리적 해석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갑자기 인간들은 삼라만상의 신비에 놀라 이처럼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모든 패배가 명백해졌을 때도 너구리들은 마지막으로 옛 모습을 되살려 낸다. 나무는 무성하고, 사람들은 논길을 걸어가며, 새들은 노래한다. 사람들은 그동안 잊어먹었던 것들을 보고 듣는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TV 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풍요를 느끼고 풍요로운 그들의 세계의 빈곤함을 느낀다. 과거는 풍성하고 현재는 빈곤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효과를 냈다”고 말하는 것이란 ‘너구리와 공생할 수 있는 생활’이라는 캠페인, 그리고 공원의 조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고, 살아가기엔 너무 좁은 것”이었다.
여전히 세계는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다. 언젠가 너구리를 만난다면 그들을 따라 모든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들의 놀이마당으로 뛰어들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내달리고 싶은 것이다. 과거는 항상 풍성하다. 영화가 이끌어온 철학의 발걸음은 여기까지이다.
사이렌의 노래! 과거로 내달리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 노래는 너무나 아름답다. 즐겁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은 동경하는 자를 과거라는 함정에 빠뜨린다(계몽의 변증법: 64).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회상은 혹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산자(無産者), 그가 꿈꾸어야 할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존재의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Ending Song
“언제든지 누군가가 꼭 곁에 있어 / 생각해주세요. 그 멋있는 이름을 ..../ 마음이 울적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 꼭 꼭 누군가가 언제나 곁에 있어.
태어난 마을을 멀리 떠나있어도 /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마을의 바람을 .... / 언제든지 곁에 있어.
비오는 아침엔 도대체 어떻게 해 / 꿈에서 깨어나도 역시 외톨이야
언제든지 네가 꼭 옆에 있어 / 생각해주세요. 멋있는 그 이름을....
싸움에서 상처입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 귀를 기울여봐요. 노래가 들려와요. / 눈물도 아픔도 언젠가 사라져 가 / 그래 꼭 너의 웃는 얼굴을 원해.
바람부는 밤엔 누군가를 만나고파. / 꿈속에서 봤지. 너를 만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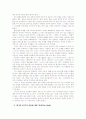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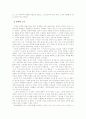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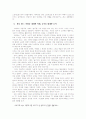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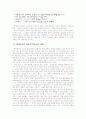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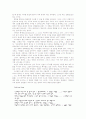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