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잃게 되면 전세를 회복하기 힘들다. 조정은 이순신의 논리에 밀려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는 못하였다.
이순신은 10배 이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명량해전에서 대승함으로써 일본군의 호남연안 진입을 봉쇄했다. 적은 원균 함대를 대파함으로써 남해의 제해권을 일시 장악했다가 통제해역을 광양만 북동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무력한 내력의 관군이 추풍낙엽처럼 와해됨으로써 일본 육군은 일사천리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유린하고 서울로 북상하게 되었으니, 이순신으로서는 내륙의 저지는 불가항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내륙으로 진격중이던 일본 육군은 명량해전의 패배로 1차 침공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에서 보급품이 끊기고, 수륙병진 공격후의 서울에서의 합류, 연결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천안 남쪽에서 더 이상 북상 못하고 유턴 퇴각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선에 반영구진지를 10개나 구축하여 전력은 재정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 파송된 명나라 군대는 대안의 불구경 하듯 하여 일본군과의 적극적인 교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피아의 상황은 쌍방 공히 보전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전략·전술의 추구였다고 하겠다. 이순신 함대의 명량해전 승리는 그후 소강상태를 거쳐 노량해전의 대승으로 이어져 7년전쟁을 마무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는 바로 패전으로 치닫던 전쟁을 무승부로 끝내게 한 보전의 원칙 적용에 의한 결정적 역할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일본군은 더 이상 자기보존이 어렵게 되자 동장군이 엄습해 오기 전에 서둘러 철수하게 된 것이다. 이미 도요도미가 사망한 후라 전쟁이 성과없이 끝나게 됨을 일본군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가 1598년 11월 하순 노량해전 직전의 상황이었다.
조선왕조 창건 200년째인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 침공하여 서울을 20일만에 함락시키고 4개월간 무방비상태의 조선을 마음대로 유린 침탈한 그 당시의 국방부재 상황은 한마디로 국가보전의 원칙을 모르는 선조와 그 신하들의 천무숭문정책과 망국적인 패거리 감투싸움이 가져온 자업자득이었다. 그 실태를 경상우도 병사로서 죽음으로 진주성을 방어한 김시민은 자해필담(紫海筆談)에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평화가 200년 계속되는 동안 백성은 군사를 알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듯 무너짐에 감히 총칼을 잡을 자 없도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문무를 겸비한 민족의 영웅 이순신은 해전승리로 쓰러진 나라를 끝까지 지켰다.
이순신은 10배 이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명량해전에서 대승함으로써 일본군의 호남연안 진입을 봉쇄했다. 적은 원균 함대를 대파함으로써 남해의 제해권을 일시 장악했다가 통제해역을 광양만 북동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무력한 내력의 관군이 추풍낙엽처럼 와해됨으로써 일본 육군은 일사천리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유린하고 서울로 북상하게 되었으니, 이순신으로서는 내륙의 저지는 불가항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내륙으로 진격중이던 일본 육군은 명량해전의 패배로 1차 침공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에서 보급품이 끊기고, 수륙병진 공격후의 서울에서의 합류, 연결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천안 남쪽에서 더 이상 북상 못하고 유턴 퇴각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선에 반영구진지를 10개나 구축하여 전력은 재정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 파송된 명나라 군대는 대안의 불구경 하듯 하여 일본군과의 적극적인 교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피아의 상황은 쌍방 공히 보전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전략·전술의 추구였다고 하겠다. 이순신 함대의 명량해전 승리는 그후 소강상태를 거쳐 노량해전의 대승으로 이어져 7년전쟁을 마무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는 바로 패전으로 치닫던 전쟁을 무승부로 끝내게 한 보전의 원칙 적용에 의한 결정적 역할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일본군은 더 이상 자기보존이 어렵게 되자 동장군이 엄습해 오기 전에 서둘러 철수하게 된 것이다. 이미 도요도미가 사망한 후라 전쟁이 성과없이 끝나게 됨을 일본군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가 1598년 11월 하순 노량해전 직전의 상황이었다.
조선왕조 창건 200년째인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 침공하여 서울을 20일만에 함락시키고 4개월간 무방비상태의 조선을 마음대로 유린 침탈한 그 당시의 국방부재 상황은 한마디로 국가보전의 원칙을 모르는 선조와 그 신하들의 천무숭문정책과 망국적인 패거리 감투싸움이 가져온 자업자득이었다. 그 실태를 경상우도 병사로서 죽음으로 진주성을 방어한 김시민은 자해필담(紫海筆談)에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평화가 200년 계속되는 동안 백성은 군사를 알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듯 무너짐에 감히 총칼을 잡을 자 없도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문무를 겸비한 민족의 영웅 이순신은 해전승리로 쓰러진 나라를 끝까지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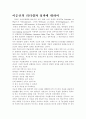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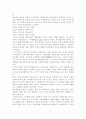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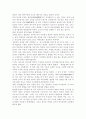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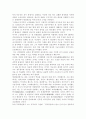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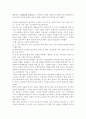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