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전 탐구의 정신
2. 문장파의 형성
3. 문장파와 그 시적 경사
4. 조지훈과 전통수용
5. 가람 이병기와 시조
6. 《문장》과 정지용
7. 작품세계
2. 문장파의 형성
3. 문장파와 그 시적 경사
4. 조지훈과 전통수용
5. 가람 이병기와 시조
6. 《문장》과 정지용
7. 작품세계
본문내용
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玉座 위엔 如意珠 희롱하는 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石(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佩玉 소리도 없었다. 品石 옆에서 正一品 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량이면 봉황새야 九天에 呼哭하리라.
조지훈 - 〈봉황수〉전문
1940년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반짝,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늬는 산가새처럼 날러갔구나!
정지용 - 〈유리창1〉전문
1930년대 전반
서구추구적 모더니즘 계통, 감각적 언어구사
(이미지즘-모더니즘 : 신선/독창)
골짝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뤼가 소란히 싸이기도 하고,
꽃도
귀향 사는 곳,
절터 가드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 〈구성동〉전문
1937년
중국고전에 상당한 관심
벌목정정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
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 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뫼
새도 울지않어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판에여섯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남긴 내음새를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이랸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정지용 - 〈장수산1〉전문
1939년
요리 조리 돌아 굴을 겨오 벗어나니
앙상한 白樺 서리 눈인 양 돌도 희고
트이는 깜언 虛空에 봉이 새로 솟는다.
서대는 다람쥐가 길을 자조 알리우고
자진 서리 틈에 石楠은 연연하고
젓나무 섞어진 부리 향은 그저 남았다.
날 인 바위 끝이 발아래 떨고 있고
봉마다 골마다 제여곰 다른 모양
한눈에 모여 드나니 다만 어질하여라.
이병기 - 〈迦葉峰〉전문
《문장》에 관계하기 전(1930년대 초)
형이상의 차원이 발견되지 않고 말씨는 두드러지게 우아한 쪽이며 잘 다듬어져 있다. 기법은 매우 묘사적이고 시각적 심상 내지 색채감각에 의거한 심상이 나타남(이미지즘)
외로 더져 두어 미미히 숨을 지고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기다리고
음음한 눈어름 속에 잠을 자던 그 梅花
손에 이아치고 바람으로 시달리다
곧고 굳은 성ㅅ결 그애를 못석이고
맺었던 봉우리 하나 피도 못한 그 梅花
닥어 오는 치위 천지를 다 벌려도
찾어 드는 볕은 방으로 하나 차다
어느 뉘(世) 다시 보오리 자최 잃은 그 梅花
이병기 - 〈梅花〉전문
《문장》에 관계한 후 1930년대 말
매화는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두드러지게 정신화되어 있다. 선비의 높은 기품을 기린 것이다. 즉 창작시조의 이념적 뼈대를 선비정신
조지훈 - 〈봉황수〉전문
1940년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반짝,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늬는 산가새처럼 날러갔구나!
정지용 - 〈유리창1〉전문
1930년대 전반
서구추구적 모더니즘 계통, 감각적 언어구사
(이미지즘-모더니즘 : 신선/독창)
골짝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뤼가 소란히 싸이기도 하고,
꽃도
귀향 사는 곳,
절터 가드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 〈구성동〉전문
1937년
중국고전에 상당한 관심
벌목정정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
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 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뫼
새도 울지않어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판에여섯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남긴 내음새를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이랸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정지용 - 〈장수산1〉전문
1939년
요리 조리 돌아 굴을 겨오 벗어나니
앙상한 白樺 서리 눈인 양 돌도 희고
트이는 깜언 虛空에 봉이 새로 솟는다.
서대는 다람쥐가 길을 자조 알리우고
자진 서리 틈에 石楠은 연연하고
젓나무 섞어진 부리 향은 그저 남았다.
날 인 바위 끝이 발아래 떨고 있고
봉마다 골마다 제여곰 다른 모양
한눈에 모여 드나니 다만 어질하여라.
이병기 - 〈迦葉峰〉전문
《문장》에 관계하기 전(1930년대 초)
형이상의 차원이 발견되지 않고 말씨는 두드러지게 우아한 쪽이며 잘 다듬어져 있다. 기법은 매우 묘사적이고 시각적 심상 내지 색채감각에 의거한 심상이 나타남(이미지즘)
외로 더져 두어 미미히 숨을 지고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기다리고
음음한 눈어름 속에 잠을 자던 그 梅花
손에 이아치고 바람으로 시달리다
곧고 굳은 성ㅅ결 그애를 못석이고
맺었던 봉우리 하나 피도 못한 그 梅花
닥어 오는 치위 천지를 다 벌려도
찾어 드는 볕은 방으로 하나 차다
어느 뉘(世) 다시 보오리 자최 잃은 그 梅花
이병기 - 〈梅花〉전문
《문장》에 관계한 후 1930년대 말
매화는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두드러지게 정신화되어 있다. 선비의 높은 기품을 기린 것이다. 즉 창작시조의 이념적 뼈대를 선비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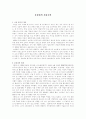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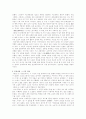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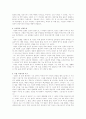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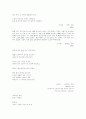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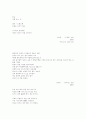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