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작가 탐구 - 뛰어난 이야기꾼, 작가 박완서
1.1. 어린시절 - 박적골에서의 생활과 서울 상경
1.2. 근대경험의 양식
1.3. 전쟁의 상처와 등단
1.4. 등단 이후의 발걸음
2. 자전적 글쓰기
2.1. 공간의 이동
2.2. 제목을 통한 작품 읽기
3. 여성문학으로 읽기
3.1. 엄마의 이름
3.2. 여성적 글쓰기의 시선
3.3. 섬세한 내면 묘사
4. 지혜로운 노년의 글쓰기
◎ 참고자료
1.1. 어린시절 - 박적골에서의 생활과 서울 상경
1.2. 근대경험의 양식
1.3. 전쟁의 상처와 등단
1.4. 등단 이후의 발걸음
2. 자전적 글쓰기
2.1. 공간의 이동
2.2. 제목을 통한 작품 읽기
3. 여성문학으로 읽기
3.1. 엄마의 이름
3.2. 여성적 글쓰기의 시선
3.3. 섬세한 내면 묘사
4. 지혜로운 노년의 글쓰기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살아가는 인물이다. 청희는 이기적이고 무지비한 오라비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옥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즉 ‘단군 이래 최고를 구가하는 풍요’의 시대 70년대를 상징하는 ‘기름진 배’와 대조되는 부분을 작가는 담아낸다. ‘기름진 배’와 대조된 그들의 조그만 몸에서 계층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콩쥐에게서 간간이 풍기는 어떤 적개심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겨낭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자는 느꼈다. 꼭 그럴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낌새가 있었던 건 아니면서도 그건 확실했다.
마치 타인의 강한 시선은 마주보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피부에 와 꽂히듯이 콩쥐의 적개심은 그 여자가 남편과 담소할 때라든지 아이들과 단란할 때라든지, 혼자 느긋하게 차를 마실 때라든지를 가리지 않고 그 여자의 피부에 와 꽂혀서 그 여자를 문득 소스라치게 했다. 실상 그 여자가 요새 누리는 오붓한 행복은 오랜만에 어렵게 얻은 거였다. 박완서,《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2, p.276.
여성 이야기들의 뼈이자 살이 되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이후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등을 쓰는데 토양이 된다. 박완서는 이렇게 말한다. ‘왜 저항해야 하는가’보다는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이다.
4. 지혜로운 노년의 글쓰기
나이를 먹는다는 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드물지 않게 동갑내기나 나보다 어린 사람, 심지어 자식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박완서,《어른 노릇 사람 노릇》,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 작가정신, 1998, p.92.
박완서의 에세이적 글쓰기는 70년 중반에서 시작되어 지금껏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1977)》을 시작으로 최근 《어른노릇 사람노릇》《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두부》등 많은 서적을 남긴다. 70-80년대가 자의식이 뚜렷했고 실천이 활발했던 시기라면, 현재의 글들은 여행, 고백, 노년의 성찰 등이 담겨있는 등 소재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소설 역시도 《너무 쓸쓸한 당신》에서 엿볼 수 있는 노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을 제시해 어루만지는 미학을 말해준다. 글 중에는 우리의 생활 안의 믿음과 도덕이 부재함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글도 많은데, 아마도 현대 사회의 건강한 도덕을 일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즉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 인정스러운 것을 되찾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어린 날의 기억을 찾고 싶은 의도로 쓰인 《옛날의 사금파리》는 어린 날의 박완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짧은 동화 다섯 편이 들어있다. 서울식 단발머리를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와, 서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덟 살의 꼬마가 실제 박완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따스한 엄마의 사랑과 추억이 묻어있는 그 시절을 엮은 것으로, 고희를 넘긴 작가의 스산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노트북을 써보니 암만해도 정이 든 내 기계만 못했다. 그까짓 기계한테 정은 무슨 놈의 정, 그 속의 나의 불휴의 명작이 숨어있는 한,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안 집어갈 낡은 기계라 해도 진주를 품은 조개나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끼고 들 수밖에 없었다. 박완서,《어른 노릇 사람 노릇》, 《나의 웬수 덩어리》 작가정신, 1998, p.127.
우리가 진정으로 기리는 목가적인 분위기, 소멸해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사람을 마음놓이게 하는 진국스러운 순박함에 있는 게 아닐까. 다목적댐에 의해, 고속도로에 의해, 공업단지에 의해 소멸해간 것들의 예스러운 게 그 외형뿐 아니라 내용까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실향은 참으로 참담하다. 박완서,《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우리들의 실향(失鄕)》, 세계사, 2000, p.99.
…아침에도 노을이 지지만 그건 곧 눈부신 햇살을 거느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진다. 그러나 저녁노을은 언제 그랬더냐 싶게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끝이 어둠이기에 순간의 영광이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때문이다. 인간사의 덧없음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박완서, 《두부》,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 창작과 비평사, 2002, p.137.
박완서는 전쟁 체험을 비롯하여 분단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 근현대사를 폭넓게 펼쳐 보인 작가다. 박완서 소설은 역사적 계기 속에 은폐되거나 억압된 기억들을 복원하려는 힘을 지니고 있고, 소설을 만드는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작가의 소설에는 인간 내면에 담는 예리한 시선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비평가들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전적 냄새가 짙다”, “그악스러운 여성을 그려 낸다”, “울궈먹기식의 글Tm기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넘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는 현재 여성 작가를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했다. 실제로 작가 신경숙은 소설을 습작하기 위해 박완서의 소설을 백여 번 필사했다고 한다. 작가는 가히 폭발적인 필력을 지녔다. 지금까지도 소설을 쓰는 게 마냥 즐겁다고 토로하는 작가, 박완서. 따가운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기 이전에, 소설사의 한 폐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거목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천편일률적인 비평을 보기 이전에, 키 작은 독자로써 그의 작품 -굳이 소설이 아니라도 좋다. 드라마 <미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의 원작자이기 때문에- 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준비를 갖길 바래본다.
◎ 참고자료
권명아, 『맞장뜨는 여자들』,소명출판사, 2001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문학사상>,1988년 1월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4.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홍경선, 『소설로 그린 자화상의 의미』, 웅진출판, 1992
콩쥐에게서 간간이 풍기는 어떤 적개심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겨낭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자는 느꼈다. 꼭 그럴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낌새가 있었던 건 아니면서도 그건 확실했다.
마치 타인의 강한 시선은 마주보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피부에 와 꽂히듯이 콩쥐의 적개심은 그 여자가 남편과 담소할 때라든지 아이들과 단란할 때라든지, 혼자 느긋하게 차를 마실 때라든지를 가리지 않고 그 여자의 피부에 와 꽂혀서 그 여자를 문득 소스라치게 했다. 실상 그 여자가 요새 누리는 오붓한 행복은 오랜만에 어렵게 얻은 거였다. 박완서,《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02, p.276.
여성 이야기들의 뼈이자 살이 되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이후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등을 쓰는데 토양이 된다. 박완서는 이렇게 말한다. ‘왜 저항해야 하는가’보다는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이다.
4. 지혜로운 노년의 글쓰기
나이를 먹는다는 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드물지 않게 동갑내기나 나보다 어린 사람, 심지어 자식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박완서,《어른 노릇 사람 노릇》,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 작가정신, 1998, p.92.
박완서의 에세이적 글쓰기는 70년 중반에서 시작되어 지금껏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1977)》을 시작으로 최근 《어른노릇 사람노릇》《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두부》등 많은 서적을 남긴다. 70-80년대가 자의식이 뚜렷했고 실천이 활발했던 시기라면, 현재의 글들은 여행, 고백, 노년의 성찰 등이 담겨있는 등 소재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소설 역시도 《너무 쓸쓸한 당신》에서 엿볼 수 있는 노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을 제시해 어루만지는 미학을 말해준다. 글 중에는 우리의 생활 안의 믿음과 도덕이 부재함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글도 많은데, 아마도 현대 사회의 건강한 도덕을 일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즉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 인정스러운 것을 되찾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어린 날의 기억을 찾고 싶은 의도로 쓰인 《옛날의 사금파리》는 어린 날의 박완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짧은 동화 다섯 편이 들어있다. 서울식 단발머리를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와, 서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덟 살의 꼬마가 실제 박완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따스한 엄마의 사랑과 추억이 묻어있는 그 시절을 엮은 것으로, 고희를 넘긴 작가의 스산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노트북을 써보니 암만해도 정이 든 내 기계만 못했다. 그까짓 기계한테 정은 무슨 놈의 정, 그 속의 나의 불휴의 명작이 숨어있는 한,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안 집어갈 낡은 기계라 해도 진주를 품은 조개나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끼고 들 수밖에 없었다. 박완서,《어른 노릇 사람 노릇》, 《나의 웬수 덩어리》 작가정신, 1998, p.127.
우리가 진정으로 기리는 목가적인 분위기, 소멸해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사람을 마음놓이게 하는 진국스러운 순박함에 있는 게 아닐까. 다목적댐에 의해, 고속도로에 의해, 공업단지에 의해 소멸해간 것들의 예스러운 게 그 외형뿐 아니라 내용까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실향은 참으로 참담하다. 박완서,《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우리들의 실향(失鄕)》, 세계사, 2000, p.99.
…아침에도 노을이 지지만 그건 곧 눈부신 햇살을 거느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진다. 그러나 저녁노을은 언제 그랬더냐 싶게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끝이 어둠이기에 순간의 영광이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때문이다. 인간사의 덧없음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박완서, 《두부》,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 창작과 비평사, 2002, p.137.
박완서는 전쟁 체험을 비롯하여 분단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 근현대사를 폭넓게 펼쳐 보인 작가다. 박완서 소설은 역사적 계기 속에 은폐되거나 억압된 기억들을 복원하려는 힘을 지니고 있고, 소설을 만드는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작가의 소설에는 인간 내면에 담는 예리한 시선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비평가들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전적 냄새가 짙다”, “그악스러운 여성을 그려 낸다”, “울궈먹기식의 글Tm기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넘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는 현재 여성 작가를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했다. 실제로 작가 신경숙은 소설을 습작하기 위해 박완서의 소설을 백여 번 필사했다고 한다. 작가는 가히 폭발적인 필력을 지녔다. 지금까지도 소설을 쓰는 게 마냥 즐겁다고 토로하는 작가, 박완서. 따가운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기 이전에, 소설사의 한 폐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거목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천편일률적인 비평을 보기 이전에, 키 작은 독자로써 그의 작품 -굳이 소설이 아니라도 좋다. 드라마 <미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의 원작자이기 때문에- 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준비를 갖길 바래본다.
◎ 참고자료
권명아, 『맞장뜨는 여자들』,소명출판사, 2001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문학사상>,1988년 1월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4.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홍경선, 『소설로 그린 자화상의 의미』, 웅진출판,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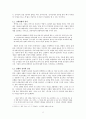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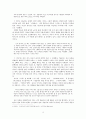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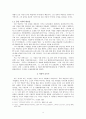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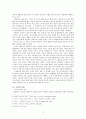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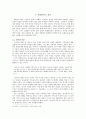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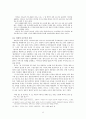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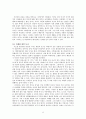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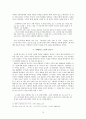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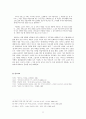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