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자는 이러한 효에 대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확고히 정착시켰다. 이 유교적인 효사상은 맹자에 와서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고, 한대(漢代)에 이르러 《효경(孝經)》에서 도덕의 근원, 우주의 원리로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효사상이 가장 중요한 도덕규범으로 정착되자 자연히 효에 대한 행동상의 규범도 많아지게 되었다. 일종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먼저 부모를 대하는 얼굴가짐을 중시했다.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겨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하여 색난(色難)이라 하였다. 또 부모의 잘못을 보면 간언은 하되 뜻은 거역하지 않으며, 살아 계실 때에는 정성으로 모시고 돌아가시면 3년간 부모의 평소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켜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소 일상생활 중에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테면 저녁에는 잠자리가 어떤지 직접 손을 넣어 확인해보고 아침에는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여쭌 다음 부모의 안색을 주의깊게 살폈으니, 이것이 바로 혼정신성으로 부모를 모시는 기본 도리였던 것이다.
이 말은 겨울에는 따뜻하게[溫] 여름에는시원하게[淸] 해드리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고[定]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省]는 뜻의 \'온청정성(溫淸定省)\'이란 말과 뜻이 통한다. 또 부모를 섬기기는 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서늘하게 한다는 뜻의 \'동온하청(冬溫夏淸)\'이라는 말도 모두 《예기》에 나오는 말로서 그 뜻이 서로 통하는 말이다.
* 화룡점정 [畵龍點睛] -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 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
畵 : 그림 화
龍 : 용 룡
點 : 점찍을 점
睛 : 눈동자 정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일 자체가 돋보인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수형기(水衡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양(梁)나라의 장승요(張僧繇)가 금릉(金陵:南京)에 있는 안락사(安樂寺)에 용 두 마리를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묻자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용 한 마리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용이 벽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편 어떤 일이 총체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어딘가 한군데 부족한 점이 있을 때 화룡에 점정이 빠졌다고도 한다.
* 회자정리[會者定離] -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會 : 모일 회
者 : 놈 자
定 : 정할 정
離 : 떠날 리(이)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人生)의 무상(無常)함을 인간(人間)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離別)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 유사어 : 生者必滅(생자필멸)
출전 : 遺敎經(유교경)
부처님께서 베사리성의 큰 숲에 계실 때,부처님께서 열반을 예고하시자 아란존자가 슬퍼하였다.그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 빠짐없이 덧없음(無常)으로 귀착되나니,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일지라도 언제인가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으레 그런 것이거늘 어찌 근심하고 슬퍼만 하랴.\' 아난은 계속하여 눈물 흘리면서 말씀드렸다. \'하늘에서나 인간에서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스승님께서 머지 않아 열반에 드신다니,제가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으리이까.이 세상의 눈을 잃게 되고, 중생은 자비하신 어버이를 잃나이다.\' \'아난아,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비록 내가 한겁 동안이나 머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리니,인연으로 된 모든 것들의 본 바탕(性相)이 그런 것이니라.\' 대반열반경 권상;<1-192하>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자 정리(會者定離: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거자 필반(去者必反):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이라고 한다.
* 후생가외 [後生可畏] -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後 : 뒤 후
生 : 날 생
可 : 옳을 가
畏 : 두려워할 외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지식과 덕망이 나중에 태어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선생(先生)이고,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 즉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생(後生)이다. 그런데 이 후생은 장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나온다.
자왈 후생가외 언지래자지불여금야 사십오십이무문언 사역부족외야이(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공자가 말했다. 뒤에 태어난 사람이 가히 두렵다. 어찌 오는 사람들이 이제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으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명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또한 두려워할 것이 못될 뿐이다.)
여기서 외(畏)란 좋은 의미에서 존경하고 주목할 만한 것을 말한다. 즉, 뒤에 태어난 사람인 후배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한 말이다. 그들의 장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인 두려움인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도 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사오십이 되도록 이름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고 말함으로써 젊었을 때 학문에 힘쓸 것을 충고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젊은이는 항상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선배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후생가외라고 한 것은 그의 제자 중 특히 재주와 덕을 갖추고 학문이 뛰어난 안회(顔回)의 훌륭함을 두고 이른 말이다.
이 말은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는 후생각고(後生角高)라는 말과도 뜻이 통한다. 후생각고는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훨씬 나을 때 이르는 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과도 뜻이 통하는 말이다.
이 말은 겨울에는 따뜻하게[溫] 여름에는시원하게[淸] 해드리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고[定]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省]는 뜻의 \'온청정성(溫淸定省)\'이란 말과 뜻이 통한다. 또 부모를 섬기기는 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서늘하게 한다는 뜻의 \'동온하청(冬溫夏淸)\'이라는 말도 모두 《예기》에 나오는 말로서 그 뜻이 서로 통하는 말이다.
* 화룡점정 [畵龍點睛] -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 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
畵 : 그림 화
龍 : 용 룡
點 : 점찍을 점
睛 : 눈동자 정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일 자체가 돋보인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수형기(水衡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양(梁)나라의 장승요(張僧繇)가 금릉(金陵:南京)에 있는 안락사(安樂寺)에 용 두 마리를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묻자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용 한 마리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용이 벽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편 어떤 일이 총체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어딘가 한군데 부족한 점이 있을 때 화룡에 점정이 빠졌다고도 한다.
* 회자정리[會者定離] -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會 : 모일 회
者 : 놈 자
定 : 정할 정
離 : 떠날 리(이)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人生)의 무상(無常)함을 인간(人間)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離別)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 유사어 : 生者必滅(생자필멸)
출전 : 遺敎經(유교경)
부처님께서 베사리성의 큰 숲에 계실 때,부처님께서 열반을 예고하시자 아란존자가 슬퍼하였다.그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 빠짐없이 덧없음(無常)으로 귀착되나니,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일지라도 언제인가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으레 그런 것이거늘 어찌 근심하고 슬퍼만 하랴.\' 아난은 계속하여 눈물 흘리면서 말씀드렸다. \'하늘에서나 인간에서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스승님께서 머지 않아 열반에 드신다니,제가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으리이까.이 세상의 눈을 잃게 되고, 중생은 자비하신 어버이를 잃나이다.\' \'아난아,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비록 내가 한겁 동안이나 머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리니,인연으로 된 모든 것들의 본 바탕(性相)이 그런 것이니라.\' 대반열반경 권상;<1-192하>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자 정리(會者定離: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거자 필반(去者必反):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이라고 한다.
* 후생가외 [後生可畏] -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後 : 뒤 후
生 : 날 생
可 : 옳을 가
畏 : 두려워할 외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지식과 덕망이 나중에 태어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선생(先生)이고,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 즉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생(後生)이다. 그런데 이 후생은 장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나온다.
자왈 후생가외 언지래자지불여금야 사십오십이무문언 사역부족외야이(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공자가 말했다. 뒤에 태어난 사람이 가히 두렵다. 어찌 오는 사람들이 이제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으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명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또한 두려워할 것이 못될 뿐이다.)
여기서 외(畏)란 좋은 의미에서 존경하고 주목할 만한 것을 말한다. 즉, 뒤에 태어난 사람인 후배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한 말이다. 그들의 장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인 두려움인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도 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사오십이 되도록 이름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고 말함으로써 젊었을 때 학문에 힘쓸 것을 충고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젊은이는 항상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선배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후생가외라고 한 것은 그의 제자 중 특히 재주와 덕을 갖추고 학문이 뛰어난 안회(顔回)의 훌륭함을 두고 이른 말이다.
이 말은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는 후생각고(後生角高)라는 말과도 뜻이 통한다. 후생각고는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훨씬 나을 때 이르는 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과도 뜻이 통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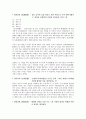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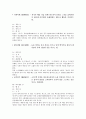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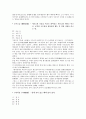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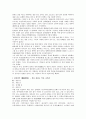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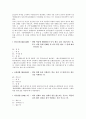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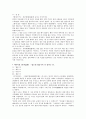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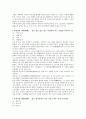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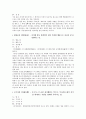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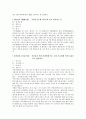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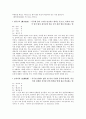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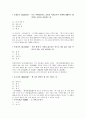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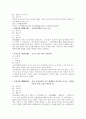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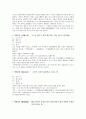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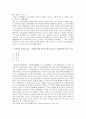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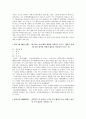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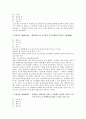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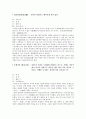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