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겠는가?
‘山으로 가는 마음’은 산이 표상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명상으로서의 이상향을 형상화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촛불’에서 맨처음 산을 중심 이미조로 읊은 시로서, 산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오늘 “잊고 살던 산을 찾아”, “내 마음 주름살 많은 늙은 산의 명상하는 모습을 사랑”하고 밤이 올 때까지 그 고요한 품안에서 고산식물들이 자라듯 마음에게 “어머니의 품안”과 같은 산의 “고요한 품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몸은 암울한 현실 속에, 마음은 이상향인 산 속에 있어야 하는 아픔이 있다. 그리하여 시적 자아는 “나는 언제까지 너와 이별을 잦은 이 생활을 하여야겠는가?”라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다.
신석정에에 있어서의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바로 자기 자신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이기까지 해서 산과 자기 자신과 하늘의 의미로 상승적 승화의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즉, 산과 하늘에 나를 합일시킴은 오로지 청정한 명상의 세계를 통해서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석정에게 나타나는 명상의 대상은 산이며, 그것도 주름살 많은 구원한 모습은 산이다. 따라서 그에게 산이 주는 인상은 감각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담긴 철학이기도 했기에, 깊이 파고 들어가 안주하려는 정신적 고향이고 이상향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집인 ‘슬픈牧歌’는 3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제시대의 비극적 현실과 시인의 고뇌를 통해, ‘촛불’ 시대의 자연에 대한 성찰이 암울한 사회적 환경과 교차되면서 현실을 보다 새롭게 접근시켜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촛불’이 이상향을 향해 나아갔다면, ‘슬픈牧歌’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슬픈牧歌’가 쓰여진 시기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로, ‘촛불’ 시대의 푸른 산과 흰구름이 그의 옆에서 점점 멀어져 산과 들로 헤매이게 된다. 그리하여 현실을 직시하기에 이르렀다.
‘슬픈牧歌’ 시대에 와서도 신석정은 ‘촛불’의 시기에 못 다 부른 ‘山’을 읊조린다. 이 때의 산은 ‘촛불’ 시대의 늙은 산이 명상하는 이상향으로써 산만이 아니라, 일제치하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슬픈牧歌’는 산과 관련된 형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의젓함이라든가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시인과 마주해 있을 정도로 밀착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靑山白雲圖
신석정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은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사는산
언제나 숭고할수 있는 푸른산이
그 푸른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날 그 아득한날 밤부터
저 산맥위로는 푸른별이 넘나 들었고
골작에는 양떼처럼 흰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고산식물들을 품에 안고 길러낸다는 너그러운산
정초한 꽃그늘에 자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내 몸이 가벼히 흰구름
‘山으로 가는 마음’은 산이 표상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명상으로서의 이상향을 형상화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촛불’에서 맨처음 산을 중심 이미조로 읊은 시로서, 산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오늘 “잊고 살던 산을 찾아”, “내 마음 주름살 많은 늙은 산의 명상하는 모습을 사랑”하고 밤이 올 때까지 그 고요한 품안에서 고산식물들이 자라듯 마음에게 “어머니의 품안”과 같은 산의 “고요한 품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몸은 암울한 현실 속에, 마음은 이상향인 산 속에 있어야 하는 아픔이 있다. 그리하여 시적 자아는 “나는 언제까지 너와 이별을 잦은 이 생활을 하여야겠는가?”라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다.
신석정에에 있어서의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바로 자기 자신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이기까지 해서 산과 자기 자신과 하늘의 의미로 상승적 승화의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즉, 산과 하늘에 나를 합일시킴은 오로지 청정한 명상의 세계를 통해서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석정에게 나타나는 명상의 대상은 산이며, 그것도 주름살 많은 구원한 모습은 산이다. 따라서 그에게 산이 주는 인상은 감각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담긴 철학이기도 했기에, 깊이 파고 들어가 안주하려는 정신적 고향이고 이상향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집인 ‘슬픈牧歌’는 3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제시대의 비극적 현실과 시인의 고뇌를 통해, ‘촛불’ 시대의 자연에 대한 성찰이 암울한 사회적 환경과 교차되면서 현실을 보다 새롭게 접근시켜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촛불’이 이상향을 향해 나아갔다면, ‘슬픈牧歌’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슬픈牧歌’가 쓰여진 시기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로, ‘촛불’ 시대의 푸른 산과 흰구름이 그의 옆에서 점점 멀어져 산과 들로 헤매이게 된다. 그리하여 현실을 직시하기에 이르렀다.
‘슬픈牧歌’ 시대에 와서도 신석정은 ‘촛불’의 시기에 못 다 부른 ‘山’을 읊조린다. 이 때의 산은 ‘촛불’ 시대의 늙은 산이 명상하는 이상향으로써 산만이 아니라, 일제치하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슬픈牧歌’는 산과 관련된 형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의젓함이라든가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시인과 마주해 있을 정도로 밀착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靑山白雲圖
신석정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은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사는산
언제나 숭고할수 있는 푸른산이
그 푸른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날 그 아득한날 밤부터
저 산맥위로는 푸른별이 넘나 들었고
골작에는 양떼처럼 흰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고산식물들을 품에 안고 길러낸다는 너그러운산
정초한 꽃그늘에 자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내 몸이 가벼히 흰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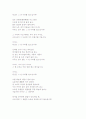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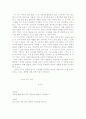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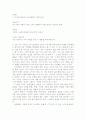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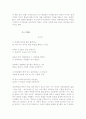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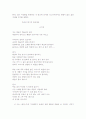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