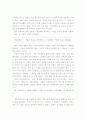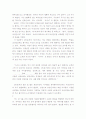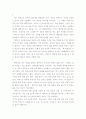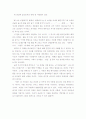본문내용
들이다. 물론 나도 남(南)씨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친일문학가로 알고 있는 ‘김동인’이나 ‘서정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들에 대해 연민과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친일이나 나 아니 우리를 부정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억압과 갖은 무시를 견뎌내고 내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이나 일본으로 쫓겨간, 피해간 힘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러하다. 그래서 김사량도 ‘정순’을 몸이 작고 연약한 여자로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하루오가 “난 선생님 이름 알아요. 남 선생님이죠?” 라고 말하고 남(南)씨가 그 말을 통해 구제받은 것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재일 한국인들은 남씨처럼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또한 자신을 어설픈 변명으로 둘러대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자신은 숨긴게 아니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순전히 김 아무개 식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혼혈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루오처럼 아버지의 것에도 어머니의 것에도 속하지 못한채로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들을 포용하고 색안경을 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도 빛속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들에 대해 연민과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친일이나 나 아니 우리를 부정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억압과 갖은 무시를 견뎌내고 내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이나 일본으로 쫓겨간, 피해간 힘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러하다. 그래서 김사량도 ‘정순’을 몸이 작고 연약한 여자로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하루오가 “난 선생님 이름 알아요. 남 선생님이죠?” 라고 말하고 남(南)씨가 그 말을 통해 구제받은 것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재일 한국인들은 남씨처럼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또한 자신을 어설픈 변명으로 둘러대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자신은 숨긴게 아니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순전히 김 아무개 식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혼혈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루오처럼 아버지의 것에도 어머니의 것에도 속하지 못한채로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들을 포용하고 색안경을 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도 빛속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