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줄거리
-1막
-2막
-Requiem
-Full
2. 주제의식
3. 인물분석
-Willy Loman & Brother Ben
-Biff Loman
-Happy Loman
-Linda Loman
-Charley & Bernard
-Howard Wagner & Oliver Stanley
4. 배경분석
5. 비평문
6. 연극 감상
-1막
-2막
-Requiem
-Full
2. 주제의식
3. 인물분석
-Willy Loman & Brother Ben
-Biff Loman
-Happy Loman
-Linda Loman
-Charley & Bernard
-Howard Wagner & Oliver Stanley
4. 배경분석
5. 비평문
6. 연극 감상
본문내용
게 해 주었다.
이제 연기쪽을 보자면, 연기자들이 자신의 특징에 맞는 탈을 쓰고 나옴으로 인해 그 캐릭터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고 그 탈 모습 하나하나가 TV에서나 행사장에서나 공연장에서 보았던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어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게다가 탈춤 공연에서 단점이 탈이 입을 막음으로 인해 소리가 널리 퍼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들은 탈의 입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얼굴 위에 쓰는 대신 머리에 써 목소리를 잘 울리게 하였다.(물론 뒤에 가서는 얼굴에 쓰는 이도 등장한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역할의 인물은 역시 턱부분을 없애 소리가 잘 울리게 하였고 말을 적게 하는 모조국 황태자역의 인물만 완전한 탈을 썼다.) 그리고 연기자들은 대사의 일부, 아니 대사의 6~70%가량을 노래로 한다. 노래라 하니, 창과 비슷한 형식인데, 가끔 민요도 나오고, 뭔가 익숙한 음색도 나오게 된다. 한국판 뮤지컬인셈인데 창극과는 약간 다르다. 판소리를 극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창이 위주인 창극에 반해 이것은 대사가 주를 이룬다. 노래가 가미된 것이다. 창극을 오페라로 친다면 이것은 역시 뮤지컬 정도라고 할 정도로, \'창\'이라는 데 거부감을 떨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역시 이런 가끔가끔 양념처럼 들어가는 노래에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 하면서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나타난다. 말을 못알아 듣는 부분이 많다. 일단 한자를 주욱 나열하는 학자님 대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해하니 논외로 두더라도 나머지, 분명 알기 쉬운 대사인데도 노래에 섞인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질 않는다. 그것의 주범은 다름아닌, 이 연극의 장점 중 하나인 음향효과이다.
북소리가 워낙 큰건지, 아니면 진짜 연기자의 발음이 노래에 신경을 쓰느라 살짝 뭉개지는 건지, 내용 파악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사를 순간순간 놓친다는 건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며 이 때문에 극에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토리극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연기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 외, \'니미\'와 같은 언어유희 라던가 여러 가지 풍자와 패러디는 정말 사람 배꼽 빠지게 만드는 부분이다. 택견이나 궁중무용, 민속무, 수벽치기를 참고로 하여 만들었다는 걸음 동작 하나하나며 춤사위 하나하나며, 몸동작 하나하나며, 이거 정말 신경써서 만든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전통을 가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살짝 비틀어주는 모습, 몇가지 단점만 보완한다면 이 양반놀음은 분명 한국 연극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연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슬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때는 조선후기.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너도나도 양반을 하겠다고 족보를 사들이던 시절, 추대인이라는 평민, 아니 양반이 살았다. 그 역시 족보를 사들여 나중에야 양반이 된 사람. 그런만큼 \'완벽한\' 양반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평민적 버릇을 못버리는 터라 하는 행동이 다 어색하다. 양반의 체면을 차린다고 괴상한 어릿광대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않나, 춤선생과 노래선생을 불러들여 개인강습까지 받는다.
이 춤선생과 노래선생이란 이들은 그에게 품위있는 몸가짐과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노리는 작자들에 불과하다. 결국은 괴상한 몸짓만 가르쳐주고 가는데 실상을 까맣게 모른는 추대인은 그게 양반들 특유의 몸가짐이려니 생각하며 그 괴상한 소행을 반복한다. 학자라고 고상한 것도 아니다. 그 역시 추대인의 돈을 보고 온 이이므로, 추대인의 비위에 거슬르지 않기 위해 추대인의 그릇된 행동도 잘했다, 잘했다, 부추겨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나마 추대인의 아내와 딸 단실이, 그리고 하녀 초랭이는 제대로 인식이 틀어박혀있는데 그네들도 추대인을 바로잡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그에게 양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하여 비비양반이다. 그는 어째, 왕궁에 출입하는 지체높은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하는 짓이 영 한량짓거리다. 여자를 끌어들여 흥청망청 놀고 모든 부담은 추대인에게 미루기 일쑤다. 그래도 추대인은 이런 양반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디냐며 흔쾌히 그 돈을 부담한다. 아내가 보기엔 영 속터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던 중, 딸인 단실이가 이웃집 평민인 양산박과 사랑에 빠진다. 물론 추대인은 그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딸을 재상집 처로 들일거라고 호언장담을 한다. 낙심한 양산박에게 그의 하인 막둑이가 한가지 술수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양산박을 저 중국에 있는 모조국의 황태자로 속여 단실이를 데려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실행에 옮긴다. 막둑이는 중국 사신으로 변장을 하고 양산박은 가면까지 쓰고나와 모조국의 황태자라고 거드름을 피워댄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기인데도 추대인은 홀딱 속아넘어가고 만다. 게다가 모조국 언어라고 하는 것도 웃겨서, \'내 사랑하는 님이여\'를 \'니미\'라고 표현한다고 일러줘 추대인이 짝사랑하는 양반 부인에게 \'니미\'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 결국 양산박은 단실이와 결혼을 하고 모조국의 가장 큰 벼슬을 추대인에게 내리겠노라고 마지막 연기를 한다. 그 가장 큰 벼슬이라는 것이 \'핑-민\'이라고, 영락없는 \'평민\'이다. 그래도 추대인은 좋다고 그 감투를 들고 헤벌쭉 웃는다. 마지막, 초랭이의 말이 압권이다. 초랭이는 헤죽거리는 추대인의 앞에 나와 그를 비웃으며 관객들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바보 양반이 되느니 똑똑한 평민으로 살겠어.\' 라고.
이 연극을 보러갔을 때, 나는 주위를 보고 놀랐다. 흔히,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젊은 사람들 일색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4~50대 아주머니, 6~70은 넘어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극을 그리 즐기러 다니지 않는 이 분들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젊은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연극을 즐겼다. 이런 것이 전통이지 않을까. 젊은이와 나이든 분들 모두가 어울러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 발전하고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한국의 전통 연극도 더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연기쪽을 보자면, 연기자들이 자신의 특징에 맞는 탈을 쓰고 나옴으로 인해 그 캐릭터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고 그 탈 모습 하나하나가 TV에서나 행사장에서나 공연장에서 보았던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어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게다가 탈춤 공연에서 단점이 탈이 입을 막음으로 인해 소리가 널리 퍼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들은 탈의 입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얼굴 위에 쓰는 대신 머리에 써 목소리를 잘 울리게 하였다.(물론 뒤에 가서는 얼굴에 쓰는 이도 등장한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역할의 인물은 역시 턱부분을 없애 소리가 잘 울리게 하였고 말을 적게 하는 모조국 황태자역의 인물만 완전한 탈을 썼다.) 그리고 연기자들은 대사의 일부, 아니 대사의 6~70%가량을 노래로 한다. 노래라 하니, 창과 비슷한 형식인데, 가끔 민요도 나오고, 뭔가 익숙한 음색도 나오게 된다. 한국판 뮤지컬인셈인데 창극과는 약간 다르다. 판소리를 극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창이 위주인 창극에 반해 이것은 대사가 주를 이룬다. 노래가 가미된 것이다. 창극을 오페라로 친다면 이것은 역시 뮤지컬 정도라고 할 정도로, \'창\'이라는 데 거부감을 떨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역시 이런 가끔가끔 양념처럼 들어가는 노래에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 하면서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나타난다. 말을 못알아 듣는 부분이 많다. 일단 한자를 주욱 나열하는 학자님 대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해하니 논외로 두더라도 나머지, 분명 알기 쉬운 대사인데도 노래에 섞인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질 않는다. 그것의 주범은 다름아닌, 이 연극의 장점 중 하나인 음향효과이다.
북소리가 워낙 큰건지, 아니면 진짜 연기자의 발음이 노래에 신경을 쓰느라 살짝 뭉개지는 건지, 내용 파악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사를 순간순간 놓친다는 건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며 이 때문에 극에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토리극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연기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 외, \'니미\'와 같은 언어유희 라던가 여러 가지 풍자와 패러디는 정말 사람 배꼽 빠지게 만드는 부분이다. 택견이나 궁중무용, 민속무, 수벽치기를 참고로 하여 만들었다는 걸음 동작 하나하나며 춤사위 하나하나며, 몸동작 하나하나며, 이거 정말 신경써서 만든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전통을 가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살짝 비틀어주는 모습, 몇가지 단점만 보완한다면 이 양반놀음은 분명 한국 연극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연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슬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때는 조선후기.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너도나도 양반을 하겠다고 족보를 사들이던 시절, 추대인이라는 평민, 아니 양반이 살았다. 그 역시 족보를 사들여 나중에야 양반이 된 사람. 그런만큼 \'완벽한\' 양반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평민적 버릇을 못버리는 터라 하는 행동이 다 어색하다. 양반의 체면을 차린다고 괴상한 어릿광대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않나, 춤선생과 노래선생을 불러들여 개인강습까지 받는다.
이 춤선생과 노래선생이란 이들은 그에게 품위있는 몸가짐과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노리는 작자들에 불과하다. 결국은 괴상한 몸짓만 가르쳐주고 가는데 실상을 까맣게 모른는 추대인은 그게 양반들 특유의 몸가짐이려니 생각하며 그 괴상한 소행을 반복한다. 학자라고 고상한 것도 아니다. 그 역시 추대인의 돈을 보고 온 이이므로, 추대인의 비위에 거슬르지 않기 위해 추대인의 그릇된 행동도 잘했다, 잘했다, 부추겨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나마 추대인의 아내와 딸 단실이, 그리고 하녀 초랭이는 제대로 인식이 틀어박혀있는데 그네들도 추대인을 바로잡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그에게 양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하여 비비양반이다. 그는 어째, 왕궁에 출입하는 지체높은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하는 짓이 영 한량짓거리다. 여자를 끌어들여 흥청망청 놀고 모든 부담은 추대인에게 미루기 일쑤다. 그래도 추대인은 이런 양반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디냐며 흔쾌히 그 돈을 부담한다. 아내가 보기엔 영 속터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던 중, 딸인 단실이가 이웃집 평민인 양산박과 사랑에 빠진다. 물론 추대인은 그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딸을 재상집 처로 들일거라고 호언장담을 한다. 낙심한 양산박에게 그의 하인 막둑이가 한가지 술수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양산박을 저 중국에 있는 모조국의 황태자로 속여 단실이를 데려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실행에 옮긴다. 막둑이는 중국 사신으로 변장을 하고 양산박은 가면까지 쓰고나와 모조국의 황태자라고 거드름을 피워댄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기인데도 추대인은 홀딱 속아넘어가고 만다. 게다가 모조국 언어라고 하는 것도 웃겨서, \'내 사랑하는 님이여\'를 \'니미\'라고 표현한다고 일러줘 추대인이 짝사랑하는 양반 부인에게 \'니미\'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 결국 양산박은 단실이와 결혼을 하고 모조국의 가장 큰 벼슬을 추대인에게 내리겠노라고 마지막 연기를 한다. 그 가장 큰 벼슬이라는 것이 \'핑-민\'이라고, 영락없는 \'평민\'이다. 그래도 추대인은 좋다고 그 감투를 들고 헤벌쭉 웃는다. 마지막, 초랭이의 말이 압권이다. 초랭이는 헤죽거리는 추대인의 앞에 나와 그를 비웃으며 관객들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바보 양반이 되느니 똑똑한 평민으로 살겠어.\' 라고.
이 연극을 보러갔을 때, 나는 주위를 보고 놀랐다. 흔히,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젊은 사람들 일색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4~50대 아주머니, 6~70은 넘어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극을 그리 즐기러 다니지 않는 이 분들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젊은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연극을 즐겼다. 이런 것이 전통이지 않을까. 젊은이와 나이든 분들 모두가 어울러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 발전하고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한국의 전통 연극도 더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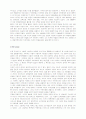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