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애제문에 대한 개념
2. 애제문의 기원과 발전
3. 각 문체 분류집에 따른 애제문의 분류
4. 애제문의 자목들
2. 애제문의 기원과 발전
3. 각 문체 분류집에 따른 애제문의 분류
4. 애제문의 자목들
본문내용
사를 지냈는데, 그 유래는 오래 되었으나 남아 있는 글이 없다. 석전문은 제문이다. 다만 제문은 총괄하는 명칭이고, 석전문은 학궁에서만 사용하였다.
14) 祈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기원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漢나라 조서에 ‘제사는 늘리되 기원은 하지 말라.(增祀無祈)’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우량과 일조량이 시기와 어긋나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빌었으니, 그 뜻은 없앨 수도 없다.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송나라 武帝의 祈雨文 한 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有司들이 지은 것이다.
15) 謝
과거에는 神明께 기도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었다. 謝는 보답하는 일이다. 빌어서 얻는 것이 있으면 謝를 짓는다.
16) 歎道文
이런 글은 과거엔 전혀 없었는데, 당나라 때 道敎가 성행하자 천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미치지 못한 듯 떠받들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 詞義를 완미해 보면 모두 女冠이 이 일을 주재한 듯하다.
17) 齋詞
당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맹신하였는데,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그들의 문집 속에는 자주 이런 글이 보인다. 齋詞란 재계하고서 詞를 바친다는 뜻이다.
18) 願文
이 또한 祝文에서 유래된 것인데 불공드릴 때 사용하는 것을 원문이라 한다. 글 속에는 반드시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더러는 응당 해야 할 공덕을 불전에 미리 고하므로 자신의 발원의 말을 담고 있다.
19) 醮辭
醮의 본래 뜻은 제사 지낼 때 술 마시는 것을 이름 한 것이다. 뒤에 승려와 道士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을 모두 초라고 하였다. 기도에는 반드시 詞가 있으므로 초사라고 하며, 또 章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어떤 시인이 “푸른 종이에 초사를 써서 밤에 통명전에 아뢴다[綠章夜奏通明殿]”라고 한 구절이 있다.
20) 冠辭
옛날에 관례를 행할 때 반드시 조상에게 고했는데, 고할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는 반드시 詞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관사라 한다. 辭가운데는 귀신에게 기도하여 많은 복을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冠祝文이라고도 하고, 또는 祝辭라고 한다.
21) 祝辭
곧 祝文을 말하는데, 祝라고도 한다. 는 福이다. 빌어서 복을 바라는 것이다. 漢代에 생겨났으며 뒤에 전하는 것은 적다. 宋나라 劉敞 劉敞 : 北宋의 학자로 호는 公是이다.
이 가끔 모방하여 지었다.
22) 賽文
『詩經』가운데는 田祖 田祖 : 밭을 처음으로 갈기 시작한 전설상의 사람 즉 神農氏를 말한다.
에게 보답하는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작품이 있는데 한해 곡식의 풍년에 대해 술로써 신명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새문이란 謝文과 같다. 賽란『說文解字』에 ‘賽는 報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확장되어 제물을 갖추어 신에게 드린다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과장되고 미화되어 있다. 賽라고도 한다.
23) 贊饗文
道家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東皇太一 東皇太一 : 고대전설상의 天神.
의 신 혹은 北帝 北帝 : 북방을 담당한 神.
明堂 明堂 : 고대 제왕들이 정치나 가르침을 펴던 곳.
을 위해 제사지내는 것으로 모두 도인들이 숭배하는 제사이다. 글의 내용 또한 齋, 醮등의 글과 비슷하다.
24) 告文
고(告)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아뢴다는 뜻으로, 주로 후배가 선조나 선사(先師)의 제를 지낼 때에 사용한다. 천자에게는 告廟文이 있는데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감히 천자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고문이라고만 하였다. 선인에게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한가지이다. 본래 告祖라고 이름 하였는데, 고조라고 하지 않고 범칭 한 것도 있다.
25) 盟文
『左傳』에 제후가 서로 맹약하면 약속한 말을 策에 싣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맹문이다. 맹이라 할 때 맹은 明으로 신명에게 고하는 것이다.『文心雕龍』에「祝盟」편이 있는데 맹문과 축맹 두 가지는 본래 같은 것이 아니었으나 약속을 진술하는 용도는 다르지 않다.
26) 誓文
誓의 문체는『尙書』에 자주 보인다. 신명에게 고하는 것은 맹문과 같다. 盟은 동등한 나라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誓는 아랫사람들과 약속할 때 쓰이는 것이 조금 다르다.
27) 靑詞
齋나 醮에 쓰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짓기 시작하여 송나라 사람 문집 가운데 자주 보인다. 嘉靖 嘉靖 : 明나라 世宗의 연호로 1522년-1566년까지 시기이다.
연간에 도교가 성행하자 천자가 뜻을 오로지하여 도를 닦으니, 당시에 글 짓는 신하들이 다투어 이 문체로 윗사람의 뜻을 따랐다. 청사라고 한 것은 푸른 종이에 썼기 때문이다.
14) 祈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기원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漢나라 조서에 ‘제사는 늘리되 기원은 하지 말라.(增祀無祈)’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우량과 일조량이 시기와 어긋나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빌었으니, 그 뜻은 없앨 수도 없다.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송나라 武帝의 祈雨文 한 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有司들이 지은 것이다.
15) 謝
과거에는 神明께 기도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었다. 謝는 보답하는 일이다. 빌어서 얻는 것이 있으면 謝를 짓는다.
16) 歎道文
이런 글은 과거엔 전혀 없었는데, 당나라 때 道敎가 성행하자 천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미치지 못한 듯 떠받들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 詞義를 완미해 보면 모두 女冠이 이 일을 주재한 듯하다.
17) 齋詞
당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맹신하였는데,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그들의 문집 속에는 자주 이런 글이 보인다. 齋詞란 재계하고서 詞를 바친다는 뜻이다.
18) 願文
이 또한 祝文에서 유래된 것인데 불공드릴 때 사용하는 것을 원문이라 한다. 글 속에는 반드시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더러는 응당 해야 할 공덕을 불전에 미리 고하므로 자신의 발원의 말을 담고 있다.
19) 醮辭
醮의 본래 뜻은 제사 지낼 때 술 마시는 것을 이름 한 것이다. 뒤에 승려와 道士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을 모두 초라고 하였다. 기도에는 반드시 詞가 있으므로 초사라고 하며, 또 章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어떤 시인이 “푸른 종이에 초사를 써서 밤에 통명전에 아뢴다[綠章夜奏通明殿]”라고 한 구절이 있다.
20) 冠辭
옛날에 관례를 행할 때 반드시 조상에게 고했는데, 고할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는 반드시 詞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관사라 한다. 辭가운데는 귀신에게 기도하여 많은 복을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冠祝文이라고도 하고, 또는 祝辭라고 한다.
21) 祝辭
곧 祝文을 말하는데, 祝라고도 한다. 는 福이다. 빌어서 복을 바라는 것이다. 漢代에 생겨났으며 뒤에 전하는 것은 적다. 宋나라 劉敞 劉敞 : 北宋의 학자로 호는 公是이다.
이 가끔 모방하여 지었다.
22) 賽文
『詩經』가운데는 田祖 田祖 : 밭을 처음으로 갈기 시작한 전설상의 사람 즉 神農氏를 말한다.
에게 보답하는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작품이 있는데 한해 곡식의 풍년에 대해 술로써 신명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새문이란 謝文과 같다. 賽란『說文解字』에 ‘賽는 報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확장되어 제물을 갖추어 신에게 드린다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과장되고 미화되어 있다. 賽라고도 한다.
23) 贊饗文
道家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東皇太一 東皇太一 : 고대전설상의 天神.
의 신 혹은 北帝 北帝 : 북방을 담당한 神.
明堂 明堂 : 고대 제왕들이 정치나 가르침을 펴던 곳.
을 위해 제사지내는 것으로 모두 도인들이 숭배하는 제사이다. 글의 내용 또한 齋, 醮등의 글과 비슷하다.
24) 告文
고(告)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아뢴다는 뜻으로, 주로 후배가 선조나 선사(先師)의 제를 지낼 때에 사용한다. 천자에게는 告廟文이 있는데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감히 천자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고문이라고만 하였다. 선인에게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한가지이다. 본래 告祖라고 이름 하였는데, 고조라고 하지 않고 범칭 한 것도 있다.
25) 盟文
『左傳』에 제후가 서로 맹약하면 약속한 말을 策에 싣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맹문이다. 맹이라 할 때 맹은 明으로 신명에게 고하는 것이다.『文心雕龍』에「祝盟」편이 있는데 맹문과 축맹 두 가지는 본래 같은 것이 아니었으나 약속을 진술하는 용도는 다르지 않다.
26) 誓文
誓의 문체는『尙書』에 자주 보인다. 신명에게 고하는 것은 맹문과 같다. 盟은 동등한 나라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誓는 아랫사람들과 약속할 때 쓰이는 것이 조금 다르다.
27) 靑詞
齋나 醮에 쓰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짓기 시작하여 송나라 사람 문집 가운데 자주 보인다. 嘉靖 嘉靖 : 明나라 世宗의 연호로 1522년-1566년까지 시기이다.
연간에 도교가 성행하자 천자가 뜻을 오로지하여 도를 닦으니, 당시에 글 짓는 신하들이 다투어 이 문체로 윗사람의 뜻을 따랐다. 청사라고 한 것은 푸른 종이에 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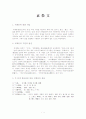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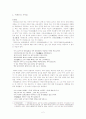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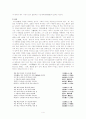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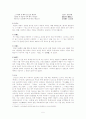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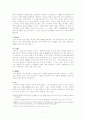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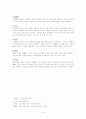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