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886~1945년 근대의 새벽
2. 1945~1980년 보릿고개를 넘어
3. 1980~2002년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2. 1945~1980년 보릿고개를 넘어
3. 1980~2002년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본문내용
화’라는 흐름과 함께 광고는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미지가 우선시되고 서사구조가 파괴된 광고가 등장했다. 이 시기에는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게 좀더 자유분방한 소비문화와 서구문화가 접목되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으며, 김건모의 랩과 힙합등도 자연스레 우리 문화로 편입되었다.
1990년대 초반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시도되던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 변혁은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부정치가 마침내 종결되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 WTO체제에 참여하는 등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고 대부분의 시장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이러한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대안적 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대중문화, 고급문화, 민중문화 등 다양한 문화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뒤섞이는 현상이 후기산업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포스트모던의 논리는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기성세대와 기존의 틀에 대한 거부의 X와 자기 개성이 강해 기성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를 X세대로 정의하며 광고에서는 ‘나’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았다. ‘신세대’ ‘감성세대’ 등의 용어를 외치는 광고도 많았고 패션을 주장하는 광고가 많았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 지구적인 문화현상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문화적 지체나 시차없이 그 어느 사회보다 포스트모던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공간의 해체, 주체의 소멸, 의미의 해체, 향수와 복고 등의 포스트모던 현상의 특질은 미국 사회만큼 빠르게 한국 사회에 침윤되기 시작했다. 신세대, X세대를 이어 인터넷과 이동통신 산업은 N세대라는 신종족을 만들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돈 댑스콧은이라는 책에서 컴퓨터 시대의 세례를 받은 N세대가 21세기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N세대라 불리는 이 종족들은 디지털 세대를 일컫는다. 1990년대 후반, IMF를 숨가프게 넘어가던 시점에서도 광고계는 PCS와 셀룰러폰의 치열한 광고전을 벌였으며, 숱한 유행어를 만들며 광고업계의 매출고를 올렸다.
우리는 바야흐로 매체가 생활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들 매체는 개인주의 사회의 단면을 부각하고 우리 언어습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매체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광고에서의 매체환경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음을 또한 광고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MF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고달팠던 시절, 아련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광고에서도 복고풍의 광고가 유행하게 된다. 그후 2000년대 광고는 동서고금의 문화를 합성해 나가는 키치나 하이브리드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네티즌이 형성되었다. 네티즌의 힘은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와 길거리 응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다른 얼굴인 보보스족도 벤처열풍을 통해 부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고의 시대이다.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가 아니더라도 집 밖을 나서면 어디서나 광고와 동영상이 무차별 난사되는 ‘영상폭격시대’가 열렸다. 거리를 지나노라면 거대한 전광판에서부터 작은 교통안내 전광판, 거리의 포스터와 전단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매체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와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광고를 보여준다. 당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비자와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광고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휘황한 소비의 낙원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시도되던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 변혁은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부정치가 마침내 종결되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 WTO체제에 참여하는 등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고 대부분의 시장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이러한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대안적 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대중문화, 고급문화, 민중문화 등 다양한 문화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뒤섞이는 현상이 후기산업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포스트모던의 논리는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기성세대와 기존의 틀에 대한 거부의 X와 자기 개성이 강해 기성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를 X세대로 정의하며 광고에서는 ‘나’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았다. ‘신세대’ ‘감성세대’ 등의 용어를 외치는 광고도 많았고 패션을 주장하는 광고가 많았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 지구적인 문화현상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문화적 지체나 시차없이 그 어느 사회보다 포스트모던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공간의 해체, 주체의 소멸, 의미의 해체, 향수와 복고 등의 포스트모던 현상의 특질은 미국 사회만큼 빠르게 한국 사회에 침윤되기 시작했다. 신세대, X세대를 이어 인터넷과 이동통신 산업은 N세대라는 신종족을 만들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돈 댑스콧은
우리는 바야흐로 매체가 생활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들 매체는 개인주의 사회의 단면을 부각하고 우리 언어습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매체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광고에서의 매체환경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음을 또한 광고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MF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고달팠던 시절, 아련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광고에서도 복고풍의 광고가 유행하게 된다. 그후 2000년대 광고는 동서고금의 문화를 합성해 나가는 키치나 하이브리드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네티즌이 형성되었다. 네티즌의 힘은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와 길거리 응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다른 얼굴인 보보스족도 벤처열풍을 통해 부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고의 시대이다.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가 아니더라도 집 밖을 나서면 어디서나 광고와 동영상이 무차별 난사되는 ‘영상폭격시대’가 열렸다. 거리를 지나노라면 거대한 전광판에서부터 작은 교통안내 전광판, 거리의 포스터와 전단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매체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와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광고를 보여준다. 당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비자와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광고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휘황한 소비의 낙원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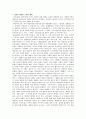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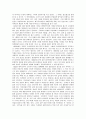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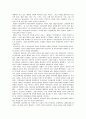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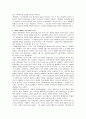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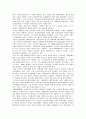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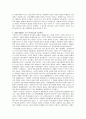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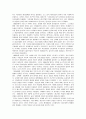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