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였다. 독자적 권력을 분점한 영주나 국왕의 지배를 벗어난 토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鄭道傳이 “人君無私藏”(?朝鮮經國典?)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국왕은 국가재정과 별도로 자신의 재산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이념하에서 인민과 토지에 대해서 수취했다. 조선왕조의 국왕은 동의를 구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의 중추원이 국왕의 과세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 적어도 어느 한 신분이라도 대표해,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한제국은 그 이전 조선왕조의 국왕이 그러했듯 아무런 동의가 필요없이 과세를 할 수 있었다. 사법, 행정, 군사, 재정, 외교 등 국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분할되지 않는 권력이 국왕 일신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대한제국의 ‘국제’를 전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전 조선왕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그렇게 전제적임을 명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다. 황실재정의 팽창은 이러한 대한제국 ‘국제’의 전제적 권력구조의 재정적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황실재정을 문제로 삼는 것은 근대국가의 초보적 조건이 통치자의 재정과 국가재정의 경계를 명확히 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함으로써 통치자의 전제를 방지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근대국가인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청와대가 한국은행을 지배해 화폐를 남발하고 재정경제부 관할의 국가재원을 집중해 “국토개발계획”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두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태진 교수는 “대한제국은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고종의 근대화 사업을 조기에 박멸하려는 일제의 계략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김재호 교수의 주장은 “고종은 왕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근대 경제성장은 고종시대가 아닌 식민지시기에 시작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상반된 논리를 가진 내재적 발전론의 민족주의적 경향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통계의존적 연구방식, 어느 하나만으로 시대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시대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오늘의 역사진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
두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태진 교수는 “대한제국은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고종의 근대화 사업을 조기에 박멸하려는 일제의 계략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김재호 교수의 주장은 “고종은 왕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근대 경제성장은 고종시대가 아닌 식민지시기에 시작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상반된 논리를 가진 내재적 발전론의 민족주의적 경향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통계의존적 연구방식, 어느 하나만으로 시대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시대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오늘의 역사진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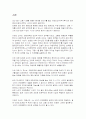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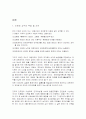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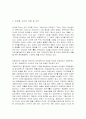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