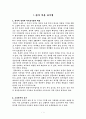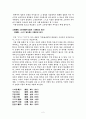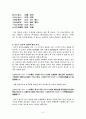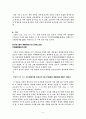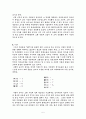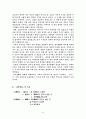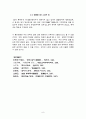목차
Ⅰ.한자 차용 표기법
1. 한자의 정착과 차자표기법의 배경
2. 고유명사의 표기
3. 誓記式 표기와 語順에 대한 인식
4. 吏讀
5. 口訣
6. 鄕札
Ⅱ. 훈민정음
1.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배경
2. 「훈민정음」의 이
1. 한자의 정착과 차자표기법의 배경
2. 고유명사의 표기
3. 誓記式 표기와 語順에 대한 인식
4. 吏讀
5. 口訣
6. 鄕札
Ⅱ. 훈민정음
1.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배경
2. 「훈민정음」의 이
본문내용
들어졌다.
창제 동기를 보면, 세종이 널리 백성을 위하고 동정하여, 유익하고 빛나는 많은 사업을 이룩한 것은 그가 항상 궁 안에 있으면서도 국민 생활의 실정을 살피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중 새 문자의 창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거룩한 업적임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큰 사업이 결코 단시일에 이룩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운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는 문헌 기록이 빈약하여, 도저히 해명할 도리가 없다. 다만, 세종 16년(1434 A. D.)에 「三綱行實」이란 책을 펴면서 내린 하교문 내용을 보면 왕으로써 무식한 백성을 교도하기 위하여 여간 애쓰지 않았던 것이다. 글 모르는 이에게 시각을 통하여 이해시키도록 그림을 널는 방안을 고안한 점으로 보아도, 그 고초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에 충분히 수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도로 국민에게 골고루 알게 할까 하는 궁리는 부단히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새 글자 창제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쓰여왔다고 여겨지는 이두나 구결이란 것이 있었으나, 구결은 본래 한무의 구두를 떼는데 쓰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 편법에 지나지 않았고, 이두는 비록 우리말을 표시함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적을 수 없었으며, 그 표기법의 일원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를 경과함에 따라, 그 원음과 원 뜻을 잃어버려 이해가 힘들었으며, 설사 이두로써 족하다 할지라도 우민에게 한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꺽꺽하고 막히어 능히 뜻대로 통달하지 못하는 문자생활의 편의를 타개하려는 방도의 모색은 일찍부터 태동하였을 것이다. 필경은 한자를 안쓰고, 어떠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새로운 글자의 출현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처지였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조가 세종조에 등어서, 훨씬 농후해지고 무르익어서 드디어 세종 25년 12월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보다 20개월 전인 세종 24년 3월에 이미 「용비어천가」 편찬을 위한 撰者의 준비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 <세종실록 권95>도 새 문자 창제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새 문자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을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문자혁명이 일어날 필연적인 당시의 문자생활의 실정을 확인하고, 창제의 기운이 세종 16년 경에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시기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불가피한 환경에서 새 글자는 배태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자생활의 불편을 배제하려는 거룩한 동기에서 새 글자가 이룩되어, 「訓民正音」이란 이름으로 공포되었고, 이것은 또한 같은 이름의 책으로도 편찬되어 나온 것이다.
2. 「훈민정음」의 이본
(1)解例本 … 漢文本 : 故 전형필씨 소장본
a. 漢文本 a. 解例本의 권두에 실린 것
b. 世宗實錄(권113)본
(2)例義本 b. 國譯本 月印釋譜의 권두에 실린 것.
故 박승빈씨 소장본
日本 宮內省本
日本 金澤莊三郞 소장본 등.
(1)의 해례본은 약 500년동안이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40년에야 발견되었다. 이 원본은 당시 경상북도에 살고 있던 李漢烋(1880∼1950)씨의 世傳家寶로 묻혀 있었는데 골동품 수집가인 전영필씨에게 넘겨짐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의 글에 대한 염원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글을 필요로 했던 열망과 필요, 우민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않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세종의 은공 이와 같은 요인에서 우리는 훈민정음의 탄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필요에서 나온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안병희·이광호, 「중세 국어 문법론」, 학연사, 1990.
金鍾塤외, 「韓國語의 歷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金享奎, 「국어사개요」, 일조각, 1997.
유창균,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1993.
안병희,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김민수, 『훈민정음 해제』 (한글121호, 한글학회, 1957.)
창제 동기를 보면, 세종이 널리 백성을 위하고 동정하여, 유익하고 빛나는 많은 사업을 이룩한 것은 그가 항상 궁 안에 있으면서도 국민 생활의 실정을 살피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중 새 문자의 창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거룩한 업적임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큰 사업이 결코 단시일에 이룩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운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는 문헌 기록이 빈약하여, 도저히 해명할 도리가 없다. 다만, 세종 16년(1434 A. D.)에 「三綱行實」이란 책을 펴면서 내린 하교문 내용을 보면 왕으로써 무식한 백성을 교도하기 위하여 여간 애쓰지 않았던 것이다. 글 모르는 이에게 시각을 통하여 이해시키도록 그림을 널는 방안을 고안한 점으로 보아도, 그 고초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에 충분히 수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도로 국민에게 골고루 알게 할까 하는 궁리는 부단히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새 글자 창제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쓰여왔다고 여겨지는 이두나 구결이란 것이 있었으나, 구결은 본래 한무의 구두를 떼는데 쓰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 편법에 지나지 않았고, 이두는 비록 우리말을 표시함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적을 수 없었으며, 그 표기법의 일원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를 경과함에 따라, 그 원음과 원 뜻을 잃어버려 이해가 힘들었으며, 설사 이두로써 족하다 할지라도 우민에게 한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꺽꺽하고 막히어 능히 뜻대로 통달하지 못하는 문자생활의 편의를 타개하려는 방도의 모색은 일찍부터 태동하였을 것이다. 필경은 한자를 안쓰고, 어떠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새로운 글자의 출현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처지였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조가 세종조에 등어서, 훨씬 농후해지고 무르익어서 드디어 세종 25년 12월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보다 20개월 전인 세종 24년 3월에 이미 「용비어천가」 편찬을 위한 撰者의 준비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 <세종실록 권95>도 새 문자 창제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새 문자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을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문자혁명이 일어날 필연적인 당시의 문자생활의 실정을 확인하고, 창제의 기운이 세종 16년 경에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시기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불가피한 환경에서 새 글자는 배태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자생활의 불편을 배제하려는 거룩한 동기에서 새 글자가 이룩되어, 「訓民正音」이란 이름으로 공포되었고, 이것은 또한 같은 이름의 책으로도 편찬되어 나온 것이다.
2. 「훈민정음」의 이본
(1)解例本 … 漢文本 : 故 전형필씨 소장본
a. 漢文本 a. 解例本의 권두에 실린 것
b. 世宗實錄(권113)본
(2)例義本 b. 國譯本 月印釋譜의 권두에 실린 것.
故 박승빈씨 소장본
日本 宮內省本
日本 金澤莊三郞 소장본 등.
(1)의 해례본은 약 500년동안이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40년에야 발견되었다. 이 원본은 당시 경상북도에 살고 있던 李漢烋(1880∼1950)씨의 世傳家寶로 묻혀 있었는데 골동품 수집가인 전영필씨에게 넘겨짐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의 글에 대한 염원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글을 필요로 했던 열망과 필요, 우민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않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세종의 은공 이와 같은 요인에서 우리는 훈민정음의 탄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필요에서 나온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안병희·이광호, 「중세 국어 문법론」, 학연사, 1990.
金鍾塤외, 「韓國語의 歷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金享奎, 「국어사개요」, 일조각, 1997.
유창균,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1993.
안병희,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김민수, 『훈민정음 해제』 (한글121호, 한글학회, 1957.)
추천자료
 [인본주의이론][매슬로우 욕구이론][매슬로우][욕구]인본주의이론의 배경, 인본주의이론의 특...
[인본주의이론][매슬로우 욕구이론][매슬로우][욕구]인본주의이론의 배경, 인본주의이론의 특... [비즈쿨]비즈쿨(창업교육, BizCool)의 출현배경, 비즈쿨(창업교육, BizCool)의 의의와 중요성...
[비즈쿨]비즈쿨(창업교육, BizCool)의 출현배경, 비즈쿨(창업교육, BizCool)의 의의와 중요성... [영어펜팔]영어펜팔(penpal)의 등장배경, 영어펜팔(penpal)의 준비와 영어펜팔(penpal)의 효...
[영어펜팔]영어펜팔(penpal)의 등장배경, 영어펜팔(penpal)의 준비와 영어펜팔(penpal)의 효... 브루너교수학습이론(발견학습) 의의, 브루너교수학습이론(발견학습) 이론적 배경, 브루너교수...
브루너교수학습이론(발견학습) 의의, 브루너교수학습이론(발견학습) 이론적 배경, 브루너교수... 현장연구 보고서의 의미와 특징, 현장연구 보고서의 체제, 현장연구 보고서의 서론 항목, 현...
현장연구 보고서의 의미와 특징, 현장연구 보고서의 체제, 현장연구 보고서의 서론 항목, 현... 인간과심리 1A)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해 논하시오 (이론적배경,주요개념,이론고찰,시...
인간과심리 1A)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해 논하시오 (이론적배경,주요개념,이론고찰,시... [국제인수합병전략] 국제 M&A의 개념과 효과, 역사, 배경, 실패요인과 사례, 동기, 종류
[국제인수합병전략] 국제 M&A의 개념과 효과, 역사, 배경, 실패요인과 사례, 동기, 종류 해결중심가족치료의 발달배경, 주요개념, 치료기법, 치료목표...
해결중심가족치료의 발달배경, 주요개념, 치료기법, 치료목표... [비디오게임][비디오게임 개념][비디오게임 기능]비디오게임의 개념, 비디오게임의 기능, 비...
[비디오게임][비디오게임 개념][비디오게임 기능]비디오게임의 개념, 비디오게임의 기능, 비... [마임]춘천마임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의 목적, 배경, 춘천마임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의 현...
[마임]춘천마임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의 목적, 배경, 춘천마임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의 현... [금융지주회사][신용공여]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
[금융지주회사][신용공여]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 [노사갈등 해결 방안]우리은행 노사 갈등 발생배경과, 원인, 쟁점, 해결과정, 문제점, 시사점...
[노사갈등 해결 방안]우리은행 노사 갈등 발생배경과, 원인, 쟁점, 해결과정, 문제점, 시사점...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nes)의 희극 『류시스트라테 (리시스트라타, 여자의 평화 Lysistrata...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nes)의 희극 『류시스트라테 (리시스트라타, 여자의 평화 Lysistrata... 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화(legislative professionalism)의 관계 고찰 - 미국의 의정 전문화...
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화(legislative professionalism)의 관계 고찰 - 미국의 의정 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