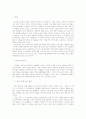목차
Ⅰ.서론
Ⅱ.출가의 양상
1. 상상 속에서의 출가
2.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출가
3. 자의에 의한 출가
4. 타의에 의한 출가
Ⅲ.결론
참고문헌
Ⅱ.출가의 양상
1. 상상 속에서의 출가
2.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출가
3. 자의에 의한 출가
4. 타의에 의한 출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들리기만 한다.
아이를 기르는 마음에 꿈이 없다는 것이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사람은 사랑과 상
처로 성숙한다고 생각해오면서도 순영이 결코 독특한 재능이나 개성을 지니기를 바라지 않
았다.
같은 책, p62
나는 정말 예쁜 딸을 원했을까. 우평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내 가슴은 다른 아이를
원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 아이하나로 온통 충만되어 이미 내 생의 온갖 꿈과 소망을 심고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식을 기르는 일에 꿈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자체가 이미
버렸다는 얘기가 아닐까
같은 책, p65
'나'는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버려진 생명을 거두어 키운다는 자부심에 가득 찼던 부부가 딸의 입양 사실을 밝히며 우려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가 가족이 아니라는 낯설음에 방황하는 것보다 부부가 우평이만큼, 친자식만큼 입양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서 살펴본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① 정상적인 가족구성과 평온한 가정.
② 불행한 과거의 구체적 사건.
③ 과거의 사건에 휘말려 변해버린 현재.
④ 사건에서 파생된 구체적 문제점.
⑤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출가'.
⑥ '출가'중에 만나게 되는 부정적 자아.
⑦ 부정적 자아의 모습을 발견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
이 작품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출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출가가 그 수위와 형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타의에 의해 강요된 출가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강요된 출가에서 자신이 그 동안 처해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부정적 상황을 이해하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출가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자신을 비극적으로 인식한다.
Ⅲ.결론
오정희 소설에는 출가가 등장한다. 인물들의 행위의 성향에 따라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와 일반적 양상의 출가로 나뉠 수 있다.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물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인물들은 억압기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외부를 향한 적의로 표현된다. 그래서 인물들은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를 행위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출가를 실제 행위로 옮겼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상상 속에서의 출가'는 행위를 실행하려했고, 실제로 행위에 옮겼지만 미수에 그친다. 인물이 행위를 시도했지만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출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은 반복적인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출가'에서는 인물이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출가를 실행하였고, 마지막에 이르러 외부세계로 적의를 크게 표출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성공시킨다. 행위의 성공으로 일시적인 욕망의 실현을 맛보았으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궁극적인 자아의 실현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물들은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인물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실패 감을 맛볼 때 순간적으로나마 닫혀있던 인물들에게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양상인 일반적 양상의 출가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것이 과연 일탈적 행위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일반적 양상을 띤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유형의 출가는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의에 의한 출가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신의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고 바깥으로 나가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탈이 소극적으로 발생하고 그 것 역시 현실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정도의 사건이 되고 만다. 인물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것은 인물이 다시금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출가이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의에 의한 출가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출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적 상황에 부딪혀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가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띤다. 하지만 출가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출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처럼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의 공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일상의 공간을 갈망한다. 그 것은 적의를 가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행위를 성공시키느냐, 가정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느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의 기준으로 나누어 작품을 해석해볼 수 있다. 본고는 현존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오정희 작품 전체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작품을 다양한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앞으로 오정희 작가의 작품을 더욱 다양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오정희, 『바람의 넋』, 문학과 지성사, 1986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 지성사, 1998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 지성사, 2003
-연구논문-
김미연,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외출'모티프 연구." 석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01
남혜란, "오정희 소설의 공간 연구.", 석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노희준, "오정희 소설연구 - 시,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성현자,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 제 4집,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8
이여진,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억압기제 연구."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2
이정선,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자아탐색", 석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아이를 기르는 마음에 꿈이 없다는 것이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사람은 사랑과 상
처로 성숙한다고 생각해오면서도 순영이 결코 독특한 재능이나 개성을 지니기를 바라지 않
았다.
같은 책, p62
나는 정말 예쁜 딸을 원했을까. 우평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내 가슴은 다른 아이를
원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 아이하나로 온통 충만되어 이미 내 생의 온갖 꿈과 소망을 심고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식을 기르는 일에 꿈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자체가 이미
버렸다는 얘기가 아닐까
같은 책, p65
'나'는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버려진 생명을 거두어 키운다는 자부심에 가득 찼던 부부가 딸의 입양 사실을 밝히며 우려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가 가족이 아니라는 낯설음에 방황하는 것보다 부부가 우평이만큼, 친자식만큼 입양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서 살펴본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① 정상적인 가족구성과 평온한 가정.
② 불행한 과거의 구체적 사건.
③ 과거의 사건에 휘말려 변해버린 현재.
④ 사건에서 파생된 구체적 문제점.
⑤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출가'.
⑥ '출가'중에 만나게 되는 부정적 자아.
⑦ 부정적 자아의 모습을 발견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
이 작품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출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출가가 그 수위와 형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타의에 의해 강요된 출가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강요된 출가에서 자신이 그 동안 처해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부정적 상황을 이해하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출가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자신을 비극적으로 인식한다.
Ⅲ.결론
오정희 소설에는 출가가 등장한다. 인물들의 행위의 성향에 따라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와 일반적 양상의 출가로 나뉠 수 있다.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물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인물들은 억압기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외부를 향한 적의로 표현된다. 그래서 인물들은 반사회적 양상의 출가를 행위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출가를 실제 행위로 옮겼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상상 속에서의 출가'는 행위를 실행하려했고, 실제로 행위에 옮겼지만 미수에 그친다. 인물이 행위를 시도했지만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출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은 반복적인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출가'에서는 인물이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출가를 실행하였고, 마지막에 이르러 외부세계로 적의를 크게 표출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성공시킨다. 행위의 성공으로 일시적인 욕망의 실현을 맛보았으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궁극적인 자아의 실현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물들은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인물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실패 감을 맛볼 때 순간적으로나마 닫혀있던 인물들에게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양상인 일반적 양상의 출가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것이 과연 일탈적 행위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일반적 양상을 띤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유형의 출가는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의에 의한 출가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신의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고 바깥으로 나가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탈이 소극적으로 발생하고 그 것 역시 현실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정도의 사건이 되고 만다. 인물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것은 인물이 다시금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출가이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의에 의한 출가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출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적 상황에 부딪혀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가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띤다. 하지만 출가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출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처럼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의 공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일상의 공간을 갈망한다. 그 것은 적의를 가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행위를 성공시키느냐, 가정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느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의 기준으로 나누어 작품을 해석해볼 수 있다. 본고는 현존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오정희 작품 전체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작품을 다양한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앞으로 오정희 작가의 작품을 더욱 다양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오정희, 『바람의 넋』, 문학과 지성사, 1986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 지성사, 1998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 지성사, 2003
-연구논문-
김미연,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외출'모티프 연구." 석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01
남혜란, "오정희 소설의 공간 연구.", 석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노희준, "오정희 소설연구 - 시,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성현자,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 제 4집,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8
이여진,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억압기제 연구."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2
이정선,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자아탐색", 석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