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형상의 변형
1. 문자도의 변형
2. 연화도의 변형
3. 책거리그림의 구성적 표현
Ⅲ. 관계의 변형
1. 장르의 조합
2. 관계의 새로운 인식
Ⅳ. 상징과 설화의 결합
Ⅴ. 의인화 경향
Ⅵ. 맺음말
Ⅱ. 형상의 변형
1. 문자도의 변형
2. 연화도의 변형
3. 책거리그림의 구성적 표현
Ⅲ. 관계의 변형
1. 장르의 조합
2. 관계의 새로운 인식
Ⅳ. 상징과 설화의 결합
Ⅴ. 의인화 경향
Ⅵ. 맺음말
본문내용
띠고 있다. 특히 오방신상, 삼불제석, 부처님 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상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불제석의 경우 부처의 상으로 그려지기도 하나 고깔모자를 쓴 스님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1800년대 서울에서 제작된 삼불제석의 경우는 적, 녹색의 옷도 아니고 아예 흰색의 가사에 빨간 안감과 주황색과 녹색의 허리띠를 매고 있고, 고깔도 투명하여 민머리가 그대로 비쳐 보인다.
대체적으로 도상이 일정치 않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얼굴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대개 5등신의 몸매에 얼굴이 유난히 크다. 이는 장승과 같은 다른 민간미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불화에서처럼 중요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표현되어 있다. 중요한 신은 크게 그리고 부수적인 신은 작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불화와 비교하여 볼 때, 신상의 자세가 비교적 점잖다고 할 정도로 정적이다. 무속화에서는 불화의 보살상과 같은 요염한 자세가 표현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대변해 준다. 이러한 점들이 그나마 무속화에서 지켜지는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만큼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은 미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인간상과 불화상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형상을 지닌 무속화도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내왓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1966년 제주대학교박물관으로 옮겨 온 무신도이다. 이것은 옛날에 제주 목사가 내왓당에 모셔두고 제를 지내던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것 외에는 무신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속화는 신병을 통해 신의 실재를 체험한 강신무가 봉안한다. 때문에 무속화는 강신무가 분포하는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제작되고 세습무가 분포하는 남부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제주도 무신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외에 속한다. 다만 무당이 아닌 목사가 봉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예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신 제주도에서는 신상을 그림이 아닌 돌로 조각한 석상이 많이 보인다. 내왓당 무속화는 고졸하면서도 위엄이 서려있다. 원색의 색채와 둥굴둥굴한 형상으로 묘한 동감이 표현되었는다. 표현은 평면적이지만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와 우락부락한 손에서 강인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기발한 형상이 갑자기 외딴 섬 제주도에서 나타났는가 의문을 가질 텐데, 무신당의 석상을 보면 어느 정도 그 형상의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석상은 거의 다듬지 않은 조그만 돌에 간신히 눈ㆍ코ㆍ입만을 표현하여 겨우 신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자연석의 모습을 따라 그 얼굴의 형상은 자유자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내왓당 무속화의 얼굴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 거친듯한 표현 속에서 제주도만의 자유로움과 강함을 느낄 수 있다.
무속화는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무속이 인간생활과 밀착된 신앙임을 웅변하여 준다. 물론 불상에서도 각 시대와 각 지역에 걸 맞는 인간의 모습이 비친다. 그러나 이 무속화만큼 뚜렷하고 사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무속화를 통해서 종교적 신비감보다는 인간적인 친근감을 통해서 민간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민화의 상상력을 일반회화의 정형에서 변화를 추구해가는 변형의 미학에서 살펴 보았다. 상상력의 일단을 우선 형상을 자유자재로 변모시켜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자도에서 그림과 글씨의 결합, 그리고 글씨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연화도에서는 여러 길상적 상징만큼이나 다양한 표현기법이 적용되었다. 책거리그림에서는 원색의 강렬한 색채, 충실한 문양표현과 더불어 독특한 구성의 미를 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간략화 또는 복잡화를 통하여 그 변화의 묘미를 구현해나갔다.
이러한 형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상과 물상의 관계, 도상과 도상의 관계, 장르와 장르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인식과 결합을 보였다. 상상에 의한 독특한 인식의 표현이라던가 전혀 엉뚱한 것들 간의 결합 등에서 새로운 관계의 미학을 살펴 볼 수 있다. 호랑이그림은 원래 벽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자칫 딱딱하기 쉬운데 여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까치호랑이 설화를 가미하여 해학적인 그림으로 탈바꿈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리고 무속화에는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휴머니즘의 세계가 펴쳐져 있다. 신들의 형상과 관계를 인간의 것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들 무신도를 통해서 무속이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화에 보이는 상상력은 자유자재한 변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민화가들은 민화 자체의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지 못하고 일반회화의 도상에 기대어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도1 <의자도> 호암미술관소장 - 李朝の民畵 하권 306
도2 <의자도> 일본 倉敷民藝館소장 - 하권 298
도3 <의자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278
도4 <의자도> 운향미술관 - 하권 316
도5 <의자도> 일본 民藝館소장 - 하권 230
도6 <의자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219
도7 <의자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240
도8 <연화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269
도9 <연화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256
도10 <연화도> 일본 益子參考館소장 - 상권 251
도11 <연화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49
도12 <연화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50
도13 <이어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47
도14 <문방구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174
도15 <책거리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183
도16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171
도17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202
도18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196
도19 <사당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168
도20 <행락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184
도21 <극락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191
도22 <금강산도> 에밀레박물관소장 - 하권 118
도23 <까치호랑이> 호암미술관소장 - 하권 3
도24 <까치호랑이> 운향미술관소장 - 하권 5
대체적으로 도상이 일정치 않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얼굴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대개 5등신의 몸매에 얼굴이 유난히 크다. 이는 장승과 같은 다른 민간미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불화에서처럼 중요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표현되어 있다. 중요한 신은 크게 그리고 부수적인 신은 작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불화와 비교하여 볼 때, 신상의 자세가 비교적 점잖다고 할 정도로 정적이다. 무속화에서는 불화의 보살상과 같은 요염한 자세가 표현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대변해 준다. 이러한 점들이 그나마 무속화에서 지켜지는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만큼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은 미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인간상과 불화상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형상을 지닌 무속화도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내왓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1966년 제주대학교박물관으로 옮겨 온 무신도이다. 이것은 옛날에 제주 목사가 내왓당에 모셔두고 제를 지내던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것 외에는 무신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속화는 신병을 통해 신의 실재를 체험한 강신무가 봉안한다. 때문에 무속화는 강신무가 분포하는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제작되고 세습무가 분포하는 남부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제주도 무신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외에 속한다. 다만 무당이 아닌 목사가 봉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예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신 제주도에서는 신상을 그림이 아닌 돌로 조각한 석상이 많이 보인다. 내왓당 무속화는 고졸하면서도 위엄이 서려있다. 원색의 색채와 둥굴둥굴한 형상으로 묘한 동감이 표현되었는다. 표현은 평면적이지만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와 우락부락한 손에서 강인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기발한 형상이 갑자기 외딴 섬 제주도에서 나타났는가 의문을 가질 텐데, 무신당의 석상을 보면 어느 정도 그 형상의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석상은 거의 다듬지 않은 조그만 돌에 간신히 눈ㆍ코ㆍ입만을 표현하여 겨우 신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자연석의 모습을 따라 그 얼굴의 형상은 자유자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내왓당 무속화의 얼굴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 거친듯한 표현 속에서 제주도만의 자유로움과 강함을 느낄 수 있다.
무속화는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무속이 인간생활과 밀착된 신앙임을 웅변하여 준다. 물론 불상에서도 각 시대와 각 지역에 걸 맞는 인간의 모습이 비친다. 그러나 이 무속화만큼 뚜렷하고 사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무속화를 통해서 종교적 신비감보다는 인간적인 친근감을 통해서 민간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민화의 상상력을 일반회화의 정형에서 변화를 추구해가는 변형의 미학에서 살펴 보았다. 상상력의 일단을 우선 형상을 자유자재로 변모시켜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자도에서 그림과 글씨의 결합, 그리고 글씨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연화도에서는 여러 길상적 상징만큼이나 다양한 표현기법이 적용되었다. 책거리그림에서는 원색의 강렬한 색채, 충실한 문양표현과 더불어 독특한 구성의 미를 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간략화 또는 복잡화를 통하여 그 변화의 묘미를 구현해나갔다.
이러한 형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상과 물상의 관계, 도상과 도상의 관계, 장르와 장르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인식과 결합을 보였다. 상상에 의한 독특한 인식의 표현이라던가 전혀 엉뚱한 것들 간의 결합 등에서 새로운 관계의 미학을 살펴 볼 수 있다. 호랑이그림은 원래 벽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자칫 딱딱하기 쉬운데 여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까치호랑이 설화를 가미하여 해학적인 그림으로 탈바꿈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리고 무속화에는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휴머니즘의 세계가 펴쳐져 있다. 신들의 형상과 관계를 인간의 것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들 무신도를 통해서 무속이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화에 보이는 상상력은 자유자재한 변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민화가들은 민화 자체의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지 못하고 일반회화의 도상에 기대어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도1 <의자도> 호암미술관소장 - 李朝の民畵 하권 306
도2 <의자도> 일본 倉敷民藝館소장 - 하권 298
도3 <의자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278
도4 <의자도> 운향미술관 - 하권 316
도5 <의자도> 일본 民藝館소장 - 하권 230
도6 <의자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219
도7 <의자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240
도8 <연화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269
도9 <연화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256
도10 <연화도> 일본 益子參考館소장 - 상권 251
도11 <연화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49
도12 <연화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50
도13 <이어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247
도14 <문방구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174
도15 <책거리도> 한국 개인소장 - 하권 183
도16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171
도17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202
도18 <책거리도> 일본 개인소장 - 하권 196
도19 <사당도> 일본 개인소장 - 상권 168
도20 <행락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184
도21 <극락도> 한국 개인소장 - 상권 191
도22 <금강산도> 에밀레박물관소장 - 하권 118
도23 <까치호랑이> 호암미술관소장 - 하권 3
도24 <까치호랑이> 운향미술관소장 - 하권 5
추천자료
 [김환기의 회화 미술][장우성의 회화 미술][박수근의 회화 미술][유영국의 회화 미술][회화][...
[김환기의 회화 미술][장우성의 회화 미술][박수근의 회화 미술][유영국의 회화 미술][회화][...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의 학년별 내용,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의 통일교육과 안전교...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의 학년별 내용,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의 통일교육과 안전교...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개념,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발달배경, 학문기초미술교육(DBAE...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개념,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발달배경, 학문기초미술교육(DBAE... [미술교육]미술교육의 의의, 미술교육의 동향, 미술교육의 대학미술교육, 미술교육의 창의성...
[미술교육]미술교육의 의의, 미술교육의 동향, 미술교육의 대학미술교육, 미술교육의 창의성... [추상미술 화가][김환기][남관][유영국][칸딘스키][파블로 피카소]추상미술 화가 김환기, 추...
[추상미술 화가][김환기][남관][유영국][칸딘스키][파블로 피카소]추상미술 화가 김환기, 추... [미술비평감상교육][신문활용교육][NIE]미술비평감상교육의 중요성, 미술비평감상교육의 단계...
[미술비평감상교육][신문활용교육][NIE]미술비평감상교육의 중요성, 미술비평감상교육의 단계... [추상미술][수화 김환기][추상미술 배경][수화 김환기 추상미술][수화 김환기 평가]추상미술 ...
[추상미술][수화 김환기][추상미술 배경][수화 김환기 추상미술][수화 김환기 평가]추상미술 ... [불교][미술][조각][공예][건축][불교미술][불교조각][불교공예][불교건축]불교미술, 불교조...
[불교][미술][조각][공예][건축][불교미술][불교조각][불교공예][불교건축]불교미술, 불교조... [민중미술][민중미술 변천][민중미술과 미술운동][민중미술 예술적 성과][민중미술 문제점]민...
[민중미술][민중미술 변천][민중미술과 미술운동][민중미술 예술적 성과][민중미술 문제점]민... [환경미술][학교환경미술][환경디자인교육]환경미술의 개념, 환경미술의 연혁, 환경미술의 창...
[환경미술][학교환경미술][환경디자인교육]환경미술의 개념, 환경미술의 연혁, 환경미술의 창... DBAE(학문기초미술교육)의 특징과 이론적 배경, DBAE(학문기초미술교육)의 기본 전제와 내용,...
DBAE(학문기초미술교육)의 특징과 이론적 배경, DBAE(학문기초미술교육)의 기본 전제와 내용,... [미술치료사][미술치료사의 역할][미술치료사의 자질][미술치료사의 자격증취득과정]미술치료...
[미술치료사][미술치료사의 역할][미술치료사의 자질][미술치료사의 자격증취득과정]미술치료... 미술교육의 성격, 미술교육의 목표, 미술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성격, 미술교육의 목표, 미술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미술과(미술교육, 미술수업)의 특성과 목표, 미술과(미술교육, 미술수업)의 기능과 내용, 미...
미술과(미술교육, 미술수업)의 특성과 목표, 미술과(미술교육, 미술수업)의 기능과 내용,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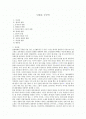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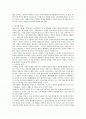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