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1. 고구려의 멸망
2. 고구려의 부흥운동
(1) 당의 고구려 지배
(2) 고구려 유민의 저항
(3) 고구려 유민의 향방
Ⅲ.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1. 백제의 멸망
2. 백제의 부흥운동
(1) 백제 부흥군 봉기의 배경
(2) 부흥운동의 전개
Ⅳ. 맺음말
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1. 고구려의 멸망
2. 고구려의 부흥운동
(1) 당의 고구려 지배
(2) 고구려 유민의 저항
(3) 고구려 유민의 향방
Ⅲ.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1. 백제의 멸망
2. 백제의 부흥운동
(1) 백제 부흥군 봉기의 배경
(2) 부흥운동의 전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진으로 옮기고, 신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계속된 당의 청병으로 신라는 김흠 등을 보내어 주류성을 치게 하였으나, 복신에게 대패하여 돌아오니, 남방의 여러 성이 복신에게 귀속하게 되었다.
백제 부흥군의 이러한 힘은 고구려의 간접적인 후원에도 힘입은 바 크다. 고구려는 백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11월 1일에 신라의 七重城(적성)을 공격하고 이듬해 5월에 술천성(여주)을 공격하여 백제부흥군을 뒤로 도왔다.
3) 제 3기(662, 6, ∼ 663, 11)
662년 왕에 추대된 왕자 부여풍이 일본의 원병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이에 부흥군은 한층 사기가 높아져서 적극적인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마침 당은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여 신라로 하여금 군량을 보급케 하니 백제 부흥군은 좋은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 부흥군은 금강 동쪽으로 진격하여 지나성, 급윤성, 대산책 등 신라의 북상로를 점령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을 고립시켰다. 당군은 일본의 원군이 도착하고 부흥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다시 본국에 응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 고종은 손인사에게 7천의 병력을 주어 유인원을 구원케하였다. 손인사는 663년에 덕물도를 거쳐 웅진에 도착하여 당군의 사기는 다시 진작되었다.
이 시기 백제 부흥군의 지도층에 내분이 일어났다. 먼저 복신과 도침 사이에 알력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휘하 군사들을 아울렀다. 거의 병권을 장악한 복신은 풍마저 제거하려 하다가 오히려 풍에게 살해 당하였다. 이로서 부흥군은 풍왕이 홀로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군은 내분이 일어난 기미를 알고 주류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륙교통의 요지인 加林城(성림천 성여산성)에 주둔한 강력한 백제군을 그대로 두고 주류성 공격을 결정하였다.
유인궤의 수군은 도중에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진격하다가 백강입구에서 왜군과 부딪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때 일본의 병선 4백여 척을 불태웠다. 이 싸움에서 일본의 응원부대는 거의 전멸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백제군의 사기는 죽고 말았다. 풍왕은 더 주류성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이어 주류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북부의 거점인 임존성만은 지수신이란 장수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성읍들이 주류성의 함락과 동시에 항복하고 말았으므로 임존성은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존성을 근거로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 등이 항복하자 신라는 그들을 회유하여 임존성 공격에 투입하여 결국 임존성도 함락되고 말았다. 이로서 4년에 걸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Ⅳ. 맺음말
이번에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나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국사 교과서에는 신라의 통일 부분에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 부분이 조그맣게 나온다. 그 때의 나에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저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 중심으로 쓰여지기 마련이고 공정해야할 국사교과서 또한 통일 후 계속 왕조를 이어가는 신라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사를 배우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이 빨리 진압되고 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독특한 발상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며,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천차만별로 생각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바람직한 안목을 심어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에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명맥을 잇고자 오열하던 군중의 함성, 그 강인한 생명력, 흐트러진 역사의 끝머리에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보려는 창조의식 등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를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사람들의 시각과는 아주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나는 또 한번 나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며 학업에의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에 대한 조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무엇보다 뜻깊은 공부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김갑주,〈高句麗의 滅亡과 復興運動〉,《統一期의 新羅社會硏究》,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김용만,《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8
노중국,《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심정보,〈백제의 부흥운동〉,《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5
임기환,《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백제 부흥군의 이러한 힘은 고구려의 간접적인 후원에도 힘입은 바 크다. 고구려는 백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11월 1일에 신라의 七重城(적성)을 공격하고 이듬해 5월에 술천성(여주)을 공격하여 백제부흥군을 뒤로 도왔다.
3) 제 3기(662, 6, ∼ 663, 11)
662년 왕에 추대된 왕자 부여풍이 일본의 원병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이에 부흥군은 한층 사기가 높아져서 적극적인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마침 당은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여 신라로 하여금 군량을 보급케 하니 백제 부흥군은 좋은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 부흥군은 금강 동쪽으로 진격하여 지나성, 급윤성, 대산책 등 신라의 북상로를 점령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을 고립시켰다. 당군은 일본의 원군이 도착하고 부흥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다시 본국에 응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 고종은 손인사에게 7천의 병력을 주어 유인원을 구원케하였다. 손인사는 663년에 덕물도를 거쳐 웅진에 도착하여 당군의 사기는 다시 진작되었다.
이 시기 백제 부흥군의 지도층에 내분이 일어났다. 먼저 복신과 도침 사이에 알력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휘하 군사들을 아울렀다. 거의 병권을 장악한 복신은 풍마저 제거하려 하다가 오히려 풍에게 살해 당하였다. 이로서 부흥군은 풍왕이 홀로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군은 내분이 일어난 기미를 알고 주류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륙교통의 요지인 加林城(성림천 성여산성)에 주둔한 강력한 백제군을 그대로 두고 주류성 공격을 결정하였다.
유인궤의 수군은 도중에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진격하다가 백강입구에서 왜군과 부딪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때 일본의 병선 4백여 척을 불태웠다. 이 싸움에서 일본의 응원부대는 거의 전멸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백제군의 사기는 죽고 말았다. 풍왕은 더 주류성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이어 주류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북부의 거점인 임존성만은 지수신이란 장수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성읍들이 주류성의 함락과 동시에 항복하고 말았으므로 임존성은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존성을 근거로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 등이 항복하자 신라는 그들을 회유하여 임존성 공격에 투입하여 결국 임존성도 함락되고 말았다. 이로서 4년에 걸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Ⅳ. 맺음말
이번에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나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국사 교과서에는 신라의 통일 부분에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 부분이 조그맣게 나온다. 그 때의 나에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저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 중심으로 쓰여지기 마련이고 공정해야할 국사교과서 또한 통일 후 계속 왕조를 이어가는 신라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사를 배우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이 빨리 진압되고 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독특한 발상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며,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천차만별로 생각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바람직한 안목을 심어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에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명맥을 잇고자 오열하던 군중의 함성, 그 강인한 생명력, 흐트러진 역사의 끝머리에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보려는 창조의식 등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를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사람들의 시각과는 아주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나는 또 한번 나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며 학업에의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에 대한 조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무엇보다 뜻깊은 공부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김갑주,〈高句麗의 滅亡과 復興運動〉,《統一期의 新羅社會硏究》,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김용만,《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8
노중국,《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심정보,〈백제의 부흥운동〉,《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5
임기환,《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추천자료
 시무언(是無言) 이용도 목사 영성운동의 역사적 재발견
시무언(是無言) 이용도 목사 영성운동의 역사적 재발견 [인문과학] 노예제 폐지운동
[인문과학] 노예제 폐지운동 경건주의(Pietism) 운동
경건주의(Pietism) 운동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령 운동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령 운동 한국 불교의 역사와 흐름 -불교의 전래부터 조계종불교정화운동까지-
한국 불교의 역사와 흐름 -불교의 전래부터 조계종불교정화운동까지- 청교도 언약 사상-개혁운동의 힘 요약
청교도 언약 사상-개혁운동의 힘 요약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의 배경, 기원 및 발전과정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의 배경, 기원 및 발전과정 110301 생활 운동 시스템 (물리치료)
110301 생활 운동 시스템 (물리치료) 한국 기독교 문제로 인한 반 기독교 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 문제로 인한 반 기독교 운동에 관한 연구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조지 휘트필트 - 에큐메니칼 운동
조지 휘트필트 - 에큐메니칼 운동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운동사적 배경 고찰》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운동사적 배경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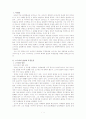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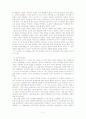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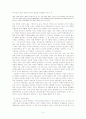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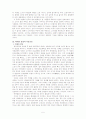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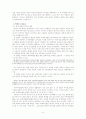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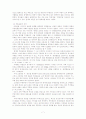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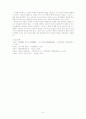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