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조들이 어떻게 자신다움의 공부를 찾아가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았다. 특히, 대학에서 그렇게 심도 있는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었다. 나는 대학이라는 책 속에는 무지 많은 양의 여러 지식의 양만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 자신을 찾기 위한 내용들이였다니 왠지 모르게 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학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넣어주고 그것을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닫고 어떤 것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착한 인간성을 깨닫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까지의 3원칙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이 학문중심으로 치달아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일상과 관련하여 그것을 보도록 해보자. 일상 속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학에 대한 것을 많이 오해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처세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교의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 이전에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인간의 자기 다짐과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제일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격물은 사물을 연구하는 일이고, 치지는 연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며, 성의는 뜻을 진실하게 품고,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은 숨겨진 체 정치적 의도로써만 만들어진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고르게 하라.’ 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학이 자신의 수양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와전되어 버린 것 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은 일상에서 쓰일 수 없는 거라고 단정 지어 버렸다. 하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유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달라진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연구와 탐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부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자는 이러한 격물치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 대학에서는 격물치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결론적 모습인 수신제가의 모습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유교의 본질인 격물치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했다. 그래서 대학에 이 ‘격물치지’에 대한 내용을 덧 붙여 설명해 놓기를 “완전한 앎에 도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라고 설명 하였다. 격물치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지식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놓치게 되는 현상이나 어떤 이들의 행동도 끝까지 파고들며 탐구해보면 어떤 지식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관찰력이나 탐구력이 부족한 탓인지 어떤 것에 진득이 붙어서 탐구하거나 관찰해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으리라고 생각된다. 주자가 말한 완전한 앎에 도달하기에 우리들은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에 주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앎이란 격물치지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학습자가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지닐 때에 그 빛을 발하여 완전한 앎의 형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상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학의 3원칙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은 자가 격물치지라는 방법을 통해 일상의 생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의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렇게 따지면 일상에서의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자가 이런 글을 쓴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공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 일 텐데 도무지 나는 대학의 심오한 그 3원칙을 이해 할 수도 없고 다가 설수도 없다. 저자는 이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던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자가 말한 공부는 무엇이고 학문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해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일상성에서의 배움을 통해 일반인들이 어떤 탐구를 한다는 것 보다는 공부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새워 놓아서 자신만의 새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꼭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되물어 보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다. 공부의 즐거움은 누군가를 괴롭혀 가며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 틀어 박혀 머리를 쥐어짜며 하는 것에서도 나오지 않고 일상을 버려가며 하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의 즐거움은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본받고, 자신 스스로 그것에 만족해하며 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불어서 그것을 이룬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공부의 즐거움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의 즐거움은 일상의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삶이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공부는 다르게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에 빙글빙글 돌아가며 머물러 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공부라는 것이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움의 어떤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지속적으로 길게 뻗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공부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돌아보라. 공부는 내가 바로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게 대한 해결을 나 스스로, 스스로가 힘들면 타인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다. 자기다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얻게 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유학에 대한 것을 많이 오해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처세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교의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 이전에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인간의 자기 다짐과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제일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격물은 사물을 연구하는 일이고, 치지는 연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며, 성의는 뜻을 진실하게 품고,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은 숨겨진 체 정치적 의도로써만 만들어진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고르게 하라.’ 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학이 자신의 수양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와전되어 버린 것 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은 일상에서 쓰일 수 없는 거라고 단정 지어 버렸다. 하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유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달라진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연구와 탐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부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자는 이러한 격물치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 대학에서는 격물치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결론적 모습인 수신제가의 모습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유교의 본질인 격물치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했다. 그래서 대학에 이 ‘격물치지’에 대한 내용을 덧 붙여 설명해 놓기를 “완전한 앎에 도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라고 설명 하였다. 격물치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지식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놓치게 되는 현상이나 어떤 이들의 행동도 끝까지 파고들며 탐구해보면 어떤 지식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관찰력이나 탐구력이 부족한 탓인지 어떤 것에 진득이 붙어서 탐구하거나 관찰해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으리라고 생각된다. 주자가 말한 완전한 앎에 도달하기에 우리들은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에 주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앎이란 격물치지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학습자가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지닐 때에 그 빛을 발하여 완전한 앎의 형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상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학의 3원칙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은 자가 격물치지라는 방법을 통해 일상의 생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의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렇게 따지면 일상에서의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자가 이런 글을 쓴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공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 일 텐데 도무지 나는 대학의 심오한 그 3원칙을 이해 할 수도 없고 다가 설수도 없다. 저자는 이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던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자가 말한 공부는 무엇이고 학문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해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일상성에서의 배움을 통해 일반인들이 어떤 탐구를 한다는 것 보다는 공부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새워 놓아서 자신만의 새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꼭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되물어 보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다. 공부의 즐거움은 누군가를 괴롭혀 가며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 틀어 박혀 머리를 쥐어짜며 하는 것에서도 나오지 않고 일상을 버려가며 하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의 즐거움은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본받고, 자신 스스로 그것에 만족해하며 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불어서 그것을 이룬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공부의 즐거움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의 즐거움은 일상의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삶이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공부는 다르게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에 빙글빙글 돌아가며 머물러 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공부라는 것이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움의 어떤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지속적으로 길게 뻗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공부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돌아보라. 공부는 내가 바로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게 대한 해결을 나 스스로, 스스로가 힘들면 타인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다. 자기다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얻게 된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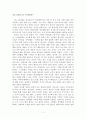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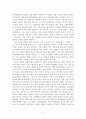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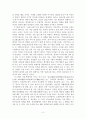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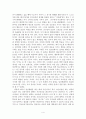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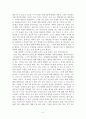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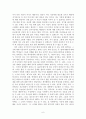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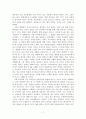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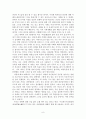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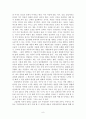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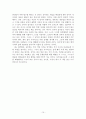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