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작자와 작품의 성격
1. 작자 연구
1) 충담사는 어떤 인물인가?
2) 충담사의 신분에 대한 연구
2. 작품 연구
1) 安民歌의 명칭에 대한 연구
2) 문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3) 종교(사상) ․ 민속적 연구
3. 배경설화 고찰
1) 배경설화
2) 배경설화 출현 경위
Ⅱ. 작품 읽기와 해석
1. 원전해석
2. 어구 풀이 및 해석상의 쟁점
3. 안민가 원문에 대한 여러 해석
1. 작자 연구
1) 충담사는 어떤 인물인가?
2) 충담사의 신분에 대한 연구
2. 작품 연구
1) 安民歌의 명칭에 대한 연구
2) 문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3) 종교(사상) ․ 민속적 연구
3. 배경설화 고찰
1) 배경설화
2) 배경설화 출현 경위
Ⅱ. 작품 읽기와 해석
1. 원전해석
2. 어구 풀이 및 해석상의 쟁점
3. 안민가 원문에 대한 여러 해석
본문내용
있는것으로보았다. \'大 \'을 \'대힝\'로써 여기서 \'대\'는 \'막대\'의 뜻이 된다.그래서 \'窟理叱大 \'은\' 구릿대힝\'로써 \'굴대\'을 뜻하면서 불교의 윤회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홍기문의 해독에 의하면 안민가는 불교적 내용의 노래로 귀결되는 특징이 있다.
) 구사회, 위의 책 p.232~237
5) 此 惡支治良羅
此는 훈독하여 \'이\'라 읽고, 는 음독하여 \'흘\'로 읽는다. 그래서 此 은 \'이흘\'로 읽을 수 있으며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이를~\'이 되는 것이다. 는 훈독하여 \'먹-\'으로 읽고, 惡은 음차 \'ㄱ\'이다. 支 역시 음차로서 \'기\'라 읽는다. 현대어로는 \'먹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治는 훈독 \'다싶-\'이고 良은 훈차 \'아\'이다. 그래서 治良羅는 \'다싶라\'라고 읽으며 뜻은 \'다스려\' 정도가 될 것이다.
6)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此地를 훈독하여 \'이힝\'로 읽었고 은 위에서와 같이 \'흘\'로 음독하였다. 捨는 훈독하여 \'빛리-\'이며 遺는 음차하여 \'고\'로 읽었다. 只 역시 음차 \'ㄱ\'이다. 그래서 捨遺只는 \'빛리곡\'이 된다. 於는 음차 \'어\'이고 冬도 음차 \'드\'이다. 是는 훈차하여 \'이\'로 읽는다. 그래서 於冬是는 \'어듸\'이다. 去는 훈독하여 \'가-\'로 읽고 於는 훈차하여 \'ㄹ\', 丁은 음차 \'뎌\'이다. 그래서 去於丁는 \'갈뎌\'가 된다. 爲尸는 훈+음차하여 \'힝\', 知는 음차하여 \'디\'이다. 그래서 \'힝디\'로 읽는다.
7) 持以支
持는 훈독하여 \'디니-\'로 읽고 以와 支는 각각 음차 \'이\', \'디\'이다. 그래서 持以支는 \'디니디\'라고 읽는다.
8)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君은 음독하였고 如는 훈독하여 \'다이\'로 읽는다. 臣,多,支,는 모두 음독하여 \'臣다이\'가 된다. 民隱은 음독하고 如는 훈독하여 \'民다이\' 라고 읽었다. 爲는 모든 향가에서 처럼 \'힝-\'로 훈독하였고 內는 음차 \'다\', 尸도 음차 \'ㄹ\'等 음차 \'딪\' 焉 음차 \'ㄴ\'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의 풀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君如에서 如를 \'다\'로 훈독하였는데 뒤의 臣多支에서 보면 如와 多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支 역시 바로 위의 행에서는 \'디\'라고 음독하였는데 이 행에서는 \'히\' 로 해석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뒤이어 民隱如를 \'민다\'로 훈+음독 하였다. 앞뒤의 해석이 어울리지 않고 지헌영 유창균의 삼구육명에 비추어보아 그 의미나 소리의 분절을 찾을 수 없기에 더욱 이상하게 보인다.
차라리 君如 臣多支 // 民隱如 爲內尸等焉 로 分節하여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다우면 백성은(백성 역시) 그답게 할지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미절의 분화를 가능케 하여 위에서 적용한 三句六名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물론 이런 관점은 체계적인 어휘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三句六名의 형식에 맞추어 의미절 분화를 하면서 나온 연역적인 추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 함을 인정한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3. 안민가 원문에 대한 여러 해석
1) 양주동의 해석
君隱父也 君은 어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다힝샬 어힝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잎 얼한 아힝고 힝샬디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다힝 알고다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구믈ㅅ다히 살손 物生
此 惡支治良羅 이흘 머기 다싶라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 힝힝 빛리곡 어듸 갈뎌 힝디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힝다딪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태평(太平)힝니잇다
2) 김완진의 해석
君隱父也 군(君)은 아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臣)은 딪힝실 어힝여.
民焉狂尸恨阿孩古 민(民)잎 얼한 아힝고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힝샬디 민(民)이 딪힝 알고다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구릿 하날 살이기 바라밑아ㅣ
此 食惡支治良羅 이를 치악다싶릴러라
此地 捨遣只於冬是去於丁 이따힝 빛리곡 어드리 가다뎌
爲尸知國惡支持以支如右如 힝디 나락 디니기 알고다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 아야 군다신다히민다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힝다딪 나락태평힝다따
3) 정창일의 해석
君隱 父也 臣隱 愛賜尸 母史也 君은 父야 臣은 괴들히 엄시야
民焉 狂尸 恨 阿孩古 爲賜尸 民언 얼히 恨 아힝ㅣ고 힝들히
知 民是 愛尸 知古如 알 民이 괼히 알고여
窟 理叱 大 生以支 所音 物生 窟 理승 한힝 生이러 바링 物生
此 食惡支 治良羅 此 地 捨遣只 이흘 잡사러 다서라 이 띵힝 주겻긔
於冬是 去 於丁爲尸 知 國惡支 持以支 如右如 어겨이 가 어뎡힝히 알 나라러 디니러 알고여
後 아~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尸 等焉 君여 신더러 민은여 힝다히 딪언
國惡 太平 恨音叱如 나라 태평 띵링승여
<현대어 풀이>
군은 부친이요 신하는 자애스런 모친이요
백성은 방탕 광일한 恨스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알만한 지혜있는 백성이라면 사랑하심을 알 것이다
굴(왕사성 칠엽굴)의 교리로 사는 커다란 삶이라고 바람을 가진 중생들
이들을 먹이고 다스리려고 이 땅을 주겠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지 알 나라라서 지닐지를 알거다
아~
왕이시여! 저더러 백성이여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입니다
) 정창일, 위의 책, p.409~410
참고 문헌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임기증 『신라가요와 기술물의연구』二友出版社 1981
『새로 읽는 향가문학』아세아문학사 1998
신재홍 『향가의 해석』집문당 1971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장홍재 『한국고전문장의 이해』 進明文化社 1996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이영태 『한국고시가의 재조명』 國學資料院 1998
나경수 『향가의 해부』 민속원 2004
정창일 『三句六名의 法式에 依한 鄕歌 新 硏究』 홍문각 1993
「삼구육명의 실상과 향가 해독」 원광대학교 어문학회 1987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보광문화사 2001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김학성 「三句六名의 解釋」
홍기문 『향가해석』 大提閣 1991
) 구사회, 위의 책 p.232~237
5) 此 惡支治良羅
此는 훈독하여 \'이\'라 읽고, 는 음독하여 \'흘\'로 읽는다. 그래서 此 은 \'이흘\'로 읽을 수 있으며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이를~\'이 되는 것이다. 는 훈독하여 \'먹-\'으로 읽고, 惡은 음차 \'ㄱ\'이다. 支 역시 음차로서 \'기\'라 읽는다. 현대어로는 \'먹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治는 훈독 \'다싶-\'이고 良은 훈차 \'아\'이다. 그래서 治良羅는 \'다싶라\'라고 읽으며 뜻은 \'다스려\' 정도가 될 것이다.
6)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此地를 훈독하여 \'이힝\'로 읽었고 은 위에서와 같이 \'흘\'로 음독하였다. 捨는 훈독하여 \'빛리-\'이며 遺는 음차하여 \'고\'로 읽었다. 只 역시 음차 \'ㄱ\'이다. 그래서 捨遺只는 \'빛리곡\'이 된다. 於는 음차 \'어\'이고 冬도 음차 \'드\'이다. 是는 훈차하여 \'이\'로 읽는다. 그래서 於冬是는 \'어듸\'이다. 去는 훈독하여 \'가-\'로 읽고 於는 훈차하여 \'ㄹ\', 丁은 음차 \'뎌\'이다. 그래서 去於丁는 \'갈뎌\'가 된다. 爲尸는 훈+음차하여 \'힝\', 知는 음차하여 \'디\'이다. 그래서 \'힝디\'로 읽는다.
7) 持以支
持는 훈독하여 \'디니-\'로 읽고 以와 支는 각각 음차 \'이\', \'디\'이다. 그래서 持以支는 \'디니디\'라고 읽는다.
8)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君은 음독하였고 如는 훈독하여 \'다이\'로 읽는다. 臣,多,支,는 모두 음독하여 \'臣다이\'가 된다. 民隱은 음독하고 如는 훈독하여 \'民다이\' 라고 읽었다. 爲는 모든 향가에서 처럼 \'힝-\'로 훈독하였고 內는 음차 \'다\', 尸도 음차 \'ㄹ\'等 음차 \'딪\' 焉 음차 \'ㄴ\'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의 풀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君如에서 如를 \'다\'로 훈독하였는데 뒤의 臣多支에서 보면 如와 多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支 역시 바로 위의 행에서는 \'디\'라고 음독하였는데 이 행에서는 \'히\' 로 해석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뒤이어 民隱如를 \'민다\'로 훈+음독 하였다. 앞뒤의 해석이 어울리지 않고 지헌영 유창균의 삼구육명에 비추어보아 그 의미나 소리의 분절을 찾을 수 없기에 더욱 이상하게 보인다.
차라리 君如 臣多支 // 民隱如 爲內尸等焉 로 分節하여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다우면 백성은(백성 역시) 그답게 할지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미절의 분화를 가능케 하여 위에서 적용한 三句六名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물론 이런 관점은 체계적인 어휘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三句六名의 형식에 맞추어 의미절 분화를 하면서 나온 연역적인 추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 함을 인정한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3. 안민가 원문에 대한 여러 해석
1) 양주동의 해석
君隱父也 君은 어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다힝샬 어힝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잎 얼한 아힝고 힝샬디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다힝 알고다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구믈ㅅ다히 살손 物生
此 惡支治良羅 이흘 머기 다싶라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 힝힝 빛리곡 어듸 갈뎌 힝디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힝다딪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태평(太平)힝니잇다
2) 김완진의 해석
君隱父也 군(君)은 아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臣)은 딪힝실 어힝여.
民焉狂尸恨阿孩古 민(民)잎 얼한 아힝고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힝샬디 민(民)이 딪힝 알고다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구릿 하날 살이기 바라밑아ㅣ
此 食惡支治良羅 이를 치악다싶릴러라
此地 捨遣只於冬是去於丁 이따힝 빛리곡 어드리 가다뎌
爲尸知國惡支持以支如右如 힝디 나락 디니기 알고다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 아야 군다신다히민다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힝다딪 나락태평힝다따
3) 정창일의 해석
君隱 父也 臣隱 愛賜尸 母史也 君은 父야 臣은 괴들히 엄시야
民焉 狂尸 恨 阿孩古 爲賜尸 民언 얼히 恨 아힝ㅣ고 힝들히
知 民是 愛尸 知古如 알 民이 괼히 알고여
窟 理叱 大 生以支 所音 物生 窟 理승 한힝 生이러 바링 物生
此 食惡支 治良羅 此 地 捨遣只 이흘 잡사러 다서라 이 띵힝 주겻긔
於冬是 去 於丁爲尸 知 國惡支 持以支 如右如 어겨이 가 어뎡힝히 알 나라러 디니러 알고여
後 아~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尸 等焉 君여 신더러 민은여 힝다히 딪언
國惡 太平 恨音叱如 나라 태평 띵링승여
<현대어 풀이>
군은 부친이요 신하는 자애스런 모친이요
백성은 방탕 광일한 恨스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알만한 지혜있는 백성이라면 사랑하심을 알 것이다
굴(왕사성 칠엽굴)의 교리로 사는 커다란 삶이라고 바람을 가진 중생들
이들을 먹이고 다스리려고 이 땅을 주겠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지 알 나라라서 지닐지를 알거다
아~
왕이시여! 저더러 백성이여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입니다
) 정창일, 위의 책, p.409~410
참고 문헌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임기증 『신라가요와 기술물의연구』二友出版社 1981
『새로 읽는 향가문학』아세아문학사 1998
신재홍 『향가의 해석』집문당 1971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장홍재 『한국고전문장의 이해』 進明文化社 1996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이영태 『한국고시가의 재조명』 國學資料院 1998
나경수 『향가의 해부』 민속원 2004
정창일 『三句六名의 法式에 依한 鄕歌 新 硏究』 홍문각 1993
「삼구육명의 실상과 향가 해독」 원광대학교 어문학회 1987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보광문화사 2001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김학성 「三句六名의 解釋」
홍기문 『향가해석』 大提閣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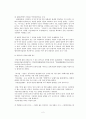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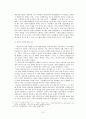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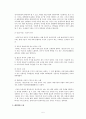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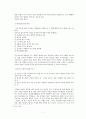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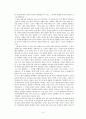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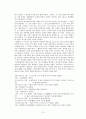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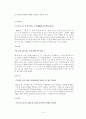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