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동리의 생애
2. 작품으로 살펴본 시기별 구분
1) 제 1기
(1) 산화
(2) 무녀도
2) 제 2기
- 역마
3) 제 3기
- 등신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김동리의 생애
2. 작품으로 살펴본 시기별 구분
1) 제 1기
(1) 산화
(2) 무녀도
2) 제 2기
- 역마
3) 제 3기
- 등신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주인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관찰자일 따름이고, 작품의 주제를 해명시켜 줄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만적이다.
다시 말해, \'나\'는 시대의 현저한 격절을 초월한 만적과의 고귀한 만남을 통해, 숙명적인 자기희생의 광휘를 체험하게 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구원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만적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등신불]이 성취한 작품 자체의 최대미덕은 완미(完美) 하다는 정도라고 평가 될 수 있는 형식적인 꾸밈새에 있다 할 것이다. 김동리는 해방직후 구경적(究竟的)생의 형식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못지않게, 그는 [등신불]에 이르러 소설 미학 자체의 형식적 완결성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분석적, 액자적(額子的), 점층적 구성으로 삶의 근원 탐색-
이 소설의 구성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분석적이다.
이 소설이 비록 단편소설이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만적의 행적이 몇 차례 되풀이 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은 뒤죽박죽 바뀌어진다. 시간의 자연적 질서를 거부하며 과거와 현재를 혼재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분석적이다.
둘째, 액자적(額子的) 이다.
\'나\' 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외부 이야기와 만적의 소신공양(燒身供養 : 몸을 스스로 불태워 부처께 바치는 죽음의 인식)을 제재로 한 내부 이야기가 나란히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점층적이다.
\'나\'는 포교사, 진기수, 경암을 통해 원혜를 만났고 원혜라는 매개적 인물을 통해 가장 법력이 높은 만적으로 인도된다. 또 공간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아도, 북경(北京)으로부터 금불각 내실에 안치된 등신불에 이르기까지, 개방된 세속적인 곳에서 은밀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깊은 곳으로 옮아간다.
만적의 내부 줄거리 역시 청운의 전언, 행장문의 기록, 원혜 대사의 설명을 통해 점차 단계적으로 구체화 된다.
이 소설의 문체는 어설픈 기교를 배제하는, 긴축함을 느끼게 할 만큼 최대한의 어휘를 절약한, 그리고 매우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정련된 글을 지향한다. 그러면서도 초논리적 수사로서의 아이러니도 번득이고 있다. 작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 라고 뒤틀고 있다. 이 왜곡된 진실 속에서 묵시와 계시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부처님이면서도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등신불은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는 \'나\'에게는 희열과 전율의 긴장 속에 존재하고 있다.
대승적인 소신공양과 소승적인 혈서로 대비되는 생의 아이러니를 통해, 작자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찬 인간조건 속에서 인간적 삶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성찰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김동리의 사상을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굳이 시기별로 구분짓지 않더라도 김동리는 평생을 일관된 문학관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현실도피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문화의 전통과 토속성을 누구보다 잘 그려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우리다운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를 아는 것임을 작가는 말하려 하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조회경, 「김동리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이동하, 「가장 한국적인 작가 김동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이진우, 「김동리소설연구-죽음의 인식과 구원을 중심으로」, 푸른사상
이광풍, 「김동리의 \'역마\'연구」,국어국문학
김동훈 외 5인, 한국 대표 중단편 소설50, 중앙일보사, 1995
다시 말해, \'나\'는 시대의 현저한 격절을 초월한 만적과의 고귀한 만남을 통해, 숙명적인 자기희생의 광휘를 체험하게 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구원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만적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등신불]이 성취한 작품 자체의 최대미덕은 완미(完美) 하다는 정도라고 평가 될 수 있는 형식적인 꾸밈새에 있다 할 것이다. 김동리는 해방직후 구경적(究竟的)생의 형식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못지않게, 그는 [등신불]에 이르러 소설 미학 자체의 형식적 완결성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분석적, 액자적(額子的), 점층적 구성으로 삶의 근원 탐색-
이 소설의 구성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분석적이다.
이 소설이 비록 단편소설이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만적의 행적이 몇 차례 되풀이 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은 뒤죽박죽 바뀌어진다. 시간의 자연적 질서를 거부하며 과거와 현재를 혼재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분석적이다.
둘째, 액자적(額子的) 이다.
\'나\' 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외부 이야기와 만적의 소신공양(燒身供養 : 몸을 스스로 불태워 부처께 바치는 죽음의 인식)을 제재로 한 내부 이야기가 나란히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점층적이다.
\'나\'는 포교사, 진기수, 경암을 통해 원혜를 만났고 원혜라는 매개적 인물을 통해 가장 법력이 높은 만적으로 인도된다. 또 공간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아도, 북경(北京)으로부터 금불각 내실에 안치된 등신불에 이르기까지, 개방된 세속적인 곳에서 은밀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깊은 곳으로 옮아간다.
만적의 내부 줄거리 역시 청운의 전언, 행장문의 기록, 원혜 대사의 설명을 통해 점차 단계적으로 구체화 된다.
이 소설의 문체는 어설픈 기교를 배제하는, 긴축함을 느끼게 할 만큼 최대한의 어휘를 절약한, 그리고 매우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정련된 글을 지향한다. 그러면서도 초논리적 수사로서의 아이러니도 번득이고 있다. 작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 라고 뒤틀고 있다. 이 왜곡된 진실 속에서 묵시와 계시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부처님이면서도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등신불은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는 \'나\'에게는 희열과 전율의 긴장 속에 존재하고 있다.
대승적인 소신공양과 소승적인 혈서로 대비되는 생의 아이러니를 통해, 작자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찬 인간조건 속에서 인간적 삶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성찰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김동리의 사상을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굳이 시기별로 구분짓지 않더라도 김동리는 평생을 일관된 문학관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현실도피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문화의 전통과 토속성을 누구보다 잘 그려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우리다운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를 아는 것임을 작가는 말하려 하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조회경, 「김동리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이동하, 「가장 한국적인 작가 김동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이진우, 「김동리소설연구-죽음의 인식과 구원을 중심으로」, 푸른사상
이광풍, 「김동리의 \'역마\'연구」,국어국문학
김동훈 외 5인, 한국 대표 중단편 소설50, 중앙일보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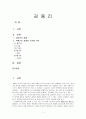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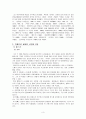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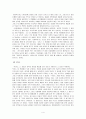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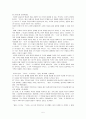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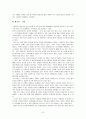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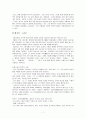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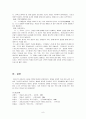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