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조사자료 정리와 해석)
결론
본론 (조사자료 정리와 해석)
결론
본문내용
에 해 숨고, 긴 밤이 침침한 때
청렴을 열어 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일편 광휘에 팔방이 다 밝았다.
하룻밤 찬 바람에 눈이 온가? 서리 온가?
어이 한 천하가 백옥경이 되었는가?
동방이 채 밝거늘 수정렴을 걸어 놓고,
요금을 비껴안아 봉황곡을 타 짚으니,
성성이 청원하여 태공에 들어가니,
파파 계수하에 옥토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차 하니,
유정한 상아도 잔 밑에 빛난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맘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 갈히었나?
천지 희맹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각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내어 벽상에 걸우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어다 기원 녹죽으로
일천 장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서의한 이내 뜻이 혜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
-출전 : 필사본 <인재속집(認齎)>권 8
- 해설
임진왜란으로 몽진 길에 오른 임금을 명월에 비겨, 우국연주의 지극한 정을 노래한 내용으로 달이 찼다가는 기울고, 구름에 가리웠다가는 어느새 모습을 나타내듯 나라의 환난도 머지 않아 물러나리라는 의지를 담았다. \'용사음\'이 직접적인 전란의 상황 속에서의 비분강개를 토로한 내용이라면 이 작품은 구름에 가린 달을 보는 안타까움을 개인적인 서정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기승에서는 밝은 달을 찬미하고, 승사에서는 달이 밝게 천하를 비추니 어두운 곳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전사에서는 밝은 달님께 가슴속에 품은 뜻을 낱낱이 아뢰려 하였더니, 떼구름이 몰려들어 달을 가려 아뢰지 못하겠다며 빨리 저 구름을 씻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피력하고, 결사에서는 단심을 지켜 밝은 달님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서원을 토하였다.
3.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
-은둔적 삶
1) 강가의 돌에 적다(題江石)
홍유손(洪裕孫)
濯足淸江臥白沙 (탁족청강와백사) 강물에 발 씻으며 모래 위에 누웠으니
心神潛寂入無何 (심신잠적입무하) 마음은 고요하여 청정 무구 경지로세.
天敎風浪長선耳 (천교풍랑장선이) 귓가에는 오직 바람에 물결 소리
不聞人間萬事多 (부문인간만사다) 번잡한 속세 일은 들리지 않는다네.
- 해설
화자는 번잡한 속세를 떠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강물’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자 소망하는 공간으로 속세와는 분리된 공간이다. 화자는 그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며 자연과 동화됨으로써, 인간 세상에서 얻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동양적인 자연관과 은둔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2)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崔致遠)
狂噴(奔)疊石吼重巒 (광분첩석후중만)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人語難分咫尺間 (인어난분지척간) 사람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常恐是非聲到耳 (상공시비성도이)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림이 두려워
故敎流水盡籠山 (고교류수진롱산)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출전 : <동문선> 제 19권
해석2.
미친 물 바위 치며 산을 울리어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 못 하네.
행여나 세상 시비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을 시켜 산을 감쌌네 ( 이은상 옮김)
해석3.
바위 바위 내닫는 물 천봉을 우짖음은,
속세의 시비 소리 혹시나마 들릴세라
일부러 물소리로 하여 귀를 먹게 함일다. (손중섭 편저 옛시정을 더듬어)
해석4.
미친 물(奔) 첩첩의 바위를 치며 산봉우리 울려
사람들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세상의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쌌네. (오세영, 서대석 문학교과서)
- 해설
기구에는 웅장한 물(단절의 이미지)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스스로를 인간 세상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작자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승구에는 시끄러운 시비 소리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구에는 작자의 내면세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결구에서의 물소리는 작자의 내면적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켜 고독에 침잠하고자 하는 작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었다. 여기서 유수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작자의 심리 상태를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법은 대조법이고, 자연의 물소리와 대조되는 것은 시비성(是非聲)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 물의 이미지는 단절을 의미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시어는 유수(流水)이다.
이 시는 현실적으로 패배한 지식인 최치원의 내면적 갈등이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정, 자연을 통해 현실적 고뇌 극복 , 자연 속의 침잠을 통해 세속과 거리를 두고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있다.
3) 산촌에 눈이 오니
신흠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하노라.
-출전 : 청구영언(靑丘永言)
- 해설
이 시조는 신흠이 인목대비 폐위 사건인 계축(癸丑)년의 옥사 때 고향인 춘천 근교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조로 산촌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선비의 고결한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겨울밤의 고요하고 씁쓸한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산촌, 눈, 돌길, 사립문, 달’로 이어지는 풍경의 묘사가 감각적이다. 주요 소재로 쓰인 것들이 모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물들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세속을 떠난 작자의 냉정한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결한 삶
1) 상춘곡(賞春曲)
정극인(丁克仁)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한고.
청렴을 열어 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일편 광휘에 팔방이 다 밝았다.
하룻밤 찬 바람에 눈이 온가? 서리 온가?
어이 한 천하가 백옥경이 되었는가?
동방이 채 밝거늘 수정렴을 걸어 놓고,
요금을 비껴안아 봉황곡을 타 짚으니,
성성이 청원하여 태공에 들어가니,
파파 계수하에 옥토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차 하니,
유정한 상아도 잔 밑에 빛난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맘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 갈히었나?
천지 희맹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각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내어 벽상에 걸우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어다 기원 녹죽으로
일천 장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서의한 이내 뜻이 혜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
-출전 : 필사본 <인재속집(認齎)>권 8
- 해설
임진왜란으로 몽진 길에 오른 임금을 명월에 비겨, 우국연주의 지극한 정을 노래한 내용으로 달이 찼다가는 기울고, 구름에 가리웠다가는 어느새 모습을 나타내듯 나라의 환난도 머지 않아 물러나리라는 의지를 담았다. \'용사음\'이 직접적인 전란의 상황 속에서의 비분강개를 토로한 내용이라면 이 작품은 구름에 가린 달을 보는 안타까움을 개인적인 서정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기승에서는 밝은 달을 찬미하고, 승사에서는 달이 밝게 천하를 비추니 어두운 곳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전사에서는 밝은 달님께 가슴속에 품은 뜻을 낱낱이 아뢰려 하였더니, 떼구름이 몰려들어 달을 가려 아뢰지 못하겠다며 빨리 저 구름을 씻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피력하고, 결사에서는 단심을 지켜 밝은 달님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서원을 토하였다.
3.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
-은둔적 삶
1) 강가의 돌에 적다(題江石)
홍유손(洪裕孫)
濯足淸江臥白沙 (탁족청강와백사) 강물에 발 씻으며 모래 위에 누웠으니
心神潛寂入無何 (심신잠적입무하) 마음은 고요하여 청정 무구 경지로세.
天敎風浪長선耳 (천교풍랑장선이) 귓가에는 오직 바람에 물결 소리
不聞人間萬事多 (부문인간만사다) 번잡한 속세 일은 들리지 않는다네.
- 해설
화자는 번잡한 속세를 떠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강물’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자 소망하는 공간으로 속세와는 분리된 공간이다. 화자는 그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며 자연과 동화됨으로써, 인간 세상에서 얻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동양적인 자연관과 은둔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2)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崔致遠)
狂噴(奔)疊石吼重巒 (광분첩석후중만)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人語難分咫尺間 (인어난분지척간) 사람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常恐是非聲到耳 (상공시비성도이)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림이 두려워
故敎流水盡籠山 (고교류수진롱산)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출전 : <동문선> 제 19권
해석2.
미친 물 바위 치며 산을 울리어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 못 하네.
행여나 세상 시비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을 시켜 산을 감쌌네 ( 이은상 옮김)
해석3.
바위 바위 내닫는 물 천봉을 우짖음은,
속세의 시비 소리 혹시나마 들릴세라
일부러 물소리로 하여 귀를 먹게 함일다. (손중섭 편저 옛시정을 더듬어)
해석4.
미친 물(奔) 첩첩의 바위를 치며 산봉우리 울려
사람들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세상의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쌌네. (오세영, 서대석 문학교과서)
- 해설
기구에는 웅장한 물(단절의 이미지)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스스로를 인간 세상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작자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승구에는 시끄러운 시비 소리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구에는 작자의 내면세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결구에서의 물소리는 작자의 내면적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켜 고독에 침잠하고자 하는 작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었다. 여기서 유수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작자의 심리 상태를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법은 대조법이고, 자연의 물소리와 대조되는 것은 시비성(是非聲)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 물의 이미지는 단절을 의미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시어는 유수(流水)이다.
이 시는 현실적으로 패배한 지식인 최치원의 내면적 갈등이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정, 자연을 통해 현실적 고뇌 극복 , 자연 속의 침잠을 통해 세속과 거리를 두고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있다.
3) 산촌에 눈이 오니
신흠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하노라.
-출전 : 청구영언(靑丘永言)
- 해설
이 시조는 신흠이 인목대비 폐위 사건인 계축(癸丑)년의 옥사 때 고향인 춘천 근교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조로 산촌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선비의 고결한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겨울밤의 고요하고 씁쓸한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산촌, 눈, 돌길, 사립문, 달’로 이어지는 풍경의 묘사가 감각적이다. 주요 소재로 쓰인 것들이 모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물들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세속을 떠난 작자의 냉정한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결한 삶
1) 상춘곡(賞春曲)
정극인(丁克仁)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한고.
추천자료
 21세기 고전시가 연구의 이념과 방법
21세기 고전시가 연구의 이념과 방법 [고전문학] 田禹治傳(전우치전)
[고전문학] 田禹治傳(전우치전) (동서양고전) 공자의 <논어> 내용요약 및 독후감
(동서양고전) 공자의 <논어> 내용요약 및 독후감 나의 동양고전독법 -강의-
나의 동양고전독법 -강의- [동서양고전] 장자 발췌요약 정리 및 독후감
[동서양고전] 장자 발췌요약 정리 및 독후감 일본 고전 문학사 개요 (日本 古典 文學史 槪要)
일본 고전 문학사 개요 (日本 古典 文學史 槪要) [고전과 현대문학의 관련성] ‘경문왕 설화’와 이청준의 ‘소문의 벽’ 문학 관련성
[고전과 현대문학의 관련성] ‘경문왕 설화’와 이청준의 ‘소문의 벽’ 문학 관련성  [고전 작품 수업지도안](만흥 학습지도안)
[고전 작품 수업지도안](만흥 학습지도안) 동아시아의 고전 이해
동아시아의 고전 이해 [한국고전문학개론] 금오신화 연구
[한국고전문학개론] 금오신화 연구 [고전문학 교육론] 가전 문학 수업하기 -교과서에 실린 주요 가전 작품 (공방전 국순전 국선...
[고전문학 교육론] 가전 문학 수업하기 -교과서에 실린 주요 가전 작품 (공방전 국순전 국선... [고전 문학 교육론] 가전 문학 수업하기 - 교과서에 실린 주요 가전 작품 (공방전 국순전 국...
[고전 문학 교육론] 가전 문학 수업하기 - 교과서에 실린 주요 가전 작품 (공방전 국순전 국... [고전문학 교육론] 살아있는 민요교육-노동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 교육론] 살아있는 민요교육-노동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 교육론] 판소리계 소설 지도 방안
[고전문학 교육론] 판소리계 소설 지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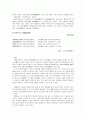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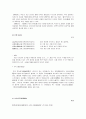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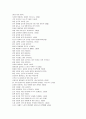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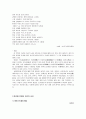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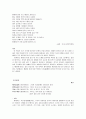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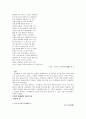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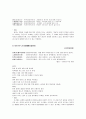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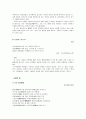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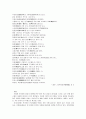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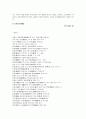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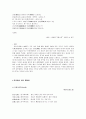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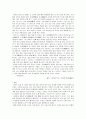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