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 리 말
Ⅱ. 고려이전의 술의 역사
Ⅲ. 고려시대 국가의 주점(酒店) 운영
Ⅳ. 고려시대 금주령(禁酒令)
1. 고려이전의 금주령
2. 고려시대의 금주령
Ⅴ. 맺 음 말
참고문헌
Ⅱ. 고려이전의 술의 역사
Ⅲ. 고려시대 국가의 주점(酒店) 운영
Ⅳ. 고려시대 금주령(禁酒令)
1. 고려이전의 금주령
2. 고려시대의 금주령
Ⅴ.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금 공진(供進)하게 하고, 제향(祭享)의 초주(醮酒)도 별도로 술만드는 곳을 세우며, 그 외에는 공사(公私)에 일체 금단(禁斷)하여 범하는 자는 각각 죄를 논하게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131 금제1 금주)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금주(禁酒)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사찰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금주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금주령이 내려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시 술을 만들고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나라법에 농부들이 흰밥, 청주를 먹기를 금지했단 소식을 듣고[聞國令禁農餉淸酒白飯]」에 보면 “……맑은 술에 동동 뜨는 기름방울을/ 머슴은 홀짝 마셔 맛을 보거니/ 이건 모두 농부들이 일한 덕이지/ 저들이 거둬들인 열매 아니라네/……맑디맑은 초록색 감도는 술이랴/ 그 모두가 농부들이 만든 것이니/ 그들이 먹는다고 하늘이 허물하랴/ 여보소 권농사(勸農使) 내 말을 들어주게/ 나라의 법 잘못이니 고쳐야 하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때 금주령은 시기상으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고종 4년(1217)에 내려진 금주령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국가에서 금주령을 내렸지만 귀족들의 경우에는 종까지도 술을 먹을 수 있었지만 술을 빚기 위한 곡식을 만든 농민들만 정작 금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술에 대한 통제가 권세가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주점운영과 다르게 정부는 고려시대에 걸쳐 여러 차례 금주령을 내림으로써 풍기의 단속 및 농사의 안정을 꾀하였다. 술을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가하였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서 백성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가능했고 술이 고려시대에는 더 이상 자유로운 기호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Ⅴ. 맺 음 말
이상으로 고려시대 국가에 의한 술의 통제를 살펴보았다. 고려 정부는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경에 6개의 주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화폐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따로 두며 지방에까지 주점을 열도록 하였다.
또한 사원이나 관료들의 술과 관련한 폐단을 막거나, 국가의 대상(大喪)이나 흉년에 전 백성에 대한 금주령을 내렸다. 이것은 술이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이 본고에서 서술한 대략의 내용인데, 서술의 구조 및 문제의식 자체가 시기적인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며 서술의 구조상 나열의 형태를 취해야 했고, 시기가 다른 사료를 이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여러 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국가의 술에 대한 통제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술이 고대시기 집단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나 치료제 혹은 신과의 매개물로 자리 잡았다가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삼국시대의 금주(禁酒)와 관련된 기사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했지만 삼국시대의 국가에 의한 관영주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정치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술이 가지는 문화적인 측면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소홀하였는데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삼국지』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이상국집』.
서긍(조동원 등 공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증보문헌비고』,동협회, 1996.
강만길,『한국사』, 한길사, 1995.
정용범,「고려시대 中國錢 유통과 주전책-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호, 1997.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금주(禁酒)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사찰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금주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금주령이 내려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시 술을 만들고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나라법에 농부들이 흰밥, 청주를 먹기를 금지했단 소식을 듣고[聞國令禁農餉淸酒白飯]」에 보면 “……맑은 술에 동동 뜨는 기름방울을/ 머슴은 홀짝 마셔 맛을 보거니/ 이건 모두 농부들이 일한 덕이지/ 저들이 거둬들인 열매 아니라네/……맑디맑은 초록색 감도는 술이랴/ 그 모두가 농부들이 만든 것이니/ 그들이 먹는다고 하늘이 허물하랴/ 여보소 권농사(勸農使) 내 말을 들어주게/ 나라의 법 잘못이니 고쳐야 하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때 금주령은 시기상으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고종 4년(1217)에 내려진 금주령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국가에서 금주령을 내렸지만 귀족들의 경우에는 종까지도 술을 먹을 수 있었지만 술을 빚기 위한 곡식을 만든 농민들만 정작 금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술에 대한 통제가 권세가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주점운영과 다르게 정부는 고려시대에 걸쳐 여러 차례 금주령을 내림으로써 풍기의 단속 및 농사의 안정을 꾀하였다. 술을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가하였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서 백성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가능했고 술이 고려시대에는 더 이상 자유로운 기호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Ⅴ. 맺 음 말
이상으로 고려시대 국가에 의한 술의 통제를 살펴보았다. 고려 정부는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경에 6개의 주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화폐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따로 두며 지방에까지 주점을 열도록 하였다.
또한 사원이나 관료들의 술과 관련한 폐단을 막거나, 국가의 대상(大喪)이나 흉년에 전 백성에 대한 금주령을 내렸다. 이것은 술이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이 본고에서 서술한 대략의 내용인데, 서술의 구조 및 문제의식 자체가 시기적인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며 서술의 구조상 나열의 형태를 취해야 했고, 시기가 다른 사료를 이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여러 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국가의 술에 대한 통제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술이 고대시기 집단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나 치료제 혹은 신과의 매개물로 자리 잡았다가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삼국시대의 금주(禁酒)와 관련된 기사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했지만 삼국시대의 국가에 의한 관영주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정치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술이 가지는 문화적인 측면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소홀하였는데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삼국지』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이상국집』.
서긍(조동원 등 공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증보문헌비고』,동협회, 1996.
강만길,『한국사』, 한길사, 1995.
정용범,「고려시대 中國錢 유통과 주전책-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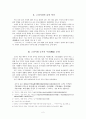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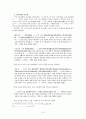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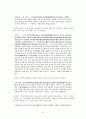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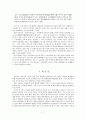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