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북공정의 배경과 목적
2. 추진기관
3. 역사문제
4. 강역문제
Ⅲ. 결 론
# 부록 - 동북공정에 관한 신문기사
Ⅱ. 본 론
1. 동북공정의 배경과 목적
2. 추진기관
3. 역사문제
4. 강역문제
Ⅲ. 결 론
# 부록 - 동북공정에 관한 신문기사
본문내용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개입 여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이 같은 행동은 또 최근 대북 정책의 의도와 속셈에 대한 오해를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의 유물이라고 할 발해의 ‘홍려정비’ 또는 ‘발해석비’를 반환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하며 우리 문화유산까지 자국 것으로 둔갑시키려 해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 ‘홍려정비’는 당나라의 사절인 홍려경 최씨가 발해의 대조영에게 발해군공이라는 관작을 책봉하기 위해 가는 길에 황금산에서 우물을 두 개 파면서 이를 기리기 위한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다. 문구의 내용이 발해가 당나라에 귀환(발해귀당)된 것을 기리고 있기 때문에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던 사실과 발해 역사가 중국 역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현존의 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중국 측 해석과 유물의 역사적 가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문제는 문구에 내재한 맹점이다. 우선 명확하게 누가 이런 비를 세웠는지가 불분명하다.
최근 중국 사료에 의하면 최흔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는 하나, 이는 푸위강이라는 사람이 이 석비를 본래 유적지에 다시 세우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흔’은 ‘기쁘다’는 의미로 당시 책봉자의 입장을 고려한 작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런 중국 측의 설명 자료에 비춰 봐서도 석비가 세워진 배경과 내재한 문구의 의미가 당시 당나라 정부 또는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이 석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유물적 가치 이외에도 아편전쟁 이후 100년의 반식민지통치 기간 외국에 반출된 자국의 문화유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실마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유네스코의 ‘문화재 본국 송환 또는 불법소유 문화재산의 송환을 촉구하는 정부 간 위원회 규약’으로 이 같은 요구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측의 동 규약에 의하면 불법으로 유출 또는 밀반출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50년 내에 합법적으로 이들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하기에 앞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문화재가 자국의 유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를 재정비하고 재해석하여 자국의 요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긴 시간의 역사인 만큼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외 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몇 점일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은 것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사례를 적극 이용하듯이, 정부와 학계가 중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것을 수호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국제관계학
이 ‘홍려정비’는 당나라의 사절인 홍려경 최씨가 발해의 대조영에게 발해군공이라는 관작을 책봉하기 위해 가는 길에 황금산에서 우물을 두 개 파면서 이를 기리기 위한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다. 문구의 내용이 발해가 당나라에 귀환(발해귀당)된 것을 기리고 있기 때문에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던 사실과 발해 역사가 중국 역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현존의 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중국 측 해석과 유물의 역사적 가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문제는 문구에 내재한 맹점이다. 우선 명확하게 누가 이런 비를 세웠는지가 불분명하다.
최근 중국 사료에 의하면 최흔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는 하나, 이는 푸위강이라는 사람이 이 석비를 본래 유적지에 다시 세우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흔’은 ‘기쁘다’는 의미로 당시 책봉자의 입장을 고려한 작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런 중국 측의 설명 자료에 비춰 봐서도 석비가 세워진 배경과 내재한 문구의 의미가 당시 당나라 정부 또는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이 석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유물적 가치 이외에도 아편전쟁 이후 100년의 반식민지통치 기간 외국에 반출된 자국의 문화유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실마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유네스코의 ‘문화재 본국 송환 또는 불법소유 문화재산의 송환을 촉구하는 정부 간 위원회 규약’으로 이 같은 요구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측의 동 규약에 의하면 불법으로 유출 또는 밀반출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50년 내에 합법적으로 이들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하기에 앞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문화재가 자국의 유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를 재정비하고 재해석하여 자국의 요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긴 시간의 역사인 만큼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외 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몇 점일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은 것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사례를 적극 이용하듯이, 정부와 학계가 중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것을 수호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국제관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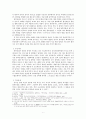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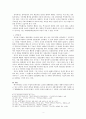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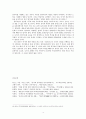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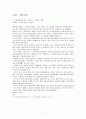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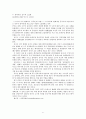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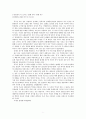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