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失藜藿緬縱橫
정해년이 저무는데 서산에선 군사 훈련하네,
공주의 길에는 양식이 쌓여 있고 병사들은 창 잡고 강성에서 싸우려하네,
엄동에 북풍이 세차고 황량한 산에는 구름이 빗겨 가네,
어두워 밤낮이 따로 없는데 격문에 다시 서로 놀라는 도다,
몸을 굽혀 만길을 오르고 위태로이 가파른 계곡을 거치네,
수다한 산봉과 계곡을 지나 처량히 눈어름길 가는 도다,
성인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태평성세 당연하리라는데,
고기 먹는 분들 하는 일 어찌 손실뿐인가? 기장 풀만 가로세로 깔려 있으니
이 시에서 정해년은 687년으로 진자앙의 나이 27세 때의 作으로 武則天이 羌을 공격하는 불의의 전쟁과 백성과 병사에 주는 재난을 묘사하면서 武窮兵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을 강렬히 표현하였다.
◆ 晩次樂鄕縣 ◆
故鄕香無際日暮且孤征
川原迷舊國道路入邊城
野戍荒烟斷深山古木平
如何此時恨夜猿鳴
고향 끝없이 아득한데 저물녘 홀로 길을 가는구나.
시내와 들엔 옛날 안보이고 길은 변성에 이어 닿았네.
수자리엔 거친 연기 끊기었고 깊은 산엔 고목이 나란히.
이 맺힌 한을 어찌 하리오? 찍찍 밤에 원숭이 울어대네.
이 시는 진자앙이 21세에 射洪에서 長安으로 가던 길에 樂鄕縣을 지나며 지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외로운 심정을 읊었고, 野戍와 深山은 타향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며, 客人의 적막하고 슬픈 감회를 돋구어 줬다.
◆ 臥疾家園 ◆
世上無名子 人間歲月餘
縱橫策已棄 寂寞道爲家
猶憶靈臺友 棲眞隱太霞
還丹奔日御 却老餌雲芽
寧知白社客 不厭靑門瓜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세상의 세월 가기만 하네.
나라 위해 계책 다 버리고 조용히 맑은 도리 본으로 삼아
병든 몸 누가 물으면 한가로이 지내며 경물을 벗한다고.
영대의 옛 벗 그리웁고 眞에 깃들려고 선소에 숨었다네.
환단을 먹고 해를 좇으며 늙지 않으려 운아차를 마시도다.
어이 알리오 백사 도장의 나그네를 청문에 오이 심음이 싫지 않음을..
이 시는 진자앙이 32세 전후의 작이다. 이 때는 母喪을 당하고 臥病하여 소극적으로 은거하며 學仙하면서 요양하고 있었을 때 지은 것으로 나이 들고 功業이 없음을 탄식하였고, 병중의 정황을 묘사하고, 은거의 希願을 이야기하고 있다. 太霞, 還丹, 雲芽, 白社客 등의 도교 용어가 쓰인 것을 보면 脫俗的인 詩意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酬暉上人秋夜山亭有贈 ◆
皎皎白林秋微微翠山靜
禪居感物變獨坐開軒
風泉夜聲雜月露宵光冷
多謝忘機人塵憂未能整
밝은 달 어울진 숲엔 가을이 깊고 미미하게 푸른 산엔 정적이 흐르누나.
참선하는 중에 어느덧 경물이 달라지매 홀로 앉아서 난간 병풍 열어펴니
소슬한 샘소리 밤과 한데 어울려있고 달빛 어린 이슬 한 밤에 더욱 차네.
감사드리네, 이 속세를 떨친 님에게! 나도 티끌진 이 근심 가눌길 없으니.
이 시에서는 아름다운 가을밤의 경치를 보여준다. “皎皎白林秋”은 찬 숲의 쓸쓸함과 달빛 아래 비치는 白色과 “秋”라는 글자가 절기를 알려준다. 또 자연과 같은 호흡의 경지에 들고, 속세의 먼지를 떨치고 忘機해야 하지만, 暉上人에 못 미치는 부끄러움이 깃들어있다.
정해년이 저무는데 서산에선 군사 훈련하네,
공주의 길에는 양식이 쌓여 있고 병사들은 창 잡고 강성에서 싸우려하네,
엄동에 북풍이 세차고 황량한 산에는 구름이 빗겨 가네,
어두워 밤낮이 따로 없는데 격문에 다시 서로 놀라는 도다,
몸을 굽혀 만길을 오르고 위태로이 가파른 계곡을 거치네,
수다한 산봉과 계곡을 지나 처량히 눈어름길 가는 도다,
성인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태평성세 당연하리라는데,
고기 먹는 분들 하는 일 어찌 손실뿐인가? 기장 풀만 가로세로 깔려 있으니
이 시에서 정해년은 687년으로 진자앙의 나이 27세 때의 作으로 武則天이 羌을 공격하는 불의의 전쟁과 백성과 병사에 주는 재난을 묘사하면서 武窮兵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을 강렬히 표현하였다.
◆ 晩次樂鄕縣 ◆
故鄕香無際日暮且孤征
川原迷舊國道路入邊城
野戍荒烟斷深山古木平
如何此時恨夜猿鳴
고향 끝없이 아득한데 저물녘 홀로 길을 가는구나.
시내와 들엔 옛날 안보이고 길은 변성에 이어 닿았네.
수자리엔 거친 연기 끊기었고 깊은 산엔 고목이 나란히.
이 맺힌 한을 어찌 하리오? 찍찍 밤에 원숭이 울어대네.
이 시는 진자앙이 21세에 射洪에서 長安으로 가던 길에 樂鄕縣을 지나며 지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외로운 심정을 읊었고, 野戍와 深山은 타향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며, 客人의 적막하고 슬픈 감회를 돋구어 줬다.
◆ 臥疾家園 ◆
世上無名子 人間歲月餘
縱橫策已棄 寂寞道爲家
猶憶靈臺友 棲眞隱太霞
還丹奔日御 却老餌雲芽
寧知白社客 不厭靑門瓜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세상의 세월 가기만 하네.
나라 위해 계책 다 버리고 조용히 맑은 도리 본으로 삼아
병든 몸 누가 물으면 한가로이 지내며 경물을 벗한다고.
영대의 옛 벗 그리웁고 眞에 깃들려고 선소에 숨었다네.
환단을 먹고 해를 좇으며 늙지 않으려 운아차를 마시도다.
어이 알리오 백사 도장의 나그네를 청문에 오이 심음이 싫지 않음을..
이 시는 진자앙이 32세 전후의 작이다. 이 때는 母喪을 당하고 臥病하여 소극적으로 은거하며 學仙하면서 요양하고 있었을 때 지은 것으로 나이 들고 功業이 없음을 탄식하였고, 병중의 정황을 묘사하고, 은거의 希願을 이야기하고 있다. 太霞, 還丹, 雲芽, 白社客 등의 도교 용어가 쓰인 것을 보면 脫俗的인 詩意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酬暉上人秋夜山亭有贈 ◆
皎皎白林秋微微翠山靜
禪居感物變獨坐開軒
風泉夜聲雜月露宵光冷
多謝忘機人塵憂未能整
밝은 달 어울진 숲엔 가을이 깊고 미미하게 푸른 산엔 정적이 흐르누나.
참선하는 중에 어느덧 경물이 달라지매 홀로 앉아서 난간 병풍 열어펴니
소슬한 샘소리 밤과 한데 어울려있고 달빛 어린 이슬 한 밤에 더욱 차네.
감사드리네, 이 속세를 떨친 님에게! 나도 티끌진 이 근심 가눌길 없으니.
이 시에서는 아름다운 가을밤의 경치를 보여준다. “皎皎白林秋”은 찬 숲의 쓸쓸함과 달빛 아래 비치는 白色과 “秋”라는 글자가 절기를 알려준다. 또 자연과 같은 호흡의 경지에 들고, 속세의 먼지를 떨치고 忘機해야 하지만, 暉上人에 못 미치는 부끄러움이 깃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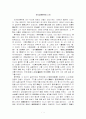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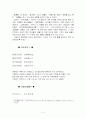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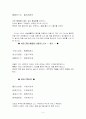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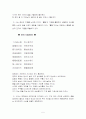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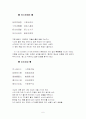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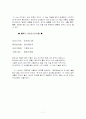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