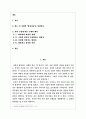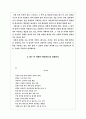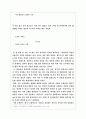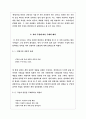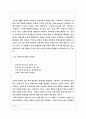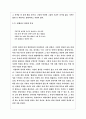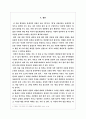목차
1. 서론
2. 쥐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상징한다.
3. 시의 구절에 따른 구체적 해석
3-Ⅰ. 위정자의 내면적 상태
3-Ⅱ. 국민과 언론을 두려워하는 위정자
3-Ⅲ. 욕망에 이끌리는 위정자
3-Ⅳ. 황홀하고 불안한 욕망
4. 결론
2. 쥐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상징한다.
3. 시의 구절에 따른 구체적 해석
3-Ⅰ. 위정자의 내면적 상태
3-Ⅱ. 국민과 언론을 두려워하는 위정자
3-Ⅲ. 욕망에 이끌리는 위정자
3-Ⅳ. 황홀하고 불안한 욕망
4. 결론
본문내용
망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황홀하다. 자신의 욕망을 떠올려 보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돈더미에 싸여 있는 상상을,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최정상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상상을,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내 혹은 남편이 곁에 있으며 예쁜 아이들이 뛰어노는 상상을 해보아라. 크든 작든 욕망은 황홀한 것이다. 하지만 그 황홀함 속에는 불안이라는 속성도 숨어있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력 끝에 채워지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 그 욕망이 허황되다면 혹은 그 욕망을 채우는 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망치는 길인 것이다. 화자는 쥐에 욕망에 이러한 평가를 내리면 시를 끝낸다.
4. 결론
이 시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상징은 바로 ‘쥐’이다. ‘쥐’를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의 경우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타락한 위정자’ 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욱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는 시인과 그가 시를 썼던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위정자도 사람의 일부이라 좀 더 쥐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대상으로 해석해 보았다.
위의 시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보면 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동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내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탐욕이나 허황된 욕망의 재물이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종윤, 시적 감동의 자기 체험화 (도서출판 鳳凰,, 2004), p.149.
하지만 나의 눈에는 요즘 시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위의 시가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질책이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화살을 돌리고 싶었는지 ‘쥐’가 ‘타락한 위정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좁혔다.
상징이 비유보다 어려운 것은 시 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원관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의 ‘쥐’도 알고 보면 허무맹랑한 나만의 추측일 수도 있다. 비유로 인해 더 풍부한 감정과 깊은 감동들이 전달된다면 상징으로 인해 시는 더욱 애매모호해지고 따라서 독자들은 하나 같이 형사 콜롬보가 되어 범인을 찾아내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 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이러한 시의 상징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서 생겨났다. 1학년 때 문학부에서 내었던 ‘5분의 여백’ 이라는 책의 나의 파트를 보면 시작 노트에 이렇게 쓰여 있다. ‘ 내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는 암호와 같아서 단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두고 곱씹으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슬그머니 자신의 속내를 비춰준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 그것은 아마 시에 사용되는 상징의 기법이 마음에 들어서이었던 것 같다. 짝을 맞추는 것. 1학년 때부터 시를 읽으면서 나는 ‘짝을 맞추는’ 재미를 느꼈던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상징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러한 기법이 사용된 실례를 통해서 그러한 표현들은 분석해보았다. 알아갈 수록 어려운 것 같다. 시 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줄줄이 늘어놓는 감정의 표현들이 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시이고 그만큼 펜을 쥐기가 어려운 것도 시인 것 같다. 단 시간에 여러 편을 써놓고 다작시인이라며 좋아했던 일학년 때가 오히려 좋았을까. 시를 쓰는 펜이 무거워졌음을 느낀다.
참고 문헌
金容稷, 現代詩原論 , 학연사, 2003.
김종윤, 시적 감동의 자기 체험화 , 도서출판 鳳凰, 2004.
4. 결론
이 시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상징은 바로 ‘쥐’이다. ‘쥐’를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의 경우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타락한 위정자’ 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욱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는 시인과 그가 시를 썼던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위정자도 사람의 일부이라 좀 더 쥐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대상으로 해석해 보았다.
위의 시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보면 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동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내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탐욕이나 허황된 욕망의 재물이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종윤, 시적 감동의 자기 체험화 (도서출판 鳳凰,, 2004), p.149.
하지만 나의 눈에는 요즘 시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위의 시가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질책이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화살을 돌리고 싶었는지 ‘쥐’가 ‘타락한 위정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좁혔다.
상징이 비유보다 어려운 것은 시 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원관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의 ‘쥐’도 알고 보면 허무맹랑한 나만의 추측일 수도 있다. 비유로 인해 더 풍부한 감정과 깊은 감동들이 전달된다면 상징으로 인해 시는 더욱 애매모호해지고 따라서 독자들은 하나 같이 형사 콜롬보가 되어 범인을 찾아내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 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이러한 시의 상징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서 생겨났다. 1학년 때 문학부에서 내었던 ‘5분의 여백’ 이라는 책의 나의 파트를 보면 시작 노트에 이렇게 쓰여 있다. ‘ 내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는 암호와 같아서 단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두고 곱씹으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슬그머니 자신의 속내를 비춰준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 그것은 아마 시에 사용되는 상징의 기법이 마음에 들어서이었던 것 같다. 짝을 맞추는 것. 1학년 때부터 시를 읽으면서 나는 ‘짝을 맞추는’ 재미를 느꼈던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상징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러한 기법이 사용된 실례를 통해서 그러한 표현들은 분석해보았다. 알아갈 수록 어려운 것 같다. 시 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줄줄이 늘어놓는 감정의 표현들이 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시이고 그만큼 펜을 쥐기가 어려운 것도 시인 것 같다. 단 시간에 여러 편을 써놓고 다작시인이라며 좋아했던 일학년 때가 오히려 좋았을까. 시를 쓰는 펜이 무거워졌음을 느낀다.
참고 문헌
金容稷, 現代詩原論 , 학연사, 2003.
김종윤, 시적 감동의 자기 체험화 , 도서출판 鳳凰, 2004.